유령과 파수꾼들유운성 지음미디어버스 발행초판 2018년 7월 10일 발행
개정판 2020년 3월 15일 발행ISBN 979-11-90434-04-1 (94600)978-89-94027-89-0 (세트)126x195mm / 500페이지값 25,000원영화평론가의 눈에 비친 동시대 영상문화의 풍경『유령과 파수꾼들』은 영화평론가 유운성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쓴 글 가운데 33편을 모은 책이다. (2020년 3월 발행된 개정판은 여기에 2개의 글이 추가되었다) 2001년 『씨네 21』 영화평론상 수상으로 등단한 이후 그는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와 문지문화원사이 기획부장을 거치면서 영화에 대한 다양한 글을 써왔다. 여기에 수록된 글에서 저자는 영화평론가 뿐만 아니라 잡지 편집자와 영화제 프로그래머 일을 통해 축적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녹여낸다.‘우정을 위한 거리’, ‘뤼미에르 은하의 가장자리에서’, ‘픽션에 대한 물음들’, ‘고다르(의) 읽기’, ‘당신을 바라보기 위하여’, ‘지금 여기의 가장자리’, ‘포르투갈식 작별’과 같은 챕터 제목 만으로 이 책의 성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저자가 후기에서 밝혔듯이, 영화라는 한정된 영역에 머물지 않고 동시대 예술과 사유라는 보다 폭넓은 맥락에서 글을 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글들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통념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통념에 익숙한 이들에게 유운성의 사유는 낯설게 보일 수 있다.그러나 이 책이 다루는 대상이 그렇게 낯선 것만은 아니다. 이 책은 크리스찬 마클레이와 같은 영상작가부터 히치콕과 고다르, 그리고 페드로 코스타와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주앙 세자르 몬테이로와 같은 동시대 포르투갈 감독까지를 아우른다. 하지만 그는 작가들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경계하고 개념어가 가진 추상성을 거부하면서 자신만의 정교한 사유를 따라 씨네필의 경전을 재구성한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유령과 파수꾼들’이라는 글에서 유운성은 미술작가 그룹 옥인 콜렉티브를 경유해서 현대미술에 이야기를 걸기도 하고, 박솔뫼나 장보윤 같은 소설가나 사진 작가들의 작업을 경유해 동시대 영상에 대해 우회적으로 숙고해 보기도 한다.이 책이 ‘우정을 위한 거리’라는 제목의 챕터로 시작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유운성은 이 책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감독과 영화를 다루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사유의 대상이 된 영화의 주변부 이야기를 포함시킨다. 혹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책은 그 ‘가장자리’에 의해 새롭게 갱신되어야 할 ‘영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동시에 ‘뤼미에르 은하의 가장자리에서’와 ‘픽션에 대한 물음들’과 같은 챕터에서 유운성은 자신의 사유의 근본이 되는 ‘이미지’, ‘픽션’, ‘에세이 영화’ 같은 중요한 개념들을 여러 개의 글을 통해 새롭게 직조한다. 이러한 사유는 독자에게 ‘이미지’나 ‘픽션’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 이러한 개념들이 영화나 오늘날 영상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재고되어야 하는지 보여준다.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비평가들조차 영화를 예술이나 문화 산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지금 유운성은 영화나 동시대 이미지 문화가 과연 고유의 언어로 사유될 수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영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나 영화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유운성이 소위 ‘영화계’라는 한정된 영역에 고정되고 않고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하나의 풍경으로 사유한 것도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이 책은 2000년대 씨네필 문화의 영광과 쇠락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갱신한 어느 신중한 비평가의 노작이다.목차우정을 위한 거리距離우정의 이미지들‘영화-편지’의 조건, 또는 ‘영화-편지’는 가능한가파편들키노-아이, 사물의 편에서유령과 파수꾼들뤼미에르 은하의 가장자리에서시간의 건축적 경험고유명으로서의 이미지떠도는 영화, 혹은 이름 없는 것의 이름 부르기밀수꾼의 노래: 다시 움직이는 비평을 위한 몽타주사막은 보이지 않는다: 조지 밀러의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
애니메이션과 리얼리즘의 처소: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픽션에 대한 물음들형상적 픽션을 향하여: 커모드, 아우어바흐, 그리고 영화천일야화, 혹은 픽션 없는 세계에 저항하기텍스트 소셜리즘, 모든 이름들을 위한 바다: 박솔뫼의 『머리부터 천천히』픽션 없는 사진들을 위한 모험, 그리고 흔적에 대한 책임: 장보윤의 ‘다시 이곳에서: 마운트 아날로그’고다르(의) 읽기〈영화의 역사(들)〉과 고다르의 서재
그저 하나의 얼굴: 「제인에게 보내는 편지」
〈언어와의 작별〉고다르의 〈인디아〉(로베르토 로셀리니, 1959) 리뷰에 대한 세 개의 주석: 에세이 영화에 대하여당신을 바라보기 위하여내 곁에 있어 줘: 필립 가렐과 고독의 인상학하나의 시선을 위한 퍼포먼스: 나루세 미키오에 대한 노트지금 여기의 가장자리부재의 구조화와 분리의 전략: 〈두 개의 문〉음각(陰刻)의 기술: 이미지, 재난의 가장자리에서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가난한 세대의 놀이: 박병래의 영상작업에 대한 노트장소 없는 시대의 영화를 위한 에토스: 박홍민의 〈혼자〉와 장우진의 〈춘천, 춘천〉포르투갈식 작별시네마-에이돌론: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입문, 혹은 논쟁을 위한 서설출항을 앞둔 방주의 주인에게 보내는 편지: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의 〈방문, 혹은 기억과 고백〉신의 숨바꼭질: 주앙 세자르 몬테이로의 우화와 노년의 희극지하로부터의 수기: 페드로 코스타의 〈호스 머니〉당신의 그림자를 껴안으면서: 페드로 코스타와 후이 샤페즈의 ‘멀리 있는 방’유령들: 주앙 페드로 호드리게스의 〈성 안토니오 축일 아침〉부록영화비평의 ‘장소’에 관하여암살과 자살영화제의 검열-효과에 관한 노트후기
2판을 내면서수록된 글의 출처저자 소개유운성영화평론가.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를 졸업했고 대학 시절 영화연구회 얄라셩에서 활동했다. 졸업 후 잠시 광고회사에서 일하다 2001년에 『씨네21』 영화평론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영화평을 쓰기 시작했다.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2004~2012) 및 문지문화원사이 기획부장(2012~2014)으로 일했다. 『인문예술잡지 F』 편집위원을 지냈고 2016년에는 미디어버스의 임경용과 함께 영상비평지 『오큘로』를 창간, 공동발행인을 맡고 있다.책 속에서“이미지가 없는 곳에는 우정도 적대도 없다. 이미지는 우정과 적대 모두의 코라chora, 즉 가능성의 조건이다. 따라서 우정의 이미지란 내기에 걸린 이미지다. 우정 없는 삶은 고독하고 적대 없는 삶은 공허하다. 하지만 이미지 없는 삶은 삶이라 불릴 수조차 없다.” (16페이지)“초현실주의가 꿈, 몽상, 광기, 우연 등의 비이성적 혹은 무의식적 영역에 관심을 기울였음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경험을 넘어선 비인칭적 무의식 — 개체적 수준이 아니라 종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무의식 — 에 대한 관심, (칸트의 용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무의식의 초월론적transcendental 조건에 대한 관심이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앙드레 브르통이 자동기술법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시를 써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되는 것을 그토록 혐오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초현실주의의 창작기법들은 무의식의 초월론적 조건이 의식의 도구나 산물(언어와 오브제)과 충분히 무매개적으로 상호작용하게끔 하기 위해 개인적이고 의지적인 것의 흔적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지우는 ‘실험’의 기술로서 고안된 것이다.” (79페이지)“언어에서의 이름, 혹은 회화, 사진, 음악 및 공연예술 등에서 비-언어적이지만 ‘고유명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호들과 사건들은 나뉘어 나누어지는 순간 이름으로서의 특성을 전적으로 잃게 된다. 하지만 영화적 이미지는 나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적 이미지는 고유명의 가능성을 간직한 채로 그토록 용이하게 영화 바깥으로, 갤러리로, 무대로, 지면으로, 그리고 가능한 모든 곳으로 나뉘어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영화적 이미지는 이름으로 불리는가?” (122페이지)
↧
[개정판] 유령과 파수꾼들: 영화의 가장자리에서 본 풍경
↧
Words at an Exhibition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 an exhibition in ten chapters and five poems
Words at an Exhibition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
an exhibition in ten chapters and five poems
배수아, 박솔뫼, 김혜순, 김금희, 김숨, 김언수, 편혜영, 마크 폰 슐레겔, 아말리에 스미스,
안드레스 솔라노, 이상우 지음
2020년 7월 8일 발행
언어: 한국어/영어
기획 및 편집: 야콥 파브리시우스
삽화: 배지민
디자인: 신신
부산비엔날레 공동발행
ISBN 979-11-90434-05-8 (93600)
148x210mm / 480페이지
값 20,000원
![]()
![]() 문학 작가들이 쓰는 부산의 이야기들
열 개의 단편 소설과 다섯 편의 시를 수록한 이 책은 2020부산비엔날레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를 위해 제작되었다. 광범위한
장르와 세대, 문체를 보여주는 열한 명의 저자들은 부산을 배경으로 탐정물, 스릴러, 공상과학, 역사물
등 다양한 형식 아래 혁명과 젠더, 음식,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부산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쓰기 위해 초대된 저자들은 도시를 둘러싸는 가상의 층을 창조했다. 이들 중 일부는 도시를 직접적으로, 다른 일부는 간접적으로 다뤘다.
현대미술과 현대문학의 만남, 문학을 통해 보는 현대미술
2020년 부산비엔날레에
참여하는 70명 이상의 시각 예술가와 음악가들은 이 책에 수록된 글이나 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작업을 제작하거나 기존의 작품을 선택했다. 2020년 부산비엔날레 전시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는 부산을 문학과 음악, 시각 예술이라는 만화경을 통해 복합적으로 제시한다. 그 중에 전시의 뼈대나 다름없는 열한 명의 저자들이 집필한 텍스트는 각 장으로 나뉘어 도시의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김숨, 김혜순, 배수아, 마크 폰 슐레겔, 아말리에 스미스,
이상우, 편혜영의 이야기를 담은 일곱 개의 장은 부산현대미술관에 자리한다. 김금희, 박솔뫼, 안드레스
솔라노의 이야기는 부산의 원도심 지역인 중앙동에 다양한 장소들을, 마지막 장인 김언수의 이야기는 영도
항구에 있는 한 창고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시장으로 선정된 공간은 부산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들로, 여기에 수록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의 이야기와
전시는 관람객들이 부산의 탐정이 되도록, 그리고 이 도시의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고 재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목차
야콥
파브리시우스 - 서문
배수아 - 나는 하나의 노래를 가졌다
박솔뫼 - 매일 산책 연습
김혜순 - 오션 뷰 / 고니 / 자갈치
하늘 / 해운대 텍사스 퀸콩 / 피난
김금희
– 크리스마스에는
김숨
– 초록은 슬프다
김언수
– 물개여관
편혜영
– 냉장고
마크
폰 슐레겔 – 분홍빛 부산
아말리에
스미스 – 전기가 말하다
안드레스
솔라노 – 결국엔 우리 모두 호수에 던져진 돌이 되리라
이상우
– 배와 버스가 지나가고
저자 소개
김금희는 1979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성장한 소설가이다. 단편집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너무 한낮의 연애』,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장편소설 『경애의 마음』, 중편소설 『나의
사랑, 매기』 등을 출간했다. 신동엽문학상, 젊은작가상 대상, 현대문학상, 우현예술상
등을 받았다.
김언수는 1972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장편소설 『캐비닛』, 『설계자들』, 『뜨거운 피』 와 소설집 『잽』이 있다. 작가의 작품들은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
번역 출간되었다. 『뜨거운 피』가 한국에서 영화로 제작되었고 『설계자들』이 할리우드에서 영화 제작 중에
있다.
김숨은 1974년 대한민국 울산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느림에 대하여」가, 1998년 문학동네신인상에 「중세의 시간」이 각각 당선되어 등단했다. 장편소설 『철』 『노란 개를 버리러』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바느질하는 여자』 『L의 운동화』 『한 명』 『흐르는 편지』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너는 너로 살고 있니』, 소설집
『침대』 『간과 쓸개』 『국수』 『당신의 신』 『나는 염소가 처음이야』 『나는 나무를 만질 수 있을까』 등이 있다. 동리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대산문학상, 허균문학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김혜순은 1995년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태어난 시인이다. 시집 『또
다른 별에서』, 『아버지가 세운 허수아비』, 『어느 별의
지옥』, 『우리들의 』,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 『불쌍한
사랑기계』, 『달력 공장 공장장님 보세요』, 『한 잔의 붉은
거울』, 『당신의 첫』, 『슬픔치약 거울크림』, 『피어라 돼지』, 『죽음의 자서전』, 『날개환상통』, 시론집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연인, 환자, 시인, 그리고 나)『, 『여성, 시하다』, 『여자짐승아시아 하기』,
시산문집 『않아는 이렇게 말했다』 등을 출간했으며, 김수영문학상, 현대시작품상, 소월문학상, 올해의
문학상, 미당문학상, 대산문학상, 이형기문학상, 그리핀 시 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솔뫼는 1985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소설집 『그럼 무얼
부르지』, 『겨울의 눈빛』, 『사랑하는 개』를 비롯해 장편소설
『을』, 『백 행을 쓰고 싶다』, 『도시의 시간』, 『머리부터 천천히』 등을 썼다. 김승옥 문학상과 문지 문학상, 김현 문학패를 수상하였다.
배수아는 1965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소설가이자 번역가이다. 1993년
첫 단편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장편과 단편, 에세이 등을 발표해왔고,
2001년 베를린에 체류한 계기로 독일어를 배워 번역가로도 활동한다. W. G. 제발트, 카프카, 헤르만 헤세, 발저
로베르트, 페르난도 페소아, 클라리시 리스펙트로 등을 한국어로
번역했다. 2018년 단편집 『뱀과 물』을 출간한 이후로 자신의 작품을 직접 낭송극으로 만들어 수 차례
공연을 했다. 가장 최근 발표한 작품은 『멀리있다 우루는 늦을 것이다』, 베르너 프리치 감독의 필름 포엠 〈FAUST SONNENGESANG〉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으며 〈FAUST SONNENGESANG〉
3(2018)편과 4(2020)편에 낭송배우로 출현했다.
안드레스
펠리페 솔라노는 1977년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나를
구해줘, 조 루이스』, 『쿠에르보 형제들』, 『네온의 묘지』를 출간했다. 또한 한국에서 6개월 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 『최저 임금으로 살아가기』, 한국에서의
삶을 그린 논픽션 『외줄 위에서 본 한국』은 2016년 콜롬비아 도서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 『한국에 삽니다』로 번역되었다. 또한 영국 문학 잡지인
그란타의 ‘스페인권 최고의 젊은 작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마크
폰 슐레겔은 1967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독일
쾰른에서 거주중인 미국/아일랜드 국적의 소설가이다. 데뷔작
『베누시아(Venusia)』는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상에서 SF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다. 실험적인 공상과학, 문학 이론, 예술에 대한 글은 독립 출판계에서 지속적으로 출간된다.
아말리에
스미스는 1985년 덴마크에서 태어난 작가이자 시각예술가이다. 2010년부터 7권의 하이브리드-소설책을 출간했으며, 대표작으로는 『Marble』을 꼽을 수 있다. 작가의 작품은 물질과 관념의 뒤얽힌 것들을 조사하며, 덴마크 섬에
있는 육식 식물, 디지털 구조로서의 직물, 인공적 삶의 선구자로서의
고대 테라코타 조각상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이상우는 1988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프리즘』, 『warp』, 『두 사람이
걸어가』를 발표한 바 있다.
편혜영은 1972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소설집 『아오이가든』
『사육장 쪽으로』, 『저녁의 구애』, 『밤이 지나간다』, 장편소설 『재와 빨강』, 『서쪽 숲에 갔다』, 『선의 법칙』, 『홀』, 『죽은
자로 하여금』 등이 있다. 한국일보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젊은작가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셜리 잭슨상을 수상했다.
책 속에서
파도가
점점 밀려와 마침내 우리의 형체를 완전히 집어삼킨다.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단지, 나는 하나의 노래를 가졌다.
나는 하나의 춤을 가졌다. 나는 하나의 바다를 가졌다. 빛이
산산이 부숴지는 수면 위로 흰 새의 형태를 가진 목소리가 날아간다. 그날 바닷가에서, 죽기 전의 싱그러운 젊은 처녀인 친척 여자에게, 나는 입맞추었던가. 구부러진 가운데 손가락을 가졌으며, 파도처럼 부서지는 웃음소리와
함께 집을 나갔던 내 최초의 여인, 그녀는 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대신
웃음을 멈추지 않으면서, 해변의 새들을 향해서 발길을 돌린다. 그러나
새를 보고 있는건 아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다. 엄마. 내 입에서는 생애 최초의 말이 흘러나오지만, 나와 그녀, 둘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30페이지, 배수아, 「나는 하나의 노래를 가졌다」 가운데)
술을
마시면 잠이 들어버리는 사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잠들면 금세 잠에서 깨어버리는 사람. 바의
주인은 끝까지 점잖게 자리를 정리하고 선물로 꼬냑을 한 병 두고 갔다. 꼬냑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는
쓰레기를 손에 들고 나갔다. 나는 최선생의 거실에서 자겠다고 하였다.
이를 닦고 나와 최선생과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우리는 보리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와 영화 사이 광고는 길고 나는 저 감독의 다른 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하며 영화
줄거리를 설명하려 하였지만 이미 본 영화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나는 그 때 알게 되었다. 내가 설명을 시작한 영화는 자주 막히고 이야기는 뜸을 들이고 주인공들은 무엇을 할지 몰라 멈췄다가 어색하게
움직였다가 그런 식으로 덜컹거렸다. 이야기를 얼버무리다 영화는 다시 시작하였고 나는 다음 광고쯤 잠이
들었다.
(42페이지, 박솔뫼, 「매일 산책 연습」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열에서 낙오한 흰 고니가
부산야생동물치료센터에
왔다
얼굴에
흰 천을 씌우고
상한
날개를 잘라야 했다
날개를
자르자 흰 고니는 더 이상 먹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눈을 가리고 주둥이를 묶고
그
사이로 미음을 집어넣었다
(80페이지, 김혜순, 「고니」 가운데)
SNS에서 맛집 알파고 얘기가 퍼진 건 지난여름부터였다. 맛집 알파고의 활동을 요약하면 이렇다. 사람들이 트위터 멘션이나
댓글로 음식 사진을 보내면 상호를 맞힌다. 물론 보낸 사람은 사진에 대한 힌트를 전혀 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를 것 없는 떡볶이 떡과 다를 것 없는 어묵, 평범하기
그지없는 고추장 양념의 색과 그릇을 보고도 M대학 인근의 엄마손 떡볶이입니다, 하고 답하는 것이다. 정확도는 놀랍게도 99.9퍼센트였다.
(102페이지, 김금희, 「크리스마스에는」 가운데)
부산
남포동 미도리마치¹에 내 친구들이 있다고 알려준 이는, 싱가포르
연합군 포로수용소에서 사귄 여자애다. 그녀는 보름 전 불쑥 날 찾아왔다. “9년 만에 고향집에 갔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날 못
알아보더라. 동생들은 쫄쫄 굶고 있고.” 그녀는 양산² 내 고향집 마루에 드러누워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똥지게를 지고 마늘밭에 거름을 주러 갔다. 그녀는 내 친구들이 미도리마치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미도리마치, 미도리, 미도리…… 미도리는 초록이다. 위안소에 미도리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애가 있어서
나는 그 뜻을 알고 있다.
(170페이지, 김숨, 「초록은 슬프다」 가운데)
철판을
때리는 망치질 소리에 수레는 눈을 떴다.
새벽
두시였다. 깡깡! 깡깡! 리듬을
타는 힘차고 규칙적인 망치질 소리. 선박 수리 조선소에서 새벽 교대조로 일하는 깡깡이 아줌마들의 첫
망치질 소리일 것이다. ‘제발 잠 좀 자자. 뭘 얼마나 잘
살겠다고 꼭두새벽부터 망치질이냐’, 베개 속으로 더 깊이 머리를 파묻으며 수레가 구시렁거렸다. 하지만 잠은 이미 깨버렸다. 몇 시간이나 잠들었던 것일까. 한 시간? 두 시간? 요즘엔
엉망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엎어져도 좀처럼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른 봄, 호수 수면에 남은 마지막 살얼음판처럼 잠은 너무나 얇고 아슬아슬해서 작은 진동이나 소음에도 쉽게 깨져버린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수레는 생각했다. 베트콩들이 밤새도록 포탄을
쏘아대던 밀림에서도 잘 잤고, 극성맞은 거머리와 모기떼가 들끓는 진흙탕 참호 속에서도 판초우의를 뒤집어쓰고
잘 잤었다. 10미터짜리 파도가 연신 덮쳐대던 태평양의 그 작은 원양어선 기관실 위에서도 늙은 고양이처럼
잠만 잘 잤었다. 그런데 이 푹신한 침대 위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잠을 더 자야 했다. 새벽에 아치섬에서 중요한 거래가 있었다. 그리고 그 거래가 끝나기 전에 누군가 죽을 것이다.
(202페이지, 김언수, 「물개여관」 가운데)
그해 K시를 연고지로 둔 야구팀의 성적은 예상 밖이었다. 원년 멤버인 야구팀은
오랜 부진을 겪고 있었고 그해 역시 마찬가지로 비관적인 성적이 예상되었다. 이미 전성기를 지난 팀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였다. 선수들 평균 연령이 높았고, 투수진은
나이가 더 많았고 부진한 실적에 비례해 구단의 투자는 갈수록 줄었다. 하지만 그해 봄 연승을 거두었다. 공공연하게 놀림을 받던 지난해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서른넷에
복부 비만이 뚜렷해진 7번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동네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 함성에 김무진의 울음소리가 묻혔다.
(264페이지, 편혜영, 「냉장고」 가운데)
1950년, 대한민국에는 부산과
인근 지역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 오래된 국제 항구에서 자본주의를 쥐어짜 내는 건 불가능했다. 부산 최전선 사수 후 도착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서울까지 다시 밀고 올라가 나라를 도로 세울 수 있었다. 몇 해 동안 부산은 미국의 직접적인 통치 하에 놓였다. 바둑, 골프, 낚시를 빼고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야구를 제외하고는 부산중부경찰서만큼
도드라진 미국의 잔재를 찾기 어려웠다. 부산국제영화제조차 유럽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308페이지, 마크 폰 슐레겔, 「분홍빛 부산」 가운데)
저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무궁무진합니다. 건물 외부에 매달려 마치 벌떼처럼 웅웅 거리는 에어컨 실외기.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는 빵집 구석의 UV벌레 퇴치기. 노래 〈작은 것들의 위한 시〉가 반복해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카메라에
포착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휴대전화 스크린. 빨강, 파랑, 초록의 미세한 다이오드. 샤부샤부 식당 식탁의 내장형 전열기. 관절염에 걸린 할머니가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전기장판. 빨간불이
켜질 때까지 카운트다운하는 교통신호. 음료나 음식이 준비되면 진동과 함께 삐 소리를 내는 동그란 진동벨. 지하상가에서 지친 이들의 종아리를 풀어주는 기계 (제가 없다면 지하상가는
어두운 터널 형태의 화장실에 불과하겠죠.). 휘어진 네온사인과 LED.
자갈치 시장 앞에서 깜박거리는 물고기 떼.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의 주황색 불빛. 매해 12월, 광복로
차 없는 거리를 수놓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나무들 사이에서 빛나는 순록. 그리고 상점 창문에 움직이는
글자와 춤추는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것도 저예요.
(334페이지, 아말리에 스미스, 「전기가 말하다」 가운데)
떠나기
전, 유리는 나에게 일기장을 갖고 다니라고 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은 찾을 수 있겠죠. 부산항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벌써
일 년이 지났다. 그동안 일기장 따위는 갖고 다닌 기억이 없다. 일기란
가장 일그러진 형태의 노출증이라고 생각한다. 일기를 쓰는 행위에는, 그
내용이 아무리 비밀일지라도, 누군가 읽을 것이라는 희망이 담겨있기 마련이다. 그칠 줄 모르고 자신을 향해 내뱉는 소리나 혼잣말과는 다르다. 일기는
불완전한 상태의 자아가 그 순간에만 드러내는 최대치의 진실을 보여줄 뿐이다. 마치 사무실 창 너머로
보이는 저 바닷물처럼 인간이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밑을 들여다보면 시시때때로 변화를 멈추지
않는다.
(360페이지, 안드레스 솔라노, 「호수에 던져진 돌이 되리라」 가운데)
여기에
왜 오셨죠. 도착해보니 여기였어요. 여관 앞 골목에 들어서면
맞은편에서 출근 중인 여성들이 걸어오고 긴 다리 교차해 걸으며 도넛 박스에서 도넛 꺼내먹는 그녀들과 서로 길을 비켜주고 가끔은 농담을 나누고 가끔은
말없이 서로의 표정에 패인 구덩이의 깊이만큼 고개 숙여 지나가고 가끔은 단속반이 비자 없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있었고 그런 날에는 길을 되돌아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타워를 중심으로 이리저리 구부러진 공원을 몇 바퀴 돌았다. 오르막길을 오르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언덕의 갈림길이 많은 공원에서 몇 번은 뒤를 돌아보면서 빙글빙글 걸어온 길 위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향해 지금의 자신과
똑같은 옷차림으로 걸어오고 있는 꿈에서 깨어나면 사람들이 사라진 옆방에서 오늘은 쫓겨나지 않은 이들이 수치심을 지워내려 안간힘 다해 코를 골아대고
있었고 책상에 앉아 있던 티엔은 두 이모들이 가르쳐 준대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406페이지, 이상우, 「배와 버스가 지나가고」 가운데)
문학 작가들이 쓰는 부산의 이야기들
열 개의 단편 소설과 다섯 편의 시를 수록한 이 책은 2020부산비엔날레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를 위해 제작되었다. 광범위한
장르와 세대, 문체를 보여주는 열한 명의 저자들은 부산을 배경으로 탐정물, 스릴러, 공상과학, 역사물
등 다양한 형식 아래 혁명과 젠더, 음식,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부산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쓰기 위해 초대된 저자들은 도시를 둘러싸는 가상의 층을 창조했다. 이들 중 일부는 도시를 직접적으로, 다른 일부는 간접적으로 다뤘다.
현대미술과 현대문학의 만남, 문학을 통해 보는 현대미술
2020년 부산비엔날레에
참여하는 70명 이상의 시각 예술가와 음악가들은 이 책에 수록된 글이나 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작업을 제작하거나 기존의 작품을 선택했다. 2020년 부산비엔날레 전시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는 부산을 문학과 음악, 시각 예술이라는 만화경을 통해 복합적으로 제시한다. 그 중에 전시의 뼈대나 다름없는 열한 명의 저자들이 집필한 텍스트는 각 장으로 나뉘어 도시의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김숨, 김혜순, 배수아, 마크 폰 슐레겔, 아말리에 스미스,
이상우, 편혜영의 이야기를 담은 일곱 개의 장은 부산현대미술관에 자리한다. 김금희, 박솔뫼, 안드레스
솔라노의 이야기는 부산의 원도심 지역인 중앙동에 다양한 장소들을, 마지막 장인 김언수의 이야기는 영도
항구에 있는 한 창고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시장으로 선정된 공간은 부산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들로, 여기에 수록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의 이야기와
전시는 관람객들이 부산의 탐정이 되도록, 그리고 이 도시의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고 재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목차
야콥
파브리시우스 - 서문
배수아 - 나는 하나의 노래를 가졌다
박솔뫼 - 매일 산책 연습
김혜순 - 오션 뷰 / 고니 / 자갈치
하늘 / 해운대 텍사스 퀸콩 / 피난
김금희
– 크리스마스에는
김숨
– 초록은 슬프다
김언수
– 물개여관
편혜영
– 냉장고
마크
폰 슐레겔 – 분홍빛 부산
아말리에
스미스 – 전기가 말하다
안드레스
솔라노 – 결국엔 우리 모두 호수에 던져진 돌이 되리라
이상우
– 배와 버스가 지나가고
저자 소개
김금희는 1979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성장한 소설가이다. 단편집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너무 한낮의 연애』,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장편소설 『경애의 마음』, 중편소설 『나의
사랑, 매기』 등을 출간했다. 신동엽문학상, 젊은작가상 대상, 현대문학상, 우현예술상
등을 받았다.
김언수는 1972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장편소설 『캐비닛』, 『설계자들』, 『뜨거운 피』 와 소설집 『잽』이 있다. 작가의 작품들은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
번역 출간되었다. 『뜨거운 피』가 한국에서 영화로 제작되었고 『설계자들』이 할리우드에서 영화 제작 중에
있다.
김숨은 1974년 대한민국 울산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느림에 대하여」가, 1998년 문학동네신인상에 「중세의 시간」이 각각 당선되어 등단했다. 장편소설 『철』 『노란 개를 버리러』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바느질하는 여자』 『L의 운동화』 『한 명』 『흐르는 편지』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너는 너로 살고 있니』, 소설집
『침대』 『간과 쓸개』 『국수』 『당신의 신』 『나는 염소가 처음이야』 『나는 나무를 만질 수 있을까』 등이 있다. 동리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대산문학상, 허균문학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김혜순은 1995년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태어난 시인이다. 시집 『또
다른 별에서』, 『아버지가 세운 허수아비』, 『어느 별의
지옥』, 『우리들의 』,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 『불쌍한
사랑기계』, 『달력 공장 공장장님 보세요』, 『한 잔의 붉은
거울』, 『당신의 첫』, 『슬픔치약 거울크림』, 『피어라 돼지』, 『죽음의 자서전』, 『날개환상통』, 시론집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연인, 환자, 시인, 그리고 나)『, 『여성, 시하다』, 『여자짐승아시아 하기』,
시산문집 『않아는 이렇게 말했다』 등을 출간했으며, 김수영문학상, 현대시작품상, 소월문학상, 올해의
문학상, 미당문학상, 대산문학상, 이형기문학상, 그리핀 시 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솔뫼는 1985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소설집 『그럼 무얼
부르지』, 『겨울의 눈빛』, 『사랑하는 개』를 비롯해 장편소설
『을』, 『백 행을 쓰고 싶다』, 『도시의 시간』, 『머리부터 천천히』 등을 썼다. 김승옥 문학상과 문지 문학상, 김현 문학패를 수상하였다.
배수아는 1965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소설가이자 번역가이다. 1993년
첫 단편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장편과 단편, 에세이 등을 발표해왔고,
2001년 베를린에 체류한 계기로 독일어를 배워 번역가로도 활동한다. W. G. 제발트, 카프카, 헤르만 헤세, 발저
로베르트, 페르난도 페소아, 클라리시 리스펙트로 등을 한국어로
번역했다. 2018년 단편집 『뱀과 물』을 출간한 이후로 자신의 작품을 직접 낭송극으로 만들어 수 차례
공연을 했다. 가장 최근 발표한 작품은 『멀리있다 우루는 늦을 것이다』, 베르너 프리치 감독의 필름 포엠 〈FAUST SONNENGESANG〉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으며 〈FAUST SONNENGESANG〉
3(2018)편과 4(2020)편에 낭송배우로 출현했다.
안드레스
펠리페 솔라노는 1977년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나를
구해줘, 조 루이스』, 『쿠에르보 형제들』, 『네온의 묘지』를 출간했다. 또한 한국에서 6개월 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 『최저 임금으로 살아가기』, 한국에서의
삶을 그린 논픽션 『외줄 위에서 본 한국』은 2016년 콜롬비아 도서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 『한국에 삽니다』로 번역되었다. 또한 영국 문학 잡지인
그란타의 ‘스페인권 최고의 젊은 작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마크
폰 슐레겔은 1967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독일
쾰른에서 거주중인 미국/아일랜드 국적의 소설가이다. 데뷔작
『베누시아(Venusia)』는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상에서 SF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다. 실험적인 공상과학, 문학 이론, 예술에 대한 글은 독립 출판계에서 지속적으로 출간된다.
아말리에
스미스는 1985년 덴마크에서 태어난 작가이자 시각예술가이다. 2010년부터 7권의 하이브리드-소설책을 출간했으며, 대표작으로는 『Marble』을 꼽을 수 있다. 작가의 작품은 물질과 관념의 뒤얽힌 것들을 조사하며, 덴마크 섬에
있는 육식 식물, 디지털 구조로서의 직물, 인공적 삶의 선구자로서의
고대 테라코타 조각상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이상우는 1988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프리즘』, 『warp』, 『두 사람이
걸어가』를 발표한 바 있다.
편혜영은 1972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소설집 『아오이가든』
『사육장 쪽으로』, 『저녁의 구애』, 『밤이 지나간다』, 장편소설 『재와 빨강』, 『서쪽 숲에 갔다』, 『선의 법칙』, 『홀』, 『죽은
자로 하여금』 등이 있다. 한국일보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젊은작가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셜리 잭슨상을 수상했다.
책 속에서
파도가
점점 밀려와 마침내 우리의 형체를 완전히 집어삼킨다.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단지, 나는 하나의 노래를 가졌다.
나는 하나의 춤을 가졌다. 나는 하나의 바다를 가졌다. 빛이
산산이 부숴지는 수면 위로 흰 새의 형태를 가진 목소리가 날아간다. 그날 바닷가에서, 죽기 전의 싱그러운 젊은 처녀인 친척 여자에게, 나는 입맞추었던가. 구부러진 가운데 손가락을 가졌으며, 파도처럼 부서지는 웃음소리와
함께 집을 나갔던 내 최초의 여인, 그녀는 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대신
웃음을 멈추지 않으면서, 해변의 새들을 향해서 발길을 돌린다. 그러나
새를 보고 있는건 아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다. 엄마. 내 입에서는 생애 최초의 말이 흘러나오지만, 나와 그녀, 둘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30페이지, 배수아, 「나는 하나의 노래를 가졌다」 가운데)
술을
마시면 잠이 들어버리는 사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잠들면 금세 잠에서 깨어버리는 사람. 바의
주인은 끝까지 점잖게 자리를 정리하고 선물로 꼬냑을 한 병 두고 갔다. 꼬냑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는
쓰레기를 손에 들고 나갔다. 나는 최선생의 거실에서 자겠다고 하였다.
이를 닦고 나와 최선생과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우리는 보리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와 영화 사이 광고는 길고 나는 저 감독의 다른 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하며 영화
줄거리를 설명하려 하였지만 이미 본 영화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나는 그 때 알게 되었다. 내가 설명을 시작한 영화는 자주 막히고 이야기는 뜸을 들이고 주인공들은 무엇을 할지 몰라 멈췄다가 어색하게
움직였다가 그런 식으로 덜컹거렸다. 이야기를 얼버무리다 영화는 다시 시작하였고 나는 다음 광고쯤 잠이
들었다.
(42페이지, 박솔뫼, 「매일 산책 연습」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열에서 낙오한 흰 고니가
부산야생동물치료센터에
왔다
얼굴에
흰 천을 씌우고
상한
날개를 잘라야 했다
날개를
자르자 흰 고니는 더 이상 먹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눈을 가리고 주둥이를 묶고
그
사이로 미음을 집어넣었다
(80페이지, 김혜순, 「고니」 가운데)
SNS에서 맛집 알파고 얘기가 퍼진 건 지난여름부터였다. 맛집 알파고의 활동을 요약하면 이렇다. 사람들이 트위터 멘션이나
댓글로 음식 사진을 보내면 상호를 맞힌다. 물론 보낸 사람은 사진에 대한 힌트를 전혀 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를 것 없는 떡볶이 떡과 다를 것 없는 어묵, 평범하기
그지없는 고추장 양념의 색과 그릇을 보고도 M대학 인근의 엄마손 떡볶이입니다, 하고 답하는 것이다. 정확도는 놀랍게도 99.9퍼센트였다.
(102페이지, 김금희, 「크리스마스에는」 가운데)
부산
남포동 미도리마치¹에 내 친구들이 있다고 알려준 이는, 싱가포르
연합군 포로수용소에서 사귄 여자애다. 그녀는 보름 전 불쑥 날 찾아왔다. “9년 만에 고향집에 갔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날 못
알아보더라. 동생들은 쫄쫄 굶고 있고.” 그녀는 양산² 내 고향집 마루에 드러누워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똥지게를 지고 마늘밭에 거름을 주러 갔다. 그녀는 내 친구들이 미도리마치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미도리마치, 미도리, 미도리…… 미도리는 초록이다. 위안소에 미도리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애가 있어서
나는 그 뜻을 알고 있다.
(170페이지, 김숨, 「초록은 슬프다」 가운데)
철판을
때리는 망치질 소리에 수레는 눈을 떴다.
새벽
두시였다. 깡깡! 깡깡! 리듬을
타는 힘차고 규칙적인 망치질 소리. 선박 수리 조선소에서 새벽 교대조로 일하는 깡깡이 아줌마들의 첫
망치질 소리일 것이다. ‘제발 잠 좀 자자. 뭘 얼마나 잘
살겠다고 꼭두새벽부터 망치질이냐’, 베개 속으로 더 깊이 머리를 파묻으며 수레가 구시렁거렸다. 하지만 잠은 이미 깨버렸다. 몇 시간이나 잠들었던 것일까. 한 시간? 두 시간? 요즘엔
엉망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엎어져도 좀처럼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른 봄, 호수 수면에 남은 마지막 살얼음판처럼 잠은 너무나 얇고 아슬아슬해서 작은 진동이나 소음에도 쉽게 깨져버린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수레는 생각했다. 베트콩들이 밤새도록 포탄을
쏘아대던 밀림에서도 잘 잤고, 극성맞은 거머리와 모기떼가 들끓는 진흙탕 참호 속에서도 판초우의를 뒤집어쓰고
잘 잤었다. 10미터짜리 파도가 연신 덮쳐대던 태평양의 그 작은 원양어선 기관실 위에서도 늙은 고양이처럼
잠만 잘 잤었다. 그런데 이 푹신한 침대 위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잠을 더 자야 했다. 새벽에 아치섬에서 중요한 거래가 있었다. 그리고 그 거래가 끝나기 전에 누군가 죽을 것이다.
(202페이지, 김언수, 「물개여관」 가운데)
그해 K시를 연고지로 둔 야구팀의 성적은 예상 밖이었다. 원년 멤버인 야구팀은
오랜 부진을 겪고 있었고 그해 역시 마찬가지로 비관적인 성적이 예상되었다. 이미 전성기를 지난 팀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였다. 선수들 평균 연령이 높았고, 투수진은
나이가 더 많았고 부진한 실적에 비례해 구단의 투자는 갈수록 줄었다. 하지만 그해 봄 연승을 거두었다. 공공연하게 놀림을 받던 지난해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서른넷에
복부 비만이 뚜렷해진 7번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동네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 함성에 김무진의 울음소리가 묻혔다.
(264페이지, 편혜영, 「냉장고」 가운데)
1950년, 대한민국에는 부산과
인근 지역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 오래된 국제 항구에서 자본주의를 쥐어짜 내는 건 불가능했다. 부산 최전선 사수 후 도착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서울까지 다시 밀고 올라가 나라를 도로 세울 수 있었다. 몇 해 동안 부산은 미국의 직접적인 통치 하에 놓였다. 바둑, 골프, 낚시를 빼고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야구를 제외하고는 부산중부경찰서만큼
도드라진 미국의 잔재를 찾기 어려웠다. 부산국제영화제조차 유럽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308페이지, 마크 폰 슐레겔, 「분홍빛 부산」 가운데)
저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무궁무진합니다. 건물 외부에 매달려 마치 벌떼처럼 웅웅 거리는 에어컨 실외기.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는 빵집 구석의 UV벌레 퇴치기. 노래 〈작은 것들의 위한 시〉가 반복해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카메라에
포착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휴대전화 스크린. 빨강, 파랑, 초록의 미세한 다이오드. 샤부샤부 식당 식탁의 내장형 전열기. 관절염에 걸린 할머니가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전기장판. 빨간불이
켜질 때까지 카운트다운하는 교통신호. 음료나 음식이 준비되면 진동과 함께 삐 소리를 내는 동그란 진동벨. 지하상가에서 지친 이들의 종아리를 풀어주는 기계 (제가 없다면 지하상가는
어두운 터널 형태의 화장실에 불과하겠죠.). 휘어진 네온사인과 LED.
자갈치 시장 앞에서 깜박거리는 물고기 떼.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의 주황색 불빛. 매해 12월, 광복로
차 없는 거리를 수놓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나무들 사이에서 빛나는 순록. 그리고 상점 창문에 움직이는
글자와 춤추는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것도 저예요.
(334페이지, 아말리에 스미스, 「전기가 말하다」 가운데)
떠나기
전, 유리는 나에게 일기장을 갖고 다니라고 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은 찾을 수 있겠죠. 부산항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벌써
일 년이 지났다. 그동안 일기장 따위는 갖고 다닌 기억이 없다. 일기란
가장 일그러진 형태의 노출증이라고 생각한다. 일기를 쓰는 행위에는, 그
내용이 아무리 비밀일지라도, 누군가 읽을 것이라는 희망이 담겨있기 마련이다. 그칠 줄 모르고 자신을 향해 내뱉는 소리나 혼잣말과는 다르다. 일기는
불완전한 상태의 자아가 그 순간에만 드러내는 최대치의 진실을 보여줄 뿐이다. 마치 사무실 창 너머로
보이는 저 바닷물처럼 인간이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밑을 들여다보면 시시때때로 변화를 멈추지
않는다.
(360페이지, 안드레스 솔라노, 「호수에 던져진 돌이 되리라」 가운데)
여기에
왜 오셨죠. 도착해보니 여기였어요. 여관 앞 골목에 들어서면
맞은편에서 출근 중인 여성들이 걸어오고 긴 다리 교차해 걸으며 도넛 박스에서 도넛 꺼내먹는 그녀들과 서로 길을 비켜주고 가끔은 농담을 나누고 가끔은
말없이 서로의 표정에 패인 구덩이의 깊이만큼 고개 숙여 지나가고 가끔은 단속반이 비자 없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있었고 그런 날에는 길을 되돌아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타워를 중심으로 이리저리 구부러진 공원을 몇 바퀴 돌았다. 오르막길을 오르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언덕의 갈림길이 많은 공원에서 몇 번은 뒤를 돌아보면서 빙글빙글 걸어온 길 위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향해 지금의 자신과
똑같은 옷차림으로 걸어오고 있는 꿈에서 깨어나면 사람들이 사라진 옆방에서 오늘은 쫓겨나지 않은 이들이 수치심을 지워내려 안간힘 다해 코를 골아대고
있었고 책상에 앉아 있던 티엔은 두 이모들이 가르쳐 준대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406페이지, 이상우, 「배와 버스가 지나가고」 가운데)
![]()
![]()
![]()
![]()
![]()

 문학 작가들이 쓰는 부산의 이야기들
열 개의 단편 소설과 다섯 편의 시를 수록한 이 책은 2020부산비엔날레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를 위해 제작되었다. 광범위한
장르와 세대, 문체를 보여주는 열한 명의 저자들은 부산을 배경으로 탐정물, 스릴러, 공상과학, 역사물
등 다양한 형식 아래 혁명과 젠더, 음식,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부산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쓰기 위해 초대된 저자들은 도시를 둘러싸는 가상의 층을 창조했다. 이들 중 일부는 도시를 직접적으로, 다른 일부는 간접적으로 다뤘다.
현대미술과 현대문학의 만남, 문학을 통해 보는 현대미술
2020년 부산비엔날레에
참여하는 70명 이상의 시각 예술가와 음악가들은 이 책에 수록된 글이나 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작업을 제작하거나 기존의 작품을 선택했다. 2020년 부산비엔날레 전시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는 부산을 문학과 음악, 시각 예술이라는 만화경을 통해 복합적으로 제시한다. 그 중에 전시의 뼈대나 다름없는 열한 명의 저자들이 집필한 텍스트는 각 장으로 나뉘어 도시의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김숨, 김혜순, 배수아, 마크 폰 슐레겔, 아말리에 스미스,
이상우, 편혜영의 이야기를 담은 일곱 개의 장은 부산현대미술관에 자리한다. 김금희, 박솔뫼, 안드레스
솔라노의 이야기는 부산의 원도심 지역인 중앙동에 다양한 장소들을, 마지막 장인 김언수의 이야기는 영도
항구에 있는 한 창고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시장으로 선정된 공간은 부산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들로, 여기에 수록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의 이야기와
전시는 관람객들이 부산의 탐정이 되도록, 그리고 이 도시의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고 재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목차
야콥
파브리시우스 - 서문
배수아 - 나는 하나의 노래를 가졌다
박솔뫼 - 매일 산책 연습
김혜순 - 오션 뷰 / 고니 / 자갈치
하늘 / 해운대 텍사스 퀸콩 / 피난
김금희
– 크리스마스에는
김숨
– 초록은 슬프다
김언수
– 물개여관
편혜영
– 냉장고
마크
폰 슐레겔 – 분홍빛 부산
아말리에
스미스 – 전기가 말하다
안드레스
솔라노 – 결국엔 우리 모두 호수에 던져진 돌이 되리라
이상우
– 배와 버스가 지나가고
저자 소개
김금희는 1979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성장한 소설가이다. 단편집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너무 한낮의 연애』,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장편소설 『경애의 마음』, 중편소설 『나의
사랑, 매기』 등을 출간했다. 신동엽문학상, 젊은작가상 대상, 현대문학상, 우현예술상
등을 받았다.
김언수는 1972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장편소설 『캐비닛』, 『설계자들』, 『뜨거운 피』 와 소설집 『잽』이 있다. 작가의 작품들은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
번역 출간되었다. 『뜨거운 피』가 한국에서 영화로 제작되었고 『설계자들』이 할리우드에서 영화 제작 중에
있다.
김숨은 1974년 대한민국 울산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느림에 대하여」가, 1998년 문학동네신인상에 「중세의 시간」이 각각 당선되어 등단했다. 장편소설 『철』 『노란 개를 버리러』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바느질하는 여자』 『L의 운동화』 『한 명』 『흐르는 편지』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너는 너로 살고 있니』, 소설집
『침대』 『간과 쓸개』 『국수』 『당신의 신』 『나는 염소가 처음이야』 『나는 나무를 만질 수 있을까』 등이 있다. 동리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대산문학상, 허균문학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김혜순은 1995년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태어난 시인이다. 시집 『또
다른 별에서』, 『아버지가 세운 허수아비』, 『어느 별의
지옥』, 『우리들의 』,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 『불쌍한
사랑기계』, 『달력 공장 공장장님 보세요』, 『한 잔의 붉은
거울』, 『당신의 첫』, 『슬픔치약 거울크림』, 『피어라 돼지』, 『죽음의 자서전』, 『날개환상통』, 시론집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연인, 환자, 시인, 그리고 나)『, 『여성, 시하다』, 『여자짐승아시아 하기』,
시산문집 『않아는 이렇게 말했다』 등을 출간했으며, 김수영문학상, 현대시작품상, 소월문학상, 올해의
문학상, 미당문학상, 대산문학상, 이형기문학상, 그리핀 시 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솔뫼는 1985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소설집 『그럼 무얼
부르지』, 『겨울의 눈빛』, 『사랑하는 개』를 비롯해 장편소설
『을』, 『백 행을 쓰고 싶다』, 『도시의 시간』, 『머리부터 천천히』 등을 썼다. 김승옥 문학상과 문지 문학상, 김현 문학패를 수상하였다.
배수아는 1965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소설가이자 번역가이다. 1993년
첫 단편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장편과 단편, 에세이 등을 발표해왔고,
2001년 베를린에 체류한 계기로 독일어를 배워 번역가로도 활동한다. W. G. 제발트, 카프카, 헤르만 헤세, 발저
로베르트, 페르난도 페소아, 클라리시 리스펙트로 등을 한국어로
번역했다. 2018년 단편집 『뱀과 물』을 출간한 이후로 자신의 작품을 직접 낭송극으로 만들어 수 차례
공연을 했다. 가장 최근 발표한 작품은 『멀리있다 우루는 늦을 것이다』, 베르너 프리치 감독의 필름 포엠 〈FAUST SONNENGESANG〉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으며 〈FAUST SONNENGESANG〉
3(2018)편과 4(2020)편에 낭송배우로 출현했다.
안드레스
펠리페 솔라노는 1977년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나를
구해줘, 조 루이스』, 『쿠에르보 형제들』, 『네온의 묘지』를 출간했다. 또한 한국에서 6개월 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 『최저 임금으로 살아가기』, 한국에서의
삶을 그린 논픽션 『외줄 위에서 본 한국』은 2016년 콜롬비아 도서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 『한국에 삽니다』로 번역되었다. 또한 영국 문학 잡지인
그란타의 ‘스페인권 최고의 젊은 작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마크
폰 슐레겔은 1967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독일
쾰른에서 거주중인 미국/아일랜드 국적의 소설가이다. 데뷔작
『베누시아(Venusia)』는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상에서 SF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다. 실험적인 공상과학, 문학 이론, 예술에 대한 글은 독립 출판계에서 지속적으로 출간된다.
아말리에
스미스는 1985년 덴마크에서 태어난 작가이자 시각예술가이다. 2010년부터 7권의 하이브리드-소설책을 출간했으며, 대표작으로는 『Marble』을 꼽을 수 있다. 작가의 작품은 물질과 관념의 뒤얽힌 것들을 조사하며, 덴마크 섬에
있는 육식 식물, 디지털 구조로서의 직물, 인공적 삶의 선구자로서의
고대 테라코타 조각상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이상우는 1988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프리즘』, 『warp』, 『두 사람이
걸어가』를 발표한 바 있다.
편혜영은 1972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소설집 『아오이가든』
『사육장 쪽으로』, 『저녁의 구애』, 『밤이 지나간다』, 장편소설 『재와 빨강』, 『서쪽 숲에 갔다』, 『선의 법칙』, 『홀』, 『죽은
자로 하여금』 등이 있다. 한국일보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젊은작가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셜리 잭슨상을 수상했다.
책 속에서
파도가
점점 밀려와 마침내 우리의 형체를 완전히 집어삼킨다.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단지, 나는 하나의 노래를 가졌다.
나는 하나의 춤을 가졌다. 나는 하나의 바다를 가졌다. 빛이
산산이 부숴지는 수면 위로 흰 새의 형태를 가진 목소리가 날아간다. 그날 바닷가에서, 죽기 전의 싱그러운 젊은 처녀인 친척 여자에게, 나는 입맞추었던가. 구부러진 가운데 손가락을 가졌으며, 파도처럼 부서지는 웃음소리와
함께 집을 나갔던 내 최초의 여인, 그녀는 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대신
웃음을 멈추지 않으면서, 해변의 새들을 향해서 발길을 돌린다. 그러나
새를 보고 있는건 아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다. 엄마. 내 입에서는 생애 최초의 말이 흘러나오지만, 나와 그녀, 둘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30페이지, 배수아, 「나는 하나의 노래를 가졌다」 가운데)
술을
마시면 잠이 들어버리는 사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잠들면 금세 잠에서 깨어버리는 사람. 바의
주인은 끝까지 점잖게 자리를 정리하고 선물로 꼬냑을 한 병 두고 갔다. 꼬냑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는
쓰레기를 손에 들고 나갔다. 나는 최선생의 거실에서 자겠다고 하였다.
이를 닦고 나와 최선생과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우리는 보리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와 영화 사이 광고는 길고 나는 저 감독의 다른 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하며 영화
줄거리를 설명하려 하였지만 이미 본 영화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나는 그 때 알게 되었다. 내가 설명을 시작한 영화는 자주 막히고 이야기는 뜸을 들이고 주인공들은 무엇을 할지 몰라 멈췄다가 어색하게
움직였다가 그런 식으로 덜컹거렸다. 이야기를 얼버무리다 영화는 다시 시작하였고 나는 다음 광고쯤 잠이
들었다.
(42페이지, 박솔뫼, 「매일 산책 연습」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열에서 낙오한 흰 고니가
부산야생동물치료센터에
왔다
얼굴에
흰 천을 씌우고
상한
날개를 잘라야 했다
날개를
자르자 흰 고니는 더 이상 먹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눈을 가리고 주둥이를 묶고
그
사이로 미음을 집어넣었다
(80페이지, 김혜순, 「고니」 가운데)
SNS에서 맛집 알파고 얘기가 퍼진 건 지난여름부터였다. 맛집 알파고의 활동을 요약하면 이렇다. 사람들이 트위터 멘션이나
댓글로 음식 사진을 보내면 상호를 맞힌다. 물론 보낸 사람은 사진에 대한 힌트를 전혀 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를 것 없는 떡볶이 떡과 다를 것 없는 어묵, 평범하기
그지없는 고추장 양념의 색과 그릇을 보고도 M대학 인근의 엄마손 떡볶이입니다, 하고 답하는 것이다. 정확도는 놀랍게도 99.9퍼센트였다.
(102페이지, 김금희, 「크리스마스에는」 가운데)
부산
남포동 미도리마치¹에 내 친구들이 있다고 알려준 이는, 싱가포르
연합군 포로수용소에서 사귄 여자애다. 그녀는 보름 전 불쑥 날 찾아왔다. “9년 만에 고향집에 갔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날 못
알아보더라. 동생들은 쫄쫄 굶고 있고.” 그녀는 양산² 내 고향집 마루에 드러누워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똥지게를 지고 마늘밭에 거름을 주러 갔다. 그녀는 내 친구들이 미도리마치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미도리마치, 미도리, 미도리…… 미도리는 초록이다. 위안소에 미도리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애가 있어서
나는 그 뜻을 알고 있다.
(170페이지, 김숨, 「초록은 슬프다」 가운데)
철판을
때리는 망치질 소리에 수레는 눈을 떴다.
새벽
두시였다. 깡깡! 깡깡! 리듬을
타는 힘차고 규칙적인 망치질 소리. 선박 수리 조선소에서 새벽 교대조로 일하는 깡깡이 아줌마들의 첫
망치질 소리일 것이다. ‘제발 잠 좀 자자. 뭘 얼마나 잘
살겠다고 꼭두새벽부터 망치질이냐’, 베개 속으로 더 깊이 머리를 파묻으며 수레가 구시렁거렸다. 하지만 잠은 이미 깨버렸다. 몇 시간이나 잠들었던 것일까. 한 시간? 두 시간? 요즘엔
엉망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엎어져도 좀처럼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른 봄, 호수 수면에 남은 마지막 살얼음판처럼 잠은 너무나 얇고 아슬아슬해서 작은 진동이나 소음에도 쉽게 깨져버린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수레는 생각했다. 베트콩들이 밤새도록 포탄을
쏘아대던 밀림에서도 잘 잤고, 극성맞은 거머리와 모기떼가 들끓는 진흙탕 참호 속에서도 판초우의를 뒤집어쓰고
잘 잤었다. 10미터짜리 파도가 연신 덮쳐대던 태평양의 그 작은 원양어선 기관실 위에서도 늙은 고양이처럼
잠만 잘 잤었다. 그런데 이 푹신한 침대 위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잠을 더 자야 했다. 새벽에 아치섬에서 중요한 거래가 있었다. 그리고 그 거래가 끝나기 전에 누군가 죽을 것이다.
(202페이지, 김언수, 「물개여관」 가운데)
그해 K시를 연고지로 둔 야구팀의 성적은 예상 밖이었다. 원년 멤버인 야구팀은
오랜 부진을 겪고 있었고 그해 역시 마찬가지로 비관적인 성적이 예상되었다. 이미 전성기를 지난 팀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였다. 선수들 평균 연령이 높았고, 투수진은
나이가 더 많았고 부진한 실적에 비례해 구단의 투자는 갈수록 줄었다. 하지만 그해 봄 연승을 거두었다. 공공연하게 놀림을 받던 지난해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서른넷에
복부 비만이 뚜렷해진 7번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동네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 함성에 김무진의 울음소리가 묻혔다.
(264페이지, 편혜영, 「냉장고」 가운데)
1950년, 대한민국에는 부산과
인근 지역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 오래된 국제 항구에서 자본주의를 쥐어짜 내는 건 불가능했다. 부산 최전선 사수 후 도착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서울까지 다시 밀고 올라가 나라를 도로 세울 수 있었다. 몇 해 동안 부산은 미국의 직접적인 통치 하에 놓였다. 바둑, 골프, 낚시를 빼고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야구를 제외하고는 부산중부경찰서만큼
도드라진 미국의 잔재를 찾기 어려웠다. 부산국제영화제조차 유럽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308페이지, 마크 폰 슐레겔, 「분홍빛 부산」 가운데)
저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무궁무진합니다. 건물 외부에 매달려 마치 벌떼처럼 웅웅 거리는 에어컨 실외기.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는 빵집 구석의 UV벌레 퇴치기. 노래 〈작은 것들의 위한 시〉가 반복해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카메라에
포착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휴대전화 스크린. 빨강, 파랑, 초록의 미세한 다이오드. 샤부샤부 식당 식탁의 내장형 전열기. 관절염에 걸린 할머니가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전기장판. 빨간불이
켜질 때까지 카운트다운하는 교통신호. 음료나 음식이 준비되면 진동과 함께 삐 소리를 내는 동그란 진동벨. 지하상가에서 지친 이들의 종아리를 풀어주는 기계 (제가 없다면 지하상가는
어두운 터널 형태의 화장실에 불과하겠죠.). 휘어진 네온사인과 LED.
자갈치 시장 앞에서 깜박거리는 물고기 떼.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의 주황색 불빛. 매해 12월, 광복로
차 없는 거리를 수놓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나무들 사이에서 빛나는 순록. 그리고 상점 창문에 움직이는
글자와 춤추는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것도 저예요.
(334페이지, 아말리에 스미스, 「전기가 말하다」 가운데)
떠나기
전, 유리는 나에게 일기장을 갖고 다니라고 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은 찾을 수 있겠죠. 부산항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벌써
일 년이 지났다. 그동안 일기장 따위는 갖고 다닌 기억이 없다. 일기란
가장 일그러진 형태의 노출증이라고 생각한다. 일기를 쓰는 행위에는, 그
내용이 아무리 비밀일지라도, 누군가 읽을 것이라는 희망이 담겨있기 마련이다. 그칠 줄 모르고 자신을 향해 내뱉는 소리나 혼잣말과는 다르다. 일기는
불완전한 상태의 자아가 그 순간에만 드러내는 최대치의 진실을 보여줄 뿐이다. 마치 사무실 창 너머로
보이는 저 바닷물처럼 인간이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밑을 들여다보면 시시때때로 변화를 멈추지
않는다.
(360페이지, 안드레스 솔라노, 「호수에 던져진 돌이 되리라」 가운데)
여기에
왜 오셨죠. 도착해보니 여기였어요. 여관 앞 골목에 들어서면
맞은편에서 출근 중인 여성들이 걸어오고 긴 다리 교차해 걸으며 도넛 박스에서 도넛 꺼내먹는 그녀들과 서로 길을 비켜주고 가끔은 농담을 나누고 가끔은
말없이 서로의 표정에 패인 구덩이의 깊이만큼 고개 숙여 지나가고 가끔은 단속반이 비자 없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있었고 그런 날에는 길을 되돌아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타워를 중심으로 이리저리 구부러진 공원을 몇 바퀴 돌았다. 오르막길을 오르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언덕의 갈림길이 많은 공원에서 몇 번은 뒤를 돌아보면서 빙글빙글 걸어온 길 위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향해 지금의 자신과
똑같은 옷차림으로 걸어오고 있는 꿈에서 깨어나면 사람들이 사라진 옆방에서 오늘은 쫓겨나지 않은 이들이 수치심을 지워내려 안간힘 다해 코를 골아대고
있었고 책상에 앉아 있던 티엔은 두 이모들이 가르쳐 준대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406페이지, 이상우, 「배와 버스가 지나가고」 가운데)
문학 작가들이 쓰는 부산의 이야기들
열 개의 단편 소설과 다섯 편의 시를 수록한 이 책은 2020부산비엔날레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를 위해 제작되었다. 광범위한
장르와 세대, 문체를 보여주는 열한 명의 저자들은 부산을 배경으로 탐정물, 스릴러, 공상과학, 역사물
등 다양한 형식 아래 혁명과 젠더, 음식,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부산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쓰기 위해 초대된 저자들은 도시를 둘러싸는 가상의 층을 창조했다. 이들 중 일부는 도시를 직접적으로, 다른 일부는 간접적으로 다뤘다.
현대미술과 현대문학의 만남, 문학을 통해 보는 현대미술
2020년 부산비엔날레에
참여하는 70명 이상의 시각 예술가와 음악가들은 이 책에 수록된 글이나 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작업을 제작하거나 기존의 작품을 선택했다. 2020년 부산비엔날레 전시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는 부산을 문학과 음악, 시각 예술이라는 만화경을 통해 복합적으로 제시한다. 그 중에 전시의 뼈대나 다름없는 열한 명의 저자들이 집필한 텍스트는 각 장으로 나뉘어 도시의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김숨, 김혜순, 배수아, 마크 폰 슐레겔, 아말리에 스미스,
이상우, 편혜영의 이야기를 담은 일곱 개의 장은 부산현대미술관에 자리한다. 김금희, 박솔뫼, 안드레스
솔라노의 이야기는 부산의 원도심 지역인 중앙동에 다양한 장소들을, 마지막 장인 김언수의 이야기는 영도
항구에 있는 한 창고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시장으로 선정된 공간은 부산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들로, 여기에 수록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의 이야기와
전시는 관람객들이 부산의 탐정이 되도록, 그리고 이 도시의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고 재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목차
야콥
파브리시우스 - 서문
배수아 - 나는 하나의 노래를 가졌다
박솔뫼 - 매일 산책 연습
김혜순 - 오션 뷰 / 고니 / 자갈치
하늘 / 해운대 텍사스 퀸콩 / 피난
김금희
– 크리스마스에는
김숨
– 초록은 슬프다
김언수
– 물개여관
편혜영
– 냉장고
마크
폰 슐레겔 – 분홍빛 부산
아말리에
스미스 – 전기가 말하다
안드레스
솔라노 – 결국엔 우리 모두 호수에 던져진 돌이 되리라
이상우
– 배와 버스가 지나가고
저자 소개
김금희는 1979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성장한 소설가이다. 단편집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너무 한낮의 연애』,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장편소설 『경애의 마음』, 중편소설 『나의
사랑, 매기』 등을 출간했다. 신동엽문학상, 젊은작가상 대상, 현대문학상, 우현예술상
등을 받았다.
김언수는 1972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장편소설 『캐비닛』, 『설계자들』, 『뜨거운 피』 와 소설집 『잽』이 있다. 작가의 작품들은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
번역 출간되었다. 『뜨거운 피』가 한국에서 영화로 제작되었고 『설계자들』이 할리우드에서 영화 제작 중에
있다.
김숨은 1974년 대한민국 울산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느림에 대하여」가, 1998년 문학동네신인상에 「중세의 시간」이 각각 당선되어 등단했다. 장편소설 『철』 『노란 개를 버리러』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바느질하는 여자』 『L의 운동화』 『한 명』 『흐르는 편지』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너는 너로 살고 있니』, 소설집
『침대』 『간과 쓸개』 『국수』 『당신의 신』 『나는 염소가 처음이야』 『나는 나무를 만질 수 있을까』 등이 있다. 동리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대산문학상, 허균문학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김혜순은 1995년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태어난 시인이다. 시집 『또
다른 별에서』, 『아버지가 세운 허수아비』, 『어느 별의
지옥』, 『우리들의 』,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 『불쌍한
사랑기계』, 『달력 공장 공장장님 보세요』, 『한 잔의 붉은
거울』, 『당신의 첫』, 『슬픔치약 거울크림』, 『피어라 돼지』, 『죽음의 자서전』, 『날개환상통』, 시론집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연인, 환자, 시인, 그리고 나)『, 『여성, 시하다』, 『여자짐승아시아 하기』,
시산문집 『않아는 이렇게 말했다』 등을 출간했으며, 김수영문학상, 현대시작품상, 소월문학상, 올해의
문학상, 미당문학상, 대산문학상, 이형기문학상, 그리핀 시 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솔뫼는 1985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소설집 『그럼 무얼
부르지』, 『겨울의 눈빛』, 『사랑하는 개』를 비롯해 장편소설
『을』, 『백 행을 쓰고 싶다』, 『도시의 시간』, 『머리부터 천천히』 등을 썼다. 김승옥 문학상과 문지 문학상, 김현 문학패를 수상하였다.
배수아는 1965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소설가이자 번역가이다. 1993년
첫 단편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장편과 단편, 에세이 등을 발표해왔고,
2001년 베를린에 체류한 계기로 독일어를 배워 번역가로도 활동한다. W. G. 제발트, 카프카, 헤르만 헤세, 발저
로베르트, 페르난도 페소아, 클라리시 리스펙트로 등을 한국어로
번역했다. 2018년 단편집 『뱀과 물』을 출간한 이후로 자신의 작품을 직접 낭송극으로 만들어 수 차례
공연을 했다. 가장 최근 발표한 작품은 『멀리있다 우루는 늦을 것이다』, 베르너 프리치 감독의 필름 포엠 〈FAUST SONNENGESANG〉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으며 〈FAUST SONNENGESANG〉
3(2018)편과 4(2020)편에 낭송배우로 출현했다.
안드레스
펠리페 솔라노는 1977년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나를
구해줘, 조 루이스』, 『쿠에르보 형제들』, 『네온의 묘지』를 출간했다. 또한 한국에서 6개월 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 『최저 임금으로 살아가기』, 한국에서의
삶을 그린 논픽션 『외줄 위에서 본 한국』은 2016년 콜롬비아 도서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 『한국에 삽니다』로 번역되었다. 또한 영국 문학 잡지인
그란타의 ‘스페인권 최고의 젊은 작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마크
폰 슐레겔은 1967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독일
쾰른에서 거주중인 미국/아일랜드 국적의 소설가이다. 데뷔작
『베누시아(Venusia)』는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상에서 SF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다. 실험적인 공상과학, 문학 이론, 예술에 대한 글은 독립 출판계에서 지속적으로 출간된다.
아말리에
스미스는 1985년 덴마크에서 태어난 작가이자 시각예술가이다. 2010년부터 7권의 하이브리드-소설책을 출간했으며, 대표작으로는 『Marble』을 꼽을 수 있다. 작가의 작품은 물질과 관념의 뒤얽힌 것들을 조사하며, 덴마크 섬에
있는 육식 식물, 디지털 구조로서의 직물, 인공적 삶의 선구자로서의
고대 테라코타 조각상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이상우는 1988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프리즘』, 『warp』, 『두 사람이
걸어가』를 발표한 바 있다.
편혜영은 1972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다. 소설집 『아오이가든』
『사육장 쪽으로』, 『저녁의 구애』, 『밤이 지나간다』, 장편소설 『재와 빨강』, 『서쪽 숲에 갔다』, 『선의 법칙』, 『홀』, 『죽은
자로 하여금』 등이 있다. 한국일보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젊은작가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셜리 잭슨상을 수상했다.
책 속에서
파도가
점점 밀려와 마침내 우리의 형체를 완전히 집어삼킨다.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단지, 나는 하나의 노래를 가졌다.
나는 하나의 춤을 가졌다. 나는 하나의 바다를 가졌다. 빛이
산산이 부숴지는 수면 위로 흰 새의 형태를 가진 목소리가 날아간다. 그날 바닷가에서, 죽기 전의 싱그러운 젊은 처녀인 친척 여자에게, 나는 입맞추었던가. 구부러진 가운데 손가락을 가졌으며, 파도처럼 부서지는 웃음소리와
함께 집을 나갔던 내 최초의 여인, 그녀는 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대신
웃음을 멈추지 않으면서, 해변의 새들을 향해서 발길을 돌린다. 그러나
새를 보고 있는건 아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다. 엄마. 내 입에서는 생애 최초의 말이 흘러나오지만, 나와 그녀, 둘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30페이지, 배수아, 「나는 하나의 노래를 가졌다」 가운데)
술을
마시면 잠이 들어버리는 사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잠들면 금세 잠에서 깨어버리는 사람. 바의
주인은 끝까지 점잖게 자리를 정리하고 선물로 꼬냑을 한 병 두고 갔다. 꼬냑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는
쓰레기를 손에 들고 나갔다. 나는 최선생의 거실에서 자겠다고 하였다.
이를 닦고 나와 최선생과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우리는 보리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와 영화 사이 광고는 길고 나는 저 감독의 다른 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하며 영화
줄거리를 설명하려 하였지만 이미 본 영화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나는 그 때 알게 되었다. 내가 설명을 시작한 영화는 자주 막히고 이야기는 뜸을 들이고 주인공들은 무엇을 할지 몰라 멈췄다가 어색하게
움직였다가 그런 식으로 덜컹거렸다. 이야기를 얼버무리다 영화는 다시 시작하였고 나는 다음 광고쯤 잠이
들었다.
(42페이지, 박솔뫼, 「매일 산책 연습」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열에서 낙오한 흰 고니가
부산야생동물치료센터에
왔다
얼굴에
흰 천을 씌우고
상한
날개를 잘라야 했다
날개를
자르자 흰 고니는 더 이상 먹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눈을 가리고 주둥이를 묶고
그
사이로 미음을 집어넣었다
(80페이지, 김혜순, 「고니」 가운데)
SNS에서 맛집 알파고 얘기가 퍼진 건 지난여름부터였다. 맛집 알파고의 활동을 요약하면 이렇다. 사람들이 트위터 멘션이나
댓글로 음식 사진을 보내면 상호를 맞힌다. 물론 보낸 사람은 사진에 대한 힌트를 전혀 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를 것 없는 떡볶이 떡과 다를 것 없는 어묵, 평범하기
그지없는 고추장 양념의 색과 그릇을 보고도 M대학 인근의 엄마손 떡볶이입니다, 하고 답하는 것이다. 정확도는 놀랍게도 99.9퍼센트였다.
(102페이지, 김금희, 「크리스마스에는」 가운데)
부산
남포동 미도리마치¹에 내 친구들이 있다고 알려준 이는, 싱가포르
연합군 포로수용소에서 사귄 여자애다. 그녀는 보름 전 불쑥 날 찾아왔다. “9년 만에 고향집에 갔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날 못
알아보더라. 동생들은 쫄쫄 굶고 있고.” 그녀는 양산² 내 고향집 마루에 드러누워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똥지게를 지고 마늘밭에 거름을 주러 갔다. 그녀는 내 친구들이 미도리마치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미도리마치, 미도리, 미도리…… 미도리는 초록이다. 위안소에 미도리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애가 있어서
나는 그 뜻을 알고 있다.
(170페이지, 김숨, 「초록은 슬프다」 가운데)
철판을
때리는 망치질 소리에 수레는 눈을 떴다.
새벽
두시였다. 깡깡! 깡깡! 리듬을
타는 힘차고 규칙적인 망치질 소리. 선박 수리 조선소에서 새벽 교대조로 일하는 깡깡이 아줌마들의 첫
망치질 소리일 것이다. ‘제발 잠 좀 자자. 뭘 얼마나 잘
살겠다고 꼭두새벽부터 망치질이냐’, 베개 속으로 더 깊이 머리를 파묻으며 수레가 구시렁거렸다. 하지만 잠은 이미 깨버렸다. 몇 시간이나 잠들었던 것일까. 한 시간? 두 시간? 요즘엔
엉망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엎어져도 좀처럼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른 봄, 호수 수면에 남은 마지막 살얼음판처럼 잠은 너무나 얇고 아슬아슬해서 작은 진동이나 소음에도 쉽게 깨져버린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수레는 생각했다. 베트콩들이 밤새도록 포탄을
쏘아대던 밀림에서도 잘 잤고, 극성맞은 거머리와 모기떼가 들끓는 진흙탕 참호 속에서도 판초우의를 뒤집어쓰고
잘 잤었다. 10미터짜리 파도가 연신 덮쳐대던 태평양의 그 작은 원양어선 기관실 위에서도 늙은 고양이처럼
잠만 잘 잤었다. 그런데 이 푹신한 침대 위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잠을 더 자야 했다. 새벽에 아치섬에서 중요한 거래가 있었다. 그리고 그 거래가 끝나기 전에 누군가 죽을 것이다.
(202페이지, 김언수, 「물개여관」 가운데)
그해 K시를 연고지로 둔 야구팀의 성적은 예상 밖이었다. 원년 멤버인 야구팀은
오랜 부진을 겪고 있었고 그해 역시 마찬가지로 비관적인 성적이 예상되었다. 이미 전성기를 지난 팀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였다. 선수들 평균 연령이 높았고, 투수진은
나이가 더 많았고 부진한 실적에 비례해 구단의 투자는 갈수록 줄었다. 하지만 그해 봄 연승을 거두었다. 공공연하게 놀림을 받던 지난해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서른넷에
복부 비만이 뚜렷해진 7번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동네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 함성에 김무진의 울음소리가 묻혔다.
(264페이지, 편혜영, 「냉장고」 가운데)
1950년, 대한민국에는 부산과
인근 지역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 오래된 국제 항구에서 자본주의를 쥐어짜 내는 건 불가능했다. 부산 최전선 사수 후 도착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서울까지 다시 밀고 올라가 나라를 도로 세울 수 있었다. 몇 해 동안 부산은 미국의 직접적인 통치 하에 놓였다. 바둑, 골프, 낚시를 빼고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야구를 제외하고는 부산중부경찰서만큼
도드라진 미국의 잔재를 찾기 어려웠다. 부산국제영화제조차 유럽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308페이지, 마크 폰 슐레겔, 「분홍빛 부산」 가운데)
저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무궁무진합니다. 건물 외부에 매달려 마치 벌떼처럼 웅웅 거리는 에어컨 실외기.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는 빵집 구석의 UV벌레 퇴치기. 노래 〈작은 것들의 위한 시〉가 반복해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카메라에
포착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휴대전화 스크린. 빨강, 파랑, 초록의 미세한 다이오드. 샤부샤부 식당 식탁의 내장형 전열기. 관절염에 걸린 할머니가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전기장판. 빨간불이
켜질 때까지 카운트다운하는 교통신호. 음료나 음식이 준비되면 진동과 함께 삐 소리를 내는 동그란 진동벨. 지하상가에서 지친 이들의 종아리를 풀어주는 기계 (제가 없다면 지하상가는
어두운 터널 형태의 화장실에 불과하겠죠.). 휘어진 네온사인과 LED.
자갈치 시장 앞에서 깜박거리는 물고기 떼.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의 주황색 불빛. 매해 12월, 광복로
차 없는 거리를 수놓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나무들 사이에서 빛나는 순록. 그리고 상점 창문에 움직이는
글자와 춤추는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것도 저예요.
(334페이지, 아말리에 스미스, 「전기가 말하다」 가운데)
떠나기
전, 유리는 나에게 일기장을 갖고 다니라고 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은 찾을 수 있겠죠. 부산항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벌써
일 년이 지났다. 그동안 일기장 따위는 갖고 다닌 기억이 없다. 일기란
가장 일그러진 형태의 노출증이라고 생각한다. 일기를 쓰는 행위에는, 그
내용이 아무리 비밀일지라도, 누군가 읽을 것이라는 희망이 담겨있기 마련이다. 그칠 줄 모르고 자신을 향해 내뱉는 소리나 혼잣말과는 다르다. 일기는
불완전한 상태의 자아가 그 순간에만 드러내는 최대치의 진실을 보여줄 뿐이다. 마치 사무실 창 너머로
보이는 저 바닷물처럼 인간이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밑을 들여다보면 시시때때로 변화를 멈추지
않는다.
(360페이지, 안드레스 솔라노, 「호수에 던져진 돌이 되리라」 가운데)
여기에
왜 오셨죠. 도착해보니 여기였어요. 여관 앞 골목에 들어서면
맞은편에서 출근 중인 여성들이 걸어오고 긴 다리 교차해 걸으며 도넛 박스에서 도넛 꺼내먹는 그녀들과 서로 길을 비켜주고 가끔은 농담을 나누고 가끔은
말없이 서로의 표정에 패인 구덩이의 깊이만큼 고개 숙여 지나가고 가끔은 단속반이 비자 없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있었고 그런 날에는 길을 되돌아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타워를 중심으로 이리저리 구부러진 공원을 몇 바퀴 돌았다. 오르막길을 오르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언덕의 갈림길이 많은 공원에서 몇 번은 뒤를 돌아보면서 빙글빙글 걸어온 길 위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향해 지금의 자신과
똑같은 옷차림으로 걸어오고 있는 꿈에서 깨어나면 사람들이 사라진 옆방에서 오늘은 쫓겨나지 않은 이들이 수치심을 지워내려 안간힘 다해 코를 골아대고
있었고 책상에 앉아 있던 티엔은 두 이모들이 가르쳐 준대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406페이지, 이상우, 「배와 버스가 지나가고」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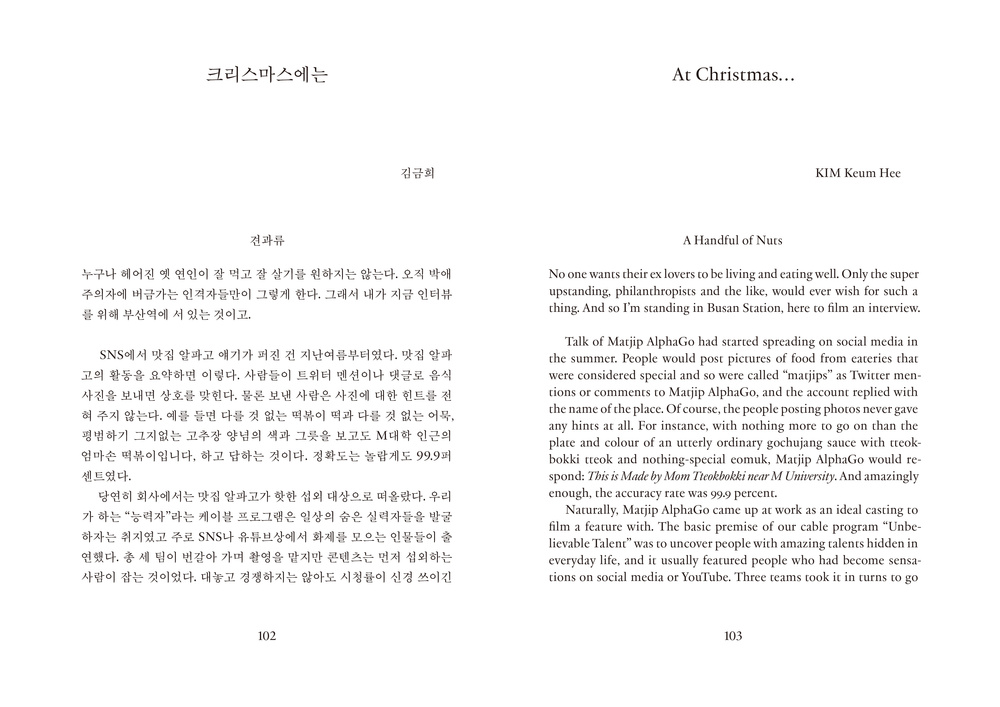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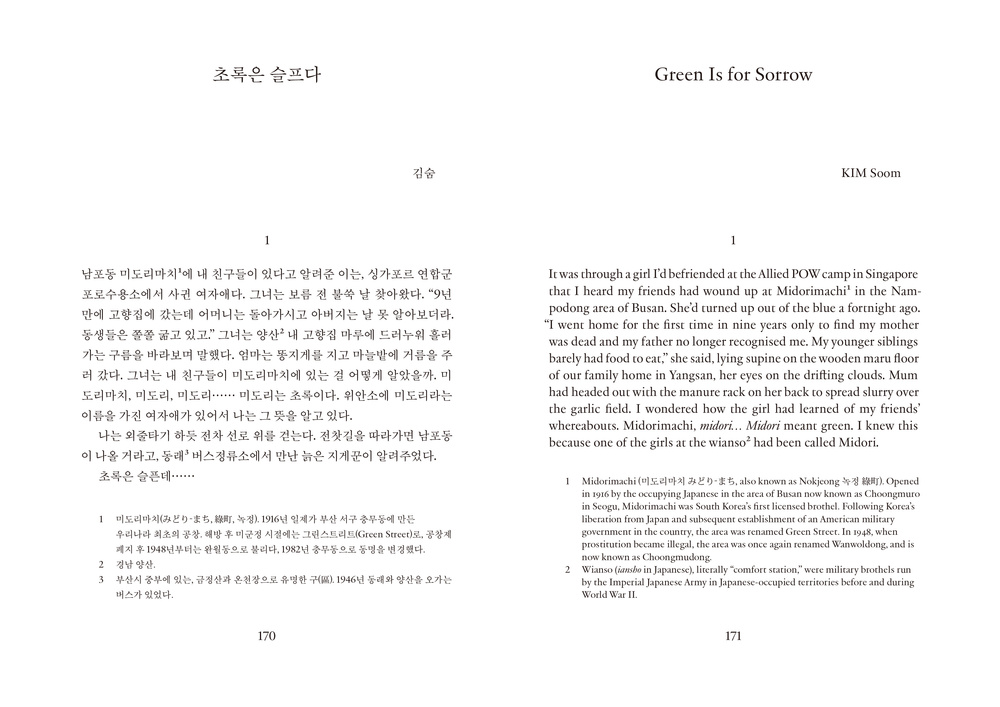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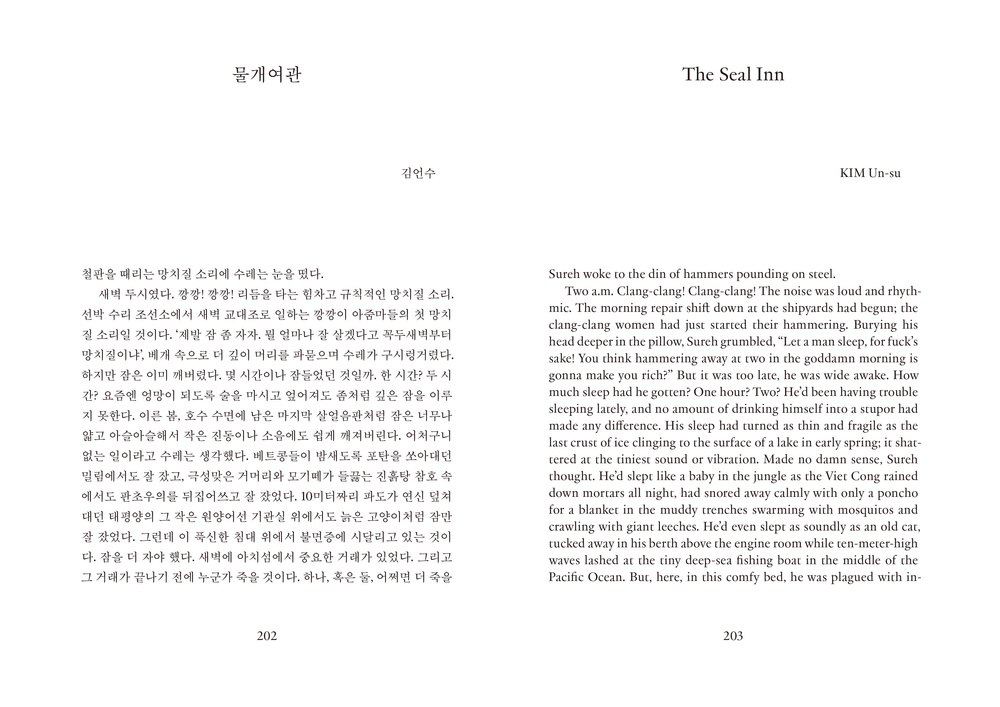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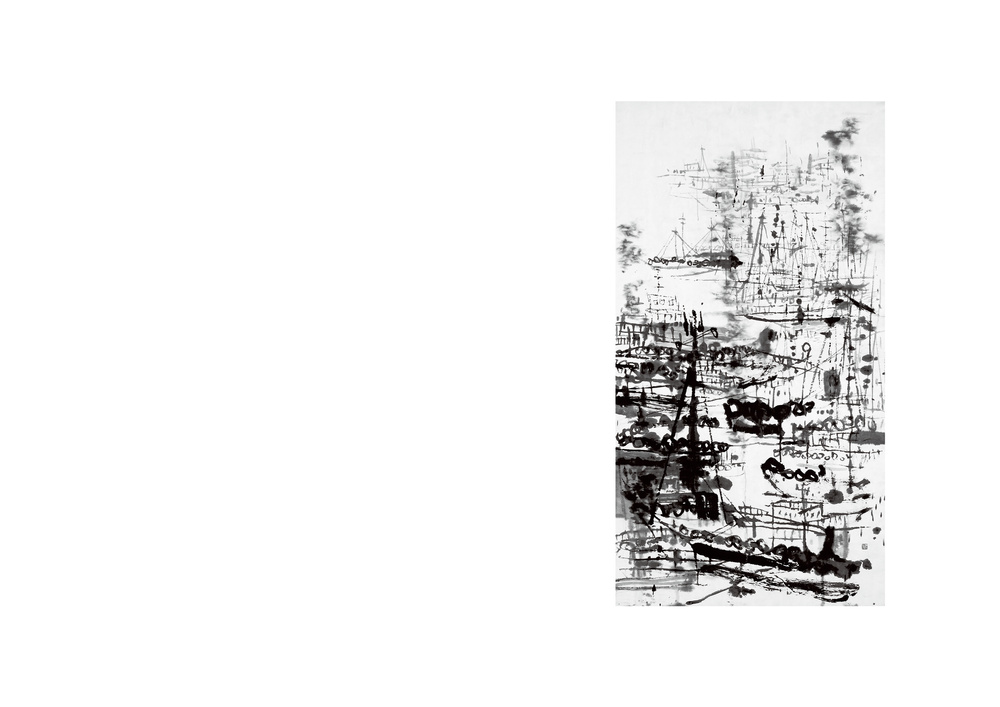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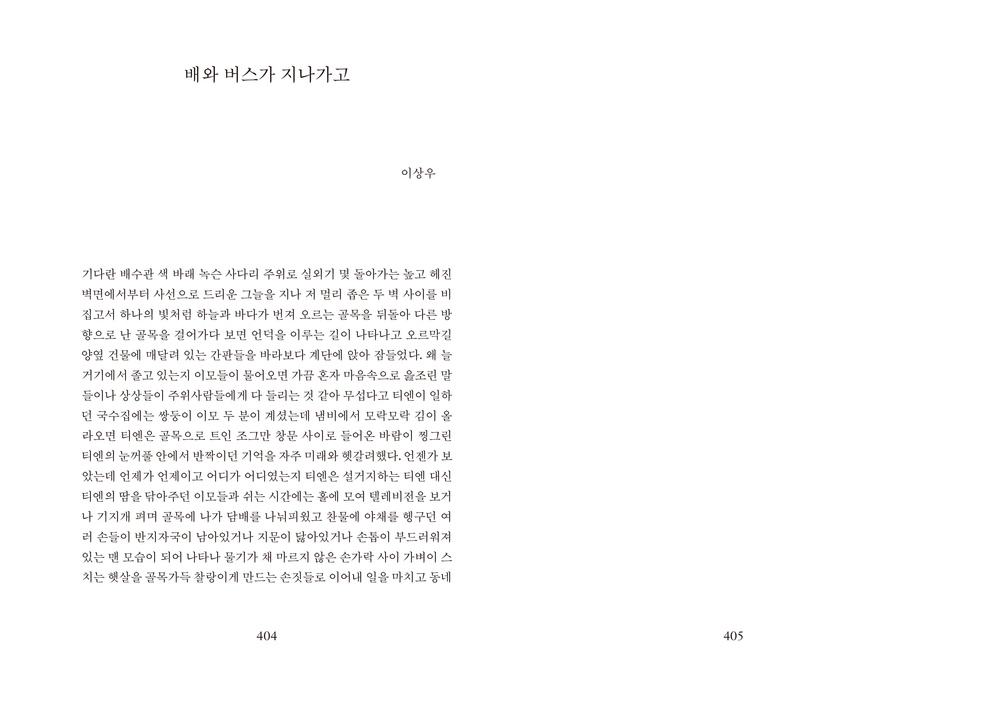
↧
↧
FEUILLES
FEUILLES
엄유정 Yu Jeong Eom
2020년 9월 1일 발행글: 안소연
디자인: 신신ISBN 979-1190-434065 (03600)225x300mm / 224 페이지값 35,000원
![]() 엄유정 작가의 112점의 식물 그림이 수록된 그림 책입니다.
엄유정 작가의 112점의 식물 그림이 수록된 그림 책입니다.
![]()
![]()
![]()
 엄유정 작가의 112점의 식물 그림이 수록된 그림 책입니다.
엄유정 작가의 112점의 식물 그림이 수록된 그림 책입니다.



↧
[한시간총서 6] 동물성의 잔상들
[한시간총서 6] 동물성의 잔상들
![]() 허호정 지음
구정연 편집미디어버스 발행강문식 디자인2020년 10월 1일 발행ISBN
979-11-90434-07- 2978–89–94027–74–6 (세트)100x150mm / 60페이지값 10,000원
책 소개
이 책은 미술비평가이자 기획자 허호정이 2019년 11월 기획한 전시(《동물성 루프》, 이민주와
공동 기획, 박보나, 임정수, 차미혜, 하상현 참여)의
이전과 이후를 다시 엮은 결과물이다. 저자는 과거의 기록물들로부터 이미지가 현재화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질문한다. 더 이상 실황으로 공연되지 않거나, 이미
파기되어 흔적만 남은 작품, 직접 몸으로 경험하지 못하며 역사상의 기록으로만 남는 이미지들을 현재에
마주할 때, 현존의 경험에 대비되어 그 위상을 가늠하게 되는 기록/이미지들의
가능성을 생각한다. 여기서 실황, 현존, 살아 있음과 그에 대비되는 죽음, 사후성 등의 개념적 이해는 ‘동물성’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재배치된다.
이때, 퍼포먼스 담론 안에서 기록물에 관한 논의를 참조한다. 그리고 전시
《동물성
루프》를 통해 던졌던 퍼포먼스와 도큐멘테이션의 관계에 관한 물음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야기는
퍼포먼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생하지 못하고 열화 되었으며 실효가 없다고 간주되는 과거의 이미지들이
현재의 ‘읽기’를 통해 그 자신의 위상을 확인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그리하여 이 책은 ‘동물성’이라는 단어가 직관적으로 제시하는 현존의 생생한 살아있음을 반문하고, ‘잔상’으로 남은 기록과 흔적을 조명한다.
저자소개
문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비평적 글쓰기와 미술사 서술을 고민한다. 이미지의 발생과 전시의 경험을 모색한다. 「전시
경험의 시세: 낙차를 견주기, Exhibition of
Exhibition of Exhibition」(크리틱칼, 2018), 「망각의 요구」(계간시청각, 2018), 「병에 ‘대하여’ 말하는 이미지」 (SEMINAR, 2020) 등을
쓰고, 전시 《내 눈이 가늘어진다》 (합정지구, 2019)를 협력 기획, 《동물성
루프》 (공-원, 2019)를 공동
기획했다.
책 속에서
지금의 글쓰기는 «동물성 루프»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나는 전시 이전과 이후를 다시 엮으려 한다. 그리고 전시와 퍼포먼스 담론의 영역을 넘어서는 데로부터 이야기의 물꼬를 튼다. 여기서 굳이 선별된 ‘퍼포먼스’라는 장르, 시간–기반 예술의 매체 특정적 정황은 주변적으로만 다뤄질 뿐 이 글의 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서술된 모든 문장에서 ‘퍼포먼스’를 지우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도 질문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미 존재했던(혹은 이미 끝난), 지금은 ‘살아 있지 않은’ 이미지를 보는 경험에 대해 말해보자. 이 글은 어떤 전시의 사후적(posthumous) 작업이자, 동시에 어떤 종류의 사후성(after-life)과 관계하는 이미지의 발생을 다룬다. 이를 위해 이미지가 기록과 언어를 선회하여 발생하는 지점을 파편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이미지’ 경험, 그 시각적(visual) 경험이 ‘무엇의 효과’로 서술되기보다 그 자체의 힘을 마련하는 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글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한다. 과거 · 죽음 · 역사에 귀속하는 것은 어떻게 현재의 이미지로서 발생하고 감각되는가? (8페이지)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작가 자신의 이전 퍼포먼스 및 다른 역사적 퍼포먼스를 재연한 ‹Seven Easy Pieces›(2005)에서, 퍼포먼스 도큐멘테이션은 과거의 ‘그’ 퍼포먼스의 유일한 힌트가 됨으로써 실황 공연의 보충물이 아닌 다른 위상을 점한다. 도큐멘테이션은 실제 ‘그’ 퍼포먼스가 어떤 물리적 조건 안에서 행해졌는지 알려주는 여타의 정보가 극히 제한된 경우—이를 테면, 남은 ‘정보’는 사진 한 장이 전부인 발리 엑스포트의 ‹Action Pants: Genital Panic›(1969)—에 오로지 이미지로써 다른 정황을 상상하고 독해하며 재설정하도록 만든다. 결국, 아브라모비치가 ‘재연’과 ‘재현’의 문법으로 과거의 퍼포먼스를 수행한 ‹Seven Easy Pieces›는 실황 공연의 유동적인 상태와, 과거 작품을 재맥락화하면서 그 나름의 고정된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에 대해 유동적인 것과 구조적인 것의 이중적—양립 불가능한(incompatible)—상황을 지적할 수 있다.16 여기서 도큐멘테이션은 과연 퍼포먼스가 특정한 시점에만 존재하는, 휘발되고 한시적인, 유동적인(mobilized) 특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묻는다. (25페이지)
허호정 지음
구정연 편집미디어버스 발행강문식 디자인2020년 10월 1일 발행ISBN
979-11-90434-07- 2978–89–94027–74–6 (세트)100x150mm / 60페이지값 10,000원
책 소개
이 책은 미술비평가이자 기획자 허호정이 2019년 11월 기획한 전시(《동물성 루프》, 이민주와
공동 기획, 박보나, 임정수, 차미혜, 하상현 참여)의
이전과 이후를 다시 엮은 결과물이다. 저자는 과거의 기록물들로부터 이미지가 현재화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질문한다. 더 이상 실황으로 공연되지 않거나, 이미
파기되어 흔적만 남은 작품, 직접 몸으로 경험하지 못하며 역사상의 기록으로만 남는 이미지들을 현재에
마주할 때, 현존의 경험에 대비되어 그 위상을 가늠하게 되는 기록/이미지들의
가능성을 생각한다. 여기서 실황, 현존, 살아 있음과 그에 대비되는 죽음, 사후성 등의 개념적 이해는 ‘동물성’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재배치된다.
이때, 퍼포먼스 담론 안에서 기록물에 관한 논의를 참조한다. 그리고 전시
《동물성
루프》를 통해 던졌던 퍼포먼스와 도큐멘테이션의 관계에 관한 물음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야기는
퍼포먼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생하지 못하고 열화 되었으며 실효가 없다고 간주되는 과거의 이미지들이
현재의 ‘읽기’를 통해 그 자신의 위상을 확인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그리하여 이 책은 ‘동물성’이라는 단어가 직관적으로 제시하는 현존의 생생한 살아있음을 반문하고, ‘잔상’으로 남은 기록과 흔적을 조명한다.
저자소개
문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비평적 글쓰기와 미술사 서술을 고민한다. 이미지의 발생과 전시의 경험을 모색한다. 「전시
경험의 시세: 낙차를 견주기, Exhibition of
Exhibition of Exhibition」(크리틱칼, 2018), 「망각의 요구」(계간시청각, 2018), 「병에 ‘대하여’ 말하는 이미지」 (SEMINAR, 2020) 등을
쓰고, 전시 《내 눈이 가늘어진다》 (합정지구, 2019)를 협력 기획, 《동물성
루프》 (공-원, 2019)를 공동
기획했다.
책 속에서
지금의 글쓰기는 «동물성 루프»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나는 전시 이전과 이후를 다시 엮으려 한다. 그리고 전시와 퍼포먼스 담론의 영역을 넘어서는 데로부터 이야기의 물꼬를 튼다. 여기서 굳이 선별된 ‘퍼포먼스’라는 장르, 시간–기반 예술의 매체 특정적 정황은 주변적으로만 다뤄질 뿐 이 글의 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서술된 모든 문장에서 ‘퍼포먼스’를 지우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도 질문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미 존재했던(혹은 이미 끝난), 지금은 ‘살아 있지 않은’ 이미지를 보는 경험에 대해 말해보자. 이 글은 어떤 전시의 사후적(posthumous) 작업이자, 동시에 어떤 종류의 사후성(after-life)과 관계하는 이미지의 발생을 다룬다. 이를 위해 이미지가 기록과 언어를 선회하여 발생하는 지점을 파편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이미지’ 경험, 그 시각적(visual) 경험이 ‘무엇의 효과’로 서술되기보다 그 자체의 힘을 마련하는 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글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한다. 과거 · 죽음 · 역사에 귀속하는 것은 어떻게 현재의 이미지로서 발생하고 감각되는가? (8페이지)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작가 자신의 이전 퍼포먼스 및 다른 역사적 퍼포먼스를 재연한 ‹Seven Easy Pieces›(2005)에서, 퍼포먼스 도큐멘테이션은 과거의 ‘그’ 퍼포먼스의 유일한 힌트가 됨으로써 실황 공연의 보충물이 아닌 다른 위상을 점한다. 도큐멘테이션은 실제 ‘그’ 퍼포먼스가 어떤 물리적 조건 안에서 행해졌는지 알려주는 여타의 정보가 극히 제한된 경우—이를 테면, 남은 ‘정보’는 사진 한 장이 전부인 발리 엑스포트의 ‹Action Pants: Genital Panic›(1969)—에 오로지 이미지로써 다른 정황을 상상하고 독해하며 재설정하도록 만든다. 결국, 아브라모비치가 ‘재연’과 ‘재현’의 문법으로 과거의 퍼포먼스를 수행한 ‹Seven Easy Pieces›는 실황 공연의 유동적인 상태와, 과거 작품을 재맥락화하면서 그 나름의 고정된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에 대해 유동적인 것과 구조적인 것의 이중적—양립 불가능한(incompatible)—상황을 지적할 수 있다.16 여기서 도큐멘테이션은 과연 퍼포먼스가 특정한 시점에만 존재하는, 휘발되고 한시적인, 유동적인(mobilized) 특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묻는다. (25페이지)
![]()
 허호정 지음
구정연 편집미디어버스 발행강문식 디자인2020년 10월 1일 발행ISBN
979-11-90434-07- 2978–89–94027–74–6 (세트)100x150mm / 60페이지값 10,000원
책 소개
이 책은 미술비평가이자 기획자 허호정이 2019년 11월 기획한 전시(《동물성 루프》, 이민주와
공동 기획, 박보나, 임정수, 차미혜, 하상현 참여)의
이전과 이후를 다시 엮은 결과물이다. 저자는 과거의 기록물들로부터 이미지가 현재화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질문한다. 더 이상 실황으로 공연되지 않거나, 이미
파기되어 흔적만 남은 작품, 직접 몸으로 경험하지 못하며 역사상의 기록으로만 남는 이미지들을 현재에
마주할 때, 현존의 경험에 대비되어 그 위상을 가늠하게 되는 기록/이미지들의
가능성을 생각한다. 여기서 실황, 현존, 살아 있음과 그에 대비되는 죽음, 사후성 등의 개념적 이해는 ‘동물성’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재배치된다.
이때, 퍼포먼스 담론 안에서 기록물에 관한 논의를 참조한다. 그리고 전시
《동물성
루프》를 통해 던졌던 퍼포먼스와 도큐멘테이션의 관계에 관한 물음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야기는
퍼포먼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생하지 못하고 열화 되었으며 실효가 없다고 간주되는 과거의 이미지들이
현재의 ‘읽기’를 통해 그 자신의 위상을 확인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그리하여 이 책은 ‘동물성’이라는 단어가 직관적으로 제시하는 현존의 생생한 살아있음을 반문하고, ‘잔상’으로 남은 기록과 흔적을 조명한다.
저자소개
문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비평적 글쓰기와 미술사 서술을 고민한다. 이미지의 발생과 전시의 경험을 모색한다. 「전시
경험의 시세: 낙차를 견주기, Exhibition of
Exhibition of Exhibition」(크리틱칼, 2018), 「망각의 요구」(계간시청각, 2018), 「병에 ‘대하여’ 말하는 이미지」 (SEMINAR, 2020) 등을
쓰고, 전시 《내 눈이 가늘어진다》 (합정지구, 2019)를 협력 기획, 《동물성
루프》 (공-원, 2019)를 공동
기획했다.
책 속에서
지금의 글쓰기는 «동물성 루프»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나는 전시 이전과 이후를 다시 엮으려 한다. 그리고 전시와 퍼포먼스 담론의 영역을 넘어서는 데로부터 이야기의 물꼬를 튼다. 여기서 굳이 선별된 ‘퍼포먼스’라는 장르, 시간–기반 예술의 매체 특정적 정황은 주변적으로만 다뤄질 뿐 이 글의 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서술된 모든 문장에서 ‘퍼포먼스’를 지우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도 질문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미 존재했던(혹은 이미 끝난), 지금은 ‘살아 있지 않은’ 이미지를 보는 경험에 대해 말해보자. 이 글은 어떤 전시의 사후적(posthumous) 작업이자, 동시에 어떤 종류의 사후성(after-life)과 관계하는 이미지의 발생을 다룬다. 이를 위해 이미지가 기록과 언어를 선회하여 발생하는 지점을 파편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이미지’ 경험, 그 시각적(visual) 경험이 ‘무엇의 효과’로 서술되기보다 그 자체의 힘을 마련하는 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글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한다. 과거 · 죽음 · 역사에 귀속하는 것은 어떻게 현재의 이미지로서 발생하고 감각되는가? (8페이지)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작가 자신의 이전 퍼포먼스 및 다른 역사적 퍼포먼스를 재연한 ‹Seven Easy Pieces›(2005)에서, 퍼포먼스 도큐멘테이션은 과거의 ‘그’ 퍼포먼스의 유일한 힌트가 됨으로써 실황 공연의 보충물이 아닌 다른 위상을 점한다. 도큐멘테이션은 실제 ‘그’ 퍼포먼스가 어떤 물리적 조건 안에서 행해졌는지 알려주는 여타의 정보가 극히 제한된 경우—이를 테면, 남은 ‘정보’는 사진 한 장이 전부인 발리 엑스포트의 ‹Action Pants: Genital Panic›(1969)—에 오로지 이미지로써 다른 정황을 상상하고 독해하며 재설정하도록 만든다. 결국, 아브라모비치가 ‘재연’과 ‘재현’의 문법으로 과거의 퍼포먼스를 수행한 ‹Seven Easy Pieces›는 실황 공연의 유동적인 상태와, 과거 작품을 재맥락화하면서 그 나름의 고정된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에 대해 유동적인 것과 구조적인 것의 이중적—양립 불가능한(incompatible)—상황을 지적할 수 있다.16 여기서 도큐멘테이션은 과연 퍼포먼스가 특정한 시점에만 존재하는, 휘발되고 한시적인, 유동적인(mobilized) 특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묻는다. (25페이지)
허호정 지음
구정연 편집미디어버스 발행강문식 디자인2020년 10월 1일 발행ISBN
979-11-90434-07- 2978–89–94027–74–6 (세트)100x150mm / 60페이지값 10,000원
책 소개
이 책은 미술비평가이자 기획자 허호정이 2019년 11월 기획한 전시(《동물성 루프》, 이민주와
공동 기획, 박보나, 임정수, 차미혜, 하상현 참여)의
이전과 이후를 다시 엮은 결과물이다. 저자는 과거의 기록물들로부터 이미지가 현재화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질문한다. 더 이상 실황으로 공연되지 않거나, 이미
파기되어 흔적만 남은 작품, 직접 몸으로 경험하지 못하며 역사상의 기록으로만 남는 이미지들을 현재에
마주할 때, 현존의 경험에 대비되어 그 위상을 가늠하게 되는 기록/이미지들의
가능성을 생각한다. 여기서 실황, 현존, 살아 있음과 그에 대비되는 죽음, 사후성 등의 개념적 이해는 ‘동물성’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재배치된다.
이때, 퍼포먼스 담론 안에서 기록물에 관한 논의를 참조한다. 그리고 전시
《동물성
루프》를 통해 던졌던 퍼포먼스와 도큐멘테이션의 관계에 관한 물음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야기는
퍼포먼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생하지 못하고 열화 되었으며 실효가 없다고 간주되는 과거의 이미지들이
현재의 ‘읽기’를 통해 그 자신의 위상을 확인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그리하여 이 책은 ‘동물성’이라는 단어가 직관적으로 제시하는 현존의 생생한 살아있음을 반문하고, ‘잔상’으로 남은 기록과 흔적을 조명한다.
저자소개
문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비평적 글쓰기와 미술사 서술을 고민한다. 이미지의 발생과 전시의 경험을 모색한다. 「전시
경험의 시세: 낙차를 견주기, Exhibition of
Exhibition of Exhibition」(크리틱칼, 2018), 「망각의 요구」(계간시청각, 2018), 「병에 ‘대하여’ 말하는 이미지」 (SEMINAR, 2020) 등을
쓰고, 전시 《내 눈이 가늘어진다》 (합정지구, 2019)를 협력 기획, 《동물성
루프》 (공-원, 2019)를 공동
기획했다.
책 속에서
지금의 글쓰기는 «동물성 루프»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나는 전시 이전과 이후를 다시 엮으려 한다. 그리고 전시와 퍼포먼스 담론의 영역을 넘어서는 데로부터 이야기의 물꼬를 튼다. 여기서 굳이 선별된 ‘퍼포먼스’라는 장르, 시간–기반 예술의 매체 특정적 정황은 주변적으로만 다뤄질 뿐 이 글의 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서술된 모든 문장에서 ‘퍼포먼스’를 지우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도 질문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미 존재했던(혹은 이미 끝난), 지금은 ‘살아 있지 않은’ 이미지를 보는 경험에 대해 말해보자. 이 글은 어떤 전시의 사후적(posthumous) 작업이자, 동시에 어떤 종류의 사후성(after-life)과 관계하는 이미지의 발생을 다룬다. 이를 위해 이미지가 기록과 언어를 선회하여 발생하는 지점을 파편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이미지’ 경험, 그 시각적(visual) 경험이 ‘무엇의 효과’로 서술되기보다 그 자체의 힘을 마련하는 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글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한다. 과거 · 죽음 · 역사에 귀속하는 것은 어떻게 현재의 이미지로서 발생하고 감각되는가? (8페이지)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작가 자신의 이전 퍼포먼스 및 다른 역사적 퍼포먼스를 재연한 ‹Seven Easy Pieces›(2005)에서, 퍼포먼스 도큐멘테이션은 과거의 ‘그’ 퍼포먼스의 유일한 힌트가 됨으로써 실황 공연의 보충물이 아닌 다른 위상을 점한다. 도큐멘테이션은 실제 ‘그’ 퍼포먼스가 어떤 물리적 조건 안에서 행해졌는지 알려주는 여타의 정보가 극히 제한된 경우—이를 테면, 남은 ‘정보’는 사진 한 장이 전부인 발리 엑스포트의 ‹Action Pants: Genital Panic›(1969)—에 오로지 이미지로써 다른 정황을 상상하고 독해하며 재설정하도록 만든다. 결국, 아브라모비치가 ‘재연’과 ‘재현’의 문법으로 과거의 퍼포먼스를 수행한 ‹Seven Easy Pieces›는 실황 공연의 유동적인 상태와, 과거 작품을 재맥락화하면서 그 나름의 고정된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에 대해 유동적인 것과 구조적인 것의 이중적—양립 불가능한(incompatible)—상황을 지적할 수 있다.16 여기서 도큐멘테이션은 과연 퍼포먼스가 특정한 시점에만 존재하는, 휘발되고 한시적인, 유동적인(mobilized) 특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묻는다. (25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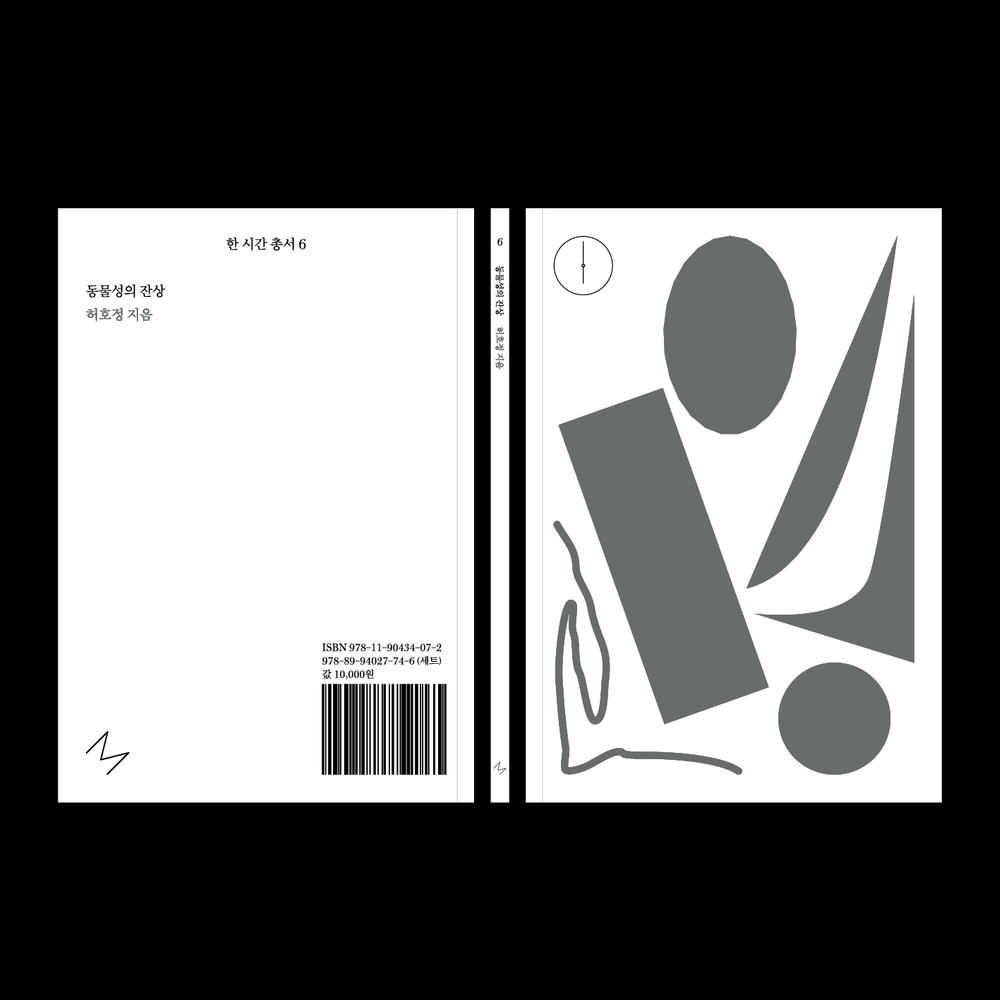
↧
Publishing as method exhibition 방법으로서의 출판 전시
Publishing as method Exhibition 방법으로서의 출판 전시
![]()
![]()
![]()
![]()
![]()
![]()
![]() 사진: 김연제 Photo: Kim Yonje
아트선재센터 1층 프로젝트 스페이스
2020년 10월 30일~12월 20일
오후 12시~7시 (월요일 휴관)
Art Sonje Center 1F Project Space
Oct. 30–Dec. 20, 2020
12 pm–7 pm (Closed on Mondays)
《방법으로서의 출판》은 오늘날 예술 출판, 특히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출판 단위들의 실천을 다룬다. 최근 몇 년간 아시아의 주요 도시에서 예술가와 기획자, 컬렉티브를 중심으로 자신의 활동을 매개하는 방식으로서 출판 실천이 늘어나면서, 이런 결과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문화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기보다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맥락 안에 배치하고 함께 읽어 내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홍콩,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덟 명의 작가/팀이 전시에 초대된다. 이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출판 전문가나 아티스트 북 작가는 아니다. 대신 그래픽 디자이너, 웹, 영상, 사운드 작가, 큐레이터, 인포숍 등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이런 문화의 조건을 형성하고 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느슨하게 공유하는 태도와 감각은 소규모 출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기보다 ‘ 방법’ 으로서 출판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계기를 제공한다.
전시 작품과 함께 ‘아시아 예술 출판 디렉터리’ 공간에는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40여 개의 출판 이니셔티브들의 책과 문서가 소개된다. 아시아 16여 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출판 컬렉티브를 비롯해 서점, 아트 북 페어, 아카이브,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연구자 등으로, 우리는 이들의 활동을 통해 아시아 소규모 예술 출판의 지형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역적인 상황은 12월 발행 예정인 『방법으로서의 출판』(미디어버스·오노마토피 공동 발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Publishing as Method addresses art publishing today, in particular, the practice of small-scale publishing in Asia. As the practice of small-scale publishing has increased among artists, curators, and collectives as a method of mediating their practices in the major cities in Asia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activities related to producing their output and circulating it have been stimulated. Instead of looking at the culture surrounding small-scale publishing as an individual and independent phenomenon, we attempt to integrate it into its historical and local contexts. To do so, we invited eight artists / teams, who practice in China, Hong Kong, South Korea, and the Middle East. They are neither publishing experts in the traditional meaning of the term, nor writers of artist books. Instead, they are graphic designers; artists using web, video, or sound; curators; infoshop, etc.—those who form and connect the conditions of culture as we encounter it today. Their loosely shared attitudes and sensibilities, while not offering a direct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small-scale publishing?,” offer an opportunity to approach and utilize publishing as a “method.”
Along with the works, “Asia Art Publishing Directory” introduces books and documents by about forty publishing initiatives active all over Asia. They are publishing collectives practicing in sixteen cities in Asia, bookshops, art book fairs, archives, artist-run spaces, researchers, and so on. Through their activities, we can imagine the terrain of small-scale publishing in Asia.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ir practice and their local context is available in the interviews included in the research publication.
thebooksociety.org/publishing-as-method
참여 작가
Participating Artists
라이팅 밴드, 류한길, 민구홍 매뉴팩처링, 슬기와 민, 윤지원, 진 쿱, 카이파 타, 후팡
Hu Fang, Kayfa ta, Min Guhong Manufacturing, Ryu Hankil, Sulki & Min, Writing Band, Yoon Jeewon, ZINE COOP
기획
Curated by
임경용
Lim Kyung yong
공동 연구
Research Collaboration
미디어버스(구정연), 현시원
Hyun Seewon, mediabus (Helen Jungyeon Ku)
그래픽 디자인
Graphic Design
슬기와 민
Sulki & Min
전시 디자인
Exhibition Design
구재회
Jaehoi Koo
제작 진행
Production Management
심규선
Shim Kyusun
웹 디자인
Website
민구홍 매뉴팩처링
Min Guhong Manufacturing
공동 주최
Organized by
아트선재센터, 더 북 소사이어티
Art Sonje Center, The Book Society
후원
Supported by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Arts Council Korea,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참여작품
라이팅 밴드
Writing Band
〈라이팅 밴드 2020〉, 2020년
Writing Band 2020, 2020웹사이트, 가변 크기, 혼합 설치Website, variable size, mixed media참여자: 박선호, 서재웅, 심규선, 최하늘, 김형재, 홍은주, 현시원 외Participants: Park Sunho, Seo Jaewoong, Shim Kyusun, Choi Hanyel, Hong Eun-joo, Kim Hyung-jae, Hyun Seewon and others
writingband.net/2020라이팅 밴드는 그래픽 디자이너 홍은주, 김형재와 시청각 랩 디렉터 현시원의 온라인 프로젝트로 올림픽을 따라 4 년마다 제작된다. 라이팅 밴드는 글쓰기 행위를 출발점에 두고 협업, 아카이브와 수행성의 문제를 제시한다. 현재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공간 삼아 〈 퍼포먼스로서의 글쓰기〉 (2012년)와 〈전시 사진 아카이브〉(2016 년)를 다뤘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의 책 공간 더 북 소사이어티를 시작점이자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은 2010년에 설립된 더 북 소사이어티 활동의 핵심에 ‘ 말과 글’이 있다고 보고 이를 글, 조각, 이미지의 형태로 제작한다. 전시장 벽면에는 라이팅 밴드의 웹 주소가 적혀 있으며 , 공간 곳곳에는 참여자들이 쓴 글의 도판이자 이들의 실물 작업이 배치된다.Writing Band is an online-media project. Hyun Seewon, director of AVP Lab, and Hong Eun-joo and Kim Hyung-jae, graphic designers, deals with issues of collaboration, archives and performance with various participants. Writing Band was based on writing as a performance (2012) and archive of “installation views” (2016) at the Gwache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Writing Band is produced every four years according to the Olympics. In the exhibition, Writing Band covers the Book Society, Seoul, a space founded in 2010. They see “words and speeches” at the core of its activities and treats them in the form of letters, sculptures and images.
류한길
Ryu Hankil
〈충격 관리자〉, 2020년
Impact Security, 2020포스터, 70 ×100 cmPosters, 70 ×100 cm포스터 디자인: 심규선Posters designed by Shim Kyusun류한길은 2000년 초반부터 음향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음향을 표현의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사유의 대상으로 여기며, 음향적 사고를 할 때 어떤 사고 실험이 가능해지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Ryu Hankil has been focusing on sound related issues since early 2000. He considers sound as an object of thought itself, not a tool of expression, and makes various attempts at what kind of thinking experiments become possible when thinking acoustically.
민구홍 매뉴팩처링
Min Guhong Manufacturing
〈새로운 질서〉, 2020년
〈방법으로서의 출판〉, 2020년
New Order, 2020
Pubilshing as method, 2020
웹사이트, 가변 설치
Website, dimension variable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겸 출판사 워크룸에 기생하는 1 인 회사다. 회사에서는 주업무를 여러 방식으로 회사, 즉 민구홍 매뉴팩처링 자체를 소개하는 일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저술, 번역, 코딩, 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편집’을 실천하기 위한 헛서사에 가깝다. 출판의 형식을 다루는 이번 전시에서 회사는 웹이라는 매체를 통해 박제된 지면(紙面)을 떠난 콘텐츠(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부여할 수 있는 질서와 그 방식을 살피는 한편, 회사의 주업무 또한 어김없이 수행한다. 누군가의 말처럼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편집자를 비롯해 저술가, 번역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여러 직함을 지닌 민구홍이 오직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편집한 결과물, 또는 그를 위한 편집 지침일지 모른다.
Min Guhong Manufacturing is a one-man company parasitic on design studio and publisher, workroom. The main job of the company is to introduce the company, Min Guhong Manufacturing itself, but this is more of a futile attempt to practice editing in a broad sense encompassing writing, translation, coding and design. In this exhibition, which deals with the form of publishing, the company examines the order and methods that can be given to characters (or data) that have left a fixed page through the Web, and performs the company’s main tasks without fail.
슬기와 민
Sulki& Min
〈나는 왜 출판하는가〉, 2020년
Why I Publish, 2020벽면에 접착 비닐, 280 × 600 cmPlastic vinyl on the wall, 280 × 600 cm슬기와 민은 2000년대 중반부터 출판과 그래픽 디자인 실천을 통해 책 만드는 예술을 한국 미술과 디자인계에 확산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번 전시에서 제시하는 대답 없는 질문을 통해, 그들은 책을 펴내려는 충동의 근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한편, 그들이 책의 내용과 형식을 이해하는 시각을 시사한다.Through their publishing and graphic design practice since mid-2000s, Sulki and Min have contributed to spreading the art of book publishing in the fields of art and design in Korea. By asking the unanswered question for this exhibition, they suggest how they understand the form and content of the book, while exploring fundamental impulses behind their act of publishing.
윤지원
Yoon Jeewon
〈북-필름(2020년 전시를 위한 발췌)〉, 2020 년
The Book-Film (Excerpt for the exhibition), 2020
싱글채널 비디오
Single-channel video
작품을 통해 매체와 사회 간의 관계를 연구해온 윤지원은 〈북-필름〉이라는 제목의 장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 이 작품에서 그는 미디어로서의 책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변화하고 사회와 관계 맺는지에 주목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소규모 출판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체들을 쫓는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영상은 완성될 장편 다큐멘터리의 프롤로그로서, 촬영된 분량 중 일부를 전시에 맞춰 편집한 버전이다.
Yoon Jeewon, who has research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society through works, is making a full-length documentary film, Book-Film. In this film, he follows some subjects who produce and distribute small publications in Asia, noting how books as media change and relate to society in the digital age. The video introduced in this exhibition is a prologue to a documentary film with some of the footage edited for the exhibition.
진 쿱
ZINE COOP
〈리: 버닝 이슈스〉, 2020년
re: BURNING IXXUES, 2020
테이블, 종이 인쇄물
Tables, printed matters
진 쿱은 진 출판물, 워크숍 및 전시를 수집, 교육하고 기획하는 홍콩의 독립 출판 단체이다. 2019년 6월 이들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서 나타난 진 모음인 〈프리덤-하이〉 컬렉션을 만들었다. 이 컬렉션은 이후 전 세계 갤러리와 상점 그리고 도서관에서 전시되었다. 2020년 1월 진 쿱은 홍콩아트북페어에서 후속작인 〈버닝 이슈스〉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이것은 홍콩 바깥에서 활동하는 진스터들이 만든 긴급한 사회 문제와 움직임에 대한 작업들을 모은 것이다. 이번 서울 전시를 위해 진 쿱은 격동의 한 해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고려하여 〈버닝 이슈스〉 컬렉션을 다시 방문하고 재발견할 것이다.
ZINE COOP is an independent publishing collective in Hong Kong that collects, educates and curates zine publications, workshops and exhibitions. In June 2019, the group launched FREEDOM-HI, a collection of zines that emerged around the pro-democracy protests in Hong Kong. The collection was subsequently exhibited in galleries, stores and libraries around the world. For the Hong Kong Art Book Fair in January 2020, ZINE COOP exhibited the follow-up BURNING IXXUES collection, which gathered works from zinesters outside of Hong Kong about their pressing social issues and movements. For this Seoul exhibition, the group will revisit and reinvent BURNING IXXUES in light of all that’s happened during this tumultuous year.
카이파 타(마하 마아문, 알라 유니스)
Kayfa ta (Maha Maamoun and Ala Younis)
〈미로 속을 걷는 법: 카이파 타 연대기〉, 2020년
How to walk through a labyrinth:
A Chronology of Kayfa ta, 2020
잉크젯 인쇄, 출판물, 비디오, 사운드, 661× 300 cm
Inkjet print, publications, videos and sound, 661× 300 cm
카이파 타는 최근 자주 사용되는 매뉴얼(how = kayfa, to = ta) 형식을 활용해 지금 인식되는 요구, 기술과 도구, 사유나 감성에 대응하는 출판 이니셔티브다. 이 책들은 기술적인 것과 성찰적인 것, 일상과 사색적인 것, 교육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 사실적인 것과 허구적인 것 사이 공간에 스스로를 배치한다. 카이파 타는 2012년 마하 마아문과 알라 유니스가 설립했다. 2019년 카이파 타는 단순히 매뉴얼을 출판하는 것에서부터 출판 자체의 행위와 맥락, 출판 산업의 다양한 측면, 개인과 제도적 차원에서 창의적 생산이 어떻게 정의되고 가치 있게 평가되는지 조명하는 일로 작업을 확장시켰다. 전시, 연구, 외부 작업을 통해 카이파 타는 저자성, 독립성, 검열, 그리고 주관적이고 유동적이며 진화하는 주체를 지배적 담론과 가치로부터 구별하는 이동하는 경계선 개념들을 둘러싼 중요한 대화를 촉구한다. 이번 전시에서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작업한 책과 도구, 전시들을 연대표를 통해 보여 준다.
Kayfa ta is a publishing initiative that uses the popular format of how-to manuals (how = kayfa, to = ta) to respond to some of today’s perceived needs; be they the development of skills, tools, thoughts, or sensibilities. These books situate themselves in the space between the technical and the reflective, the everyday and the speculative, the instructional and the intuitive, the factual and the fictional. Kayfa ta was founded in 2012 by Maha Maamoun and Ala Younis. In 2019, Kayfa ta expanded its work from solely publishing its series of how-to books, to shedding light on the acts and contexts of publishing itself, various aspects of the publishing industry, as well as on how creative production is defined and valued on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levels. Through exhibitions, research and commissions, Kayfa ta prompts important conversations around notions of authorship, independence, censorship, and the shifting demarcation lines separating dominant discourses and values from more subjective, fluid and evolving alternatives. This timeline highlights a selection of the books, tools and exhibitions that Kayfa has commissioned since 2012.
후팡
Hu Fang
〈책을 위한 집〉, 2017년
〈명상가들을 위하여〉, 2020년
Home for Books, 2017For the Contemplative Ones, 2020
아프리카 엠보니아 나무, 48 × 48 × 48 cm
African ambila, 48 × 48 × 48 cm
낭독: 심규선
Narration by Shim Kyusun
후팡은 광저우와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작가이자 기획자이다. 2002년 비타민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를 공동 설립한 후, 전시와 출판 등의 실천을 통해 동시대 중국의 맥락 대안적인 생산 방식을 탐색한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 책을 위한 집〉이라는 책장과 〈 명상가들을 위하여〉라는 시를 선보인다. 책의 본성에 따라 만들어진 책장은 일상 속 책 풍경을 만들어 주는 공간으로, 중국식 정원과의 흥미로운 관계를 반영한다. 팬데믹 시대에 대한 성찰을 담은 시 〈 명상가들을 위하여〉는 우리를 말과 글의 세계로 인도한다.
Hu Fang is a writer and curator working in Guangzhou and Beijing, China. He co-founded the Vitamin Creative Space in 2002 and through various practices to explore an alternative working mode specifically geared to the contemporary Chinese context. In this exhibition, he presents a bookshelf Home for Books and a poem For the Contemplative Ones. Bookshelf, which can be us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book, creates a perfect space for the book, and this space creates the scenery of the book within our daily lives and reflecting an interesting relation with Chinese gardens. For the Contemplative Ones, a contemplation of the pandemic era, guides us through a gateway into the world of words and writing.
아시아 예술 출판 디렉터리
Asia Art Publishing Directory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40여 개의 출판 이니셔티브들의 책과 문서가 소개된다. 이들은 출판사를 비롯해 서점, 아카이브,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컬렉티브, 아트 북 페어, 예술가, 디자인 스튜디오 등 다양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대안적이고 비판적인 지식 생산 및 유통 활동을 보여준다.For this project, we have researched various publishing initiatives in major 16 cities of Asia. Here, about 40 initiatives are engaged in publishing activities with various identities, including publishing house, bookshop, archive, artist-run-space, collective, art book fairs, artist, and design studio. We display some books which they have published in the exhibition. We also interviewed them, which will be included in Publishing as Method (to be published in December 2020 by mediabus and Onomatopee).
사진: 김연제 Photo: Kim Yonje
아트선재센터 1층 프로젝트 스페이스
2020년 10월 30일~12월 20일
오후 12시~7시 (월요일 휴관)
Art Sonje Center 1F Project Space
Oct. 30–Dec. 20, 2020
12 pm–7 pm (Closed on Mondays)
《방법으로서의 출판》은 오늘날 예술 출판, 특히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출판 단위들의 실천을 다룬다. 최근 몇 년간 아시아의 주요 도시에서 예술가와 기획자, 컬렉티브를 중심으로 자신의 활동을 매개하는 방식으로서 출판 실천이 늘어나면서, 이런 결과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문화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기보다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맥락 안에 배치하고 함께 읽어 내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홍콩,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덟 명의 작가/팀이 전시에 초대된다. 이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출판 전문가나 아티스트 북 작가는 아니다. 대신 그래픽 디자이너, 웹, 영상, 사운드 작가, 큐레이터, 인포숍 등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이런 문화의 조건을 형성하고 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느슨하게 공유하는 태도와 감각은 소규모 출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기보다 ‘ 방법’ 으로서 출판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계기를 제공한다.
전시 작품과 함께 ‘아시아 예술 출판 디렉터리’ 공간에는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40여 개의 출판 이니셔티브들의 책과 문서가 소개된다. 아시아 16여 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출판 컬렉티브를 비롯해 서점, 아트 북 페어, 아카이브,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연구자 등으로, 우리는 이들의 활동을 통해 아시아 소규모 예술 출판의 지형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역적인 상황은 12월 발행 예정인 『방법으로서의 출판』(미디어버스·오노마토피 공동 발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Publishing as Method addresses art publishing today, in particular, the practice of small-scale publishing in Asia. As the practice of small-scale publishing has increased among artists, curators, and collectives as a method of mediating their practices in the major cities in Asia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activities related to producing their output and circulating it have been stimulated. Instead of looking at the culture surrounding small-scale publishing as an individual and independent phenomenon, we attempt to integrate it into its historical and local contexts. To do so, we invited eight artists / teams, who practice in China, Hong Kong, South Korea, and the Middle East. They are neither publishing experts in the traditional meaning of the term, nor writers of artist books. Instead, they are graphic designers; artists using web, video, or sound; curators; infoshop, etc.—those who form and connect the conditions of culture as we encounter it today. Their loosely shared attitudes and sensibilities, while not offering a direct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small-scale publishing?,” offer an opportunity to approach and utilize publishing as a “method.”
Along with the works, “Asia Art Publishing Directory” introduces books and documents by about forty publishing initiatives active all over Asia. They are publishing collectives practicing in sixteen cities in Asia, bookshops, art book fairs, archives, artist-run spaces, researchers, and so on. Through their activities, we can imagine the terrain of small-scale publishing in Asia.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ir practice and their local context is available in the interviews included in the research publication.
thebooksociety.org/publishing-as-method
참여 작가
Participating Artists
라이팅 밴드, 류한길, 민구홍 매뉴팩처링, 슬기와 민, 윤지원, 진 쿱, 카이파 타, 후팡
Hu Fang, Kayfa ta, Min Guhong Manufacturing, Ryu Hankil, Sulki & Min, Writing Band, Yoon Jeewon, ZINE COOP
기획
Curated by
임경용
Lim Kyung yong
공동 연구
Research Collaboration
미디어버스(구정연), 현시원
Hyun Seewon, mediabus (Helen Jungyeon Ku)
그래픽 디자인
Graphic Design
슬기와 민
Sulki & Min
전시 디자인
Exhibition Design
구재회
Jaehoi Koo
제작 진행
Production Management
심규선
Shim Kyusun
웹 디자인
Website
민구홍 매뉴팩처링
Min Guhong Manufacturing
공동 주최
Organized by
아트선재센터, 더 북 소사이어티
Art Sonje Center, The Book Society
후원
Supported by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Arts Council Korea,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참여작품
라이팅 밴드
Writing Band
〈라이팅 밴드 2020〉, 2020년
Writing Band 2020, 2020웹사이트, 가변 크기, 혼합 설치Website, variable size, mixed media참여자: 박선호, 서재웅, 심규선, 최하늘, 김형재, 홍은주, 현시원 외Participants: Park Sunho, Seo Jaewoong, Shim Kyusun, Choi Hanyel, Hong Eun-joo, Kim Hyung-jae, Hyun Seewon and others
writingband.net/2020라이팅 밴드는 그래픽 디자이너 홍은주, 김형재와 시청각 랩 디렉터 현시원의 온라인 프로젝트로 올림픽을 따라 4 년마다 제작된다. 라이팅 밴드는 글쓰기 행위를 출발점에 두고 협업, 아카이브와 수행성의 문제를 제시한다. 현재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공간 삼아 〈 퍼포먼스로서의 글쓰기〉 (2012년)와 〈전시 사진 아카이브〉(2016 년)를 다뤘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의 책 공간 더 북 소사이어티를 시작점이자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은 2010년에 설립된 더 북 소사이어티 활동의 핵심에 ‘ 말과 글’이 있다고 보고 이를 글, 조각, 이미지의 형태로 제작한다. 전시장 벽면에는 라이팅 밴드의 웹 주소가 적혀 있으며 , 공간 곳곳에는 참여자들이 쓴 글의 도판이자 이들의 실물 작업이 배치된다.Writing Band is an online-media project. Hyun Seewon, director of AVP Lab, and Hong Eun-joo and Kim Hyung-jae, graphic designers, deals with issues of collaboration, archives and performance with various participants. Writing Band was based on writing as a performance (2012) and archive of “installation views” (2016) at the Gwache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Writing Band is produced every four years according to the Olympics. In the exhibition, Writing Band covers the Book Society, Seoul, a space founded in 2010. They see “words and speeches” at the core of its activities and treats them in the form of letters, sculptures and images.
류한길
Ryu Hankil
〈충격 관리자〉, 2020년
Impact Security, 2020포스터, 70 ×100 cmPosters, 70 ×100 cm포스터 디자인: 심규선Posters designed by Shim Kyusun류한길은 2000년 초반부터 음향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음향을 표현의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사유의 대상으로 여기며, 음향적 사고를 할 때 어떤 사고 실험이 가능해지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Ryu Hankil has been focusing on sound related issues since early 2000. He considers sound as an object of thought itself, not a tool of expression, and makes various attempts at what kind of thinking experiments become possible when thinking acoustically.
민구홍 매뉴팩처링
Min Guhong Manufacturing
〈새로운 질서〉, 2020년
〈방법으로서의 출판〉, 2020년
New Order, 2020
Pubilshing as method, 2020
웹사이트, 가변 설치
Website, dimension variable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겸 출판사 워크룸에 기생하는 1 인 회사다. 회사에서는 주업무를 여러 방식으로 회사, 즉 민구홍 매뉴팩처링 자체를 소개하는 일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저술, 번역, 코딩, 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편집’을 실천하기 위한 헛서사에 가깝다. 출판의 형식을 다루는 이번 전시에서 회사는 웹이라는 매체를 통해 박제된 지면(紙面)을 떠난 콘텐츠(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부여할 수 있는 질서와 그 방식을 살피는 한편, 회사의 주업무 또한 어김없이 수행한다. 누군가의 말처럼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편집자를 비롯해 저술가, 번역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여러 직함을 지닌 민구홍이 오직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편집한 결과물, 또는 그를 위한 편집 지침일지 모른다.
Min Guhong Manufacturing is a one-man company parasitic on design studio and publisher, workroom. The main job of the company is to introduce the company, Min Guhong Manufacturing itself, but this is more of a futile attempt to practice editing in a broad sense encompassing writing, translation, coding and design. In this exhibition, which deals with the form of publishing, the company examines the order and methods that can be given to characters (or data) that have left a fixed page through the Web, and performs the company’s main tasks without fail.
슬기와 민
Sulki& Min
〈나는 왜 출판하는가〉, 2020년
Why I Publish, 2020벽면에 접착 비닐, 280 × 600 cmPlastic vinyl on the wall, 280 × 600 cm슬기와 민은 2000년대 중반부터 출판과 그래픽 디자인 실천을 통해 책 만드는 예술을 한국 미술과 디자인계에 확산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번 전시에서 제시하는 대답 없는 질문을 통해, 그들은 책을 펴내려는 충동의 근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한편, 그들이 책의 내용과 형식을 이해하는 시각을 시사한다.Through their publishing and graphic design practice since mid-2000s, Sulki and Min have contributed to spreading the art of book publishing in the fields of art and design in Korea. By asking the unanswered question for this exhibition, they suggest how they understand the form and content of the book, while exploring fundamental impulses behind their act of publishing.
윤지원
Yoon Jeewon
〈북-필름(2020년 전시를 위한 발췌)〉, 2020 년
The Book-Film (Excerpt for the exhibition), 2020
싱글채널 비디오
Single-channel video
작품을 통해 매체와 사회 간의 관계를 연구해온 윤지원은 〈북-필름〉이라는 제목의 장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 이 작품에서 그는 미디어로서의 책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변화하고 사회와 관계 맺는지에 주목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소규모 출판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체들을 쫓는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영상은 완성될 장편 다큐멘터리의 프롤로그로서, 촬영된 분량 중 일부를 전시에 맞춰 편집한 버전이다.
Yoon Jeewon, who has research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society through works, is making a full-length documentary film, Book-Film. In this film, he follows some subjects who produce and distribute small publications in Asia, noting how books as media change and relate to society in the digital age. The video introduced in this exhibition is a prologue to a documentary film with some of the footage edited for the exhibition.
진 쿱
ZINE COOP
〈리: 버닝 이슈스〉, 2020년
re: BURNING IXXUES, 2020
테이블, 종이 인쇄물
Tables, printed matters
진 쿱은 진 출판물, 워크숍 및 전시를 수집, 교육하고 기획하는 홍콩의 독립 출판 단체이다. 2019년 6월 이들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서 나타난 진 모음인 〈프리덤-하이〉 컬렉션을 만들었다. 이 컬렉션은 이후 전 세계 갤러리와 상점 그리고 도서관에서 전시되었다. 2020년 1월 진 쿱은 홍콩아트북페어에서 후속작인 〈버닝 이슈스〉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이것은 홍콩 바깥에서 활동하는 진스터들이 만든 긴급한 사회 문제와 움직임에 대한 작업들을 모은 것이다. 이번 서울 전시를 위해 진 쿱은 격동의 한 해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고려하여 〈버닝 이슈스〉 컬렉션을 다시 방문하고 재발견할 것이다.
ZINE COOP is an independent publishing collective in Hong Kong that collects, educates and curates zine publications, workshops and exhibitions. In June 2019, the group launched FREEDOM-HI, a collection of zines that emerged around the pro-democracy protests in Hong Kong. The collection was subsequently exhibited in galleries, stores and libraries around the world. For the Hong Kong Art Book Fair in January 2020, ZINE COOP exhibited the follow-up BURNING IXXUES collection, which gathered works from zinesters outside of Hong Kong about their pressing social issues and movements. For this Seoul exhibition, the group will revisit and reinvent BURNING IXXUES in light of all that’s happened during this tumultuous year.
카이파 타(마하 마아문, 알라 유니스)
Kayfa ta (Maha Maamoun and Ala Younis)
〈미로 속을 걷는 법: 카이파 타 연대기〉, 2020년
How to walk through a labyrinth:
A Chronology of Kayfa ta, 2020
잉크젯 인쇄, 출판물, 비디오, 사운드, 661× 300 cm
Inkjet print, publications, videos and sound, 661× 300 cm
카이파 타는 최근 자주 사용되는 매뉴얼(how = kayfa, to = ta) 형식을 활용해 지금 인식되는 요구, 기술과 도구, 사유나 감성에 대응하는 출판 이니셔티브다. 이 책들은 기술적인 것과 성찰적인 것, 일상과 사색적인 것, 교육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 사실적인 것과 허구적인 것 사이 공간에 스스로를 배치한다. 카이파 타는 2012년 마하 마아문과 알라 유니스가 설립했다. 2019년 카이파 타는 단순히 매뉴얼을 출판하는 것에서부터 출판 자체의 행위와 맥락, 출판 산업의 다양한 측면, 개인과 제도적 차원에서 창의적 생산이 어떻게 정의되고 가치 있게 평가되는지 조명하는 일로 작업을 확장시켰다. 전시, 연구, 외부 작업을 통해 카이파 타는 저자성, 독립성, 검열, 그리고 주관적이고 유동적이며 진화하는 주체를 지배적 담론과 가치로부터 구별하는 이동하는 경계선 개념들을 둘러싼 중요한 대화를 촉구한다. 이번 전시에서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작업한 책과 도구, 전시들을 연대표를 통해 보여 준다.
Kayfa ta is a publishing initiative that uses the popular format of how-to manuals (how = kayfa, to = ta) to respond to some of today’s perceived needs; be they the development of skills, tools, thoughts, or sensibilities. These books situate themselves in the space between the technical and the reflective, the everyday and the speculative, the instructional and the intuitive, the factual and the fictional. Kayfa ta was founded in 2012 by Maha Maamoun and Ala Younis. In 2019, Kayfa ta expanded its work from solely publishing its series of how-to books, to shedding light on the acts and contexts of publishing itself, various aspects of the publishing industry, as well as on how creative production is defined and valued on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levels. Through exhibitions, research and commissions, Kayfa ta prompts important conversations around notions of authorship, independence, censorship, and the shifting demarcation lines separating dominant discourses and values from more subjective, fluid and evolving alternatives. This timeline highlights a selection of the books, tools and exhibitions that Kayfa has commissioned since 2012.
후팡
Hu Fang
〈책을 위한 집〉, 2017년
〈명상가들을 위하여〉, 2020년
Home for Books, 2017For the Contemplative Ones, 2020
아프리카 엠보니아 나무, 48 × 48 × 48 cm
African ambila, 48 × 48 × 48 cm
낭독: 심규선
Narration by Shim Kyusun
후팡은 광저우와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작가이자 기획자이다. 2002년 비타민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를 공동 설립한 후, 전시와 출판 등의 실천을 통해 동시대 중국의 맥락 대안적인 생산 방식을 탐색한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 책을 위한 집〉이라는 책장과 〈 명상가들을 위하여〉라는 시를 선보인다. 책의 본성에 따라 만들어진 책장은 일상 속 책 풍경을 만들어 주는 공간으로, 중국식 정원과의 흥미로운 관계를 반영한다. 팬데믹 시대에 대한 성찰을 담은 시 〈 명상가들을 위하여〉는 우리를 말과 글의 세계로 인도한다.
Hu Fang is a writer and curator working in Guangzhou and Beijing, China. He co-founded the Vitamin Creative Space in 2002 and through various practices to explore an alternative working mode specifically geared to the contemporary Chinese context. In this exhibition, he presents a bookshelf Home for Books and a poem For the Contemplative Ones. Bookshelf, which can be us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book, creates a perfect space for the book, and this space creates the scenery of the book within our daily lives and reflecting an interesting relation with Chinese gardens. For the Contemplative Ones, a contemplation of the pandemic era, guides us through a gateway into the world of words and writing.
아시아 예술 출판 디렉터리
Asia Art Publishing Directory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40여 개의 출판 이니셔티브들의 책과 문서가 소개된다. 이들은 출판사를 비롯해 서점, 아카이브,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컬렉티브, 아트 북 페어, 예술가, 디자인 스튜디오 등 다양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대안적이고 비판적인 지식 생산 및 유통 활동을 보여준다.For this project, we have researched various publishing initiatives in major 16 cities of Asia. Here, about 40 initiatives are engaged in publishing activities with various identities, including publishing house, bookshop, archive, artist-run-space, collective, art book fairs, artist, and design studio. We display some books which they have published in the exhibition. We also interviewed them, which will be included in Publishing as Method (to be published in December 2020 by mediabus and Onomatop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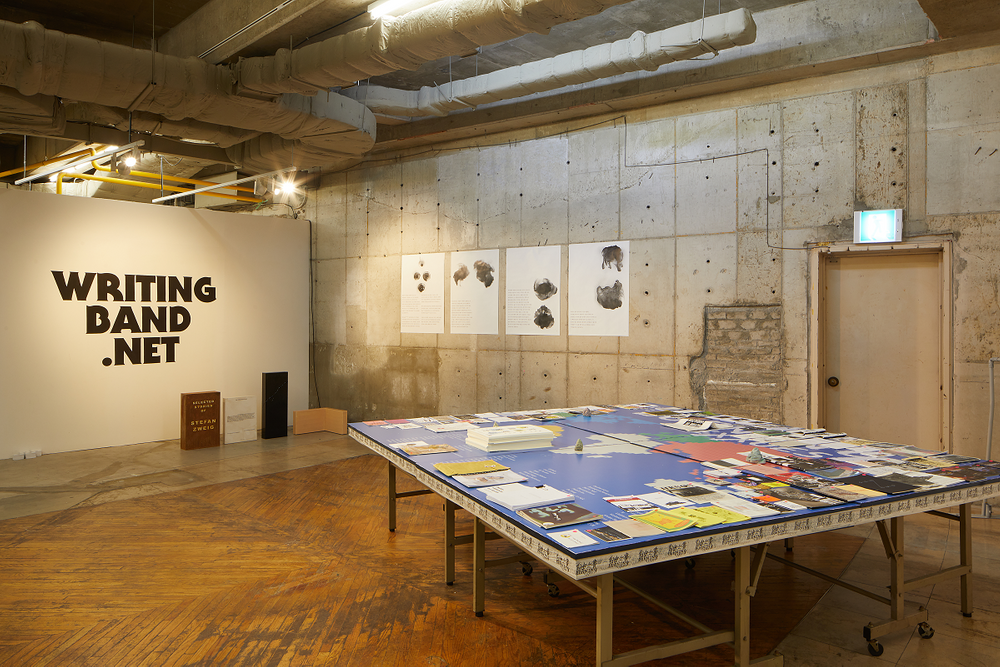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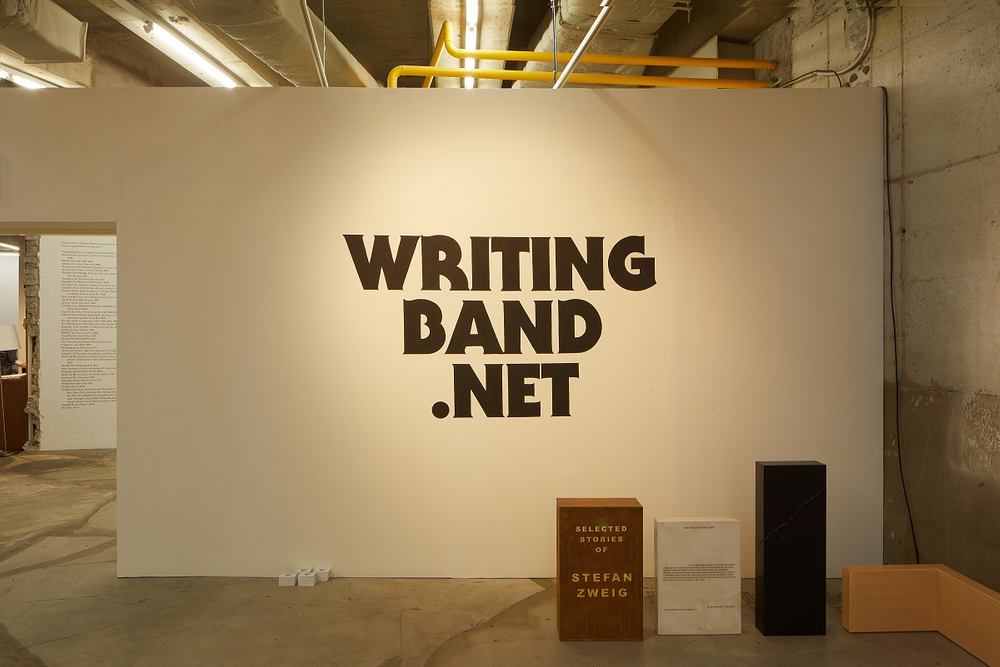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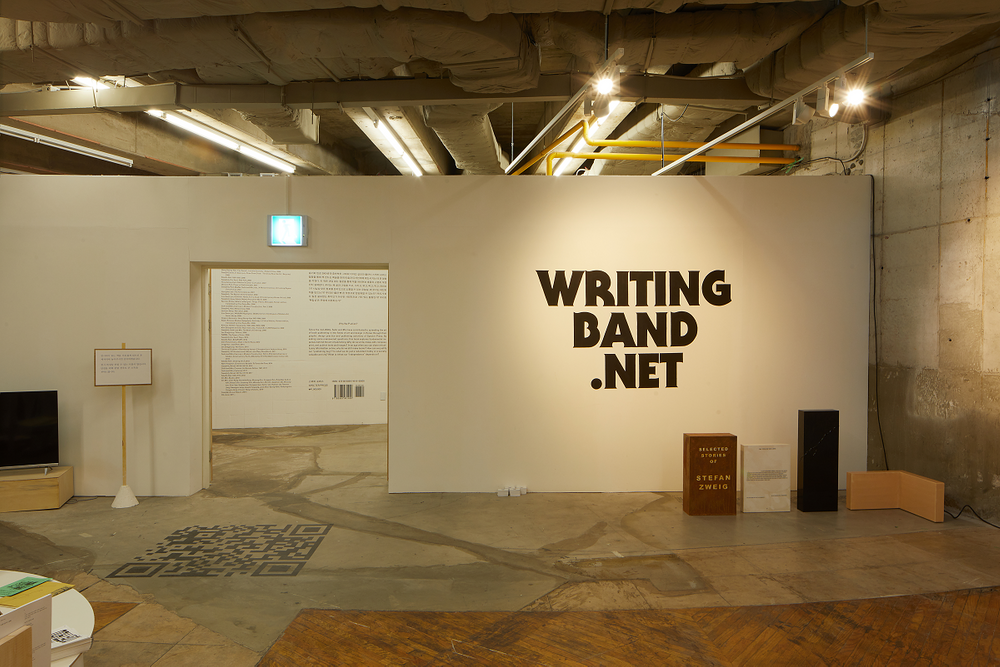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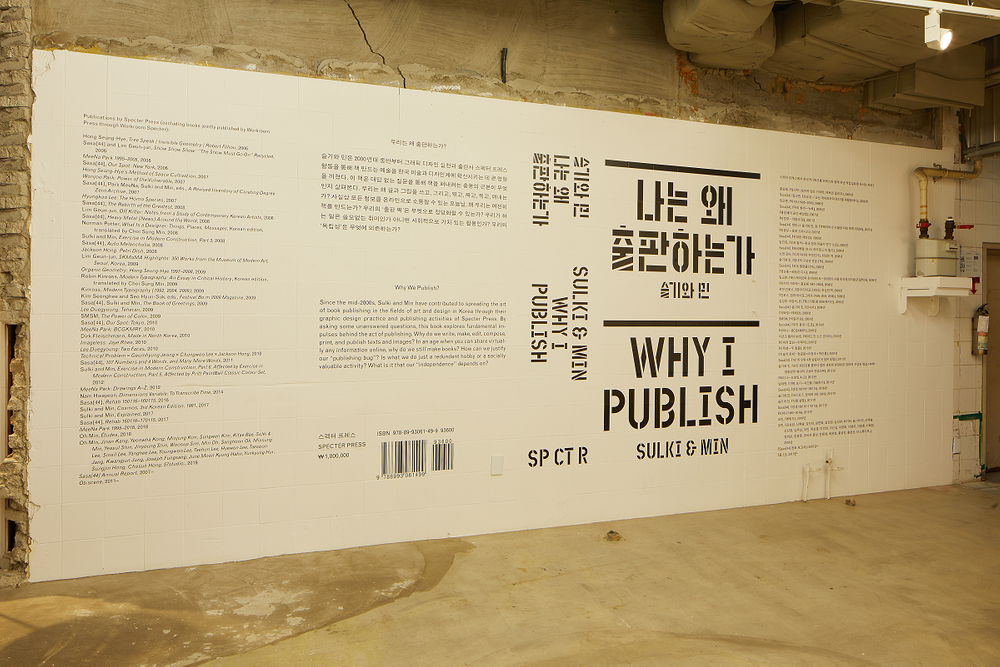
 사진: 김연제 Photo: Kim Yonje
아트선재센터 1층 프로젝트 스페이스
2020년 10월 30일~12월 20일
오후 12시~7시 (월요일 휴관)
Art Sonje Center 1F Project Space
Oct. 30–Dec. 20, 2020
12 pm–7 pm (Closed on Mondays)
《방법으로서의 출판》은 오늘날 예술 출판, 특히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출판 단위들의 실천을 다룬다. 최근 몇 년간 아시아의 주요 도시에서 예술가와 기획자, 컬렉티브를 중심으로 자신의 활동을 매개하는 방식으로서 출판 실천이 늘어나면서, 이런 결과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문화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기보다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맥락 안에 배치하고 함께 읽어 내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홍콩,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덟 명의 작가/팀이 전시에 초대된다. 이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출판 전문가나 아티스트 북 작가는 아니다. 대신 그래픽 디자이너, 웹, 영상, 사운드 작가, 큐레이터, 인포숍 등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이런 문화의 조건을 형성하고 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느슨하게 공유하는 태도와 감각은 소규모 출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기보다 ‘ 방법’ 으로서 출판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계기를 제공한다.
전시 작품과 함께 ‘아시아 예술 출판 디렉터리’ 공간에는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40여 개의 출판 이니셔티브들의 책과 문서가 소개된다. 아시아 16여 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출판 컬렉티브를 비롯해 서점, 아트 북 페어, 아카이브,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연구자 등으로, 우리는 이들의 활동을 통해 아시아 소규모 예술 출판의 지형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역적인 상황은 12월 발행 예정인 『방법으로서의 출판』(미디어버스·오노마토피 공동 발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Publishing as Method addresses art publishing today, in particular, the practice of small-scale publishing in Asia. As the practice of small-scale publishing has increased among artists, curators, and collectives as a method of mediating their practices in the major cities in Asia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activities related to producing their output and circulating it have been stimulated. Instead of looking at the culture surrounding small-scale publishing as an individual and independent phenomenon, we attempt to integrate it into its historical and local contexts. To do so, we invited eight artists / teams, who practice in China, Hong Kong, South Korea, and the Middle East. They are neither publishing experts in the traditional meaning of the term, nor writers of artist books. Instead, they are graphic designers; artists using web, video, or sound; curators; infoshop, etc.—those who form and connect the conditions of culture as we encounter it today. Their loosely shared attitudes and sensibilities, while not offering a direct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small-scale publishing?,” offer an opportunity to approach and utilize publishing as a “method.”
Along with the works, “Asia Art Publishing Directory” introduces books and documents by about forty publishing initiatives active all over Asia. They are publishing collectives practicing in sixteen cities in Asia, bookshops, art book fairs, archives, artist-run spaces, researchers, and so on. Through their activities, we can imagine the terrain of small-scale publishing in Asia.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ir practice and their local context is available in the interviews included in the research publication.
thebooksociety.org/publishing-as-method
참여 작가
Participating Artists
라이팅 밴드, 류한길, 민구홍 매뉴팩처링, 슬기와 민, 윤지원, 진 쿱, 카이파 타, 후팡
Hu Fang, Kayfa ta, Min Guhong Manufacturing, Ryu Hankil, Sulki & Min, Writing Band, Yoon Jeewon, ZINE COOP
기획
Curated by
임경용
Lim Kyung yong
공동 연구
Research Collaboration
미디어버스(구정연), 현시원
Hyun Seewon, mediabus (Helen Jungyeon Ku)
그래픽 디자인
Graphic Design
슬기와 민
Sulki & Min
전시 디자인
Exhibition Design
구재회
Jaehoi Koo
제작 진행
Production Management
심규선
Shim Kyusun
웹 디자인
Website
민구홍 매뉴팩처링
Min Guhong Manufacturing
공동 주최
Organized by
아트선재센터, 더 북 소사이어티
Art Sonje Center, The Book Society
후원
Supported by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Arts Council Korea,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참여작품
라이팅 밴드
Writing Band
〈라이팅 밴드 2020〉, 2020년
Writing Band 2020, 2020웹사이트, 가변 크기, 혼합 설치Website, variable size, mixed media참여자: 박선호, 서재웅, 심규선, 최하늘, 김형재, 홍은주, 현시원 외Participants: Park Sunho, Seo Jaewoong, Shim Kyusun, Choi Hanyel, Hong Eun-joo, Kim Hyung-jae, Hyun Seewon and others
writingband.net/2020라이팅 밴드는 그래픽 디자이너 홍은주, 김형재와 시청각 랩 디렉터 현시원의 온라인 프로젝트로 올림픽을 따라 4 년마다 제작된다. 라이팅 밴드는 글쓰기 행위를 출발점에 두고 협업, 아카이브와 수행성의 문제를 제시한다. 현재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공간 삼아 〈 퍼포먼스로서의 글쓰기〉 (2012년)와 〈전시 사진 아카이브〉(2016 년)를 다뤘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의 책 공간 더 북 소사이어티를 시작점이자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은 2010년에 설립된 더 북 소사이어티 활동의 핵심에 ‘ 말과 글’이 있다고 보고 이를 글, 조각, 이미지의 형태로 제작한다. 전시장 벽면에는 라이팅 밴드의 웹 주소가 적혀 있으며 , 공간 곳곳에는 참여자들이 쓴 글의 도판이자 이들의 실물 작업이 배치된다.Writing Band is an online-media project. Hyun Seewon, director of AVP Lab, and Hong Eun-joo and Kim Hyung-jae, graphic designers, deals with issues of collaboration, archives and performance with various participants. Writing Band was based on writing as a performance (2012) and archive of “installation views” (2016) at the Gwache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Writing Band is produced every four years according to the Olympics. In the exhibition, Writing Band covers the Book Society, Seoul, a space founded in 2010. They see “words and speeches” at the core of its activities and treats them in the form of letters, sculptures and images.
류한길
Ryu Hankil
〈충격 관리자〉, 2020년
Impact Security, 2020포스터, 70 ×100 cmPosters, 70 ×100 cm포스터 디자인: 심규선Posters designed by Shim Kyusun류한길은 2000년 초반부터 음향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음향을 표현의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사유의 대상으로 여기며, 음향적 사고를 할 때 어떤 사고 실험이 가능해지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Ryu Hankil has been focusing on sound related issues since early 2000. He considers sound as an object of thought itself, not a tool of expression, and makes various attempts at what kind of thinking experiments become possible when thinking acoustically.
민구홍 매뉴팩처링
Min Guhong Manufacturing
〈새로운 질서〉, 2020년
〈방법으로서의 출판〉, 2020년
New Order, 2020
Pubilshing as method, 2020
웹사이트, 가변 설치
Website, dimension variable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겸 출판사 워크룸에 기생하는 1 인 회사다. 회사에서는 주업무를 여러 방식으로 회사, 즉 민구홍 매뉴팩처링 자체를 소개하는 일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저술, 번역, 코딩, 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편집’을 실천하기 위한 헛서사에 가깝다. 출판의 형식을 다루는 이번 전시에서 회사는 웹이라는 매체를 통해 박제된 지면(紙面)을 떠난 콘텐츠(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부여할 수 있는 질서와 그 방식을 살피는 한편, 회사의 주업무 또한 어김없이 수행한다. 누군가의 말처럼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편집자를 비롯해 저술가, 번역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여러 직함을 지닌 민구홍이 오직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편집한 결과물, 또는 그를 위한 편집 지침일지 모른다.
Min Guhong Manufacturing is a one-man company parasitic on design studio and publisher, workroom. The main job of the company is to introduce the company, Min Guhong Manufacturing itself, but this is more of a futile attempt to practice editing in a broad sense encompassing writing, translation, coding and design. In this exhibition, which deals with the form of publishing, the company examines the order and methods that can be given to characters (or data) that have left a fixed page through the Web, and performs the company’s main tasks without fail.
슬기와 민
Sulki& Min
〈나는 왜 출판하는가〉, 2020년
Why I Publish, 2020벽면에 접착 비닐, 280 × 600 cmPlastic vinyl on the wall, 280 × 600 cm슬기와 민은 2000년대 중반부터 출판과 그래픽 디자인 실천을 통해 책 만드는 예술을 한국 미술과 디자인계에 확산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번 전시에서 제시하는 대답 없는 질문을 통해, 그들은 책을 펴내려는 충동의 근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한편, 그들이 책의 내용과 형식을 이해하는 시각을 시사한다.Through their publishing and graphic design practice since mid-2000s, Sulki and Min have contributed to spreading the art of book publishing in the fields of art and design in Korea. By asking the unanswered question for this exhibition, they suggest how they understand the form and content of the book, while exploring fundamental impulses behind their act of publishing.
윤지원
Yoon Jeewon
〈북-필름(2020년 전시를 위한 발췌)〉, 2020 년
The Book-Film (Excerpt for the exhibition), 2020
싱글채널 비디오
Single-channel video
작품을 통해 매체와 사회 간의 관계를 연구해온 윤지원은 〈북-필름〉이라는 제목의 장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 이 작품에서 그는 미디어로서의 책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변화하고 사회와 관계 맺는지에 주목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소규모 출판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체들을 쫓는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영상은 완성될 장편 다큐멘터리의 프롤로그로서, 촬영된 분량 중 일부를 전시에 맞춰 편집한 버전이다.
Yoon Jeewon, who has research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society through works, is making a full-length documentary film, Book-Film. In this film, he follows some subjects who produce and distribute small publications in Asia, noting how books as media change and relate to society in the digital age. The video introduced in this exhibition is a prologue to a documentary film with some of the footage edited for the exhibition.
진 쿱
ZINE COOP
〈리: 버닝 이슈스〉, 2020년
re: BURNING IXXUES, 2020
테이블, 종이 인쇄물
Tables, printed matters
진 쿱은 진 출판물, 워크숍 및 전시를 수집, 교육하고 기획하는 홍콩의 독립 출판 단체이다. 2019년 6월 이들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서 나타난 진 모음인 〈프리덤-하이〉 컬렉션을 만들었다. 이 컬렉션은 이후 전 세계 갤러리와 상점 그리고 도서관에서 전시되었다. 2020년 1월 진 쿱은 홍콩아트북페어에서 후속작인 〈버닝 이슈스〉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이것은 홍콩 바깥에서 활동하는 진스터들이 만든 긴급한 사회 문제와 움직임에 대한 작업들을 모은 것이다. 이번 서울 전시를 위해 진 쿱은 격동의 한 해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고려하여 〈버닝 이슈스〉 컬렉션을 다시 방문하고 재발견할 것이다.
ZINE COOP is an independent publishing collective in Hong Kong that collects, educates and curates zine publications, workshops and exhibitions. In June 2019, the group launched FREEDOM-HI, a collection of zines that emerged around the pro-democracy protests in Hong Kong. The collection was subsequently exhibited in galleries, stores and libraries around the world. For the Hong Kong Art Book Fair in January 2020, ZINE COOP exhibited the follow-up BURNING IXXUES collection, which gathered works from zinesters outside of Hong Kong about their pressing social issues and movements. For this Seoul exhibition, the group will revisit and reinvent BURNING IXXUES in light of all that’s happened during this tumultuous year.
카이파 타(마하 마아문, 알라 유니스)
Kayfa ta (Maha Maamoun and Ala Younis)
〈미로 속을 걷는 법: 카이파 타 연대기〉, 2020년
How to walk through a labyrinth:
A Chronology of Kayfa ta, 2020
잉크젯 인쇄, 출판물, 비디오, 사운드, 661× 300 cm
Inkjet print, publications, videos and sound, 661× 300 cm
카이파 타는 최근 자주 사용되는 매뉴얼(how = kayfa, to = ta) 형식을 활용해 지금 인식되는 요구, 기술과 도구, 사유나 감성에 대응하는 출판 이니셔티브다. 이 책들은 기술적인 것과 성찰적인 것, 일상과 사색적인 것, 교육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 사실적인 것과 허구적인 것 사이 공간에 스스로를 배치한다. 카이파 타는 2012년 마하 마아문과 알라 유니스가 설립했다. 2019년 카이파 타는 단순히 매뉴얼을 출판하는 것에서부터 출판 자체의 행위와 맥락, 출판 산업의 다양한 측면, 개인과 제도적 차원에서 창의적 생산이 어떻게 정의되고 가치 있게 평가되는지 조명하는 일로 작업을 확장시켰다. 전시, 연구, 외부 작업을 통해 카이파 타는 저자성, 독립성, 검열, 그리고 주관적이고 유동적이며 진화하는 주체를 지배적 담론과 가치로부터 구별하는 이동하는 경계선 개념들을 둘러싼 중요한 대화를 촉구한다. 이번 전시에서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작업한 책과 도구, 전시들을 연대표를 통해 보여 준다.
Kayfa ta is a publishing initiative that uses the popular format of how-to manuals (how = kayfa, to = ta) to respond to some of today’s perceived needs; be they the development of skills, tools, thoughts, or sensibilities. These books situate themselves in the space between the technical and the reflective, the everyday and the speculative, the instructional and the intuitive, the factual and the fictional. Kayfa ta was founded in 2012 by Maha Maamoun and Ala Younis. In 2019, Kayfa ta expanded its work from solely publishing its series of how-to books, to shedding light on the acts and contexts of publishing itself, various aspects of the publishing industry, as well as on how creative production is defined and valued on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levels. Through exhibitions, research and commissions, Kayfa ta prompts important conversations around notions of authorship, independence, censorship, and the shifting demarcation lines separating dominant discourses and values from more subjective, fluid and evolving alternatives. This timeline highlights a selection of the books, tools and exhibitions that Kayfa has commissioned since 2012.
후팡
Hu Fang
〈책을 위한 집〉, 2017년
〈명상가들을 위하여〉, 2020년
Home for Books, 2017For the Contemplative Ones, 2020
아프리카 엠보니아 나무, 48 × 48 × 48 cm
African ambila, 48 × 48 × 48 cm
낭독: 심규선
Narration by Shim Kyusun
후팡은 광저우와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작가이자 기획자이다. 2002년 비타민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를 공동 설립한 후, 전시와 출판 등의 실천을 통해 동시대 중국의 맥락 대안적인 생산 방식을 탐색한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 책을 위한 집〉이라는 책장과 〈 명상가들을 위하여〉라는 시를 선보인다. 책의 본성에 따라 만들어진 책장은 일상 속 책 풍경을 만들어 주는 공간으로, 중국식 정원과의 흥미로운 관계를 반영한다. 팬데믹 시대에 대한 성찰을 담은 시 〈 명상가들을 위하여〉는 우리를 말과 글의 세계로 인도한다.
Hu Fang is a writer and curator working in Guangzhou and Beijing, China. He co-founded the Vitamin Creative Space in 2002 and through various practices to explore an alternative working mode specifically geared to the contemporary Chinese context. In this exhibition, he presents a bookshelf Home for Books and a poem For the Contemplative Ones. Bookshelf, which can be us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book, creates a perfect space for the book, and this space creates the scenery of the book within our daily lives and reflecting an interesting relation with Chinese gardens. For the Contemplative Ones, a contemplation of the pandemic era, guides us through a gateway into the world of words and writing.
아시아 예술 출판 디렉터리
Asia Art Publishing Directory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40여 개의 출판 이니셔티브들의 책과 문서가 소개된다. 이들은 출판사를 비롯해 서점, 아카이브,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컬렉티브, 아트 북 페어, 예술가, 디자인 스튜디오 등 다양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대안적이고 비판적인 지식 생산 및 유통 활동을 보여준다.For this project, we have researched various publishing initiatives in major 16 cities of Asia. Here, about 40 initiatives are engaged in publishing activities with various identities, including publishing house, bookshop, archive, artist-run-space, collective, art book fairs, artist, and design studio. We display some books which they have published in the exhibition. We also interviewed them, which will be included in Publishing as Method (to be published in December 2020 by mediabus and Onomatopee).
사진: 김연제 Photo: Kim Yonje
아트선재센터 1층 프로젝트 스페이스
2020년 10월 30일~12월 20일
오후 12시~7시 (월요일 휴관)
Art Sonje Center 1F Project Space
Oct. 30–Dec. 20, 2020
12 pm–7 pm (Closed on Mondays)
《방법으로서의 출판》은 오늘날 예술 출판, 특히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출판 단위들의 실천을 다룬다. 최근 몇 년간 아시아의 주요 도시에서 예술가와 기획자, 컬렉티브를 중심으로 자신의 활동을 매개하는 방식으로서 출판 실천이 늘어나면서, 이런 결과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문화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기보다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맥락 안에 배치하고 함께 읽어 내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홍콩,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덟 명의 작가/팀이 전시에 초대된다. 이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출판 전문가나 아티스트 북 작가는 아니다. 대신 그래픽 디자이너, 웹, 영상, 사운드 작가, 큐레이터, 인포숍 등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이런 문화의 조건을 형성하고 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느슨하게 공유하는 태도와 감각은 소규모 출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기보다 ‘ 방법’ 으로서 출판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계기를 제공한다.
전시 작품과 함께 ‘아시아 예술 출판 디렉터리’ 공간에는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40여 개의 출판 이니셔티브들의 책과 문서가 소개된다. 아시아 16여 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출판 컬렉티브를 비롯해 서점, 아트 북 페어, 아카이브,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연구자 등으로, 우리는 이들의 활동을 통해 아시아 소규모 예술 출판의 지형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역적인 상황은 12월 발행 예정인 『방법으로서의 출판』(미디어버스·오노마토피 공동 발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Publishing as Method addresses art publishing today, in particular, the practice of small-scale publishing in Asia. As the practice of small-scale publishing has increased among artists, curators, and collectives as a method of mediating their practices in the major cities in Asia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activities related to producing their output and circulating it have been stimulated. Instead of looking at the culture surrounding small-scale publishing as an individual and independent phenomenon, we attempt to integrate it into its historical and local contexts. To do so, we invited eight artists / teams, who practice in China, Hong Kong, South Korea, and the Middle East. They are neither publishing experts in the traditional meaning of the term, nor writers of artist books. Instead, they are graphic designers; artists using web, video, or sound; curators; infoshop, etc.—those who form and connect the conditions of culture as we encounter it today. Their loosely shared attitudes and sensibilities, while not offering a direct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small-scale publishing?,” offer an opportunity to approach and utilize publishing as a “method.”
Along with the works, “Asia Art Publishing Directory” introduces books and documents by about forty publishing initiatives active all over Asia. They are publishing collectives practicing in sixteen cities in Asia, bookshops, art book fairs, archives, artist-run spaces, researchers, and so on. Through their activities, we can imagine the terrain of small-scale publishing in Asia.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ir practice and their local context is available in the interviews included in the research publication.
thebooksociety.org/publishing-as-method
참여 작가
Participating Artists
라이팅 밴드, 류한길, 민구홍 매뉴팩처링, 슬기와 민, 윤지원, 진 쿱, 카이파 타, 후팡
Hu Fang, Kayfa ta, Min Guhong Manufacturing, Ryu Hankil, Sulki & Min, Writing Band, Yoon Jeewon, ZINE COOP
기획
Curated by
임경용
Lim Kyung yong
공동 연구
Research Collaboration
미디어버스(구정연), 현시원
Hyun Seewon, mediabus (Helen Jungyeon Ku)
그래픽 디자인
Graphic Design
슬기와 민
Sulki & Min
전시 디자인
Exhibition Design
구재회
Jaehoi Koo
제작 진행
Production Management
심규선
Shim Kyusun
웹 디자인
Website
민구홍 매뉴팩처링
Min Guhong Manufacturing
공동 주최
Organized by
아트선재센터, 더 북 소사이어티
Art Sonje Center, The Book Society
후원
Supported by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Arts Council Korea,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참여작품
라이팅 밴드
Writing Band
〈라이팅 밴드 2020〉, 2020년
Writing Band 2020, 2020웹사이트, 가변 크기, 혼합 설치Website, variable size, mixed media참여자: 박선호, 서재웅, 심규선, 최하늘, 김형재, 홍은주, 현시원 외Participants: Park Sunho, Seo Jaewoong, Shim Kyusun, Choi Hanyel, Hong Eun-joo, Kim Hyung-jae, Hyun Seewon and others
writingband.net/2020라이팅 밴드는 그래픽 디자이너 홍은주, 김형재와 시청각 랩 디렉터 현시원의 온라인 프로젝트로 올림픽을 따라 4 년마다 제작된다. 라이팅 밴드는 글쓰기 행위를 출발점에 두고 협업, 아카이브와 수행성의 문제를 제시한다. 현재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공간 삼아 〈 퍼포먼스로서의 글쓰기〉 (2012년)와 〈전시 사진 아카이브〉(2016 년)를 다뤘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의 책 공간 더 북 소사이어티를 시작점이자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은 2010년에 설립된 더 북 소사이어티 활동의 핵심에 ‘ 말과 글’이 있다고 보고 이를 글, 조각, 이미지의 형태로 제작한다. 전시장 벽면에는 라이팅 밴드의 웹 주소가 적혀 있으며 , 공간 곳곳에는 참여자들이 쓴 글의 도판이자 이들의 실물 작업이 배치된다.Writing Band is an online-media project. Hyun Seewon, director of AVP Lab, and Hong Eun-joo and Kim Hyung-jae, graphic designers, deals with issues of collaboration, archives and performance with various participants. Writing Band was based on writing as a performance (2012) and archive of “installation views” (2016) at the Gwache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Writing Band is produced every four years according to the Olympics. In the exhibition, Writing Band covers the Book Society, Seoul, a space founded in 2010. They see “words and speeches” at the core of its activities and treats them in the form of letters, sculptures and images.
류한길
Ryu Hankil
〈충격 관리자〉, 2020년
Impact Security, 2020포스터, 70 ×100 cmPosters, 70 ×100 cm포스터 디자인: 심규선Posters designed by Shim Kyusun류한길은 2000년 초반부터 음향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음향을 표현의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사유의 대상으로 여기며, 음향적 사고를 할 때 어떤 사고 실험이 가능해지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Ryu Hankil has been focusing on sound related issues since early 2000. He considers sound as an object of thought itself, not a tool of expression, and makes various attempts at what kind of thinking experiments become possible when thinking acoustically.
민구홍 매뉴팩처링
Min Guhong Manufacturing
〈새로운 질서〉, 2020년
〈방법으로서의 출판〉, 2020년
New Order, 2020
Pubilshing as method, 2020
웹사이트, 가변 설치
Website, dimension variable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겸 출판사 워크룸에 기생하는 1 인 회사다. 회사에서는 주업무를 여러 방식으로 회사, 즉 민구홍 매뉴팩처링 자체를 소개하는 일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저술, 번역, 코딩, 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편집’을 실천하기 위한 헛서사에 가깝다. 출판의 형식을 다루는 이번 전시에서 회사는 웹이라는 매체를 통해 박제된 지면(紙面)을 떠난 콘텐츠(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부여할 수 있는 질서와 그 방식을 살피는 한편, 회사의 주업무 또한 어김없이 수행한다. 누군가의 말처럼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편집자를 비롯해 저술가, 번역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여러 직함을 지닌 민구홍이 오직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편집한 결과물, 또는 그를 위한 편집 지침일지 모른다.
Min Guhong Manufacturing is a one-man company parasitic on design studio and publisher, workroom. The main job of the company is to introduce the company, Min Guhong Manufacturing itself, but this is more of a futile attempt to practice editing in a broad sense encompassing writing, translation, coding and design. In this exhibition, which deals with the form of publishing, the company examines the order and methods that can be given to characters (or data) that have left a fixed page through the Web, and performs the company’s main tasks without fail.
슬기와 민
Sulki& Min
〈나는 왜 출판하는가〉, 2020년
Why I Publish, 2020벽면에 접착 비닐, 280 × 600 cmPlastic vinyl on the wall, 280 × 600 cm슬기와 민은 2000년대 중반부터 출판과 그래픽 디자인 실천을 통해 책 만드는 예술을 한국 미술과 디자인계에 확산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번 전시에서 제시하는 대답 없는 질문을 통해, 그들은 책을 펴내려는 충동의 근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한편, 그들이 책의 내용과 형식을 이해하는 시각을 시사한다.Through their publishing and graphic design practice since mid-2000s, Sulki and Min have contributed to spreading the art of book publishing in the fields of art and design in Korea. By asking the unanswered question for this exhibition, they suggest how they understand the form and content of the book, while exploring fundamental impulses behind their act of publishing.
윤지원
Yoon Jeewon
〈북-필름(2020년 전시를 위한 발췌)〉, 2020 년
The Book-Film (Excerpt for the exhibition), 2020
싱글채널 비디오
Single-channel video
작품을 통해 매체와 사회 간의 관계를 연구해온 윤지원은 〈북-필름〉이라는 제목의 장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 이 작품에서 그는 미디어로서의 책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변화하고 사회와 관계 맺는지에 주목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소규모 출판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체들을 쫓는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영상은 완성될 장편 다큐멘터리의 프롤로그로서, 촬영된 분량 중 일부를 전시에 맞춰 편집한 버전이다.
Yoon Jeewon, who has research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society through works, is making a full-length documentary film, Book-Film. In this film, he follows some subjects who produce and distribute small publications in Asia, noting how books as media change and relate to society in the digital age. The video introduced in this exhibition is a prologue to a documentary film with some of the footage edited for the exhibition.
진 쿱
ZINE COOP
〈리: 버닝 이슈스〉, 2020년
re: BURNING IXXUES, 2020
테이블, 종이 인쇄물
Tables, printed matters
진 쿱은 진 출판물, 워크숍 및 전시를 수집, 교육하고 기획하는 홍콩의 독립 출판 단체이다. 2019년 6월 이들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서 나타난 진 모음인 〈프리덤-하이〉 컬렉션을 만들었다. 이 컬렉션은 이후 전 세계 갤러리와 상점 그리고 도서관에서 전시되었다. 2020년 1월 진 쿱은 홍콩아트북페어에서 후속작인 〈버닝 이슈스〉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이것은 홍콩 바깥에서 활동하는 진스터들이 만든 긴급한 사회 문제와 움직임에 대한 작업들을 모은 것이다. 이번 서울 전시를 위해 진 쿱은 격동의 한 해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고려하여 〈버닝 이슈스〉 컬렉션을 다시 방문하고 재발견할 것이다.
ZINE COOP is an independent publishing collective in Hong Kong that collects, educates and curates zine publications, workshops and exhibitions. In June 2019, the group launched FREEDOM-HI, a collection of zines that emerged around the pro-democracy protests in Hong Kong. The collection was subsequently exhibited in galleries, stores and libraries around the world. For the Hong Kong Art Book Fair in January 2020, ZINE COOP exhibited the follow-up BURNING IXXUES collection, which gathered works from zinesters outside of Hong Kong about their pressing social issues and movements. For this Seoul exhibition, the group will revisit and reinvent BURNING IXXUES in light of all that’s happened during this tumultuous year.
카이파 타(마하 마아문, 알라 유니스)
Kayfa ta (Maha Maamoun and Ala Younis)
〈미로 속을 걷는 법: 카이파 타 연대기〉, 2020년
How to walk through a labyrinth:
A Chronology of Kayfa ta, 2020
잉크젯 인쇄, 출판물, 비디오, 사운드, 661× 300 cm
Inkjet print, publications, videos and sound, 661× 300 cm
카이파 타는 최근 자주 사용되는 매뉴얼(how = kayfa, to = ta) 형식을 활용해 지금 인식되는 요구, 기술과 도구, 사유나 감성에 대응하는 출판 이니셔티브다. 이 책들은 기술적인 것과 성찰적인 것, 일상과 사색적인 것, 교육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 사실적인 것과 허구적인 것 사이 공간에 스스로를 배치한다. 카이파 타는 2012년 마하 마아문과 알라 유니스가 설립했다. 2019년 카이파 타는 단순히 매뉴얼을 출판하는 것에서부터 출판 자체의 행위와 맥락, 출판 산업의 다양한 측면, 개인과 제도적 차원에서 창의적 생산이 어떻게 정의되고 가치 있게 평가되는지 조명하는 일로 작업을 확장시켰다. 전시, 연구, 외부 작업을 통해 카이파 타는 저자성, 독립성, 검열, 그리고 주관적이고 유동적이며 진화하는 주체를 지배적 담론과 가치로부터 구별하는 이동하는 경계선 개념들을 둘러싼 중요한 대화를 촉구한다. 이번 전시에서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작업한 책과 도구, 전시들을 연대표를 통해 보여 준다.
Kayfa ta is a publishing initiative that uses the popular format of how-to manuals (how = kayfa, to = ta) to respond to some of today’s perceived needs; be they the development of skills, tools, thoughts, or sensibilities. These books situate themselves in the space between the technical and the reflective, the everyday and the speculative, the instructional and the intuitive, the factual and the fictional. Kayfa ta was founded in 2012 by Maha Maamoun and Ala Younis. In 2019, Kayfa ta expanded its work from solely publishing its series of how-to books, to shedding light on the acts and contexts of publishing itself, various aspects of the publishing industry, as well as on how creative production is defined and valued on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levels. Through exhibitions, research and commissions, Kayfa ta prompts important conversations around notions of authorship, independence, censorship, and the shifting demarcation lines separating dominant discourses and values from more subjective, fluid and evolving alternatives. This timeline highlights a selection of the books, tools and exhibitions that Kayfa has commissioned since 2012.
후팡
Hu Fang
〈책을 위한 집〉, 2017년
〈명상가들을 위하여〉, 2020년
Home for Books, 2017For the Contemplative Ones, 2020
아프리카 엠보니아 나무, 48 × 48 × 48 cm
African ambila, 48 × 48 × 48 cm
낭독: 심규선
Narration by Shim Kyusun
후팡은 광저우와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작가이자 기획자이다. 2002년 비타민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를 공동 설립한 후, 전시와 출판 등의 실천을 통해 동시대 중국의 맥락 대안적인 생산 방식을 탐색한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 책을 위한 집〉이라는 책장과 〈 명상가들을 위하여〉라는 시를 선보인다. 책의 본성에 따라 만들어진 책장은 일상 속 책 풍경을 만들어 주는 공간으로, 중국식 정원과의 흥미로운 관계를 반영한다. 팬데믹 시대에 대한 성찰을 담은 시 〈 명상가들을 위하여〉는 우리를 말과 글의 세계로 인도한다.
Hu Fang is a writer and curator working in Guangzhou and Beijing, China. He co-founded the Vitamin Creative Space in 2002 and through various practices to explore an alternative working mode specifically geared to the contemporary Chinese context. In this exhibition, he presents a bookshelf Home for Books and a poem For the Contemplative Ones. Bookshelf, which can be us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book, creates a perfect space for the book, and this space creates the scenery of the book within our daily lives and reflecting an interesting relation with Chinese gardens. For the Contemplative Ones, a contemplation of the pandemic era, guides us through a gateway into the world of words and writing.
아시아 예술 출판 디렉터리
Asia Art Publishing Directory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40여 개의 출판 이니셔티브들의 책과 문서가 소개된다. 이들은 출판사를 비롯해 서점, 아카이브,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컬렉티브, 아트 북 페어, 예술가, 디자인 스튜디오 등 다양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대안적이고 비판적인 지식 생산 및 유통 활동을 보여준다.For this project, we have researched various publishing initiatives in major 16 cities of Asia. Here, about 40 initiatives are engaged in publishing activities with various identities, including publishing house, bookshop, archive, artist-run-space, collective, art book fairs, artist, and design studio. We display some books which they have published in the exhibition. We also interviewed them, which will be included in Publishing as Method (to be published in December 2020 by mediabus and Onomatopee).
↧
↧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 도록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 도록
지은이:
데이비드 롭, 김미영, 김지훈, 루슬라나
리히트치어, 야콥 파브리시우스
미디어버스, 부산비엔날레 공동발행
2020년 7월 8일 발행
언어: 한국어/영어
디자인: 신신
ISBN 979-11-90434-05-8 (93600)
148x210mm / 페이지
값 15,000원
![]()
![]() 책 소개
2020 부산비엔날레의
전시 도록으로 <열 개의 단편 소설과 다섯 편의 시>와
함께 발행되었다. 10명의 소설가와 1명의 시인이 부산을
배경으로 완성한 단편 소설과 시는 비엔날레 전시에 참여한 67명의 시각예술가와 11명의 음악가에게 영감을 부여하였고, 이들은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 도록은 이러한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 결과물이다.
작가들의 작품 소개와 사진을 비롯해 작가들과의 짧은 인터뷰도 수록되어 있다. 전시 감독인
야콥 파브리시우스의 글을 비롯해 사회학자이자 지리전문가가 본 부산의 역사와 지리적 맥락을 파악한 김미영의 에세이,
영상 전문가로서 영화 도시로서 부산을 살펴본 김지훈, 부산의 소리를 탐색한 데이비드 툽
등의 에세이도 수록되어 있다.
목차
서문 – 야콥 파브리시우스
부산을
듣다 - 데이비드 툽
부산항에
담긴 시간의 형적 - 김미영
부산을
기록하기: 김정근, 오민욱의 영화 - 김지훈
압상(壓像) ‑ 루슬라나 리히트치어
작가•작품
설치
전경
이야기와
시 요약
작가
약력
필자
소개
콜로폰
저자 소개
야콥
파브리시우스
야콥
파브리시우스는 2020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이자 현재 덴마크 쿤스트할 오르후스의 예술 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스웨덴 말뫼 콘스트할과 덴마크 쿤스트할 샤를로텐보르의 감독으로 일했다. 제6회 무빙이미지 비엔날레 《Leisure, Discipline and
Punishment》(벨기에)의 예술 감독을
역임했다. 아트선재센터에서의 《나는너를중세의미래한다1》을
포함한 다수의 국제전과 공공공간에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출판사 ‘포크
살라드 프레스’의 창립인이자 뉴스페이퍼 프로젝트 『올드뉴스』의 발행인이다.
데이비드
툽
1970년부터 데이비드 툽은 소리, 듣기, 음악과 물질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즉흥 음악 퍼포먼스를 넘어 글쓰기, 작곡, 필드 레코딩과 전시 기획 등의 다양한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런던 칼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의 교수이며, 『Ocean of Sound, Sinister Resonance』, 『Into the Maelstrom』을 비롯한 8권의 책을 쓴 저자다. 가장 최근에는 솔로로 ‘Apparition Paintings’을
녹음했다. 즉흥음악가로서 그는 최근 리에 나카지마, 시젤 엔데레센, 서스턴 무어, 다니아 캐롤라인 첸,
류이치 사카모토와 협업했다.
김미영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 후 서울연구원과
부산연구원에서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관심분야는 도시의 문화예술공간,
공간의 문화사, 공간의 사회학
등으로 물리적 실체로서 공간을 너머 그것의 문화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발견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옥상의 공간사회학」,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와
행복의 관계」, 「호텔과 ‘강남의 탄생’」, 「‘오감(五感)도시’를 위한 연구방법론으로서 걷기」 등이 있다.
김지훈
『필름, 비디오, 그리고 디지털 사이에서:
포스트-미디어 시대의 하이브리드 무빙 이미지』(Bloomsbury
Academic, 2018/16)의 저자이다. 영화이론,
실험영화와 비디오, 무빙 이미지의 예술, 영화와
현대 미술, 디지털 시네마, 그리고 실험 다큐멘터리에 관한
논문들은 「Cinema Journal」, 「Screen」, 「Film Quarterly」, 「Camera Obscura」, 「Animat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Millennium Film Journal」 등의 학술지와, 공저서인
『글로벌 아트 시네마: 새로운 역사와 이론들』(Oxford University
Press, 2010)과 『발생: 위치와 무빙 이미지』(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1) 등에 실렸다. 또한 『Journal of Popular Film and Television』의 ‘21세기
한국영화와 텔레비전’ 특집을 편집했다. 두 권의 저서를 준비중이며 각각의 제목은 『다큐멘터리의 확장된
영역: 뉴미디어, 뉴플랫폼 그리고 다큐멘터리』와 『포스트-베리떼 전환: 21세기의 한국 다큐멘터리영화』이다. 현재 중앙대학교 영화미디어 연구 부교수이다.
루슬라나
리히트치어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에서 성장한 루슬라나 리히트치어는 작가이자 큐레이터, 일리노이 노스웨스턴대학의
미술사 박사과정생이다. 그가 갖고 있는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은 차이와 변화에 대한 급진적 상상력을 품고자
하는 문화적 작업을 생산하도록 한다. 텍사스 휴스턴 미술관의 ‘코어’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디트로이트 레드불 아츠의 펠로우십에 선정되었다. 리히트치어는
각종 전시 도록 및 국제적인 예술관련 출판물에 정기적으로 투고하고 있다.
책 속에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어휘 차원의 변화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귓속말로 전해들은 말을 다른
삶에게 다시 귓속말로 옮기는 아이들 놀이 ‘옮겨 말하기’(Chinese
Whispers)에서—이 말놀이는 전화기, 전화
교환원, 망가진 전화기, 그레이프 바인, 가십, 우유 마시지마, 비밀
메시지 게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프랑스어로는 아랍 전화 또는 무선 전화 놀이로도 불린다. 놀이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우선 일렬로 줄지어 서거나
둥글게 원을 만든다. 놀이를 시작하는 사람이 전할 문장이나 말을 생각해 옆에 선 두 번째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달한다. 이 사람은 자기 옆에 선 세 번째 사람에게 다시 말을 전달하고, 세 번째 사람은 네 번째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놀이를 진행해 나간다. 그러다가 마지막 사람의 차례가 오면, 이 사람이 자기가 전해들은
말(메시지)을 모두에게 알려준다. 이어 애초 메시지를 고안한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속삭였던 말과 그 말을 비교한다. 처음의 말과 마지막 사람이 전해들은 말 사이에는 대개 큰 간극이 존재한다. 재미와
교육적인 측면을 두루 갖춘 이 놀이는 간접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보와 해석이 얼마나 쉽사리 변질되는지 보여준다.
(야콥 파브리시우스, 서문, 14쪽)
현대의
도시들은 음향적 다양성이 부족하다. 같은 도로에 같은 차들이 달리고,
같은 디자인의 상품들을 팔고 있는 같은 쇼핑몰, 같은 바와 클럽들은 같은 음악을 틀고 같은
술을 팔며 같은 여객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 다닌다. 물론 이것이 전부 맞는 말은 아니다. 아래를 볼 때혹은 들을 때라고 말할 수 도 있겠다‑ 많은 차이를 찾아 볼 수 있다. 서울에 있을 때 한국의 악기들을
사고 싶다고 내 호스트에게 말했다. 처음에 그들은 나를 기타와 드럼,
키보드로 가득 차 있는 상점으로 데려갔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그 다음 우리는 큰 절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나는
나무로 된 목탁을 살 수 있었다. 그날 밤, 분주한 거리에서
노인이 박스를 두고 골동품을 파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서 나는 한국 무악에서 쓰는, 가운데 구멍에 보랏빛으로 물든 실크가 꿰어져 엮인 자바라
한 쌍을 샀다. 나는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툽, 부산을 듣다, 54쪽)
부산은
인구 340만, 면적
768제곱킬로미터의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다. 하나의
산과 작은 포구에 불과했던 부산이 이처럼 성장하기까지 그 중심에는 부산항이 있었다. 흔히 부산을 ‘항구도시’로 일컬을 만큼, 드넓은
바다와 어우러진 거대한 항구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부산의 상징임에 틀림없다. 이곳은 거대한 수출입
화물선이 바쁘게 드나들고 주홍빛 컨테이너가 겹겹이 쌓여있는 공간 이상이다. 근대 도시 부산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내륙을 향해 뻗어나가는 도시 성장 동력의 구심점으로서 시대의 상흔과 번영의 결과들이 누적된 복합체이다.
(김미영, 부산항에 담긴 시간의 형적, 82쪽)
부산이
영화적 도시cinematic city‑라는 규정은 새롭지 않게 들릴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 영화를 자신의 산업적, 문화적, 경제적 차원과 통합한 도시, 즉 영화-도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산은 분명 영화적 도시다. 1996년 최초로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를
부산의 브랜드로 특성화하고자 했던 문민정부 시기 지방자치제의 기획과 부산을 아시아의 문화적 허브cultural
hub‑로 조성하려는 지역적 프로젝트가 국제영화제를 당시 성장 일로에 놓인 영화산업과 영화문화의 촉매로 수립하고자 했던 영화인들의
열망과 제휴한 결과였다. 줄리안 스트링거Julian Stringer‑의
견해를 활용한다면 ‘영화의 바다’를 브랜드 이미지로 수립한 부산국제영화제는 “글로벌/로컬 동역학에 참여하고 로컬 영화 문화의 국제적 차원을 충분히
시사하는 행사”로서 “시네필리아라는 공유된 감각과 문화적
교환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참여에 근거한 진정한 로컬 도시 정체성을 낳을 수” 있었다. (김지훈, 부산을 기록하기: 김정근, 오민욱의 영화, 90쪽)
책 소개
2020 부산비엔날레의
전시 도록으로 <열 개의 단편 소설과 다섯 편의 시>와
함께 발행되었다. 10명의 소설가와 1명의 시인이 부산을
배경으로 완성한 단편 소설과 시는 비엔날레 전시에 참여한 67명의 시각예술가와 11명의 음악가에게 영감을 부여하였고, 이들은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 도록은 이러한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 결과물이다.
작가들의 작품 소개와 사진을 비롯해 작가들과의 짧은 인터뷰도 수록되어 있다. 전시 감독인
야콥 파브리시우스의 글을 비롯해 사회학자이자 지리전문가가 본 부산의 역사와 지리적 맥락을 파악한 김미영의 에세이,
영상 전문가로서 영화 도시로서 부산을 살펴본 김지훈, 부산의 소리를 탐색한 데이비드 툽
등의 에세이도 수록되어 있다.
목차
서문 – 야콥 파브리시우스
부산을
듣다 - 데이비드 툽
부산항에
담긴 시간의 형적 - 김미영
부산을
기록하기: 김정근, 오민욱의 영화 - 김지훈
압상(壓像) ‑ 루슬라나 리히트치어
작가•작품
설치
전경
이야기와
시 요약
작가
약력
필자
소개
콜로폰
저자 소개
야콥
파브리시우스
야콥
파브리시우스는 2020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이자 현재 덴마크 쿤스트할 오르후스의 예술 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스웨덴 말뫼 콘스트할과 덴마크 쿤스트할 샤를로텐보르의 감독으로 일했다. 제6회 무빙이미지 비엔날레 《Leisure, Discipline and
Punishment》(벨기에)의 예술 감독을
역임했다. 아트선재센터에서의 《나는너를중세의미래한다1》을
포함한 다수의 국제전과 공공공간에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출판사 ‘포크
살라드 프레스’의 창립인이자 뉴스페이퍼 프로젝트 『올드뉴스』의 발행인이다.
데이비드
툽
1970년부터 데이비드 툽은 소리, 듣기, 음악과 물질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즉흥 음악 퍼포먼스를 넘어 글쓰기, 작곡, 필드 레코딩과 전시 기획 등의 다양한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런던 칼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의 교수이며, 『Ocean of Sound, Sinister Resonance』, 『Into the Maelstrom』을 비롯한 8권의 책을 쓴 저자다. 가장 최근에는 솔로로 ‘Apparition Paintings’을
녹음했다. 즉흥음악가로서 그는 최근 리에 나카지마, 시젤 엔데레센, 서스턴 무어, 다니아 캐롤라인 첸,
류이치 사카모토와 협업했다.
김미영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 후 서울연구원과
부산연구원에서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관심분야는 도시의 문화예술공간,
공간의 문화사, 공간의 사회학
등으로 물리적 실체로서 공간을 너머 그것의 문화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발견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옥상의 공간사회학」,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와
행복의 관계」, 「호텔과 ‘강남의 탄생’」, 「‘오감(五感)도시’를 위한 연구방법론으로서 걷기」 등이 있다.
김지훈
『필름, 비디오, 그리고 디지털 사이에서:
포스트-미디어 시대의 하이브리드 무빙 이미지』(Bloomsbury
Academic, 2018/16)의 저자이다. 영화이론,
실험영화와 비디오, 무빙 이미지의 예술, 영화와
현대 미술, 디지털 시네마, 그리고 실험 다큐멘터리에 관한
논문들은 「Cinema Journal」, 「Screen」, 「Film Quarterly」, 「Camera Obscura」, 「Animat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Millennium Film Journal」 등의 학술지와, 공저서인
『글로벌 아트 시네마: 새로운 역사와 이론들』(Oxford University
Press, 2010)과 『발생: 위치와 무빙 이미지』(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1) 등에 실렸다. 또한 『Journal of Popular Film and Television』의 ‘21세기
한국영화와 텔레비전’ 특집을 편집했다. 두 권의 저서를 준비중이며 각각의 제목은 『다큐멘터리의 확장된
영역: 뉴미디어, 뉴플랫폼 그리고 다큐멘터리』와 『포스트-베리떼 전환: 21세기의 한국 다큐멘터리영화』이다. 현재 중앙대학교 영화미디어 연구 부교수이다.
루슬라나
리히트치어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에서 성장한 루슬라나 리히트치어는 작가이자 큐레이터, 일리노이 노스웨스턴대학의
미술사 박사과정생이다. 그가 갖고 있는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은 차이와 변화에 대한 급진적 상상력을 품고자
하는 문화적 작업을 생산하도록 한다. 텍사스 휴스턴 미술관의 ‘코어’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디트로이트 레드불 아츠의 펠로우십에 선정되었다. 리히트치어는
각종 전시 도록 및 국제적인 예술관련 출판물에 정기적으로 투고하고 있다.
책 속에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어휘 차원의 변화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귓속말로 전해들은 말을 다른
삶에게 다시 귓속말로 옮기는 아이들 놀이 ‘옮겨 말하기’(Chinese
Whispers)에서—이 말놀이는 전화기, 전화
교환원, 망가진 전화기, 그레이프 바인, 가십, 우유 마시지마, 비밀
메시지 게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프랑스어로는 아랍 전화 또는 무선 전화 놀이로도 불린다. 놀이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우선 일렬로 줄지어 서거나
둥글게 원을 만든다. 놀이를 시작하는 사람이 전할 문장이나 말을 생각해 옆에 선 두 번째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달한다. 이 사람은 자기 옆에 선 세 번째 사람에게 다시 말을 전달하고, 세 번째 사람은 네 번째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놀이를 진행해 나간다. 그러다가 마지막 사람의 차례가 오면, 이 사람이 자기가 전해들은
말(메시지)을 모두에게 알려준다. 이어 애초 메시지를 고안한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속삭였던 말과 그 말을 비교한다. 처음의 말과 마지막 사람이 전해들은 말 사이에는 대개 큰 간극이 존재한다. 재미와
교육적인 측면을 두루 갖춘 이 놀이는 간접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보와 해석이 얼마나 쉽사리 변질되는지 보여준다.
(야콥 파브리시우스, 서문, 14쪽)
현대의
도시들은 음향적 다양성이 부족하다. 같은 도로에 같은 차들이 달리고,
같은 디자인의 상품들을 팔고 있는 같은 쇼핑몰, 같은 바와 클럽들은 같은 음악을 틀고 같은
술을 팔며 같은 여객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 다닌다. 물론 이것이 전부 맞는 말은 아니다. 아래를 볼 때혹은 들을 때라고 말할 수 도 있겠다‑ 많은 차이를 찾아 볼 수 있다. 서울에 있을 때 한국의 악기들을
사고 싶다고 내 호스트에게 말했다. 처음에 그들은 나를 기타와 드럼,
키보드로 가득 차 있는 상점으로 데려갔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그 다음 우리는 큰 절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나는
나무로 된 목탁을 살 수 있었다. 그날 밤, 분주한 거리에서
노인이 박스를 두고 골동품을 파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서 나는 한국 무악에서 쓰는, 가운데 구멍에 보랏빛으로 물든 실크가 꿰어져 엮인 자바라
한 쌍을 샀다. 나는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툽, 부산을 듣다, 54쪽)
부산은
인구 340만, 면적
768제곱킬로미터의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다. 하나의
산과 작은 포구에 불과했던 부산이 이처럼 성장하기까지 그 중심에는 부산항이 있었다. 흔히 부산을 ‘항구도시’로 일컬을 만큼, 드넓은
바다와 어우러진 거대한 항구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부산의 상징임에 틀림없다. 이곳은 거대한 수출입
화물선이 바쁘게 드나들고 주홍빛 컨테이너가 겹겹이 쌓여있는 공간 이상이다. 근대 도시 부산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내륙을 향해 뻗어나가는 도시 성장 동력의 구심점으로서 시대의 상흔과 번영의 결과들이 누적된 복합체이다.
(김미영, 부산항에 담긴 시간의 형적, 82쪽)
부산이
영화적 도시cinematic city‑라는 규정은 새롭지 않게 들릴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 영화를 자신의 산업적, 문화적, 경제적 차원과 통합한 도시, 즉 영화-도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산은 분명 영화적 도시다. 1996년 최초로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를
부산의 브랜드로 특성화하고자 했던 문민정부 시기 지방자치제의 기획과 부산을 아시아의 문화적 허브cultural
hub‑로 조성하려는 지역적 프로젝트가 국제영화제를 당시 성장 일로에 놓인 영화산업과 영화문화의 촉매로 수립하고자 했던 영화인들의
열망과 제휴한 결과였다. 줄리안 스트링거Julian Stringer‑의
견해를 활용한다면 ‘영화의 바다’를 브랜드 이미지로 수립한 부산국제영화제는 “글로벌/로컬 동역학에 참여하고 로컬 영화 문화의 국제적 차원을 충분히
시사하는 행사”로서 “시네필리아라는 공유된 감각과 문화적
교환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참여에 근거한 진정한 로컬 도시 정체성을 낳을 수” 있었다. (김지훈, 부산을 기록하기: 김정근, 오민욱의 영화, 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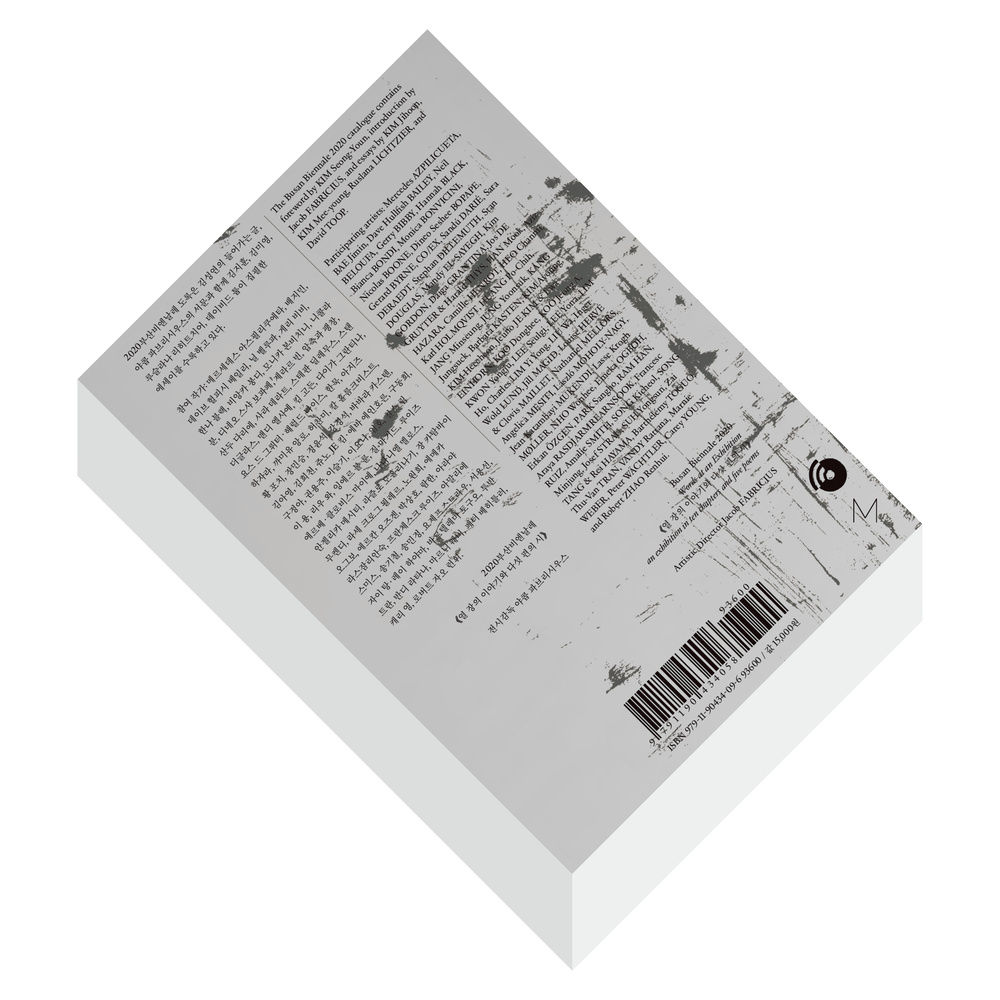 책 소개
2020 부산비엔날레의
전시 도록으로 <열 개의 단편 소설과 다섯 편의 시>와
함께 발행되었다. 10명의 소설가와 1명의 시인이 부산을
배경으로 완성한 단편 소설과 시는 비엔날레 전시에 참여한 67명의 시각예술가와 11명의 음악가에게 영감을 부여하였고, 이들은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 도록은 이러한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 결과물이다.
작가들의 작품 소개와 사진을 비롯해 작가들과의 짧은 인터뷰도 수록되어 있다. 전시 감독인
야콥 파브리시우스의 글을 비롯해 사회학자이자 지리전문가가 본 부산의 역사와 지리적 맥락을 파악한 김미영의 에세이,
영상 전문가로서 영화 도시로서 부산을 살펴본 김지훈, 부산의 소리를 탐색한 데이비드 툽
등의 에세이도 수록되어 있다.
목차
서문 – 야콥 파브리시우스
부산을
듣다 - 데이비드 툽
부산항에
담긴 시간의 형적 - 김미영
부산을
기록하기: 김정근, 오민욱의 영화 - 김지훈
압상(壓像) ‑ 루슬라나 리히트치어
작가•작품
설치
전경
이야기와
시 요약
작가
약력
필자
소개
콜로폰
저자 소개
야콥
파브리시우스
야콥
파브리시우스는 2020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이자 현재 덴마크 쿤스트할 오르후스의 예술 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스웨덴 말뫼 콘스트할과 덴마크 쿤스트할 샤를로텐보르의 감독으로 일했다. 제6회 무빙이미지 비엔날레 《Leisure, Discipline and
Punishment》(벨기에)의 예술 감독을
역임했다. 아트선재센터에서의 《나는너를중세의미래한다1》을
포함한 다수의 국제전과 공공공간에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출판사 ‘포크
살라드 프레스’의 창립인이자 뉴스페이퍼 프로젝트 『올드뉴스』의 발행인이다.
데이비드
툽
1970년부터 데이비드 툽은 소리, 듣기, 음악과 물질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즉흥 음악 퍼포먼스를 넘어 글쓰기, 작곡, 필드 레코딩과 전시 기획 등의 다양한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런던 칼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의 교수이며, 『Ocean of Sound, Sinister Resonance』, 『Into the Maelstrom』을 비롯한 8권의 책을 쓴 저자다. 가장 최근에는 솔로로 ‘Apparition Paintings’을
녹음했다. 즉흥음악가로서 그는 최근 리에 나카지마, 시젤 엔데레센, 서스턴 무어, 다니아 캐롤라인 첸,
류이치 사카모토와 협업했다.
김미영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 후 서울연구원과
부산연구원에서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관심분야는 도시의 문화예술공간,
공간의 문화사, 공간의 사회학
등으로 물리적 실체로서 공간을 너머 그것의 문화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발견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옥상의 공간사회학」,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와
행복의 관계」, 「호텔과 ‘강남의 탄생’」, 「‘오감(五感)도시’를 위한 연구방법론으로서 걷기」 등이 있다.
김지훈
『필름, 비디오, 그리고 디지털 사이에서:
포스트-미디어 시대의 하이브리드 무빙 이미지』(Bloomsbury
Academic, 2018/16)의 저자이다. 영화이론,
실험영화와 비디오, 무빙 이미지의 예술, 영화와
현대 미술, 디지털 시네마, 그리고 실험 다큐멘터리에 관한
논문들은 「Cinema Journal」, 「Screen」, 「Film Quarterly」, 「Camera Obscura」, 「Animat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Millennium Film Journal」 등의 학술지와, 공저서인
『글로벌 아트 시네마: 새로운 역사와 이론들』(Oxford University
Press, 2010)과 『발생: 위치와 무빙 이미지』(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1) 등에 실렸다. 또한 『Journal of Popular Film and Television』의 ‘21세기
한국영화와 텔레비전’ 특집을 편집했다. 두 권의 저서를 준비중이며 각각의 제목은 『다큐멘터리의 확장된
영역: 뉴미디어, 뉴플랫폼 그리고 다큐멘터리』와 『포스트-베리떼 전환: 21세기의 한국 다큐멘터리영화』이다. 현재 중앙대학교 영화미디어 연구 부교수이다.
루슬라나
리히트치어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에서 성장한 루슬라나 리히트치어는 작가이자 큐레이터, 일리노이 노스웨스턴대학의
미술사 박사과정생이다. 그가 갖고 있는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은 차이와 변화에 대한 급진적 상상력을 품고자
하는 문화적 작업을 생산하도록 한다. 텍사스 휴스턴 미술관의 ‘코어’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디트로이트 레드불 아츠의 펠로우십에 선정되었다. 리히트치어는
각종 전시 도록 및 국제적인 예술관련 출판물에 정기적으로 투고하고 있다.
책 속에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어휘 차원의 변화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귓속말로 전해들은 말을 다른
삶에게 다시 귓속말로 옮기는 아이들 놀이 ‘옮겨 말하기’(Chinese
Whispers)에서—이 말놀이는 전화기, 전화
교환원, 망가진 전화기, 그레이프 바인, 가십, 우유 마시지마, 비밀
메시지 게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프랑스어로는 아랍 전화 또는 무선 전화 놀이로도 불린다. 놀이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우선 일렬로 줄지어 서거나
둥글게 원을 만든다. 놀이를 시작하는 사람이 전할 문장이나 말을 생각해 옆에 선 두 번째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달한다. 이 사람은 자기 옆에 선 세 번째 사람에게 다시 말을 전달하고, 세 번째 사람은 네 번째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놀이를 진행해 나간다. 그러다가 마지막 사람의 차례가 오면, 이 사람이 자기가 전해들은
말(메시지)을 모두에게 알려준다. 이어 애초 메시지를 고안한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속삭였던 말과 그 말을 비교한다. 처음의 말과 마지막 사람이 전해들은 말 사이에는 대개 큰 간극이 존재한다. 재미와
교육적인 측면을 두루 갖춘 이 놀이는 간접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보와 해석이 얼마나 쉽사리 변질되는지 보여준다.
(야콥 파브리시우스, 서문, 14쪽)
현대의
도시들은 음향적 다양성이 부족하다. 같은 도로에 같은 차들이 달리고,
같은 디자인의 상품들을 팔고 있는 같은 쇼핑몰, 같은 바와 클럽들은 같은 음악을 틀고 같은
술을 팔며 같은 여객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 다닌다. 물론 이것이 전부 맞는 말은 아니다. 아래를 볼 때혹은 들을 때라고 말할 수 도 있겠다‑ 많은 차이를 찾아 볼 수 있다. 서울에 있을 때 한국의 악기들을
사고 싶다고 내 호스트에게 말했다. 처음에 그들은 나를 기타와 드럼,
키보드로 가득 차 있는 상점으로 데려갔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그 다음 우리는 큰 절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나는
나무로 된 목탁을 살 수 있었다. 그날 밤, 분주한 거리에서
노인이 박스를 두고 골동품을 파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서 나는 한국 무악에서 쓰는, 가운데 구멍에 보랏빛으로 물든 실크가 꿰어져 엮인 자바라
한 쌍을 샀다. 나는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툽, 부산을 듣다, 54쪽)
부산은
인구 340만, 면적
768제곱킬로미터의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다. 하나의
산과 작은 포구에 불과했던 부산이 이처럼 성장하기까지 그 중심에는 부산항이 있었다. 흔히 부산을 ‘항구도시’로 일컬을 만큼, 드넓은
바다와 어우러진 거대한 항구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부산의 상징임에 틀림없다. 이곳은 거대한 수출입
화물선이 바쁘게 드나들고 주홍빛 컨테이너가 겹겹이 쌓여있는 공간 이상이다. 근대 도시 부산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내륙을 향해 뻗어나가는 도시 성장 동력의 구심점으로서 시대의 상흔과 번영의 결과들이 누적된 복합체이다.
(김미영, 부산항에 담긴 시간의 형적, 82쪽)
부산이
영화적 도시cinematic city‑라는 규정은 새롭지 않게 들릴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 영화를 자신의 산업적, 문화적, 경제적 차원과 통합한 도시, 즉 영화-도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산은 분명 영화적 도시다. 1996년 최초로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를
부산의 브랜드로 특성화하고자 했던 문민정부 시기 지방자치제의 기획과 부산을 아시아의 문화적 허브cultural
hub‑로 조성하려는 지역적 프로젝트가 국제영화제를 당시 성장 일로에 놓인 영화산업과 영화문화의 촉매로 수립하고자 했던 영화인들의
열망과 제휴한 결과였다. 줄리안 스트링거Julian Stringer‑의
견해를 활용한다면 ‘영화의 바다’를 브랜드 이미지로 수립한 부산국제영화제는 “글로벌/로컬 동역학에 참여하고 로컬 영화 문화의 국제적 차원을 충분히
시사하는 행사”로서 “시네필리아라는 공유된 감각과 문화적
교환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참여에 근거한 진정한 로컬 도시 정체성을 낳을 수” 있었다. (김지훈, 부산을 기록하기: 김정근, 오민욱의 영화, 90쪽)
책 소개
2020 부산비엔날레의
전시 도록으로 <열 개의 단편 소설과 다섯 편의 시>와
함께 발행되었다. 10명의 소설가와 1명의 시인이 부산을
배경으로 완성한 단편 소설과 시는 비엔날레 전시에 참여한 67명의 시각예술가와 11명의 음악가에게 영감을 부여하였고, 이들은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 도록은 이러한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 결과물이다.
작가들의 작품 소개와 사진을 비롯해 작가들과의 짧은 인터뷰도 수록되어 있다. 전시 감독인
야콥 파브리시우스의 글을 비롯해 사회학자이자 지리전문가가 본 부산의 역사와 지리적 맥락을 파악한 김미영의 에세이,
영상 전문가로서 영화 도시로서 부산을 살펴본 김지훈, 부산의 소리를 탐색한 데이비드 툽
등의 에세이도 수록되어 있다.
목차
서문 – 야콥 파브리시우스
부산을
듣다 - 데이비드 툽
부산항에
담긴 시간의 형적 - 김미영
부산을
기록하기: 김정근, 오민욱의 영화 - 김지훈
압상(壓像) ‑ 루슬라나 리히트치어
작가•작품
설치
전경
이야기와
시 요약
작가
약력
필자
소개
콜로폰
저자 소개
야콥
파브리시우스
야콥
파브리시우스는 2020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이자 현재 덴마크 쿤스트할 오르후스의 예술 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스웨덴 말뫼 콘스트할과 덴마크 쿤스트할 샤를로텐보르의 감독으로 일했다. 제6회 무빙이미지 비엔날레 《Leisure, Discipline and
Punishment》(벨기에)의 예술 감독을
역임했다. 아트선재센터에서의 《나는너를중세의미래한다1》을
포함한 다수의 국제전과 공공공간에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출판사 ‘포크
살라드 프레스’의 창립인이자 뉴스페이퍼 프로젝트 『올드뉴스』의 발행인이다.
데이비드
툽
1970년부터 데이비드 툽은 소리, 듣기, 음악과 물질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즉흥 음악 퍼포먼스를 넘어 글쓰기, 작곡, 필드 레코딩과 전시 기획 등의 다양한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런던 칼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의 교수이며, 『Ocean of Sound, Sinister Resonance』, 『Into the Maelstrom』을 비롯한 8권의 책을 쓴 저자다. 가장 최근에는 솔로로 ‘Apparition Paintings’을
녹음했다. 즉흥음악가로서 그는 최근 리에 나카지마, 시젤 엔데레센, 서스턴 무어, 다니아 캐롤라인 첸,
류이치 사카모토와 협업했다.
김미영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 후 서울연구원과
부산연구원에서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관심분야는 도시의 문화예술공간,
공간의 문화사, 공간의 사회학
등으로 물리적 실체로서 공간을 너머 그것의 문화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발견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옥상의 공간사회학」,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와
행복의 관계」, 「호텔과 ‘강남의 탄생’」, 「‘오감(五感)도시’를 위한 연구방법론으로서 걷기」 등이 있다.
김지훈
『필름, 비디오, 그리고 디지털 사이에서:
포스트-미디어 시대의 하이브리드 무빙 이미지』(Bloomsbury
Academic, 2018/16)의 저자이다. 영화이론,
실험영화와 비디오, 무빙 이미지의 예술, 영화와
현대 미술, 디지털 시네마, 그리고 실험 다큐멘터리에 관한
논문들은 「Cinema Journal」, 「Screen」, 「Film Quarterly」, 「Camera Obscura」, 「Animat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Millennium Film Journal」 등의 학술지와, 공저서인
『글로벌 아트 시네마: 새로운 역사와 이론들』(Oxford University
Press, 2010)과 『발생: 위치와 무빙 이미지』(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1) 등에 실렸다. 또한 『Journal of Popular Film and Television』의 ‘21세기
한국영화와 텔레비전’ 특집을 편집했다. 두 권의 저서를 준비중이며 각각의 제목은 『다큐멘터리의 확장된
영역: 뉴미디어, 뉴플랫폼 그리고 다큐멘터리』와 『포스트-베리떼 전환: 21세기의 한국 다큐멘터리영화』이다. 현재 중앙대학교 영화미디어 연구 부교수이다.
루슬라나
리히트치어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에서 성장한 루슬라나 리히트치어는 작가이자 큐레이터, 일리노이 노스웨스턴대학의
미술사 박사과정생이다. 그가 갖고 있는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은 차이와 변화에 대한 급진적 상상력을 품고자
하는 문화적 작업을 생산하도록 한다. 텍사스 휴스턴 미술관의 ‘코어’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디트로이트 레드불 아츠의 펠로우십에 선정되었다. 리히트치어는
각종 전시 도록 및 국제적인 예술관련 출판물에 정기적으로 투고하고 있다.
책 속에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어휘 차원의 변화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귓속말로 전해들은 말을 다른
삶에게 다시 귓속말로 옮기는 아이들 놀이 ‘옮겨 말하기’(Chinese
Whispers)에서—이 말놀이는 전화기, 전화
교환원, 망가진 전화기, 그레이프 바인, 가십, 우유 마시지마, 비밀
메시지 게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프랑스어로는 아랍 전화 또는 무선 전화 놀이로도 불린다. 놀이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우선 일렬로 줄지어 서거나
둥글게 원을 만든다. 놀이를 시작하는 사람이 전할 문장이나 말을 생각해 옆에 선 두 번째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달한다. 이 사람은 자기 옆에 선 세 번째 사람에게 다시 말을 전달하고, 세 번째 사람은 네 번째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놀이를 진행해 나간다. 그러다가 마지막 사람의 차례가 오면, 이 사람이 자기가 전해들은
말(메시지)을 모두에게 알려준다. 이어 애초 메시지를 고안한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속삭였던 말과 그 말을 비교한다. 처음의 말과 마지막 사람이 전해들은 말 사이에는 대개 큰 간극이 존재한다. 재미와
교육적인 측면을 두루 갖춘 이 놀이는 간접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보와 해석이 얼마나 쉽사리 변질되는지 보여준다.
(야콥 파브리시우스, 서문, 14쪽)
현대의
도시들은 음향적 다양성이 부족하다. 같은 도로에 같은 차들이 달리고,
같은 디자인의 상품들을 팔고 있는 같은 쇼핑몰, 같은 바와 클럽들은 같은 음악을 틀고 같은
술을 팔며 같은 여객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 다닌다. 물론 이것이 전부 맞는 말은 아니다. 아래를 볼 때혹은 들을 때라고 말할 수 도 있겠다‑ 많은 차이를 찾아 볼 수 있다. 서울에 있을 때 한국의 악기들을
사고 싶다고 내 호스트에게 말했다. 처음에 그들은 나를 기타와 드럼,
키보드로 가득 차 있는 상점으로 데려갔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그 다음 우리는 큰 절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나는
나무로 된 목탁을 살 수 있었다. 그날 밤, 분주한 거리에서
노인이 박스를 두고 골동품을 파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서 나는 한국 무악에서 쓰는, 가운데 구멍에 보랏빛으로 물든 실크가 꿰어져 엮인 자바라
한 쌍을 샀다. 나는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툽, 부산을 듣다, 54쪽)
부산은
인구 340만, 면적
768제곱킬로미터의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다. 하나의
산과 작은 포구에 불과했던 부산이 이처럼 성장하기까지 그 중심에는 부산항이 있었다. 흔히 부산을 ‘항구도시’로 일컬을 만큼, 드넓은
바다와 어우러진 거대한 항구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부산의 상징임에 틀림없다. 이곳은 거대한 수출입
화물선이 바쁘게 드나들고 주홍빛 컨테이너가 겹겹이 쌓여있는 공간 이상이다. 근대 도시 부산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내륙을 향해 뻗어나가는 도시 성장 동력의 구심점으로서 시대의 상흔과 번영의 결과들이 누적된 복합체이다.
(김미영, 부산항에 담긴 시간의 형적, 82쪽)
부산이
영화적 도시cinematic city‑라는 규정은 새롭지 않게 들릴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 영화를 자신의 산업적, 문화적, 경제적 차원과 통합한 도시, 즉 영화-도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산은 분명 영화적 도시다. 1996년 최초로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를
부산의 브랜드로 특성화하고자 했던 문민정부 시기 지방자치제의 기획과 부산을 아시아의 문화적 허브cultural
hub‑로 조성하려는 지역적 프로젝트가 국제영화제를 당시 성장 일로에 놓인 영화산업과 영화문화의 촉매로 수립하고자 했던 영화인들의
열망과 제휴한 결과였다. 줄리안 스트링거Julian Stringer‑의
견해를 활용한다면 ‘영화의 바다’를 브랜드 이미지로 수립한 부산국제영화제는 “글로벌/로컬 동역학에 참여하고 로컬 영화 문화의 국제적 차원을 충분히
시사하는 행사”로서 “시네필리아라는 공유된 감각과 문화적
교환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참여에 근거한 진정한 로컬 도시 정체성을 낳을 수” 있었다. (김지훈, 부산을 기록하기: 김정근, 오민욱의 영화, 90쪽)
↧
Stranger Than Paradise
Stranger Than Paradise
![]() 저자: 주황, 이제
편집: 이진실
글: 권진, 백은선, 이규, 이진실
미디어버스 발행
2020년 11월 9일 발행
언어: 한국어/영어
디자인: 조현열
ISBN 979-11-90434-08-9 (93600)
220x285mm / 152페이지
값 21,000원
책 소개
그림을 그리는 이제와 사진을 찍는 주황 작가의 2인전인 <Stranger Than Paradise>의 전시
도록으로 발행된 책이다. 회화와 사진이라는 매체뿐 아니라, 세대도
배경도 다른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작업을 지지하며 꽤 오랫동안 상대의 매체가 지닌 매혹과 힘에 대해 호기심과 존중 어린 대화를 나눠왔다. 두 사람의 작업은 여성적 재현 혹은 여성성의 재현이라는 화두나 여성주의 주제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작업이
아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작업 모두에 깊숙이 박힌 심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동시대 여성들의 초상과 풍경, 그리고 정동의
한 끝을 포착하려는 부단한 노력일 것이다.
최근 주황은 한국 여성들의 정체성과 환상을 작동시키는 소위 ‘K뷰티’의 기제를 파고드는 〈온전한 초상〉(2016) 시리즈부터 연해주와 일본지역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존재를 주목하는 〈민요, 이곳에서 저곳으로〉(2018)까지,
여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간극과 겹겹의 시간성을 간결하게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편, 이제는 2005년 개인전 이래로 주로 사회적이고 상징적 기호가 각인된
곳이자 부단히 변화하는 유기체로서 여성의 몸 혹은 형상을 캔버스에 그려왔다. 그녀의 그림에서 그러한
여성적 ‘되기’는 소녀의 초상을 비롯해 가슴, 옹기, 열기, 춤, 공동체 등 구상적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 리듬이자 역동하는 영토로서 등장해왔다.
이 두 작가의 작업세계에서 여성이라는 화두는 확고한 발언권으로도 자전적 투사로도
기능하지 않는다. 지독한 비행공포증을 가진 주황이 공항에서 처음 만나는 여성들을 찍은 사진들에도, 세월호 이후 소녀들의 초상을 쓸쓸한 바람처럼 담아낸 이제의 그림에서도 여성이라는 형상은 (이 작가들 역시 여성이면서) 아직 말을 걸어보지 못한 바깥의 존재들에
가깝다. 자신의 위치와 서로 다른 경험과 시차에 귀를 기울이는 자의식을 동반한 이들의 작업에서 여성의
초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기억해낼 수 없는 얼굴, 혹은 실체라고는 부를 수 없는 복수의
존재처럼 등장한다.
이 책에는 전시 전경을 비롯해 작품 이미지,
작가의 작품에 대한 큐레이터와 작가, 시인 등의 글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목차
Stranger Than Paradise – 이진실
#1 – 주황
Stranger Than Paradise – 백은선
#2 – 이제
#3 – 주황
살과
얼굴 – 권진
#4 – 이제
그림자
그림 그린 자 홀로 함께, “삶의 어떤 시간”을 둘러싼 경계
그리기 – 이규
필자
소개
작가
약력
저자 소개
이제
이제는 2002 년 국민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2004 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다. 2002 년부터 현재까지 7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2회의 2인전, 다수의
기획단체전에 참여했다. 이제는 도시적 일상과 주변 인물들을 통해 기억과 정서, 연대와 우정이 담길 수 있는 회화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자신이 있는
곳,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그리는 행위를 반복하며, 화가로서
세상과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 2019년 종근당 예술지상 지원 선정되었고 2014년 63 스카이아트 뉴아티스트 프로그램, 2010년 송암문화재단 영크리에이티브에 선정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송암문화재단, 서울시립미술관 등 여러 주요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주황
1964년 생. 서울에서 활동.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와 예일대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뉴욕에서는
아시안 여성의 타자화된 정체성에 관한 작업을 하였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도시의 인공 자연물과 건축물의 변이를 기록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들은 하나의 체제가 또 다른 것으로 변환/대체되어 갈 때 생기는
불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본과 노동, 상품을 지속적으로 순환시켜야만 하는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에
관한 비유적 고찰이다.
필자 소개
권진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권진은 미술의 공공성과 언어로서의 미술에 관심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거쳐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 소속으로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백은선
백은선은
의심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잘 믿는 사람. 시에 대해 늘 생각하지만 시와 자주 불화하는 사람. 그래도 시는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 매사 솔직하며 현재를
살고 싶은 사람. 현재에는 없는 사람.
이규
연구자, 저술가, 그리고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다. AICA-USA의 멤버이자 현재 연변대학교 석좌교수이자 뉴욕시립대학교에서 철학과 젠더스터디를 가르치고 있다. 저술로는 『데카르트 읽기』와 『엔탱글리쉬 쓰기』가 있으며, 최근
캠브리지 대학, KIAS 그리고 멜론 파운데이션의 연구 펠로우십에 선정되었다.
이진실
미술평론가이자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원에서 독일미학을 공부하고 시각 매체와 미술에서 의미있는 실천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 큐레이토리얼&에디토리얼 콜렉티브
아그라파 소사이어티의 멤버로서 페미니즘, 퀴어,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타자적 전망 안에서 텍스트를 생산하고 수행성을 실험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책 속에서
낯선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는 언제나 설레는 일이고 누구에게는 마지못한 일, 때로는 차마 두려운
일일 것이다. 그것은 단지 떠남을 좋아한다는 취향이나 성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떠나는 처지’를
둘러싼 그/녀 각자의 조건의 불안정성과 친연성의 밀도, 온도에
따른 일이다. 일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잠깐의 여행과 달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혼자 떠나는 여정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긴장이 따라붙는다. 다가올 곤란을 무릅쓰고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 타국으로 떠나야
하는 이들이나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바다를 건너야 하는 이들에게 떠남이란 극도의 배타성과 대면하면서 ‘불필요한
타자’로 존재의 추락을 감행해야 하는 일이다. 각자에게 매번
그 강도를 달리하는 이방의 정서, 이 비교 불가능한 안온함과 생경함,
그리고 공포의 감각을 우리가 ‘이주’라고 부르는
시공성으로 명명할 수 있을까? 여하튼 이산, 이주, 여행의 이동성이 자신의 의지보다 삶의 강제로서 수행되는 오늘날, 이
세계의 여성들은 언제나 길을 떠나는 중이며, 어디에서나 이방인이다. 심지어
고향, 그리고 그녀들의 집에서도. (이진실, 서문, 12쪽)
세계의
커다란 엄마가 되어 내려다본다면 천사가 되어 내려다본다면 주황과 이제의 작품들이 걸려 있는 전시실은 아마 거대한 콜라주 같지 않을까 여러 얼굴
여러 풍경 여러 동물이 직조된 거대한 퀼트 담요처럼 아름다울 거야 천공을 향해 흔들리는 뭉치들처럼 만지고 만지고 또 만진 돌고 있는 수건처럼 아름다울
거야 세계의 시점에서 보면 우린 모두 이방인이고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잖아 각각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 속에서 잠시 살아볼
수 있을 거야 (백은선, 37쪽)
이
전시를 이끌어가는 주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극단의 성질들이 주고받는 다이내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작가를 둘러싼 여러 대칭적인 개념들, 표면적으로 매체의 구분부터, 시간과
공간의 재현 방식, 초상 사진에서 기록하는 그 시절의 얼굴들, 회화가
발언하는 생生에 대한 이야기, 직관적 내용과 이성적 형식, 물리적인
실체로서 작품과 이 물리적 실체를 사용하는 의미형성의 동기로서 작업 등이 끊임없이 오고 가며 왕복운동한다. 따라서
주황과 이제의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독해보다는, 이들이 전시장에서 주고 받는 다이내믹의 실체를 추적하는
것이 거꾸로 두 작가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적절할 것이다. (권진, 살과
얼굴, 100쪽)
사진가
주황과 여성 “타자들”의 우연한 만남을 보라. 뉴욕의 아무 거리에서나 마주치게 된, 앳된 동양인으로 보이는, 무명의 여성들 가운데 여럿은 주황의 “실내/내부” 초상 속 인물들로 투사된다.
거기에 나타나는 “두 번째” 반영적인 모습을, 그러나 이차적이지 않은 그 모습을 보라. 화가 이제가 동북아의 국경을
따라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기까지 홀로 여행하며 그려낸 시퀀스를 보라. 이러한 에너지를 흩뿌리는 역동의
선은 회화적 생기가 집약적으로 응축된 그녀의 작업에서 파편적으로, 율동적으로 재등장한다. 거기에 나타나는 “두 번째” 회상의
모습을, 그러나 이차적이지 않은 그 모습을 보라. 각각은
작가 자신의 일상적 재탄생을 재무대화한다. 마치 처음으로 그녀 앞에 쌓여진, 혹은 부분적으로 미리 규정된 시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곳으로 얽혀들어가듯이.
이 둘의 작업 모두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타성을, 그리고 변화를 부드러이 함께
대면하고 있는지 감지한다. 주변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주황의 카메라 렌즈와 이제의 역동적인 붓질은 그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의지하게 되는 탈 것이 된다. (이규, 그림자
그림, 130쪽)
저자: 주황, 이제
편집: 이진실
글: 권진, 백은선, 이규, 이진실
미디어버스 발행
2020년 11월 9일 발행
언어: 한국어/영어
디자인: 조현열
ISBN 979-11-90434-08-9 (93600)
220x285mm / 152페이지
값 21,000원
책 소개
그림을 그리는 이제와 사진을 찍는 주황 작가의 2인전인 <Stranger Than Paradise>의 전시
도록으로 발행된 책이다. 회화와 사진이라는 매체뿐 아니라, 세대도
배경도 다른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작업을 지지하며 꽤 오랫동안 상대의 매체가 지닌 매혹과 힘에 대해 호기심과 존중 어린 대화를 나눠왔다. 두 사람의 작업은 여성적 재현 혹은 여성성의 재현이라는 화두나 여성주의 주제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작업이
아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작업 모두에 깊숙이 박힌 심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동시대 여성들의 초상과 풍경, 그리고 정동의
한 끝을 포착하려는 부단한 노력일 것이다.
최근 주황은 한국 여성들의 정체성과 환상을 작동시키는 소위 ‘K뷰티’의 기제를 파고드는 〈온전한 초상〉(2016) 시리즈부터 연해주와 일본지역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존재를 주목하는 〈민요, 이곳에서 저곳으로〉(2018)까지,
여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간극과 겹겹의 시간성을 간결하게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편, 이제는 2005년 개인전 이래로 주로 사회적이고 상징적 기호가 각인된
곳이자 부단히 변화하는 유기체로서 여성의 몸 혹은 형상을 캔버스에 그려왔다. 그녀의 그림에서 그러한
여성적 ‘되기’는 소녀의 초상을 비롯해 가슴, 옹기, 열기, 춤, 공동체 등 구상적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 리듬이자 역동하는 영토로서 등장해왔다.
이 두 작가의 작업세계에서 여성이라는 화두는 확고한 발언권으로도 자전적 투사로도
기능하지 않는다. 지독한 비행공포증을 가진 주황이 공항에서 처음 만나는 여성들을 찍은 사진들에도, 세월호 이후 소녀들의 초상을 쓸쓸한 바람처럼 담아낸 이제의 그림에서도 여성이라는 형상은 (이 작가들 역시 여성이면서) 아직 말을 걸어보지 못한 바깥의 존재들에
가깝다. 자신의 위치와 서로 다른 경험과 시차에 귀를 기울이는 자의식을 동반한 이들의 작업에서 여성의
초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기억해낼 수 없는 얼굴, 혹은 실체라고는 부를 수 없는 복수의
존재처럼 등장한다.
이 책에는 전시 전경을 비롯해 작품 이미지,
작가의 작품에 대한 큐레이터와 작가, 시인 등의 글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목차
Stranger Than Paradise – 이진실
#1 – 주황
Stranger Than Paradise – 백은선
#2 – 이제
#3 – 주황
살과
얼굴 – 권진
#4 – 이제
그림자
그림 그린 자 홀로 함께, “삶의 어떤 시간”을 둘러싼 경계
그리기 – 이규
필자
소개
작가
약력
저자 소개
이제
이제는 2002 년 국민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2004 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다. 2002 년부터 현재까지 7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2회의 2인전, 다수의
기획단체전에 참여했다. 이제는 도시적 일상과 주변 인물들을 통해 기억과 정서, 연대와 우정이 담길 수 있는 회화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자신이 있는
곳,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그리는 행위를 반복하며, 화가로서
세상과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 2019년 종근당 예술지상 지원 선정되었고 2014년 63 스카이아트 뉴아티스트 프로그램, 2010년 송암문화재단 영크리에이티브에 선정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송암문화재단, 서울시립미술관 등 여러 주요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주황
1964년 생. 서울에서 활동.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와 예일대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뉴욕에서는
아시안 여성의 타자화된 정체성에 관한 작업을 하였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도시의 인공 자연물과 건축물의 변이를 기록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들은 하나의 체제가 또 다른 것으로 변환/대체되어 갈 때 생기는
불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본과 노동, 상품을 지속적으로 순환시켜야만 하는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에
관한 비유적 고찰이다.
필자 소개
권진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권진은 미술의 공공성과 언어로서의 미술에 관심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거쳐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 소속으로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백은선
백은선은
의심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잘 믿는 사람. 시에 대해 늘 생각하지만 시와 자주 불화하는 사람. 그래도 시는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 매사 솔직하며 현재를
살고 싶은 사람. 현재에는 없는 사람.
이규
연구자, 저술가, 그리고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다. AICA-USA의 멤버이자 현재 연변대학교 석좌교수이자 뉴욕시립대학교에서 철학과 젠더스터디를 가르치고 있다. 저술로는 『데카르트 읽기』와 『엔탱글리쉬 쓰기』가 있으며, 최근
캠브리지 대학, KIAS 그리고 멜론 파운데이션의 연구 펠로우십에 선정되었다.
이진실
미술평론가이자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원에서 독일미학을 공부하고 시각 매체와 미술에서 의미있는 실천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 큐레이토리얼&에디토리얼 콜렉티브
아그라파 소사이어티의 멤버로서 페미니즘, 퀴어,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타자적 전망 안에서 텍스트를 생산하고 수행성을 실험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책 속에서
낯선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는 언제나 설레는 일이고 누구에게는 마지못한 일, 때로는 차마 두려운
일일 것이다. 그것은 단지 떠남을 좋아한다는 취향이나 성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떠나는 처지’를
둘러싼 그/녀 각자의 조건의 불안정성과 친연성의 밀도, 온도에
따른 일이다. 일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잠깐의 여행과 달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혼자 떠나는 여정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긴장이 따라붙는다. 다가올 곤란을 무릅쓰고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 타국으로 떠나야
하는 이들이나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바다를 건너야 하는 이들에게 떠남이란 극도의 배타성과 대면하면서 ‘불필요한
타자’로 존재의 추락을 감행해야 하는 일이다. 각자에게 매번
그 강도를 달리하는 이방의 정서, 이 비교 불가능한 안온함과 생경함,
그리고 공포의 감각을 우리가 ‘이주’라고 부르는
시공성으로 명명할 수 있을까? 여하튼 이산, 이주, 여행의 이동성이 자신의 의지보다 삶의 강제로서 수행되는 오늘날, 이
세계의 여성들은 언제나 길을 떠나는 중이며, 어디에서나 이방인이다. 심지어
고향, 그리고 그녀들의 집에서도. (이진실, 서문, 12쪽)
세계의
커다란 엄마가 되어 내려다본다면 천사가 되어 내려다본다면 주황과 이제의 작품들이 걸려 있는 전시실은 아마 거대한 콜라주 같지 않을까 여러 얼굴
여러 풍경 여러 동물이 직조된 거대한 퀼트 담요처럼 아름다울 거야 천공을 향해 흔들리는 뭉치들처럼 만지고 만지고 또 만진 돌고 있는 수건처럼 아름다울
거야 세계의 시점에서 보면 우린 모두 이방인이고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잖아 각각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 속에서 잠시 살아볼
수 있을 거야 (백은선, 37쪽)
이
전시를 이끌어가는 주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극단의 성질들이 주고받는 다이내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작가를 둘러싼 여러 대칭적인 개념들, 표면적으로 매체의 구분부터, 시간과
공간의 재현 방식, 초상 사진에서 기록하는 그 시절의 얼굴들, 회화가
발언하는 생生에 대한 이야기, 직관적 내용과 이성적 형식, 물리적인
실체로서 작품과 이 물리적 실체를 사용하는 의미형성의 동기로서 작업 등이 끊임없이 오고 가며 왕복운동한다. 따라서
주황과 이제의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독해보다는, 이들이 전시장에서 주고 받는 다이내믹의 실체를 추적하는
것이 거꾸로 두 작가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적절할 것이다. (권진, 살과
얼굴, 100쪽)
사진가
주황과 여성 “타자들”의 우연한 만남을 보라. 뉴욕의 아무 거리에서나 마주치게 된, 앳된 동양인으로 보이는, 무명의 여성들 가운데 여럿은 주황의 “실내/내부” 초상 속 인물들로 투사된다.
거기에 나타나는 “두 번째” 반영적인 모습을, 그러나 이차적이지 않은 그 모습을 보라. 화가 이제가 동북아의 국경을
따라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기까지 홀로 여행하며 그려낸 시퀀스를 보라. 이러한 에너지를 흩뿌리는 역동의
선은 회화적 생기가 집약적으로 응축된 그녀의 작업에서 파편적으로, 율동적으로 재등장한다. 거기에 나타나는 “두 번째” 회상의
모습을, 그러나 이차적이지 않은 그 모습을 보라. 각각은
작가 자신의 일상적 재탄생을 재무대화한다. 마치 처음으로 그녀 앞에 쌓여진, 혹은 부분적으로 미리 규정된 시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곳으로 얽혀들어가듯이.
이 둘의 작업 모두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타성을, 그리고 변화를 부드러이 함께
대면하고 있는지 감지한다. 주변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주황의 카메라 렌즈와 이제의 역동적인 붓질은 그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의지하게 되는 탈 것이 된다. (이규, 그림자
그림, 130쪽)
![]()
![]()
![]()
![]()
![]()
![]()
![]()
![]()
![]()
![]()
![]()
 저자: 주황, 이제
편집: 이진실
글: 권진, 백은선, 이규, 이진실
미디어버스 발행
2020년 11월 9일 발행
언어: 한국어/영어
디자인: 조현열
ISBN 979-11-90434-08-9 (93600)
220x285mm / 152페이지
값 21,000원
책 소개
그림을 그리는 이제와 사진을 찍는 주황 작가의 2인전인 <Stranger Than Paradise>의 전시
도록으로 발행된 책이다. 회화와 사진이라는 매체뿐 아니라, 세대도
배경도 다른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작업을 지지하며 꽤 오랫동안 상대의 매체가 지닌 매혹과 힘에 대해 호기심과 존중 어린 대화를 나눠왔다. 두 사람의 작업은 여성적 재현 혹은 여성성의 재현이라는 화두나 여성주의 주제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작업이
아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작업 모두에 깊숙이 박힌 심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동시대 여성들의 초상과 풍경, 그리고 정동의
한 끝을 포착하려는 부단한 노력일 것이다.
최근 주황은 한국 여성들의 정체성과 환상을 작동시키는 소위 ‘K뷰티’의 기제를 파고드는 〈온전한 초상〉(2016) 시리즈부터 연해주와 일본지역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존재를 주목하는 〈민요, 이곳에서 저곳으로〉(2018)까지,
여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간극과 겹겹의 시간성을 간결하게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편, 이제는 2005년 개인전 이래로 주로 사회적이고 상징적 기호가 각인된
곳이자 부단히 변화하는 유기체로서 여성의 몸 혹은 형상을 캔버스에 그려왔다. 그녀의 그림에서 그러한
여성적 ‘되기’는 소녀의 초상을 비롯해 가슴, 옹기, 열기, 춤, 공동체 등 구상적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 리듬이자 역동하는 영토로서 등장해왔다.
이 두 작가의 작업세계에서 여성이라는 화두는 확고한 발언권으로도 자전적 투사로도
기능하지 않는다. 지독한 비행공포증을 가진 주황이 공항에서 처음 만나는 여성들을 찍은 사진들에도, 세월호 이후 소녀들의 초상을 쓸쓸한 바람처럼 담아낸 이제의 그림에서도 여성이라는 형상은 (이 작가들 역시 여성이면서) 아직 말을 걸어보지 못한 바깥의 존재들에
가깝다. 자신의 위치와 서로 다른 경험과 시차에 귀를 기울이는 자의식을 동반한 이들의 작업에서 여성의
초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기억해낼 수 없는 얼굴, 혹은 실체라고는 부를 수 없는 복수의
존재처럼 등장한다.
이 책에는 전시 전경을 비롯해 작품 이미지,
작가의 작품에 대한 큐레이터와 작가, 시인 등의 글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목차
Stranger Than Paradise – 이진실
#1 – 주황
Stranger Than Paradise – 백은선
#2 – 이제
#3 – 주황
살과
얼굴 – 권진
#4 – 이제
그림자
그림 그린 자 홀로 함께, “삶의 어떤 시간”을 둘러싼 경계
그리기 – 이규
필자
소개
작가
약력
저자 소개
이제
이제는 2002 년 국민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2004 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다. 2002 년부터 현재까지 7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2회의 2인전, 다수의
기획단체전에 참여했다. 이제는 도시적 일상과 주변 인물들을 통해 기억과 정서, 연대와 우정이 담길 수 있는 회화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자신이 있는
곳,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그리는 행위를 반복하며, 화가로서
세상과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 2019년 종근당 예술지상 지원 선정되었고 2014년 63 스카이아트 뉴아티스트 프로그램, 2010년 송암문화재단 영크리에이티브에 선정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송암문화재단, 서울시립미술관 등 여러 주요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주황
1964년 생. 서울에서 활동.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와 예일대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뉴욕에서는
아시안 여성의 타자화된 정체성에 관한 작업을 하였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도시의 인공 자연물과 건축물의 변이를 기록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들은 하나의 체제가 또 다른 것으로 변환/대체되어 갈 때 생기는
불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본과 노동, 상품을 지속적으로 순환시켜야만 하는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에
관한 비유적 고찰이다.
필자 소개
권진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권진은 미술의 공공성과 언어로서의 미술에 관심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거쳐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 소속으로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백은선
백은선은
의심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잘 믿는 사람. 시에 대해 늘 생각하지만 시와 자주 불화하는 사람. 그래도 시는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 매사 솔직하며 현재를
살고 싶은 사람. 현재에는 없는 사람.
이규
연구자, 저술가, 그리고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다. AICA-USA의 멤버이자 현재 연변대학교 석좌교수이자 뉴욕시립대학교에서 철학과 젠더스터디를 가르치고 있다. 저술로는 『데카르트 읽기』와 『엔탱글리쉬 쓰기』가 있으며, 최근
캠브리지 대학, KIAS 그리고 멜론 파운데이션의 연구 펠로우십에 선정되었다.
이진실
미술평론가이자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원에서 독일미학을 공부하고 시각 매체와 미술에서 의미있는 실천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 큐레이토리얼&에디토리얼 콜렉티브
아그라파 소사이어티의 멤버로서 페미니즘, 퀴어,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타자적 전망 안에서 텍스트를 생산하고 수행성을 실험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책 속에서
낯선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는 언제나 설레는 일이고 누구에게는 마지못한 일, 때로는 차마 두려운
일일 것이다. 그것은 단지 떠남을 좋아한다는 취향이나 성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떠나는 처지’를
둘러싼 그/녀 각자의 조건의 불안정성과 친연성의 밀도, 온도에
따른 일이다. 일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잠깐의 여행과 달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혼자 떠나는 여정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긴장이 따라붙는다. 다가올 곤란을 무릅쓰고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 타국으로 떠나야
하는 이들이나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바다를 건너야 하는 이들에게 떠남이란 극도의 배타성과 대면하면서 ‘불필요한
타자’로 존재의 추락을 감행해야 하는 일이다. 각자에게 매번
그 강도를 달리하는 이방의 정서, 이 비교 불가능한 안온함과 생경함,
그리고 공포의 감각을 우리가 ‘이주’라고 부르는
시공성으로 명명할 수 있을까? 여하튼 이산, 이주, 여행의 이동성이 자신의 의지보다 삶의 강제로서 수행되는 오늘날, 이
세계의 여성들은 언제나 길을 떠나는 중이며, 어디에서나 이방인이다. 심지어
고향, 그리고 그녀들의 집에서도. (이진실, 서문, 12쪽)
세계의
커다란 엄마가 되어 내려다본다면 천사가 되어 내려다본다면 주황과 이제의 작품들이 걸려 있는 전시실은 아마 거대한 콜라주 같지 않을까 여러 얼굴
여러 풍경 여러 동물이 직조된 거대한 퀼트 담요처럼 아름다울 거야 천공을 향해 흔들리는 뭉치들처럼 만지고 만지고 또 만진 돌고 있는 수건처럼 아름다울
거야 세계의 시점에서 보면 우린 모두 이방인이고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잖아 각각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 속에서 잠시 살아볼
수 있을 거야 (백은선, 37쪽)
이
전시를 이끌어가는 주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극단의 성질들이 주고받는 다이내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작가를 둘러싼 여러 대칭적인 개념들, 표면적으로 매체의 구분부터, 시간과
공간의 재현 방식, 초상 사진에서 기록하는 그 시절의 얼굴들, 회화가
발언하는 생生에 대한 이야기, 직관적 내용과 이성적 형식, 물리적인
실체로서 작품과 이 물리적 실체를 사용하는 의미형성의 동기로서 작업 등이 끊임없이 오고 가며 왕복운동한다. 따라서
주황과 이제의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독해보다는, 이들이 전시장에서 주고 받는 다이내믹의 실체를 추적하는
것이 거꾸로 두 작가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적절할 것이다. (권진, 살과
얼굴, 100쪽)
사진가
주황과 여성 “타자들”의 우연한 만남을 보라. 뉴욕의 아무 거리에서나 마주치게 된, 앳된 동양인으로 보이는, 무명의 여성들 가운데 여럿은 주황의 “실내/내부” 초상 속 인물들로 투사된다.
거기에 나타나는 “두 번째” 반영적인 모습을, 그러나 이차적이지 않은 그 모습을 보라. 화가 이제가 동북아의 국경을
따라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기까지 홀로 여행하며 그려낸 시퀀스를 보라. 이러한 에너지를 흩뿌리는 역동의
선은 회화적 생기가 집약적으로 응축된 그녀의 작업에서 파편적으로, 율동적으로 재등장한다. 거기에 나타나는 “두 번째” 회상의
모습을, 그러나 이차적이지 않은 그 모습을 보라. 각각은
작가 자신의 일상적 재탄생을 재무대화한다. 마치 처음으로 그녀 앞에 쌓여진, 혹은 부분적으로 미리 규정된 시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곳으로 얽혀들어가듯이.
이 둘의 작업 모두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타성을, 그리고 변화를 부드러이 함께
대면하고 있는지 감지한다. 주변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주황의 카메라 렌즈와 이제의 역동적인 붓질은 그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의지하게 되는 탈 것이 된다. (이규, 그림자
그림, 130쪽)
저자: 주황, 이제
편집: 이진실
글: 권진, 백은선, 이규, 이진실
미디어버스 발행
2020년 11월 9일 발행
언어: 한국어/영어
디자인: 조현열
ISBN 979-11-90434-08-9 (93600)
220x285mm / 152페이지
값 21,000원
책 소개
그림을 그리는 이제와 사진을 찍는 주황 작가의 2인전인 <Stranger Than Paradise>의 전시
도록으로 발행된 책이다. 회화와 사진이라는 매체뿐 아니라, 세대도
배경도 다른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작업을 지지하며 꽤 오랫동안 상대의 매체가 지닌 매혹과 힘에 대해 호기심과 존중 어린 대화를 나눠왔다. 두 사람의 작업은 여성적 재현 혹은 여성성의 재현이라는 화두나 여성주의 주제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작업이
아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작업 모두에 깊숙이 박힌 심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동시대 여성들의 초상과 풍경, 그리고 정동의
한 끝을 포착하려는 부단한 노력일 것이다.
최근 주황은 한국 여성들의 정체성과 환상을 작동시키는 소위 ‘K뷰티’의 기제를 파고드는 〈온전한 초상〉(2016) 시리즈부터 연해주와 일본지역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존재를 주목하는 〈민요, 이곳에서 저곳으로〉(2018)까지,
여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간극과 겹겹의 시간성을 간결하게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편, 이제는 2005년 개인전 이래로 주로 사회적이고 상징적 기호가 각인된
곳이자 부단히 변화하는 유기체로서 여성의 몸 혹은 형상을 캔버스에 그려왔다. 그녀의 그림에서 그러한
여성적 ‘되기’는 소녀의 초상을 비롯해 가슴, 옹기, 열기, 춤, 공동체 등 구상적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 리듬이자 역동하는 영토로서 등장해왔다.
이 두 작가의 작업세계에서 여성이라는 화두는 확고한 발언권으로도 자전적 투사로도
기능하지 않는다. 지독한 비행공포증을 가진 주황이 공항에서 처음 만나는 여성들을 찍은 사진들에도, 세월호 이후 소녀들의 초상을 쓸쓸한 바람처럼 담아낸 이제의 그림에서도 여성이라는 형상은 (이 작가들 역시 여성이면서) 아직 말을 걸어보지 못한 바깥의 존재들에
가깝다. 자신의 위치와 서로 다른 경험과 시차에 귀를 기울이는 자의식을 동반한 이들의 작업에서 여성의
초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기억해낼 수 없는 얼굴, 혹은 실체라고는 부를 수 없는 복수의
존재처럼 등장한다.
이 책에는 전시 전경을 비롯해 작품 이미지,
작가의 작품에 대한 큐레이터와 작가, 시인 등의 글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목차
Stranger Than Paradise – 이진실
#1 – 주황
Stranger Than Paradise – 백은선
#2 – 이제
#3 – 주황
살과
얼굴 – 권진
#4 – 이제
그림자
그림 그린 자 홀로 함께, “삶의 어떤 시간”을 둘러싼 경계
그리기 – 이규
필자
소개
작가
약력
저자 소개
이제
이제는 2002 년 국민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2004 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다. 2002 년부터 현재까지 7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2회의 2인전, 다수의
기획단체전에 참여했다. 이제는 도시적 일상과 주변 인물들을 통해 기억과 정서, 연대와 우정이 담길 수 있는 회화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자신이 있는
곳,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그리는 행위를 반복하며, 화가로서
세상과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 2019년 종근당 예술지상 지원 선정되었고 2014년 63 스카이아트 뉴아티스트 프로그램, 2010년 송암문화재단 영크리에이티브에 선정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송암문화재단, 서울시립미술관 등 여러 주요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주황
1964년 생. 서울에서 활동.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와 예일대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뉴욕에서는
아시안 여성의 타자화된 정체성에 관한 작업을 하였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도시의 인공 자연물과 건축물의 변이를 기록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들은 하나의 체제가 또 다른 것으로 변환/대체되어 갈 때 생기는
불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본과 노동, 상품을 지속적으로 순환시켜야만 하는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에
관한 비유적 고찰이다.
필자 소개
권진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권진은 미술의 공공성과 언어로서의 미술에 관심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거쳐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 소속으로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백은선
백은선은
의심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잘 믿는 사람. 시에 대해 늘 생각하지만 시와 자주 불화하는 사람. 그래도 시는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 매사 솔직하며 현재를
살고 싶은 사람. 현재에는 없는 사람.
이규
연구자, 저술가, 그리고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다. AICA-USA의 멤버이자 현재 연변대학교 석좌교수이자 뉴욕시립대학교에서 철학과 젠더스터디를 가르치고 있다. 저술로는 『데카르트 읽기』와 『엔탱글리쉬 쓰기』가 있으며, 최근
캠브리지 대학, KIAS 그리고 멜론 파운데이션의 연구 펠로우십에 선정되었다.
이진실
미술평론가이자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원에서 독일미학을 공부하고 시각 매체와 미술에서 의미있는 실천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 큐레이토리얼&에디토리얼 콜렉티브
아그라파 소사이어티의 멤버로서 페미니즘, 퀴어,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타자적 전망 안에서 텍스트를 생산하고 수행성을 실험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책 속에서
낯선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는 언제나 설레는 일이고 누구에게는 마지못한 일, 때로는 차마 두려운
일일 것이다. 그것은 단지 떠남을 좋아한다는 취향이나 성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떠나는 처지’를
둘러싼 그/녀 각자의 조건의 불안정성과 친연성의 밀도, 온도에
따른 일이다. 일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잠깐의 여행과 달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혼자 떠나는 여정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긴장이 따라붙는다. 다가올 곤란을 무릅쓰고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 타국으로 떠나야
하는 이들이나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바다를 건너야 하는 이들에게 떠남이란 극도의 배타성과 대면하면서 ‘불필요한
타자’로 존재의 추락을 감행해야 하는 일이다. 각자에게 매번
그 강도를 달리하는 이방의 정서, 이 비교 불가능한 안온함과 생경함,
그리고 공포의 감각을 우리가 ‘이주’라고 부르는
시공성으로 명명할 수 있을까? 여하튼 이산, 이주, 여행의 이동성이 자신의 의지보다 삶의 강제로서 수행되는 오늘날, 이
세계의 여성들은 언제나 길을 떠나는 중이며, 어디에서나 이방인이다. 심지어
고향, 그리고 그녀들의 집에서도. (이진실, 서문, 12쪽)
세계의
커다란 엄마가 되어 내려다본다면 천사가 되어 내려다본다면 주황과 이제의 작품들이 걸려 있는 전시실은 아마 거대한 콜라주 같지 않을까 여러 얼굴
여러 풍경 여러 동물이 직조된 거대한 퀼트 담요처럼 아름다울 거야 천공을 향해 흔들리는 뭉치들처럼 만지고 만지고 또 만진 돌고 있는 수건처럼 아름다울
거야 세계의 시점에서 보면 우린 모두 이방인이고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잖아 각각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 속에서 잠시 살아볼
수 있을 거야 (백은선, 37쪽)
이
전시를 이끌어가는 주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극단의 성질들이 주고받는 다이내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작가를 둘러싼 여러 대칭적인 개념들, 표면적으로 매체의 구분부터, 시간과
공간의 재현 방식, 초상 사진에서 기록하는 그 시절의 얼굴들, 회화가
발언하는 생生에 대한 이야기, 직관적 내용과 이성적 형식, 물리적인
실체로서 작품과 이 물리적 실체를 사용하는 의미형성의 동기로서 작업 등이 끊임없이 오고 가며 왕복운동한다. 따라서
주황과 이제의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독해보다는, 이들이 전시장에서 주고 받는 다이내믹의 실체를 추적하는
것이 거꾸로 두 작가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적절할 것이다. (권진, 살과
얼굴, 100쪽)
사진가
주황과 여성 “타자들”의 우연한 만남을 보라. 뉴욕의 아무 거리에서나 마주치게 된, 앳된 동양인으로 보이는, 무명의 여성들 가운데 여럿은 주황의 “실내/내부” 초상 속 인물들로 투사된다.
거기에 나타나는 “두 번째” 반영적인 모습을, 그러나 이차적이지 않은 그 모습을 보라. 화가 이제가 동북아의 국경을
따라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기까지 홀로 여행하며 그려낸 시퀀스를 보라. 이러한 에너지를 흩뿌리는 역동의
선은 회화적 생기가 집약적으로 응축된 그녀의 작업에서 파편적으로, 율동적으로 재등장한다. 거기에 나타나는 “두 번째” 회상의
모습을, 그러나 이차적이지 않은 그 모습을 보라. 각각은
작가 자신의 일상적 재탄생을 재무대화한다. 마치 처음으로 그녀 앞에 쌓여진, 혹은 부분적으로 미리 규정된 시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곳으로 얽혀들어가듯이.
이 둘의 작업 모두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타성을, 그리고 변화를 부드러이 함께
대면하고 있는지 감지한다. 주변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주황의 카메라 렌즈와 이제의 역동적인 붓질은 그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의지하게 되는 탈 것이 된다. (이규, 그림자
그림, 1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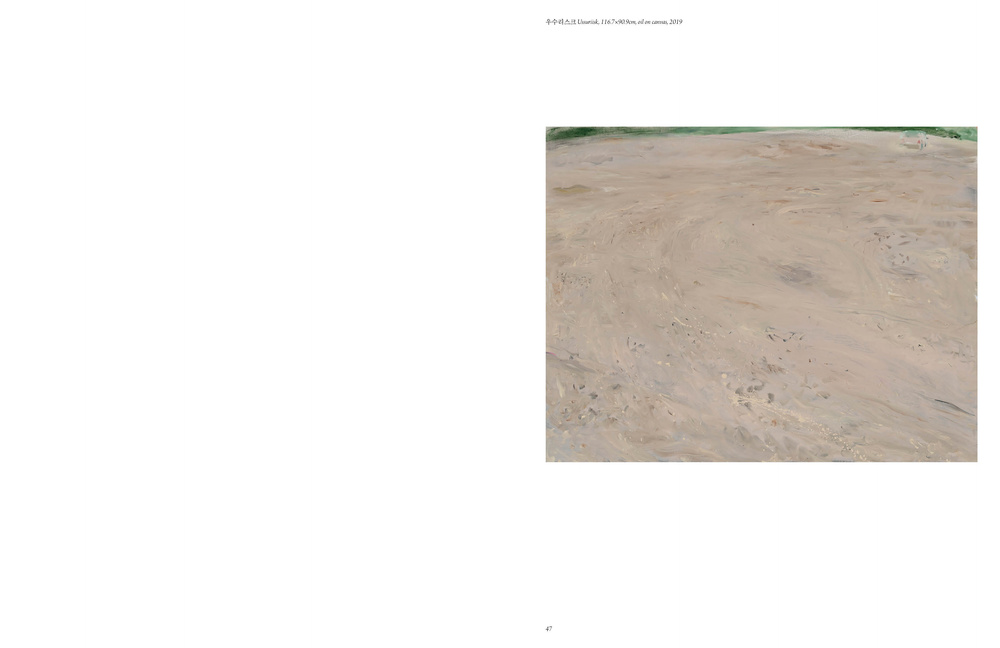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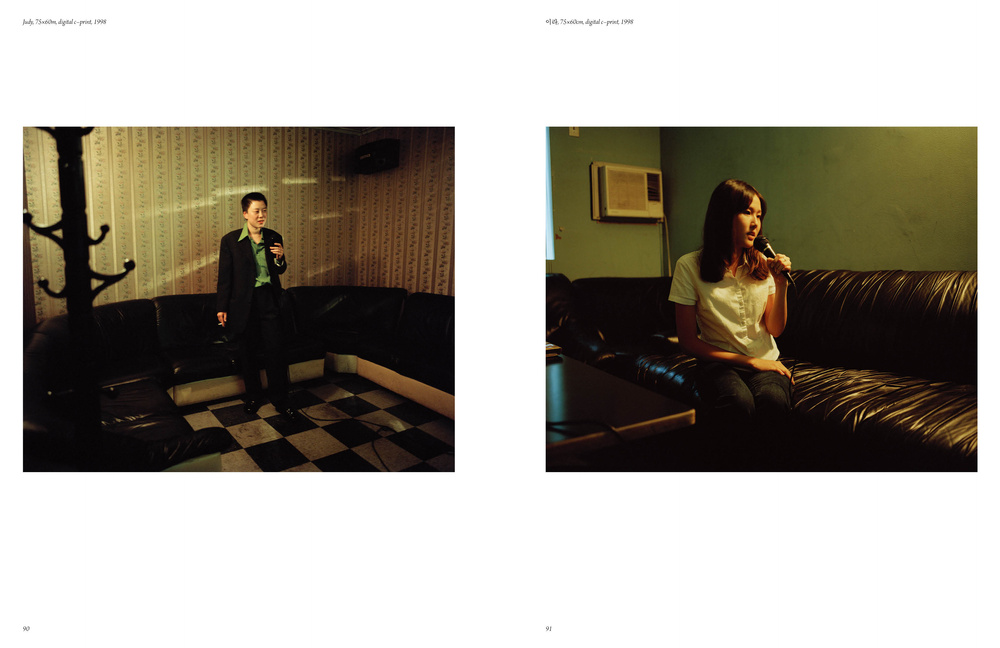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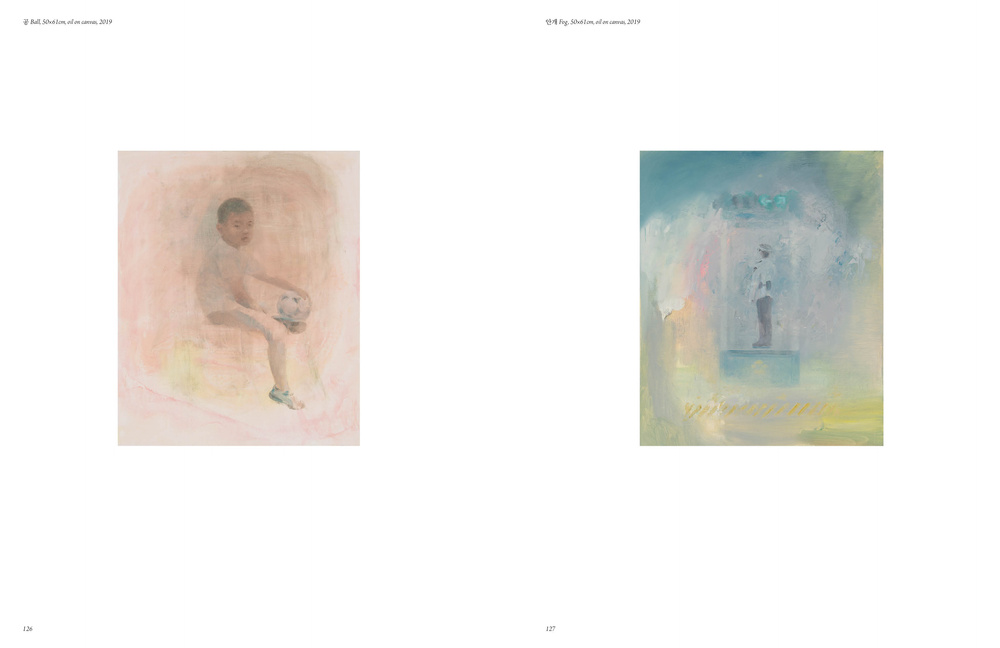

↧
개별꽃 False Starwort
개별꽃 False Starwort
![]() 구정연, 김뉘연, 박가희, 신해옥, 이미지, 린다 판 되르선 지음
110×180mm, 152쪽, 사철 소프트커버, 2020년 11월 6일, 17,000원
ISBN 979-11-90434-10-2 93600
디자인: 신동혁
언어: 한국어, 영어
《Gathering Flowers》는 디자이너 신해옥의 관심과 태도가 디자인의 방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양한 협업자들과 함께 담은 프로젝트다. ‘(신중하게) 꽃을 모으듯’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필자의 다양한 글을 선별하여 한데 묶은 출판물, 선집의 어원인 ‘anthologia’에서 빌려온 프로젝트의 제목은 디자이너를 작업자이자 저자로서 바라보는 프로젝트의 접근과 태도를 은유한다. 디자이너는 작업자로서 사물과 현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수집하며, 이를 시각언어로 잇고 배치하는 편집 과정을 따라 구조를 짓는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 사고를 가진 저자로서 시각물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경험을 생산해 내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의 이러한 수행적 실천에 주목한다.
프로젝트는 디자이너 신해옥이 수집한 말, 생각, 이미지를 담은 글과 이미지 뭉치 「개별꽃」을 씨앗 삼아, 이를 해석하는 협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형되고, 상이한 생각과 구조를 교차하면서 전개된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수집된 말과 생각을 신체와 공간이라는 다른 매체로 전환하는 매개자라기보다는, 「개별꽃」을 해석하여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드는, ‘꽃을 모으는’ 생산자가 된다.
동명의 출판물 『개별꽃』은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었던 신해옥의 「개별꽃」을 비롯하여 이를 건네어 받은 협업자들의 생각과 언어가 틔워낸 ‘꽃’을 모은 선집이다.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책의 전반부에 수록된 신해옥이 작성한 「개별꽃」은 성격이 다소 다른 세 꼭지의 글로 이뤄진다. 첫 번째 꼭지에서는 편집자이자 생산자로서 디자이너의 활동을 ‘선집’에 비유하여 앞으로 전개될 글을 소개하고, 이어서 자신의 관심사와 디자인 방법이 느슨히 또 긴밀히 연결되는 수집한 글과 이미지들을 주관적인 당위에 따라 타래처럼 펼쳐 놓는다. 마지막 꼭지는 이 과정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결과물로서 새롭게 배치되고 응집된 구조의 책을 익명 저자의 시점에서 탐험하는 픽션으로 마무리한다.
후반부에 이어지는 세 편의 글은 신해옥의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그 개념을 확장하며 디자인의 구조적, 수행적 측면 등 주요한 관점을 살핀다. 김뉘연은 신해옥의 책 작업을 열고 닫히는 순간마다 동기화되는 사물로 바라보고 이를 양손으로 펼쳐낸 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적절한 지침을 안내한다. 책에 담긴 내용이 아닌 책이 지어진 구조 자체를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각하듯 서술한다. 린다 판 되르선은 그의 디렉토리 어딘가에 저장된 세 장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이를 추적하는 듯한 글쓰기를 선보인다. 본래의 맥락에서 탈각된 개별 이미지에 길게 늘어뜨린 설명을 덧붙여서 이미지와 글이 공생하는 디자이너의 '시각적 방황'을 중계한다. 이미지와 활자가 서로 접합되어 한 줄기에서 흐르는 모양새가 신해옥의 「개별꽃」에서 보이는 편집자적 면모와 닮아있다. 구정연은 디자이너가 생산한 아티스트 북에 대한 질문으로 글을 연다. 그는 2006년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최된 《큐레이터의 사물함》과 연계하여 슬기와민이 제작한 『A REVISED INVENTORY』를 경유하여 책의 구조를 통해 특정한 읽기의 행위를 추동하는 것이야 말로 디자이너의 실천이자 디자인의 수행성이라 주장한다.
「개별꽃」에서 시작된 해석과 편집의 무한 타래는 협업자들의 언어를 따라 여러 차원을 지나 다시 책 『개별꽃』으로 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별꽃이 인쇄된 책갈피를 책 속에 끼워 독자들에게 건넨다. 책갈피를 움직이는 손을 따라 지면을 이동하며 이 타래의 구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박가희, 이미지
목차
들어가며 — 박가희, 이미지
개별꽃 — 신해옥사물의 방식 — 김뉘연
드레스 부류하기 — 린다 판 되르선
특별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 구정연
참여자들
지은이
구정연
불문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제로원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전시 큐레이터를 거쳐, 미디어버스와 더북소사이어티를 공동 운영했다. 《예술가의 문서들: 예술,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협업》(2016) 전시를 공동 기획했고, 『래디컬 뮤지엄』(현실문화, 2016)을 공역했다. MMCA 작가연구 총서 및 『국립현대미술관 연구 2019: 초국가적 미술관』, 아카이브 연구 포럼 <부재하는 아카이브: 디자인, 건축, 시각문화>(2019)를 기획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김뉘연
작가, 편집자. 〈문학적으로 걷기〉, 〈수사학: 장식과 여담〉, 〈시는 직선이다〉, 《비문: 어긋난 말들》, 〈마침〉, 《방》 등으로 문서를 발표했고, 『말하는 사람』과 『모눈 지우개』를 썼다.
린다 판 되르선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이다. 1987년부터 아르만트 메비스와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인 ‘메비스 & 판 되르선’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헤릿 리트벨트 아카데미의 그래픽 디자인과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예일대학교 예술대학 그래픽 디자인과 크리틱으로, 헤이그 왕립 예술학교의 마스터 과정인 NLN(논 리니어 내러티브)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박가희
기획자. 전시를 하나의 매체로 간주하고, ‘앎의 사건’을 촉발하는 전시의 수행적 실천에 관심이 있다.
신해옥
그래픽 디자이너. 책을 구조로 삼아 텍스트, 이미지, 페이지를 서로 교차시키며 직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관계성에 주목한다. 2014년부터 신동혁과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신신’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강의하며 본인의 관심사를 학생들과 동기화하고 있다.
이미지
시각적으로 사고하는 기획자. 디자인과 미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관계 속에서 번안되는 감각과 의미 체계에 관해 탐구한다.
구정연, 김뉘연, 박가희, 신해옥, 이미지, 린다 판 되르선 지음
110×180mm, 152쪽, 사철 소프트커버, 2020년 11월 6일, 17,000원
ISBN 979-11-90434-10-2 93600
디자인: 신동혁
언어: 한국어, 영어
《Gathering Flowers》는 디자이너 신해옥의 관심과 태도가 디자인의 방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양한 협업자들과 함께 담은 프로젝트다. ‘(신중하게) 꽃을 모으듯’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필자의 다양한 글을 선별하여 한데 묶은 출판물, 선집의 어원인 ‘anthologia’에서 빌려온 프로젝트의 제목은 디자이너를 작업자이자 저자로서 바라보는 프로젝트의 접근과 태도를 은유한다. 디자이너는 작업자로서 사물과 현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수집하며, 이를 시각언어로 잇고 배치하는 편집 과정을 따라 구조를 짓는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 사고를 가진 저자로서 시각물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경험을 생산해 내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의 이러한 수행적 실천에 주목한다.
프로젝트는 디자이너 신해옥이 수집한 말, 생각, 이미지를 담은 글과 이미지 뭉치 「개별꽃」을 씨앗 삼아, 이를 해석하는 협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형되고, 상이한 생각과 구조를 교차하면서 전개된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수집된 말과 생각을 신체와 공간이라는 다른 매체로 전환하는 매개자라기보다는, 「개별꽃」을 해석하여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드는, ‘꽃을 모으는’ 생산자가 된다.
동명의 출판물 『개별꽃』은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었던 신해옥의 「개별꽃」을 비롯하여 이를 건네어 받은 협업자들의 생각과 언어가 틔워낸 ‘꽃’을 모은 선집이다.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책의 전반부에 수록된 신해옥이 작성한 「개별꽃」은 성격이 다소 다른 세 꼭지의 글로 이뤄진다. 첫 번째 꼭지에서는 편집자이자 생산자로서 디자이너의 활동을 ‘선집’에 비유하여 앞으로 전개될 글을 소개하고, 이어서 자신의 관심사와 디자인 방법이 느슨히 또 긴밀히 연결되는 수집한 글과 이미지들을 주관적인 당위에 따라 타래처럼 펼쳐 놓는다. 마지막 꼭지는 이 과정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결과물로서 새롭게 배치되고 응집된 구조의 책을 익명 저자의 시점에서 탐험하는 픽션으로 마무리한다.
후반부에 이어지는 세 편의 글은 신해옥의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그 개념을 확장하며 디자인의 구조적, 수행적 측면 등 주요한 관점을 살핀다. 김뉘연은 신해옥의 책 작업을 열고 닫히는 순간마다 동기화되는 사물로 바라보고 이를 양손으로 펼쳐낸 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적절한 지침을 안내한다. 책에 담긴 내용이 아닌 책이 지어진 구조 자체를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각하듯 서술한다. 린다 판 되르선은 그의 디렉토리 어딘가에 저장된 세 장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이를 추적하는 듯한 글쓰기를 선보인다. 본래의 맥락에서 탈각된 개별 이미지에 길게 늘어뜨린 설명을 덧붙여서 이미지와 글이 공생하는 디자이너의 '시각적 방황'을 중계한다. 이미지와 활자가 서로 접합되어 한 줄기에서 흐르는 모양새가 신해옥의 「개별꽃」에서 보이는 편집자적 면모와 닮아있다. 구정연은 디자이너가 생산한 아티스트 북에 대한 질문으로 글을 연다. 그는 2006년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최된 《큐레이터의 사물함》과 연계하여 슬기와민이 제작한 『A REVISED INVENTORY』를 경유하여 책의 구조를 통해 특정한 읽기의 행위를 추동하는 것이야 말로 디자이너의 실천이자 디자인의 수행성이라 주장한다.
「개별꽃」에서 시작된 해석과 편집의 무한 타래는 협업자들의 언어를 따라 여러 차원을 지나 다시 책 『개별꽃』으로 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별꽃이 인쇄된 책갈피를 책 속에 끼워 독자들에게 건넨다. 책갈피를 움직이는 손을 따라 지면을 이동하며 이 타래의 구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박가희, 이미지
목차
들어가며 — 박가희, 이미지
개별꽃 — 신해옥사물의 방식 — 김뉘연
드레스 부류하기 — 린다 판 되르선
특별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 구정연
참여자들
지은이
구정연
불문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제로원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전시 큐레이터를 거쳐, 미디어버스와 더북소사이어티를 공동 운영했다. 《예술가의 문서들: 예술,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협업》(2016) 전시를 공동 기획했고, 『래디컬 뮤지엄』(현실문화, 2016)을 공역했다. MMCA 작가연구 총서 및 『국립현대미술관 연구 2019: 초국가적 미술관』, 아카이브 연구 포럼 <부재하는 아카이브: 디자인, 건축, 시각문화>(2019)를 기획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김뉘연
작가, 편집자. 〈문학적으로 걷기〉, 〈수사학: 장식과 여담〉, 〈시는 직선이다〉, 《비문: 어긋난 말들》, 〈마침〉, 《방》 등으로 문서를 발표했고, 『말하는 사람』과 『모눈 지우개』를 썼다.
린다 판 되르선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이다. 1987년부터 아르만트 메비스와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인 ‘메비스 & 판 되르선’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헤릿 리트벨트 아카데미의 그래픽 디자인과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예일대학교 예술대학 그래픽 디자인과 크리틱으로, 헤이그 왕립 예술학교의 마스터 과정인 NLN(논 리니어 내러티브)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박가희
기획자. 전시를 하나의 매체로 간주하고, ‘앎의 사건’을 촉발하는 전시의 수행적 실천에 관심이 있다.
신해옥
그래픽 디자이너. 책을 구조로 삼아 텍스트, 이미지, 페이지를 서로 교차시키며 직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관계성에 주목한다. 2014년부터 신동혁과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신신’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강의하며 본인의 관심사를 학생들과 동기화하고 있다.
이미지
시각적으로 사고하는 기획자. 디자인과 미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관계 속에서 번안되는 감각과 의미 체계에 관해 탐구한다.
![]()
![]()
![]()
![]()
![]()
![]()
![]()
![]()
![]()
![]()
![]()
![]()
![]()
![]()
 구정연, 김뉘연, 박가희, 신해옥, 이미지, 린다 판 되르선 지음
110×180mm, 152쪽, 사철 소프트커버, 2020년 11월 6일, 17,000원
ISBN 979-11-90434-10-2 93600
디자인: 신동혁
언어: 한국어, 영어
《Gathering Flowers》는 디자이너 신해옥의 관심과 태도가 디자인의 방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양한 협업자들과 함께 담은 프로젝트다. ‘(신중하게) 꽃을 모으듯’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필자의 다양한 글을 선별하여 한데 묶은 출판물, 선집의 어원인 ‘anthologia’에서 빌려온 프로젝트의 제목은 디자이너를 작업자이자 저자로서 바라보는 프로젝트의 접근과 태도를 은유한다. 디자이너는 작업자로서 사물과 현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수집하며, 이를 시각언어로 잇고 배치하는 편집 과정을 따라 구조를 짓는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 사고를 가진 저자로서 시각물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경험을 생산해 내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의 이러한 수행적 실천에 주목한다.
프로젝트는 디자이너 신해옥이 수집한 말, 생각, 이미지를 담은 글과 이미지 뭉치 「개별꽃」을 씨앗 삼아, 이를 해석하는 협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형되고, 상이한 생각과 구조를 교차하면서 전개된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수집된 말과 생각을 신체와 공간이라는 다른 매체로 전환하는 매개자라기보다는, 「개별꽃」을 해석하여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드는, ‘꽃을 모으는’ 생산자가 된다.
동명의 출판물 『개별꽃』은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었던 신해옥의 「개별꽃」을 비롯하여 이를 건네어 받은 협업자들의 생각과 언어가 틔워낸 ‘꽃’을 모은 선집이다.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책의 전반부에 수록된 신해옥이 작성한 「개별꽃」은 성격이 다소 다른 세 꼭지의 글로 이뤄진다. 첫 번째 꼭지에서는 편집자이자 생산자로서 디자이너의 활동을 ‘선집’에 비유하여 앞으로 전개될 글을 소개하고, 이어서 자신의 관심사와 디자인 방법이 느슨히 또 긴밀히 연결되는 수집한 글과 이미지들을 주관적인 당위에 따라 타래처럼 펼쳐 놓는다. 마지막 꼭지는 이 과정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결과물로서 새롭게 배치되고 응집된 구조의 책을 익명 저자의 시점에서 탐험하는 픽션으로 마무리한다.
후반부에 이어지는 세 편의 글은 신해옥의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그 개념을 확장하며 디자인의 구조적, 수행적 측면 등 주요한 관점을 살핀다. 김뉘연은 신해옥의 책 작업을 열고 닫히는 순간마다 동기화되는 사물로 바라보고 이를 양손으로 펼쳐낸 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적절한 지침을 안내한다. 책에 담긴 내용이 아닌 책이 지어진 구조 자체를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각하듯 서술한다. 린다 판 되르선은 그의 디렉토리 어딘가에 저장된 세 장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이를 추적하는 듯한 글쓰기를 선보인다. 본래의 맥락에서 탈각된 개별 이미지에 길게 늘어뜨린 설명을 덧붙여서 이미지와 글이 공생하는 디자이너의 '시각적 방황'을 중계한다. 이미지와 활자가 서로 접합되어 한 줄기에서 흐르는 모양새가 신해옥의 「개별꽃」에서 보이는 편집자적 면모와 닮아있다. 구정연은 디자이너가 생산한 아티스트 북에 대한 질문으로 글을 연다. 그는 2006년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최된 《큐레이터의 사물함》과 연계하여 슬기와민이 제작한 『A REVISED INVENTORY』를 경유하여 책의 구조를 통해 특정한 읽기의 행위를 추동하는 것이야 말로 디자이너의 실천이자 디자인의 수행성이라 주장한다.
「개별꽃」에서 시작된 해석과 편집의 무한 타래는 협업자들의 언어를 따라 여러 차원을 지나 다시 책 『개별꽃』으로 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별꽃이 인쇄된 책갈피를 책 속에 끼워 독자들에게 건넨다. 책갈피를 움직이는 손을 따라 지면을 이동하며 이 타래의 구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박가희, 이미지
목차
들어가며 — 박가희, 이미지
개별꽃 — 신해옥사물의 방식 — 김뉘연
드레스 부류하기 — 린다 판 되르선
특별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 구정연
참여자들
지은이
구정연
불문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제로원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전시 큐레이터를 거쳐, 미디어버스와 더북소사이어티를 공동 운영했다. 《예술가의 문서들: 예술,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협업》(2016) 전시를 공동 기획했고, 『래디컬 뮤지엄』(현실문화, 2016)을 공역했다. MMCA 작가연구 총서 및 『국립현대미술관 연구 2019: 초국가적 미술관』, 아카이브 연구 포럼 <부재하는 아카이브: 디자인, 건축, 시각문화>(2019)를 기획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김뉘연
작가, 편집자. 〈문학적으로 걷기〉, 〈수사학: 장식과 여담〉, 〈시는 직선이다〉, 《비문: 어긋난 말들》, 〈마침〉, 《방》 등으로 문서를 발표했고, 『말하는 사람』과 『모눈 지우개』를 썼다.
린다 판 되르선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이다. 1987년부터 아르만트 메비스와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인 ‘메비스 & 판 되르선’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헤릿 리트벨트 아카데미의 그래픽 디자인과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예일대학교 예술대학 그래픽 디자인과 크리틱으로, 헤이그 왕립 예술학교의 마스터 과정인 NLN(논 리니어 내러티브)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박가희
기획자. 전시를 하나의 매체로 간주하고, ‘앎의 사건’을 촉발하는 전시의 수행적 실천에 관심이 있다.
신해옥
그래픽 디자이너. 책을 구조로 삼아 텍스트, 이미지, 페이지를 서로 교차시키며 직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관계성에 주목한다. 2014년부터 신동혁과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신신’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강의하며 본인의 관심사를 학생들과 동기화하고 있다.
이미지
시각적으로 사고하는 기획자. 디자인과 미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관계 속에서 번안되는 감각과 의미 체계에 관해 탐구한다.
구정연, 김뉘연, 박가희, 신해옥, 이미지, 린다 판 되르선 지음
110×180mm, 152쪽, 사철 소프트커버, 2020년 11월 6일, 17,000원
ISBN 979-11-90434-10-2 93600
디자인: 신동혁
언어: 한국어, 영어
《Gathering Flowers》는 디자이너 신해옥의 관심과 태도가 디자인의 방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양한 협업자들과 함께 담은 프로젝트다. ‘(신중하게) 꽃을 모으듯’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필자의 다양한 글을 선별하여 한데 묶은 출판물, 선집의 어원인 ‘anthologia’에서 빌려온 프로젝트의 제목은 디자이너를 작업자이자 저자로서 바라보는 프로젝트의 접근과 태도를 은유한다. 디자이너는 작업자로서 사물과 현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수집하며, 이를 시각언어로 잇고 배치하는 편집 과정을 따라 구조를 짓는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 사고를 가진 저자로서 시각물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경험을 생산해 내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의 이러한 수행적 실천에 주목한다.
프로젝트는 디자이너 신해옥이 수집한 말, 생각, 이미지를 담은 글과 이미지 뭉치 「개별꽃」을 씨앗 삼아, 이를 해석하는 협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형되고, 상이한 생각과 구조를 교차하면서 전개된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수집된 말과 생각을 신체와 공간이라는 다른 매체로 전환하는 매개자라기보다는, 「개별꽃」을 해석하여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드는, ‘꽃을 모으는’ 생산자가 된다.
동명의 출판물 『개별꽃』은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었던 신해옥의 「개별꽃」을 비롯하여 이를 건네어 받은 협업자들의 생각과 언어가 틔워낸 ‘꽃’을 모은 선집이다.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책의 전반부에 수록된 신해옥이 작성한 「개별꽃」은 성격이 다소 다른 세 꼭지의 글로 이뤄진다. 첫 번째 꼭지에서는 편집자이자 생산자로서 디자이너의 활동을 ‘선집’에 비유하여 앞으로 전개될 글을 소개하고, 이어서 자신의 관심사와 디자인 방법이 느슨히 또 긴밀히 연결되는 수집한 글과 이미지들을 주관적인 당위에 따라 타래처럼 펼쳐 놓는다. 마지막 꼭지는 이 과정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결과물로서 새롭게 배치되고 응집된 구조의 책을 익명 저자의 시점에서 탐험하는 픽션으로 마무리한다.
후반부에 이어지는 세 편의 글은 신해옥의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그 개념을 확장하며 디자인의 구조적, 수행적 측면 등 주요한 관점을 살핀다. 김뉘연은 신해옥의 책 작업을 열고 닫히는 순간마다 동기화되는 사물로 바라보고 이를 양손으로 펼쳐낸 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적절한 지침을 안내한다. 책에 담긴 내용이 아닌 책이 지어진 구조 자체를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각하듯 서술한다. 린다 판 되르선은 그의 디렉토리 어딘가에 저장된 세 장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이를 추적하는 듯한 글쓰기를 선보인다. 본래의 맥락에서 탈각된 개별 이미지에 길게 늘어뜨린 설명을 덧붙여서 이미지와 글이 공생하는 디자이너의 '시각적 방황'을 중계한다. 이미지와 활자가 서로 접합되어 한 줄기에서 흐르는 모양새가 신해옥의 「개별꽃」에서 보이는 편집자적 면모와 닮아있다. 구정연은 디자이너가 생산한 아티스트 북에 대한 질문으로 글을 연다. 그는 2006년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최된 《큐레이터의 사물함》과 연계하여 슬기와민이 제작한 『A REVISED INVENTORY』를 경유하여 책의 구조를 통해 특정한 읽기의 행위를 추동하는 것이야 말로 디자이너의 실천이자 디자인의 수행성이라 주장한다.
「개별꽃」에서 시작된 해석과 편집의 무한 타래는 협업자들의 언어를 따라 여러 차원을 지나 다시 책 『개별꽃』으로 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별꽃이 인쇄된 책갈피를 책 속에 끼워 독자들에게 건넨다. 책갈피를 움직이는 손을 따라 지면을 이동하며 이 타래의 구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박가희, 이미지
목차
들어가며 — 박가희, 이미지
개별꽃 — 신해옥사물의 방식 — 김뉘연
드레스 부류하기 — 린다 판 되르선
특별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 구정연
참여자들
지은이
구정연
불문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제로원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전시 큐레이터를 거쳐, 미디어버스와 더북소사이어티를 공동 운영했다. 《예술가의 문서들: 예술,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협업》(2016) 전시를 공동 기획했고, 『래디컬 뮤지엄』(현실문화, 2016)을 공역했다. MMCA 작가연구 총서 및 『국립현대미술관 연구 2019: 초국가적 미술관』, 아카이브 연구 포럼 <부재하는 아카이브: 디자인, 건축, 시각문화>(2019)를 기획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김뉘연
작가, 편집자. 〈문학적으로 걷기〉, 〈수사학: 장식과 여담〉, 〈시는 직선이다〉, 《비문: 어긋난 말들》, 〈마침〉, 《방》 등으로 문서를 발표했고, 『말하는 사람』과 『모눈 지우개』를 썼다.
린다 판 되르선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이다. 1987년부터 아르만트 메비스와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인 ‘메비스 & 판 되르선’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헤릿 리트벨트 아카데미의 그래픽 디자인과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예일대학교 예술대학 그래픽 디자인과 크리틱으로, 헤이그 왕립 예술학교의 마스터 과정인 NLN(논 리니어 내러티브)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박가희
기획자. 전시를 하나의 매체로 간주하고, ‘앎의 사건’을 촉발하는 전시의 수행적 실천에 관심이 있다.
신해옥
그래픽 디자이너. 책을 구조로 삼아 텍스트, 이미지, 페이지를 서로 교차시키며 직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관계성에 주목한다. 2014년부터 신동혁과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신신’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강의하며 본인의 관심사를 학생들과 동기화하고 있다.
이미지
시각적으로 사고하는 기획자. 디자인과 미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관계 속에서 번안되는 감각과 의미 체계에 관해 탐구한다.














↧
로버스트 제어/벤타블랙
로버스트 제어/벤타블랙
![]()
![]() 최하늘 지음
미디어버스 발행
신신 디자인
2019년 11월 14일 발행
ISBN 979-11-90434-00-3
(90600)
105x148mm /
120페이지
값 15,000원
책 소개
『로버스트 제어/벤타블랙』은
조각가 최하늘이 쓴 2개의 짧은 소설을 모은 소설집이다. 현대미술작가
혹은 조각가로서 최하늘은 이 두 개의 소설을 통해 미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로버스트 제어
2018년 한 해 동안 두 번의 개인전과 다섯 번의 단체전을 가졌다. 서로 다른 일곱
개의 전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느슨하게 혹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때때로 모든 전시의 작품을 만든 당사자로서 나 스스로 방점을 찍은 것들에 대한 정리/해설이 요구됐고 한 해 동안 참여한 전시, 제작된 작업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부득이하게 소설의 형식을 빌려왔지만 결과물은 소설의 형식을 띄지
않고 외려 알 수 없는 글쓰기가 되어버렸다. 다만 허구적인 서사가 가미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소설이다.
벤타블랙
미술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창작 과정에서 늘 의식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 하나의 픽션으로 작성했다. 그를
통해 나는 내가 사적으로 겪는 것들이 단순히 작가의 자기 고백으로 여겨지며 축소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것은
창작하는 모든 이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관객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목차
로버스트 제어 3
벤타블랙 97
저자 소개
최하늘은 조각가이다.
책 속에서
“어쨌든 나는 이제 다시 혼자 이곳에서 느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가 나에게
준 유산이라면, 이곳에 어떤 전시장이 있고, 어떤 연주회가
열리고, 어떤 디저트가 맛있고, 앉아서 맥주를 마시기에 좋은
곳이 어디인지와 같은 명백한 것들. 이런 실용적인 것들은 그의 부재가 느껴질수록 더욱더 뚜렷한 유산이
되었다. 그를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많지만 나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에게 있어 그냥 오래된 귀인이고 싶다. 어차피 나도 이번
출장을 마지막으로 이곳과 작별을 고한다. 우리 둘의 시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 정도면 내가 꿈꿨던 로맨스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을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없던 정도 생겨난다고, 나는 이곳이 조금은 그리울 것 같다는 착각에 사로잡혔다. 특히 이곳의 수많은 전시장들. 왜 하필 전시장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곳에서 전시를 관람하는 것이 같은 경험을 서울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싶다. 물론 몇 가지를 제외하면 그 둘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미술은 범지구적인 것이니까. 나는 딱 그 정도만 미술을 경험해왔으니까. 그의 설명이 없이 관람하는 미술은 예전만큼 재미있지 않았지만 나는 마치 사별한 애인이 살아생전 간곡히 부탁한
것처럼 열심히 전시를 살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내가 미술을 대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취향을 갖고 이것들을 감상하는지 알게 되었고, 문득 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자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 없지. 그래
사실은 말이야,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를 많이 봤어. 공부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자랑하려고.” (7쪽)
“S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는 나의 의지를 지지해주었다. 또한 흔쾌히 나의
마지막 작업제작을 도와주기로 했다. 사실 이 상황은 철저히 나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출품작을 먼저 제작하는 습관을 들였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든 쉬운 일을 먼저 끝내놓고 큰일을 진행하는 습관은 늘 시간을 버는 방식이라고 믿었고, 이것이 나의 큰 자랑거리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어쨌든 마지막 작업은 무조건 완성시켜야한다. 전시장 동선의 가장 안쪽에 자리할 이 조각은 내가 생각하는 결말이다. 그
또한 마지막 작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나의 의견을 이해했고,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기에 흔쾌히 나를
돕기로 한 것이다. 뼈대를 포함해 대부분의 덩어리가 이미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마무리의 과정이 그리 지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낙관했다. 나는 S에게 나의 눈과 손을 위임했다. 머릿속에서 완성된 마지막 조각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에게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그리 명료하게 처리될 수 없는 일이었다. 손으로 느끼는 표면의 질감을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결국 그에게 위임된 것들 중 손은 다시 내게 돌아왔다. 나는 직접 재료를 만지며
마지막 조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그가 봐주며 천천히 작업을 진행했다.” (107쪽)
최하늘 지음
미디어버스 발행
신신 디자인
2019년 11월 14일 발행
ISBN 979-11-90434-00-3
(90600)
105x148mm /
120페이지
값 15,000원
책 소개
『로버스트 제어/벤타블랙』은
조각가 최하늘이 쓴 2개의 짧은 소설을 모은 소설집이다. 현대미술작가
혹은 조각가로서 최하늘은 이 두 개의 소설을 통해 미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로버스트 제어
2018년 한 해 동안 두 번의 개인전과 다섯 번의 단체전을 가졌다. 서로 다른 일곱
개의 전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느슨하게 혹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때때로 모든 전시의 작품을 만든 당사자로서 나 스스로 방점을 찍은 것들에 대한 정리/해설이 요구됐고 한 해 동안 참여한 전시, 제작된 작업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부득이하게 소설의 형식을 빌려왔지만 결과물은 소설의 형식을 띄지
않고 외려 알 수 없는 글쓰기가 되어버렸다. 다만 허구적인 서사가 가미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소설이다.
벤타블랙
미술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창작 과정에서 늘 의식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 하나의 픽션으로 작성했다. 그를
통해 나는 내가 사적으로 겪는 것들이 단순히 작가의 자기 고백으로 여겨지며 축소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것은
창작하는 모든 이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관객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목차
로버스트 제어 3
벤타블랙 97
저자 소개
최하늘은 조각가이다.
책 속에서
“어쨌든 나는 이제 다시 혼자 이곳에서 느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가 나에게
준 유산이라면, 이곳에 어떤 전시장이 있고, 어떤 연주회가
열리고, 어떤 디저트가 맛있고, 앉아서 맥주를 마시기에 좋은
곳이 어디인지와 같은 명백한 것들. 이런 실용적인 것들은 그의 부재가 느껴질수록 더욱더 뚜렷한 유산이
되었다. 그를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많지만 나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에게 있어 그냥 오래된 귀인이고 싶다. 어차피 나도 이번
출장을 마지막으로 이곳과 작별을 고한다. 우리 둘의 시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 정도면 내가 꿈꿨던 로맨스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을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없던 정도 생겨난다고, 나는 이곳이 조금은 그리울 것 같다는 착각에 사로잡혔다. 특히 이곳의 수많은 전시장들. 왜 하필 전시장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곳에서 전시를 관람하는 것이 같은 경험을 서울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싶다. 물론 몇 가지를 제외하면 그 둘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미술은 범지구적인 것이니까. 나는 딱 그 정도만 미술을 경험해왔으니까. 그의 설명이 없이 관람하는 미술은 예전만큼 재미있지 않았지만 나는 마치 사별한 애인이 살아생전 간곡히 부탁한
것처럼 열심히 전시를 살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내가 미술을 대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취향을 갖고 이것들을 감상하는지 알게 되었고, 문득 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자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 없지. 그래
사실은 말이야,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를 많이 봤어. 공부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자랑하려고.” (7쪽)
“S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는 나의 의지를 지지해주었다. 또한 흔쾌히 나의
마지막 작업제작을 도와주기로 했다. 사실 이 상황은 철저히 나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출품작을 먼저 제작하는 습관을 들였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든 쉬운 일을 먼저 끝내놓고 큰일을 진행하는 습관은 늘 시간을 버는 방식이라고 믿었고, 이것이 나의 큰 자랑거리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어쨌든 마지막 작업은 무조건 완성시켜야한다. 전시장 동선의 가장 안쪽에 자리할 이 조각은 내가 생각하는 결말이다. 그
또한 마지막 작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나의 의견을 이해했고,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기에 흔쾌히 나를
돕기로 한 것이다. 뼈대를 포함해 대부분의 덩어리가 이미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마무리의 과정이 그리 지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낙관했다. 나는 S에게 나의 눈과 손을 위임했다. 머릿속에서 완성된 마지막 조각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에게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그리 명료하게 처리될 수 없는 일이었다. 손으로 느끼는 표면의 질감을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결국 그에게 위임된 것들 중 손은 다시 내게 돌아왔다. 나는 직접 재료를 만지며
마지막 조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그가 봐주며 천천히 작업을 진행했다.” (107쪽)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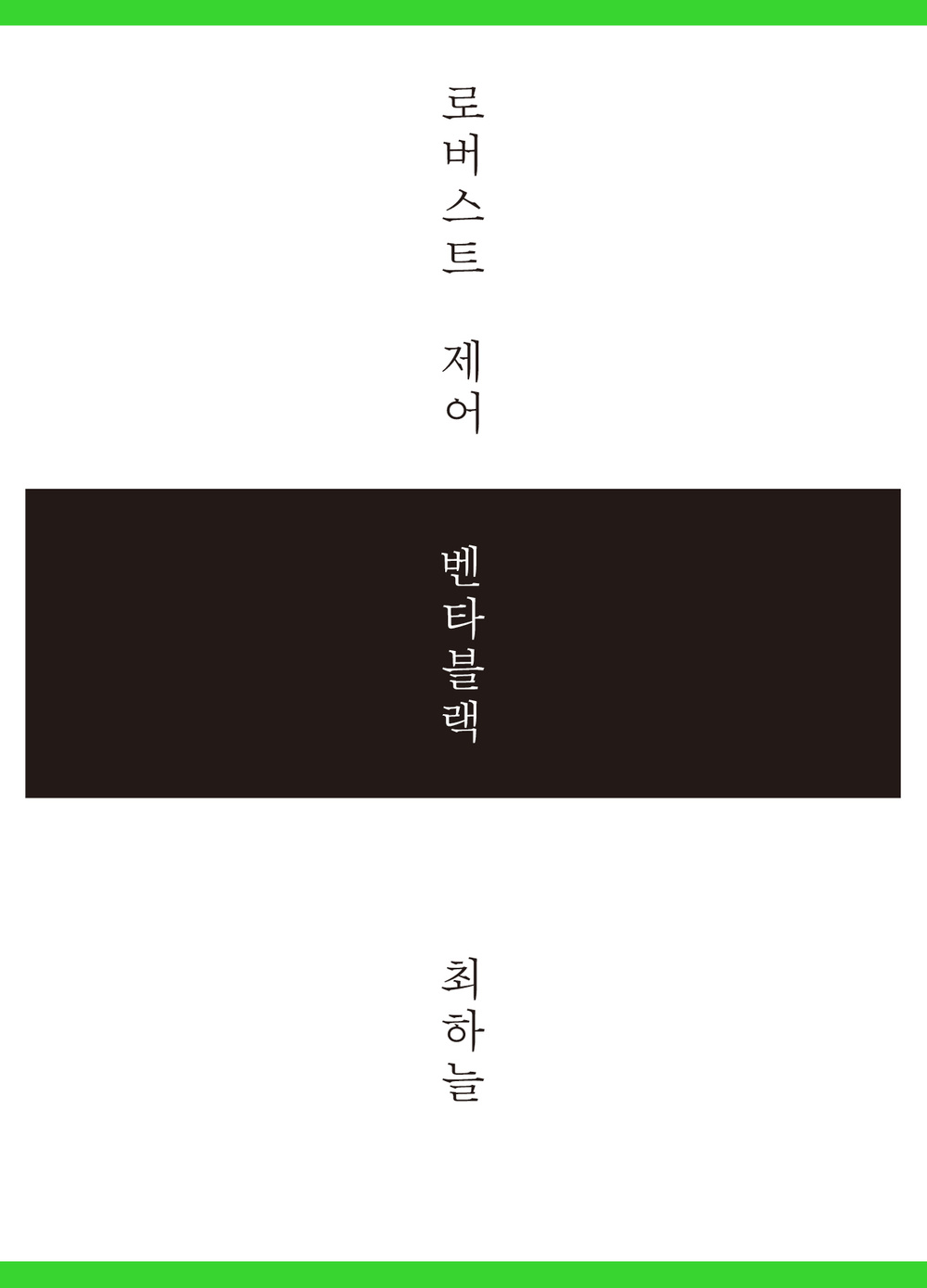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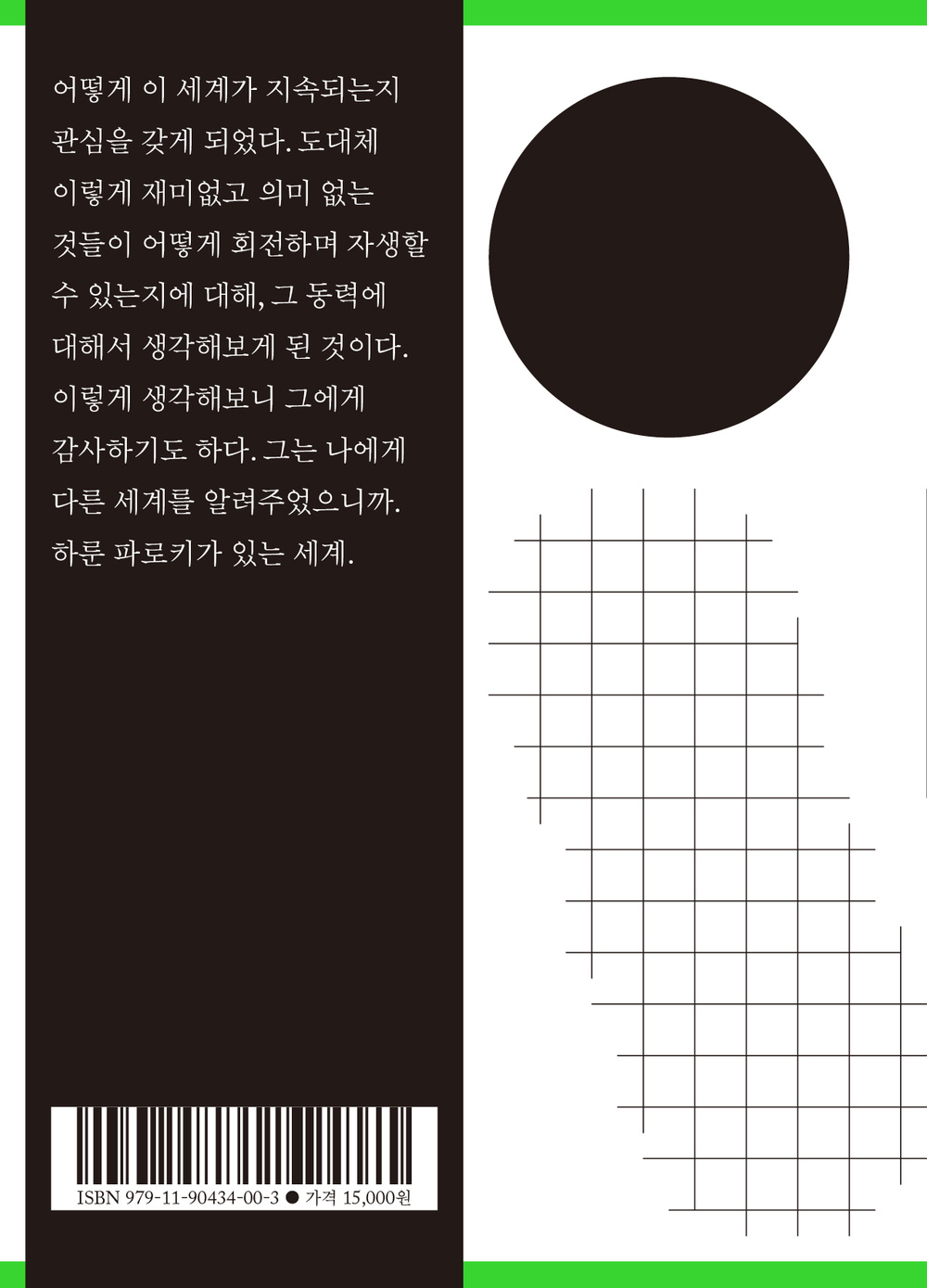 최하늘 지음
미디어버스 발행
신신 디자인
2019년 11월 14일 발행
ISBN 979-11-90434-00-3
(90600)
105x148mm /
120페이지
값 15,000원
책 소개
『로버스트 제어/벤타블랙』은
조각가 최하늘이 쓴 2개의 짧은 소설을 모은 소설집이다. 현대미술작가
혹은 조각가로서 최하늘은 이 두 개의 소설을 통해 미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로버스트 제어
2018년 한 해 동안 두 번의 개인전과 다섯 번의 단체전을 가졌다. 서로 다른 일곱
개의 전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느슨하게 혹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때때로 모든 전시의 작품을 만든 당사자로서 나 스스로 방점을 찍은 것들에 대한 정리/해설이 요구됐고 한 해 동안 참여한 전시, 제작된 작업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부득이하게 소설의 형식을 빌려왔지만 결과물은 소설의 형식을 띄지
않고 외려 알 수 없는 글쓰기가 되어버렸다. 다만 허구적인 서사가 가미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소설이다.
벤타블랙
미술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창작 과정에서 늘 의식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 하나의 픽션으로 작성했다. 그를
통해 나는 내가 사적으로 겪는 것들이 단순히 작가의 자기 고백으로 여겨지며 축소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것은
창작하는 모든 이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관객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목차
로버스트 제어 3
벤타블랙 97
저자 소개
최하늘은 조각가이다.
책 속에서
“어쨌든 나는 이제 다시 혼자 이곳에서 느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가 나에게
준 유산이라면, 이곳에 어떤 전시장이 있고, 어떤 연주회가
열리고, 어떤 디저트가 맛있고, 앉아서 맥주를 마시기에 좋은
곳이 어디인지와 같은 명백한 것들. 이런 실용적인 것들은 그의 부재가 느껴질수록 더욱더 뚜렷한 유산이
되었다. 그를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많지만 나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에게 있어 그냥 오래된 귀인이고 싶다. 어차피 나도 이번
출장을 마지막으로 이곳과 작별을 고한다. 우리 둘의 시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 정도면 내가 꿈꿨던 로맨스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을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없던 정도 생겨난다고, 나는 이곳이 조금은 그리울 것 같다는 착각에 사로잡혔다. 특히 이곳의 수많은 전시장들. 왜 하필 전시장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곳에서 전시를 관람하는 것이 같은 경험을 서울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싶다. 물론 몇 가지를 제외하면 그 둘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미술은 범지구적인 것이니까. 나는 딱 그 정도만 미술을 경험해왔으니까. 그의 설명이 없이 관람하는 미술은 예전만큼 재미있지 않았지만 나는 마치 사별한 애인이 살아생전 간곡히 부탁한
것처럼 열심히 전시를 살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내가 미술을 대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취향을 갖고 이것들을 감상하는지 알게 되었고, 문득 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자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 없지. 그래
사실은 말이야,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를 많이 봤어. 공부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자랑하려고.” (7쪽)
“S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는 나의 의지를 지지해주었다. 또한 흔쾌히 나의
마지막 작업제작을 도와주기로 했다. 사실 이 상황은 철저히 나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출품작을 먼저 제작하는 습관을 들였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든 쉬운 일을 먼저 끝내놓고 큰일을 진행하는 습관은 늘 시간을 버는 방식이라고 믿었고, 이것이 나의 큰 자랑거리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어쨌든 마지막 작업은 무조건 완성시켜야한다. 전시장 동선의 가장 안쪽에 자리할 이 조각은 내가 생각하는 결말이다. 그
또한 마지막 작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나의 의견을 이해했고,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기에 흔쾌히 나를
돕기로 한 것이다. 뼈대를 포함해 대부분의 덩어리가 이미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마무리의 과정이 그리 지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낙관했다. 나는 S에게 나의 눈과 손을 위임했다. 머릿속에서 완성된 마지막 조각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에게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그리 명료하게 처리될 수 없는 일이었다. 손으로 느끼는 표면의 질감을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결국 그에게 위임된 것들 중 손은 다시 내게 돌아왔다. 나는 직접 재료를 만지며
마지막 조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그가 봐주며 천천히 작업을 진행했다.” (107쪽)
최하늘 지음
미디어버스 발행
신신 디자인
2019년 11월 14일 발행
ISBN 979-11-90434-00-3
(90600)
105x148mm /
120페이지
값 15,000원
책 소개
『로버스트 제어/벤타블랙』은
조각가 최하늘이 쓴 2개의 짧은 소설을 모은 소설집이다. 현대미술작가
혹은 조각가로서 최하늘은 이 두 개의 소설을 통해 미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로버스트 제어
2018년 한 해 동안 두 번의 개인전과 다섯 번의 단체전을 가졌다. 서로 다른 일곱
개의 전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느슨하게 혹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때때로 모든 전시의 작품을 만든 당사자로서 나 스스로 방점을 찍은 것들에 대한 정리/해설이 요구됐고 한 해 동안 참여한 전시, 제작된 작업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부득이하게 소설의 형식을 빌려왔지만 결과물은 소설의 형식을 띄지
않고 외려 알 수 없는 글쓰기가 되어버렸다. 다만 허구적인 서사가 가미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소설이다.
벤타블랙
미술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창작 과정에서 늘 의식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 하나의 픽션으로 작성했다. 그를
통해 나는 내가 사적으로 겪는 것들이 단순히 작가의 자기 고백으로 여겨지며 축소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것은
창작하는 모든 이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관객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목차
로버스트 제어 3
벤타블랙 97
저자 소개
최하늘은 조각가이다.
책 속에서
“어쨌든 나는 이제 다시 혼자 이곳에서 느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가 나에게
준 유산이라면, 이곳에 어떤 전시장이 있고, 어떤 연주회가
열리고, 어떤 디저트가 맛있고, 앉아서 맥주를 마시기에 좋은
곳이 어디인지와 같은 명백한 것들. 이런 실용적인 것들은 그의 부재가 느껴질수록 더욱더 뚜렷한 유산이
되었다. 그를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많지만 나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에게 있어 그냥 오래된 귀인이고 싶다. 어차피 나도 이번
출장을 마지막으로 이곳과 작별을 고한다. 우리 둘의 시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 정도면 내가 꿈꿨던 로맨스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을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없던 정도 생겨난다고, 나는 이곳이 조금은 그리울 것 같다는 착각에 사로잡혔다. 특히 이곳의 수많은 전시장들. 왜 하필 전시장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곳에서 전시를 관람하는 것이 같은 경험을 서울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싶다. 물론 몇 가지를 제외하면 그 둘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미술은 범지구적인 것이니까. 나는 딱 그 정도만 미술을 경험해왔으니까. 그의 설명이 없이 관람하는 미술은 예전만큼 재미있지 않았지만 나는 마치 사별한 애인이 살아생전 간곡히 부탁한
것처럼 열심히 전시를 살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내가 미술을 대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취향을 갖고 이것들을 감상하는지 알게 되었고, 문득 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자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 없지. 그래
사실은 말이야,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를 많이 봤어. 공부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자랑하려고.” (7쪽)
“S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는 나의 의지를 지지해주었다. 또한 흔쾌히 나의
마지막 작업제작을 도와주기로 했다. 사실 이 상황은 철저히 나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출품작을 먼저 제작하는 습관을 들였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든 쉬운 일을 먼저 끝내놓고 큰일을 진행하는 습관은 늘 시간을 버는 방식이라고 믿었고, 이것이 나의 큰 자랑거리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어쨌든 마지막 작업은 무조건 완성시켜야한다. 전시장 동선의 가장 안쪽에 자리할 이 조각은 내가 생각하는 결말이다. 그
또한 마지막 작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나의 의견을 이해했고,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기에 흔쾌히 나를
돕기로 한 것이다. 뼈대를 포함해 대부분의 덩어리가 이미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마무리의 과정이 그리 지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낙관했다. 나는 S에게 나의 눈과 손을 위임했다. 머릿속에서 완성된 마지막 조각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에게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그리 명료하게 처리될 수 없는 일이었다. 손으로 느끼는 표면의 질감을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결국 그에게 위임된 것들 중 손은 다시 내게 돌아왔다. 나는 직접 재료를 만지며
마지막 조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그가 봐주며 천천히 작업을 진행했다.” (10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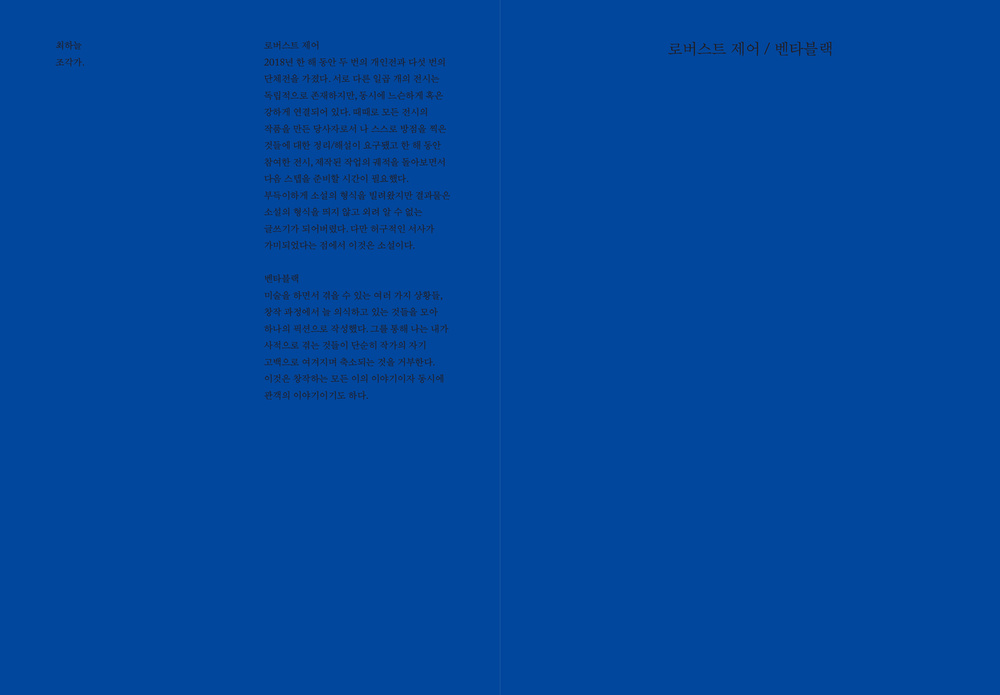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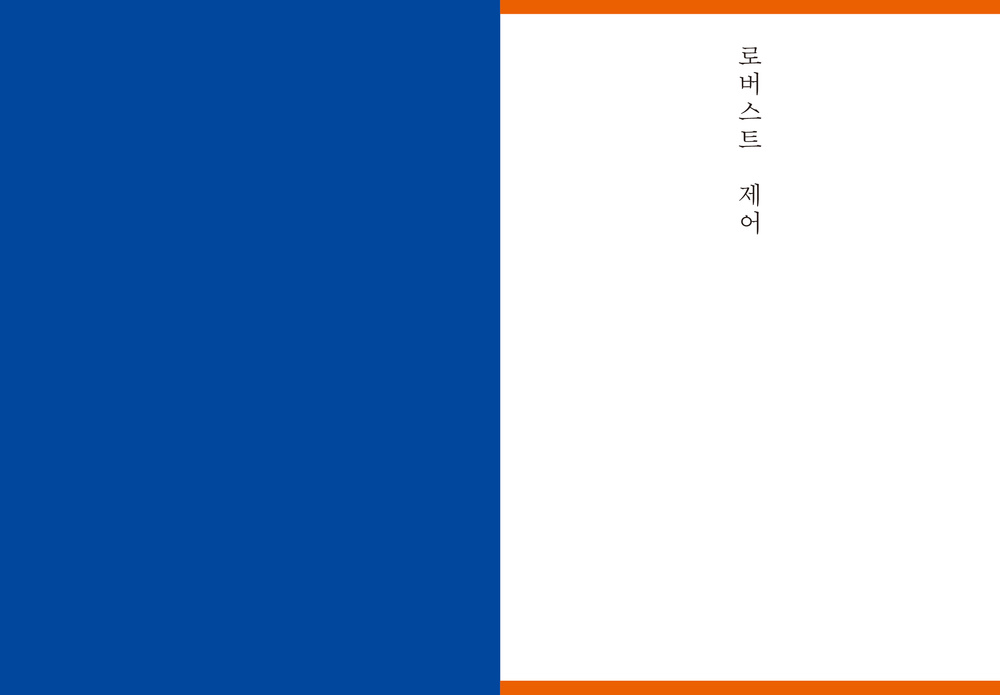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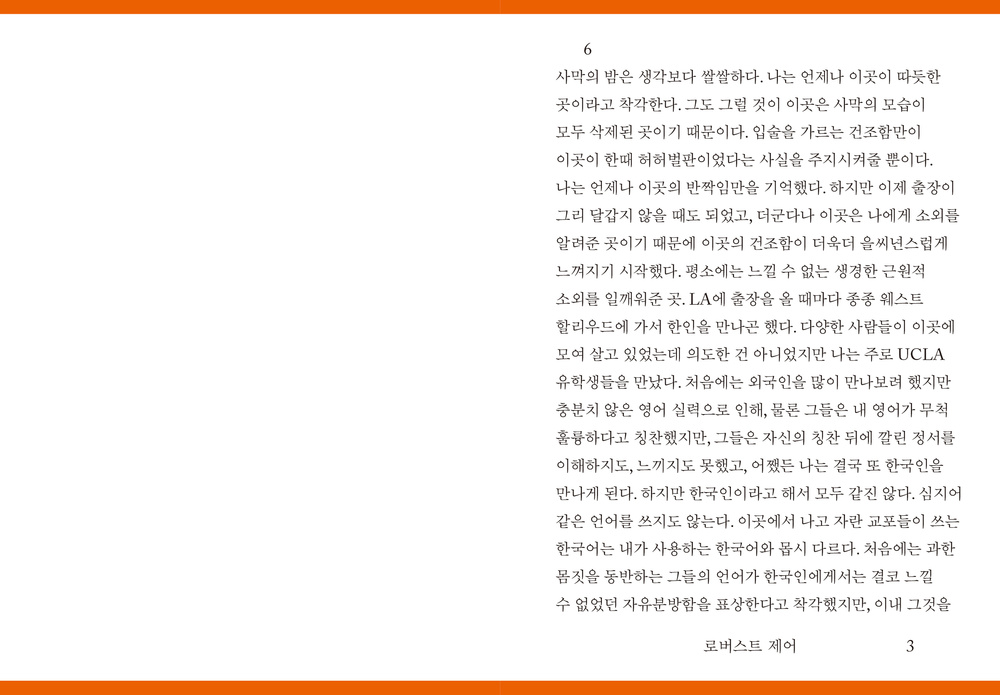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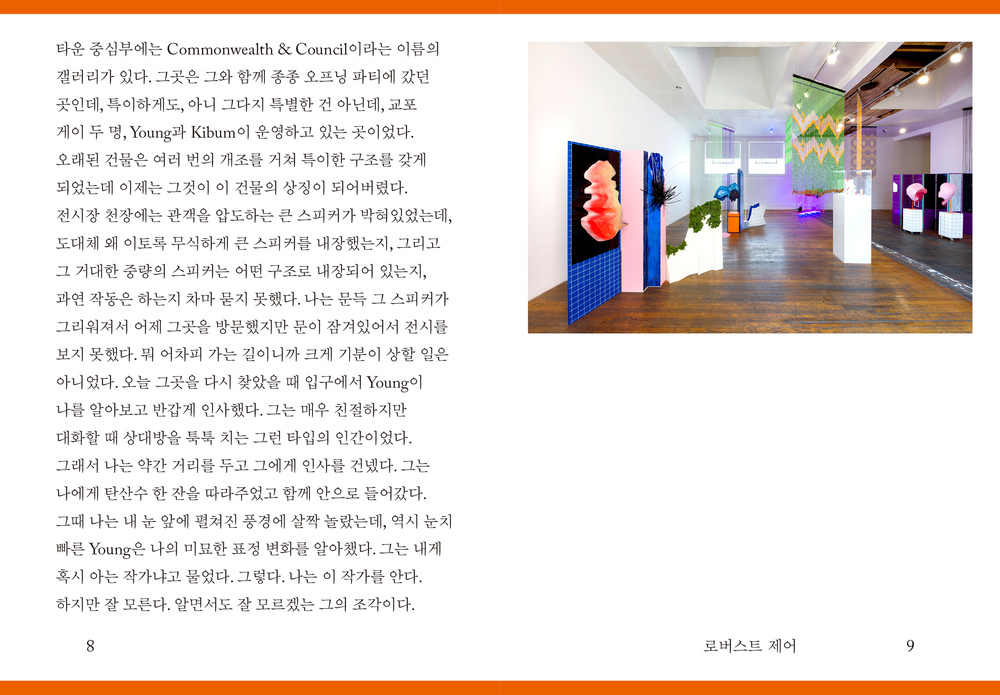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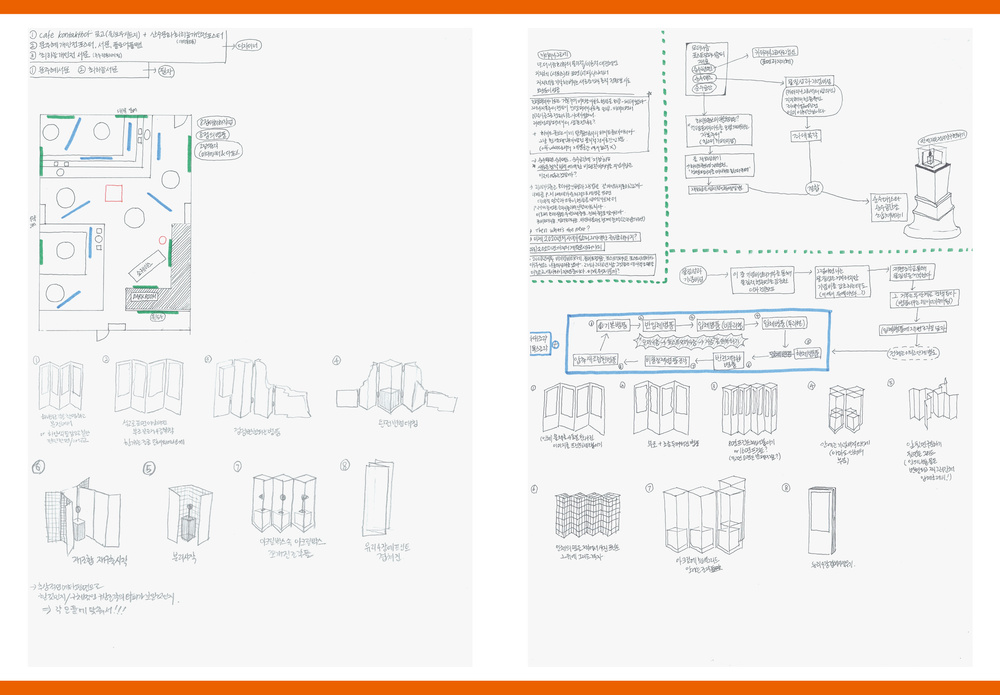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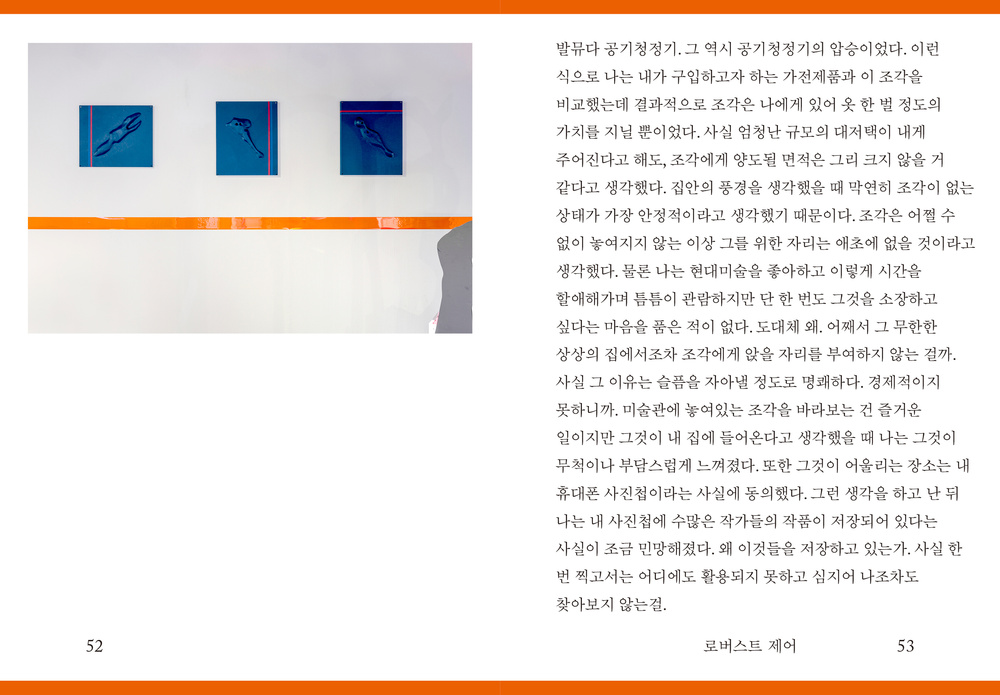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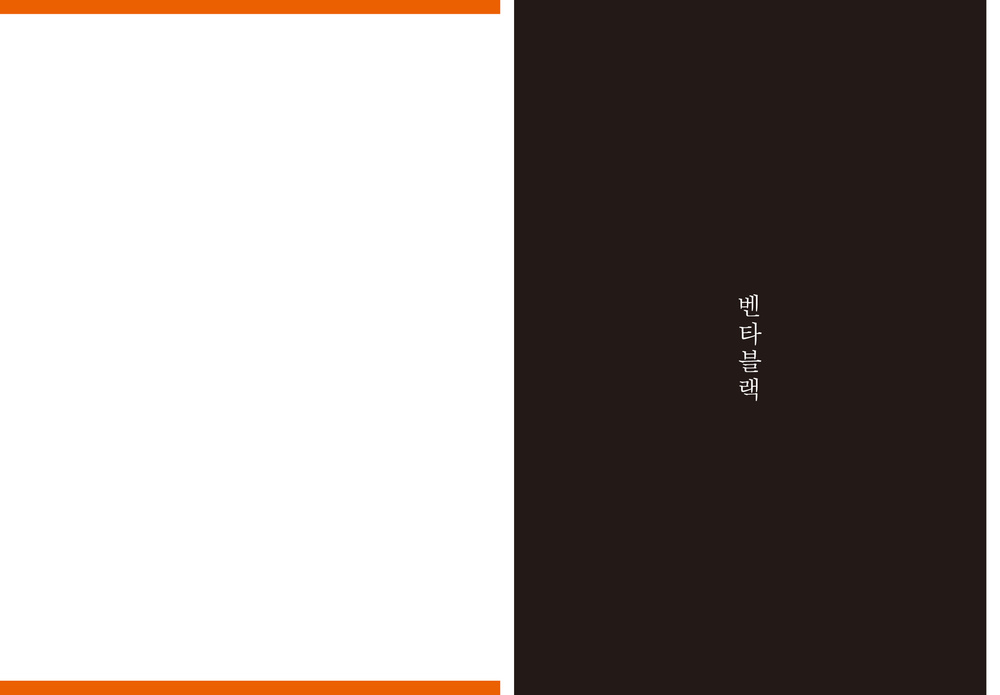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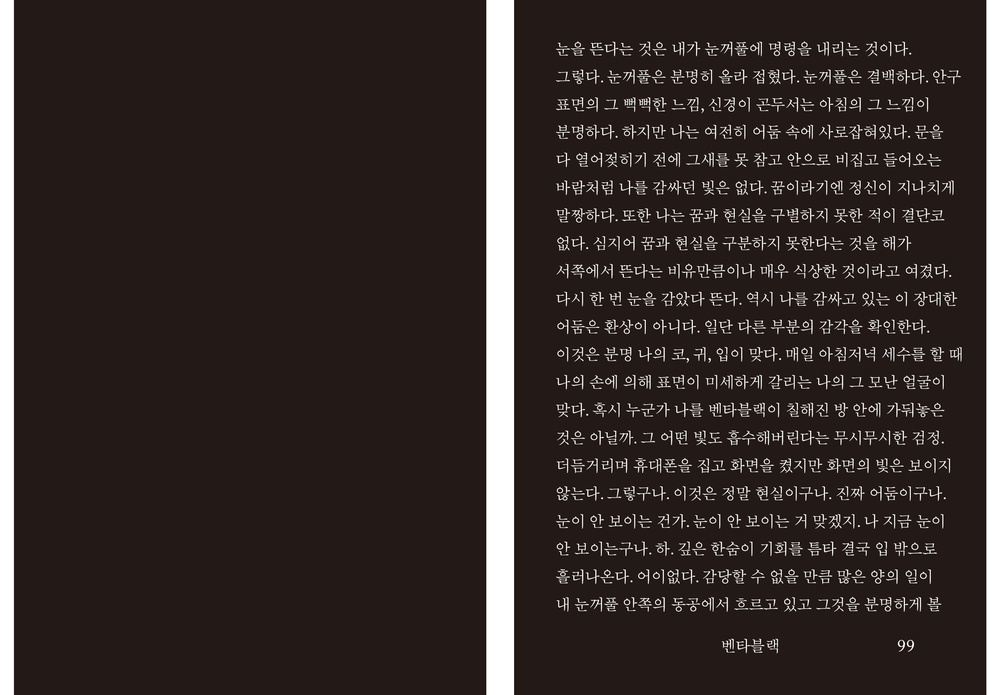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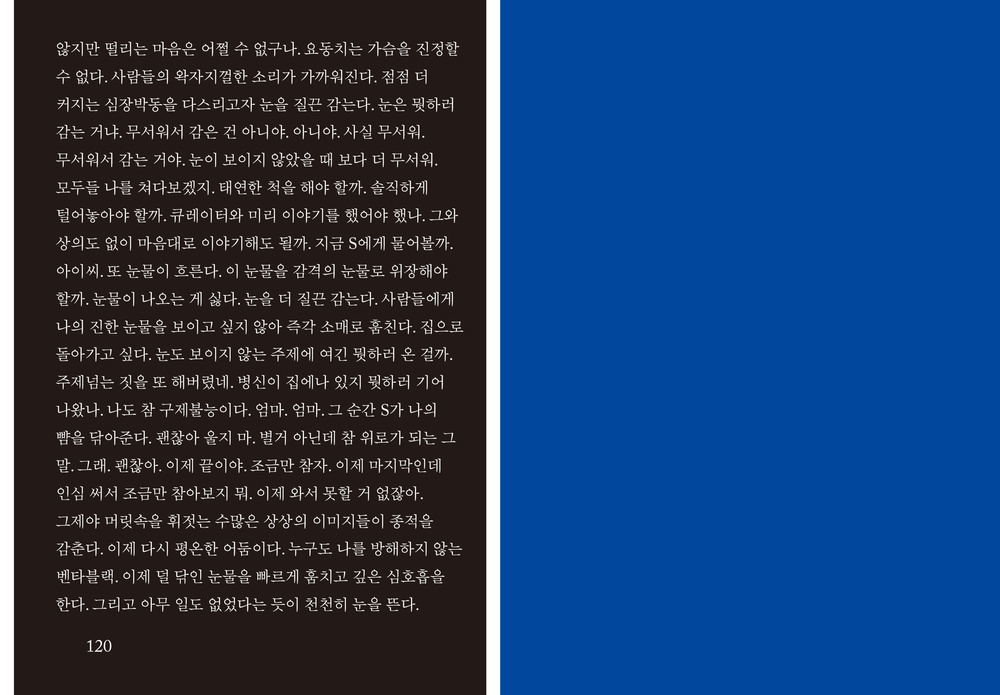
↧
↧
개별꽃 False Starwort
개별꽃 False Starwort![]() 구정연, 김뉘연, 박가희, 신해옥, 이미지, 린다 판 되르선 지음
110×180mm, 152쪽, 사철 소프트커버, 2020년 11월 6일, 17,000원
ISBN 979-11-90434-10-2 93600
디자인: 신동혁
언어: 한국어, 영어
《Gathering Flowers》는 디자이너 신해옥의 관심과 태도가 디자인의 방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양한 협업자들과 함께 담은 프로젝트다. ‘(신중하게) 꽃을 모으듯’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필자의 다양한 글을 선별하여 한데 묶은 출판물, 선집의 어원인 ‘anthologia’에서 빌려온 프로젝트의 제목은 디자이너를 작업자이자 저자로서 바라보는 프로젝트의 접근과 태도를 은유한다. 디자이너는 작업자로서 사물과 현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수집하며, 이를 시각언어로 잇고 배치하는 편집 과정을 따라 구조를 짓는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 사고를 가진 저자로서 시각물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경험을 생산해 내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의 이러한 수행적 실천에 주목한다.
프로젝트는 디자이너 신해옥이 수집한 말, 생각, 이미지를 담은 글과 이미지 뭉치 「개별꽃」을 씨앗 삼아, 이를 해석하는 협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형되고, 상이한 생각과 구조를 교차하면서 전개된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수집된 말과 생각을 신체와 공간이라는 다른 매체로 전환하는 매개자라기보다는, 「개별꽃」을 해석하여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드는, ‘꽃을 모으는’ 생산자가 된다.
동명의 출판물 『개별꽃』은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었던 신해옥의 「개별꽃」을 비롯하여 이를 건네어 받은 협업자들의 생각과 언어가 틔워낸 ‘꽃’을 모은 선집이다.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책의 전반부에 수록된 신해옥이 작성한 「개별꽃」은 성격이 다소 다른 세 꼭지의 글로 이뤄진다. 첫 번째 꼭지에서는 편집자이자 생산자로서 디자이너의 활동을 ‘선집’에 비유하여 앞으로 전개될 글을 소개하고, 이어서 자신의 관심사와 디자인 방법이 느슨히 또 긴밀히 연결되는 수집한 글과 이미지들을 주관적인 당위에 따라 타래처럼 펼쳐 놓는다. 마지막 꼭지는 이 과정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결과물로서 새롭게 배치되고 응집된 구조의 책을 익명 저자의 시점에서 탐험하는 픽션으로 마무리한다.
후반부에 이어지는 세 편의 글은 신해옥의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그 개념을 확장하며 디자인의 구조적, 수행적 측면 등 주요한 관점을 살핀다. 김뉘연은 신해옥의 책 작업을 열고 닫히는 순간마다 동기화되는 사물로 바라보고 이를 양손으로 펼쳐낸 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적절한 지침을 안내한다. 책에 담긴 내용이 아닌 책이 지어진 구조 자체를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각하듯 서술한다. 린다 판 되르선은 그의 디렉토리 어딘가에 저장된 세 장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이를 추적하는 듯한 글쓰기를 선보인다. 본래의 맥락에서 탈각된 개별 이미지에 길게 늘어뜨린 설명을 덧붙여서 이미지와 글이 공생하는 디자이너의 '시각적 방황'을 중계한다. 이미지와 활자가 서로 접합되어 한 줄기에서 흐르는 모양새가 신해옥의 「개별꽃」에서 보이는 편집자적 면모와 닮아있다. 구정연은 디자이너가 생산한 아티스트 북에 대한 질문으로 글을 연다. 그는 2006년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최된 《큐레이터의 사물함》과 연계하여 슬기와민이 제작한 『A REVISED INVENTORY』를 경유하여 책의 구조를 통해 특정한 읽기의 행위를 추동하는 것이야 말로 디자이너의 실천이자 디자인의 수행성이라 주장한다.
「개별꽃」에서 시작된 해석과 편집의 무한 타래는 협업자들의 언어를 따라 여러 차원을 지나 다시 책 『개별꽃』으로 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별꽃이 인쇄된 책갈피를 책 속에 끼워 독자들에게 건넨다. 책갈피를 움직이는 손을 따라 지면을 이동하며 이 타래의 구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박가희, 이미지
목차
들어가며 — 박가희, 이미지
개별꽃 — 신해옥사물의 방식 — 김뉘연
드레스 부류하기 — 린다 판 되르선
특별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 구정연
참여자들
지은이
구정연
불문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제로원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전시 큐레이터를 거쳐, 미디어버스와 더북소사이어티를 공동 운영했다. 《예술가의 문서들: 예술,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협업》(2016) 전시를 공동 기획했고, 『래디컬 뮤지엄』(현실문화, 2016)을 공역했다. MMCA 작가연구 총서 및 『국립현대미술관 연구 2019: 초국가적 미술관』, 아카이브 연구 포럼 <부재하는 아카이브: 디자인, 건축, 시각문화>(2019)를 기획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김뉘연
작가, 편집자. 〈문학적으로 걷기〉, 〈수사학: 장식과 여담〉, 〈시는 직선이다〉, 《비문: 어긋난 말들》, 〈마침〉, 《방》 등으로 문서를 발표했고, 『말하는 사람』과 『모눈 지우개』를 썼다.
린다 판 되르선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이다. 1987년부터 아르만트 메비스와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인 ‘메비스 & 판 되르선’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헤릿 리트벨트 아카데미의 그래픽 디자인과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예일대학교 예술대학 그래픽 디자인과 크리틱으로, 헤이그 왕립 예술학교의 마스터 과정인 NLN(논 리니어 내러티브)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박가희
기획자. 전시를 하나의 매체로 간주하고, ‘앎의 사건’을 촉발하는 전시의 수행적 실천에 관심이 있다.
신해옥
그래픽 디자이너. 책을 구조로 삼아 텍스트, 이미지, 페이지를 서로 교차시키며 직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관계성에 주목한다. 2014년부터 신동혁과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신신’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강의하며 본인의 관심사를 학생들과 동기화하고 있다.
이미지
시각적으로 사고하는 기획자. 디자인과 미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관계 속에서 번안되는 감각과 의미 체계에 관해 탐구한다.
책 속에서
사물로서의
책. 인쇄된 책은 사물로 존재한다. 사물로서 책이 존재하게
된 방식은 사물로서 책이 존재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책을 만드는 역할을 맡은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들게 되는 이 사물이 적절히 작동할 만한 방식을 고안해 낸다. 닫힌 책은 열리면서 작동된다. 펼쳐졌을 때, 즉 움직여졌을 때 책은 어떻게 스스로를 드러내게 되는가. 시공간에서 여러 움직임으로 변주될 잠재 가능성을 품은 책들. 이
글은 그동안 디자이너 신해옥이 협업자 신동혁과 함께 ‘신신’으로 활동하며 만들어 온 인쇄물 몇 점을 재료로 삼아 움직임을 내포하는 사물로서의 책을, 그 제작 방식과 사용 방식을 짐작하거나 가늠해 보고 구상해 보기도 하는 우회적 안내문이다. (김뉘연, 「사물의 방식」, 94페이지)
후에
여배우 앤 셰리든으로 명성을 얻게 된 클라라-루 셰리든은 사진 속에서 마치 인쇄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드레스는
두 개의 다른 포스터를 한 장으로 완성하여 이루어져 있다. 스커트는 밝은 주황색과 파란색의 세로형 포스터로, 소매는 보라색과 빨간색의 가로형 포스터의 일부를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이
포스터들은 배급사가 영화 홍보를 위해 제작한 수많은 아이템들 중 두 가지 항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상의는 포스터의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 보이지만, 아마도 빌보드 같은 대형 광고를
위해 제작된 인쇄물일 것이다. 당시 대형 가로 광고판을 채우려면 용지가 총 24장 필요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00년에 빌보드 구조에 붙게 되는 대형 광고가 표준화되었고, 정밀한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는 오프셋 인쇄가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광고 캠페인에 붐이 일었다. 나는 미국의 사진작가 워커
에반스의 1936년 작품인 〈애틀랜타의 집과 빌보드들〉을 떠올린다. 에반스의
사진 한가운데에 캐럴 롬바드가 출연한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또 다른 영화 〈러브 비포 브랙퍼스트〉를 홍보하는 빌보드가 보인다. (린다 판 되르선, 「드레스 분류하기」, 110페이지)
아티스트
북은 통상적인 관점에서 예술가 개인이 만드는 책으로 소개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술가 개인이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아티스트 북을 특정 개인의 작업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뭔가
불공정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 협업이든, 의뢰든 복수의 저자가
존재하는 아티스트 북에서 디자이너의 주권은 어떻게 획득될까. 2000년대 중반 한국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전시라는 외부 환경 및 예술가와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시도하며 아티스트 북을 디자인 실천을 확장하는 동시대적 매체이자 방법론으로 삼았다. 어느 때보다 종이 인쇄물은 다량 생산되었고, 미술기관은 특정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기관 고유의 시각 언어를, 또 개별 작가들은 아티스트 북을 생산해갔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마주하는 풍경은 전통적인 책의 구조와 제작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도대체 디자이너가 만든 아티스트 북은 무엇인가. (구정연, 「특정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122페이지)
구정연, 김뉘연, 박가희, 신해옥, 이미지, 린다 판 되르선 지음
110×180mm, 152쪽, 사철 소프트커버, 2020년 11월 6일, 17,000원
ISBN 979-11-90434-10-2 93600
디자인: 신동혁
언어: 한국어, 영어
《Gathering Flowers》는 디자이너 신해옥의 관심과 태도가 디자인의 방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양한 협업자들과 함께 담은 프로젝트다. ‘(신중하게) 꽃을 모으듯’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필자의 다양한 글을 선별하여 한데 묶은 출판물, 선집의 어원인 ‘anthologia’에서 빌려온 프로젝트의 제목은 디자이너를 작업자이자 저자로서 바라보는 프로젝트의 접근과 태도를 은유한다. 디자이너는 작업자로서 사물과 현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수집하며, 이를 시각언어로 잇고 배치하는 편집 과정을 따라 구조를 짓는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 사고를 가진 저자로서 시각물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경험을 생산해 내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의 이러한 수행적 실천에 주목한다.
프로젝트는 디자이너 신해옥이 수집한 말, 생각, 이미지를 담은 글과 이미지 뭉치 「개별꽃」을 씨앗 삼아, 이를 해석하는 협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형되고, 상이한 생각과 구조를 교차하면서 전개된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수집된 말과 생각을 신체와 공간이라는 다른 매체로 전환하는 매개자라기보다는, 「개별꽃」을 해석하여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드는, ‘꽃을 모으는’ 생산자가 된다.
동명의 출판물 『개별꽃』은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었던 신해옥의 「개별꽃」을 비롯하여 이를 건네어 받은 협업자들의 생각과 언어가 틔워낸 ‘꽃’을 모은 선집이다.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책의 전반부에 수록된 신해옥이 작성한 「개별꽃」은 성격이 다소 다른 세 꼭지의 글로 이뤄진다. 첫 번째 꼭지에서는 편집자이자 생산자로서 디자이너의 활동을 ‘선집’에 비유하여 앞으로 전개될 글을 소개하고, 이어서 자신의 관심사와 디자인 방법이 느슨히 또 긴밀히 연결되는 수집한 글과 이미지들을 주관적인 당위에 따라 타래처럼 펼쳐 놓는다. 마지막 꼭지는 이 과정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결과물로서 새롭게 배치되고 응집된 구조의 책을 익명 저자의 시점에서 탐험하는 픽션으로 마무리한다.
후반부에 이어지는 세 편의 글은 신해옥의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그 개념을 확장하며 디자인의 구조적, 수행적 측면 등 주요한 관점을 살핀다. 김뉘연은 신해옥의 책 작업을 열고 닫히는 순간마다 동기화되는 사물로 바라보고 이를 양손으로 펼쳐낸 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적절한 지침을 안내한다. 책에 담긴 내용이 아닌 책이 지어진 구조 자체를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각하듯 서술한다. 린다 판 되르선은 그의 디렉토리 어딘가에 저장된 세 장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이를 추적하는 듯한 글쓰기를 선보인다. 본래의 맥락에서 탈각된 개별 이미지에 길게 늘어뜨린 설명을 덧붙여서 이미지와 글이 공생하는 디자이너의 '시각적 방황'을 중계한다. 이미지와 활자가 서로 접합되어 한 줄기에서 흐르는 모양새가 신해옥의 「개별꽃」에서 보이는 편집자적 면모와 닮아있다. 구정연은 디자이너가 생산한 아티스트 북에 대한 질문으로 글을 연다. 그는 2006년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최된 《큐레이터의 사물함》과 연계하여 슬기와민이 제작한 『A REVISED INVENTORY』를 경유하여 책의 구조를 통해 특정한 읽기의 행위를 추동하는 것이야 말로 디자이너의 실천이자 디자인의 수행성이라 주장한다.
「개별꽃」에서 시작된 해석과 편집의 무한 타래는 협업자들의 언어를 따라 여러 차원을 지나 다시 책 『개별꽃』으로 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별꽃이 인쇄된 책갈피를 책 속에 끼워 독자들에게 건넨다. 책갈피를 움직이는 손을 따라 지면을 이동하며 이 타래의 구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박가희, 이미지
목차
들어가며 — 박가희, 이미지
개별꽃 — 신해옥사물의 방식 — 김뉘연
드레스 부류하기 — 린다 판 되르선
특별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 구정연
참여자들
지은이
구정연
불문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제로원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전시 큐레이터를 거쳐, 미디어버스와 더북소사이어티를 공동 운영했다. 《예술가의 문서들: 예술,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협업》(2016) 전시를 공동 기획했고, 『래디컬 뮤지엄』(현실문화, 2016)을 공역했다. MMCA 작가연구 총서 및 『국립현대미술관 연구 2019: 초국가적 미술관』, 아카이브 연구 포럼 <부재하는 아카이브: 디자인, 건축, 시각문화>(2019)를 기획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김뉘연
작가, 편집자. 〈문학적으로 걷기〉, 〈수사학: 장식과 여담〉, 〈시는 직선이다〉, 《비문: 어긋난 말들》, 〈마침〉, 《방》 등으로 문서를 발표했고, 『말하는 사람』과 『모눈 지우개』를 썼다.
린다 판 되르선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이다. 1987년부터 아르만트 메비스와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인 ‘메비스 & 판 되르선’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헤릿 리트벨트 아카데미의 그래픽 디자인과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예일대학교 예술대학 그래픽 디자인과 크리틱으로, 헤이그 왕립 예술학교의 마스터 과정인 NLN(논 리니어 내러티브)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박가희
기획자. 전시를 하나의 매체로 간주하고, ‘앎의 사건’을 촉발하는 전시의 수행적 실천에 관심이 있다.
신해옥
그래픽 디자이너. 책을 구조로 삼아 텍스트, 이미지, 페이지를 서로 교차시키며 직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관계성에 주목한다. 2014년부터 신동혁과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신신’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강의하며 본인의 관심사를 학생들과 동기화하고 있다.
이미지
시각적으로 사고하는 기획자. 디자인과 미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관계 속에서 번안되는 감각과 의미 체계에 관해 탐구한다.
책 속에서
사물로서의
책. 인쇄된 책은 사물로 존재한다. 사물로서 책이 존재하게
된 방식은 사물로서 책이 존재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책을 만드는 역할을 맡은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들게 되는 이 사물이 적절히 작동할 만한 방식을 고안해 낸다. 닫힌 책은 열리면서 작동된다. 펼쳐졌을 때, 즉 움직여졌을 때 책은 어떻게 스스로를 드러내게 되는가. 시공간에서 여러 움직임으로 변주될 잠재 가능성을 품은 책들. 이
글은 그동안 디자이너 신해옥이 협업자 신동혁과 함께 ‘신신’으로 활동하며 만들어 온 인쇄물 몇 점을 재료로 삼아 움직임을 내포하는 사물로서의 책을, 그 제작 방식과 사용 방식을 짐작하거나 가늠해 보고 구상해 보기도 하는 우회적 안내문이다. (김뉘연, 「사물의 방식」, 94페이지)
후에
여배우 앤 셰리든으로 명성을 얻게 된 클라라-루 셰리든은 사진 속에서 마치 인쇄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드레스는
두 개의 다른 포스터를 한 장으로 완성하여 이루어져 있다. 스커트는 밝은 주황색과 파란색의 세로형 포스터로, 소매는 보라색과 빨간색의 가로형 포스터의 일부를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이
포스터들은 배급사가 영화 홍보를 위해 제작한 수많은 아이템들 중 두 가지 항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상의는 포스터의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 보이지만, 아마도 빌보드 같은 대형 광고를
위해 제작된 인쇄물일 것이다. 당시 대형 가로 광고판을 채우려면 용지가 총 24장 필요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00년에 빌보드 구조에 붙게 되는 대형 광고가 표준화되었고, 정밀한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는 오프셋 인쇄가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광고 캠페인에 붐이 일었다. 나는 미국의 사진작가 워커
에반스의 1936년 작품인 〈애틀랜타의 집과 빌보드들〉을 떠올린다. 에반스의
사진 한가운데에 캐럴 롬바드가 출연한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또 다른 영화 〈러브 비포 브랙퍼스트〉를 홍보하는 빌보드가 보인다. (린다 판 되르선, 「드레스 분류하기」, 110페이지)
아티스트
북은 통상적인 관점에서 예술가 개인이 만드는 책으로 소개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술가 개인이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아티스트 북을 특정 개인의 작업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뭔가
불공정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 협업이든, 의뢰든 복수의 저자가
존재하는 아티스트 북에서 디자이너의 주권은 어떻게 획득될까. 2000년대 중반 한국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전시라는 외부 환경 및 예술가와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시도하며 아티스트 북을 디자인 실천을 확장하는 동시대적 매체이자 방법론으로 삼았다. 어느 때보다 종이 인쇄물은 다량 생산되었고, 미술기관은 특정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기관 고유의 시각 언어를, 또 개별 작가들은 아티스트 북을 생산해갔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마주하는 풍경은 전통적인 책의 구조와 제작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도대체 디자이너가 만든 아티스트 북은 무엇인가. (구정연, 「특정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122페이지)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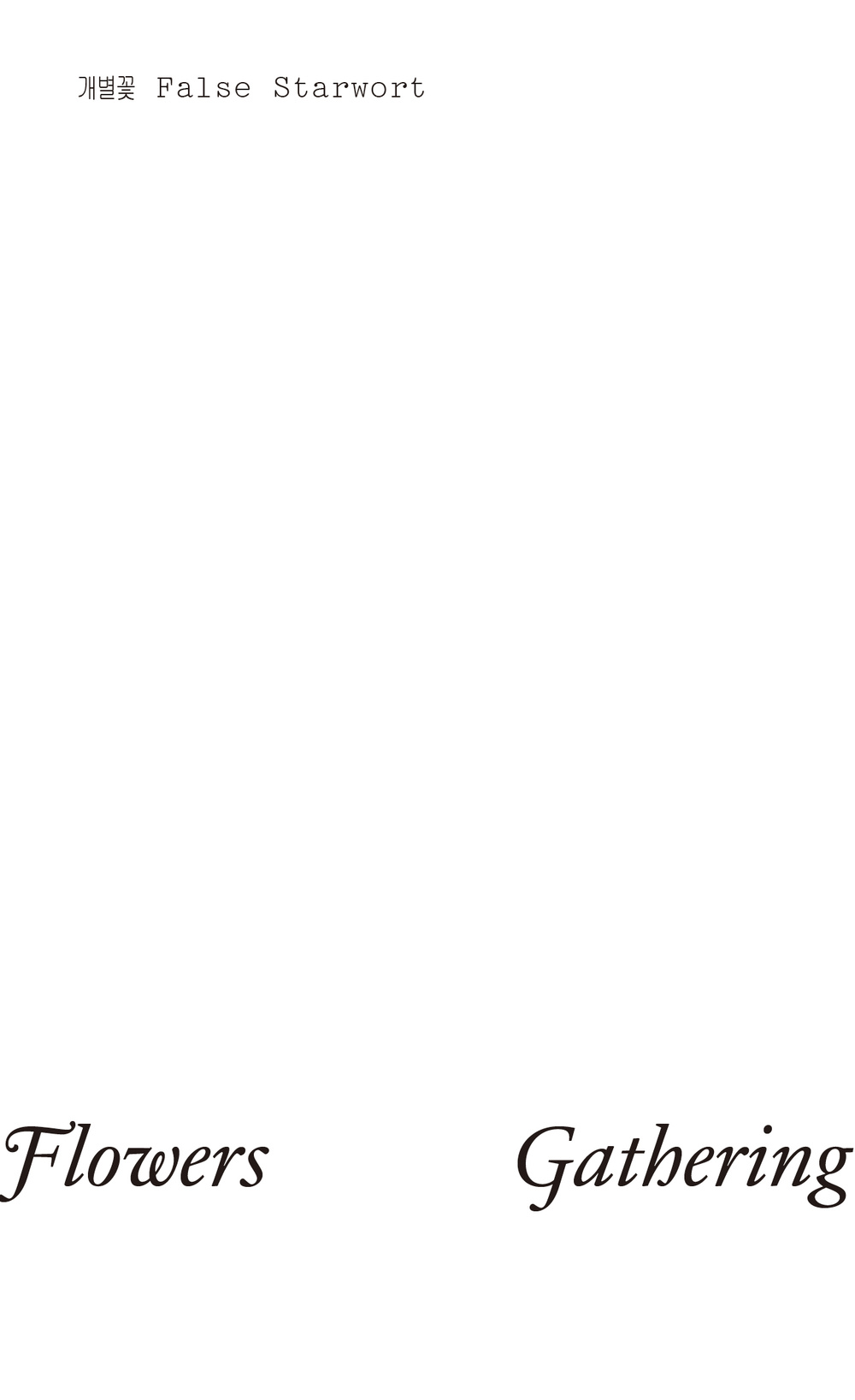 구정연, 김뉘연, 박가희, 신해옥, 이미지, 린다 판 되르선 지음
110×180mm, 152쪽, 사철 소프트커버, 2020년 11월 6일, 17,000원
ISBN 979-11-90434-10-2 93600
디자인: 신동혁
언어: 한국어, 영어
《Gathering Flowers》는 디자이너 신해옥의 관심과 태도가 디자인의 방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양한 협업자들과 함께 담은 프로젝트다. ‘(신중하게) 꽃을 모으듯’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필자의 다양한 글을 선별하여 한데 묶은 출판물, 선집의 어원인 ‘anthologia’에서 빌려온 프로젝트의 제목은 디자이너를 작업자이자 저자로서 바라보는 프로젝트의 접근과 태도를 은유한다. 디자이너는 작업자로서 사물과 현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수집하며, 이를 시각언어로 잇고 배치하는 편집 과정을 따라 구조를 짓는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 사고를 가진 저자로서 시각물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경험을 생산해 내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의 이러한 수행적 실천에 주목한다.
프로젝트는 디자이너 신해옥이 수집한 말, 생각, 이미지를 담은 글과 이미지 뭉치 「개별꽃」을 씨앗 삼아, 이를 해석하는 협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형되고, 상이한 생각과 구조를 교차하면서 전개된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수집된 말과 생각을 신체와 공간이라는 다른 매체로 전환하는 매개자라기보다는, 「개별꽃」을 해석하여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드는, ‘꽃을 모으는’ 생산자가 된다.
동명의 출판물 『개별꽃』은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었던 신해옥의 「개별꽃」을 비롯하여 이를 건네어 받은 협업자들의 생각과 언어가 틔워낸 ‘꽃’을 모은 선집이다.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책의 전반부에 수록된 신해옥이 작성한 「개별꽃」은 성격이 다소 다른 세 꼭지의 글로 이뤄진다. 첫 번째 꼭지에서는 편집자이자 생산자로서 디자이너의 활동을 ‘선집’에 비유하여 앞으로 전개될 글을 소개하고, 이어서 자신의 관심사와 디자인 방법이 느슨히 또 긴밀히 연결되는 수집한 글과 이미지들을 주관적인 당위에 따라 타래처럼 펼쳐 놓는다. 마지막 꼭지는 이 과정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결과물로서 새롭게 배치되고 응집된 구조의 책을 익명 저자의 시점에서 탐험하는 픽션으로 마무리한다.
후반부에 이어지는 세 편의 글은 신해옥의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그 개념을 확장하며 디자인의 구조적, 수행적 측면 등 주요한 관점을 살핀다. 김뉘연은 신해옥의 책 작업을 열고 닫히는 순간마다 동기화되는 사물로 바라보고 이를 양손으로 펼쳐낸 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적절한 지침을 안내한다. 책에 담긴 내용이 아닌 책이 지어진 구조 자체를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각하듯 서술한다. 린다 판 되르선은 그의 디렉토리 어딘가에 저장된 세 장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이를 추적하는 듯한 글쓰기를 선보인다. 본래의 맥락에서 탈각된 개별 이미지에 길게 늘어뜨린 설명을 덧붙여서 이미지와 글이 공생하는 디자이너의 '시각적 방황'을 중계한다. 이미지와 활자가 서로 접합되어 한 줄기에서 흐르는 모양새가 신해옥의 「개별꽃」에서 보이는 편집자적 면모와 닮아있다. 구정연은 디자이너가 생산한 아티스트 북에 대한 질문으로 글을 연다. 그는 2006년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최된 《큐레이터의 사물함》과 연계하여 슬기와민이 제작한 『A REVISED INVENTORY』를 경유하여 책의 구조를 통해 특정한 읽기의 행위를 추동하는 것이야 말로 디자이너의 실천이자 디자인의 수행성이라 주장한다.
「개별꽃」에서 시작된 해석과 편집의 무한 타래는 협업자들의 언어를 따라 여러 차원을 지나 다시 책 『개별꽃』으로 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별꽃이 인쇄된 책갈피를 책 속에 끼워 독자들에게 건넨다. 책갈피를 움직이는 손을 따라 지면을 이동하며 이 타래의 구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박가희, 이미지
목차
들어가며 — 박가희, 이미지
개별꽃 — 신해옥사물의 방식 — 김뉘연
드레스 부류하기 — 린다 판 되르선
특별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 구정연
참여자들
지은이
구정연
불문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제로원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전시 큐레이터를 거쳐, 미디어버스와 더북소사이어티를 공동 운영했다. 《예술가의 문서들: 예술,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협업》(2016) 전시를 공동 기획했고, 『래디컬 뮤지엄』(현실문화, 2016)을 공역했다. MMCA 작가연구 총서 및 『국립현대미술관 연구 2019: 초국가적 미술관』, 아카이브 연구 포럼 <부재하는 아카이브: 디자인, 건축, 시각문화>(2019)를 기획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김뉘연
작가, 편집자. 〈문학적으로 걷기〉, 〈수사학: 장식과 여담〉, 〈시는 직선이다〉, 《비문: 어긋난 말들》, 〈마침〉, 《방》 등으로 문서를 발표했고, 『말하는 사람』과 『모눈 지우개』를 썼다.
린다 판 되르선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이다. 1987년부터 아르만트 메비스와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인 ‘메비스 & 판 되르선’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헤릿 리트벨트 아카데미의 그래픽 디자인과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예일대학교 예술대학 그래픽 디자인과 크리틱으로, 헤이그 왕립 예술학교의 마스터 과정인 NLN(논 리니어 내러티브)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박가희
기획자. 전시를 하나의 매체로 간주하고, ‘앎의 사건’을 촉발하는 전시의 수행적 실천에 관심이 있다.
신해옥
그래픽 디자이너. 책을 구조로 삼아 텍스트, 이미지, 페이지를 서로 교차시키며 직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관계성에 주목한다. 2014년부터 신동혁과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신신’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강의하며 본인의 관심사를 학생들과 동기화하고 있다.
이미지
시각적으로 사고하는 기획자. 디자인과 미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관계 속에서 번안되는 감각과 의미 체계에 관해 탐구한다.
책 속에서
사물로서의
책. 인쇄된 책은 사물로 존재한다. 사물로서 책이 존재하게
된 방식은 사물로서 책이 존재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책을 만드는 역할을 맡은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들게 되는 이 사물이 적절히 작동할 만한 방식을 고안해 낸다. 닫힌 책은 열리면서 작동된다. 펼쳐졌을 때, 즉 움직여졌을 때 책은 어떻게 스스로를 드러내게 되는가. 시공간에서 여러 움직임으로 변주될 잠재 가능성을 품은 책들. 이
글은 그동안 디자이너 신해옥이 협업자 신동혁과 함께 ‘신신’으로 활동하며 만들어 온 인쇄물 몇 점을 재료로 삼아 움직임을 내포하는 사물로서의 책을, 그 제작 방식과 사용 방식을 짐작하거나 가늠해 보고 구상해 보기도 하는 우회적 안내문이다. (김뉘연, 「사물의 방식」, 94페이지)
후에
여배우 앤 셰리든으로 명성을 얻게 된 클라라-루 셰리든은 사진 속에서 마치 인쇄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드레스는
두 개의 다른 포스터를 한 장으로 완성하여 이루어져 있다. 스커트는 밝은 주황색과 파란색의 세로형 포스터로, 소매는 보라색과 빨간색의 가로형 포스터의 일부를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이
포스터들은 배급사가 영화 홍보를 위해 제작한 수많은 아이템들 중 두 가지 항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상의는 포스터의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 보이지만, 아마도 빌보드 같은 대형 광고를
위해 제작된 인쇄물일 것이다. 당시 대형 가로 광고판을 채우려면 용지가 총 24장 필요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00년에 빌보드 구조에 붙게 되는 대형 광고가 표준화되었고, 정밀한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는 오프셋 인쇄가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광고 캠페인에 붐이 일었다. 나는 미국의 사진작가 워커
에반스의 1936년 작품인 〈애틀랜타의 집과 빌보드들〉을 떠올린다. 에반스의
사진 한가운데에 캐럴 롬바드가 출연한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또 다른 영화 〈러브 비포 브랙퍼스트〉를 홍보하는 빌보드가 보인다. (린다 판 되르선, 「드레스 분류하기」, 110페이지)
아티스트
북은 통상적인 관점에서 예술가 개인이 만드는 책으로 소개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술가 개인이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아티스트 북을 특정 개인의 작업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뭔가
불공정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 협업이든, 의뢰든 복수의 저자가
존재하는 아티스트 북에서 디자이너의 주권은 어떻게 획득될까. 2000년대 중반 한국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전시라는 외부 환경 및 예술가와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시도하며 아티스트 북을 디자인 실천을 확장하는 동시대적 매체이자 방법론으로 삼았다. 어느 때보다 종이 인쇄물은 다량 생산되었고, 미술기관은 특정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기관 고유의 시각 언어를, 또 개별 작가들은 아티스트 북을 생산해갔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마주하는 풍경은 전통적인 책의 구조와 제작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도대체 디자이너가 만든 아티스트 북은 무엇인가. (구정연, 「특정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122페이지)
구정연, 김뉘연, 박가희, 신해옥, 이미지, 린다 판 되르선 지음
110×180mm, 152쪽, 사철 소프트커버, 2020년 11월 6일, 17,000원
ISBN 979-11-90434-10-2 93600
디자인: 신동혁
언어: 한국어, 영어
《Gathering Flowers》는 디자이너 신해옥의 관심과 태도가 디자인의 방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양한 협업자들과 함께 담은 프로젝트다. ‘(신중하게) 꽃을 모으듯’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필자의 다양한 글을 선별하여 한데 묶은 출판물, 선집의 어원인 ‘anthologia’에서 빌려온 프로젝트의 제목은 디자이너를 작업자이자 저자로서 바라보는 프로젝트의 접근과 태도를 은유한다. 디자이너는 작업자로서 사물과 현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수집하며, 이를 시각언어로 잇고 배치하는 편집 과정을 따라 구조를 짓는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 사고를 가진 저자로서 시각물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경험을 생산해 내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의 이러한 수행적 실천에 주목한다.
프로젝트는 디자이너 신해옥이 수집한 말, 생각, 이미지를 담은 글과 이미지 뭉치 「개별꽃」을 씨앗 삼아, 이를 해석하는 협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형되고, 상이한 생각과 구조를 교차하면서 전개된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수집된 말과 생각을 신체와 공간이라는 다른 매체로 전환하는 매개자라기보다는, 「개별꽃」을 해석하여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드는, ‘꽃을 모으는’ 생산자가 된다.
동명의 출판물 『개별꽃』은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었던 신해옥의 「개별꽃」을 비롯하여 이를 건네어 받은 협업자들의 생각과 언어가 틔워낸 ‘꽃’을 모은 선집이다.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책의 전반부에 수록된 신해옥이 작성한 「개별꽃」은 성격이 다소 다른 세 꼭지의 글로 이뤄진다. 첫 번째 꼭지에서는 편집자이자 생산자로서 디자이너의 활동을 ‘선집’에 비유하여 앞으로 전개될 글을 소개하고, 이어서 자신의 관심사와 디자인 방법이 느슨히 또 긴밀히 연결되는 수집한 글과 이미지들을 주관적인 당위에 따라 타래처럼 펼쳐 놓는다. 마지막 꼭지는 이 과정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결과물로서 새롭게 배치되고 응집된 구조의 책을 익명 저자의 시점에서 탐험하는 픽션으로 마무리한다.
후반부에 이어지는 세 편의 글은 신해옥의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그 개념을 확장하며 디자인의 구조적, 수행적 측면 등 주요한 관점을 살핀다. 김뉘연은 신해옥의 책 작업을 열고 닫히는 순간마다 동기화되는 사물로 바라보고 이를 양손으로 펼쳐낸 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적절한 지침을 안내한다. 책에 담긴 내용이 아닌 책이 지어진 구조 자체를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각하듯 서술한다. 린다 판 되르선은 그의 디렉토리 어딘가에 저장된 세 장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이를 추적하는 듯한 글쓰기를 선보인다. 본래의 맥락에서 탈각된 개별 이미지에 길게 늘어뜨린 설명을 덧붙여서 이미지와 글이 공생하는 디자이너의 '시각적 방황'을 중계한다. 이미지와 활자가 서로 접합되어 한 줄기에서 흐르는 모양새가 신해옥의 「개별꽃」에서 보이는 편집자적 면모와 닮아있다. 구정연은 디자이너가 생산한 아티스트 북에 대한 질문으로 글을 연다. 그는 2006년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최된 《큐레이터의 사물함》과 연계하여 슬기와민이 제작한 『A REVISED INVENTORY』를 경유하여 책의 구조를 통해 특정한 읽기의 행위를 추동하는 것이야 말로 디자이너의 실천이자 디자인의 수행성이라 주장한다.
「개별꽃」에서 시작된 해석과 편집의 무한 타래는 협업자들의 언어를 따라 여러 차원을 지나 다시 책 『개별꽃』으로 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별꽃이 인쇄된 책갈피를 책 속에 끼워 독자들에게 건넨다. 책갈피를 움직이는 손을 따라 지면을 이동하며 이 타래의 구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박가희, 이미지
목차
들어가며 — 박가희, 이미지
개별꽃 — 신해옥사물의 방식 — 김뉘연
드레스 부류하기 — 린다 판 되르선
특별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 구정연
참여자들
지은이
구정연
불문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제로원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전시 큐레이터를 거쳐, 미디어버스와 더북소사이어티를 공동 운영했다. 《예술가의 문서들: 예술,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협업》(2016) 전시를 공동 기획했고, 『래디컬 뮤지엄』(현실문화, 2016)을 공역했다. MMCA 작가연구 총서 및 『국립현대미술관 연구 2019: 초국가적 미술관』, 아카이브 연구 포럼 <부재하는 아카이브: 디자인, 건축, 시각문화>(2019)를 기획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김뉘연
작가, 편집자. 〈문학적으로 걷기〉, 〈수사학: 장식과 여담〉, 〈시는 직선이다〉, 《비문: 어긋난 말들》, 〈마침〉, 《방》 등으로 문서를 발표했고, 『말하는 사람』과 『모눈 지우개』를 썼다.
린다 판 되르선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이다. 1987년부터 아르만트 메비스와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인 ‘메비스 & 판 되르선’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헤릿 리트벨트 아카데미의 그래픽 디자인과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예일대학교 예술대학 그래픽 디자인과 크리틱으로, 헤이그 왕립 예술학교의 마스터 과정인 NLN(논 리니어 내러티브)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박가희
기획자. 전시를 하나의 매체로 간주하고, ‘앎의 사건’을 촉발하는 전시의 수행적 실천에 관심이 있다.
신해옥
그래픽 디자이너. 책을 구조로 삼아 텍스트, 이미지, 페이지를 서로 교차시키며 직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관계성에 주목한다. 2014년부터 신동혁과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신신’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강의하며 본인의 관심사를 학생들과 동기화하고 있다.
이미지
시각적으로 사고하는 기획자. 디자인과 미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관계 속에서 번안되는 감각과 의미 체계에 관해 탐구한다.
책 속에서
사물로서의
책. 인쇄된 책은 사물로 존재한다. 사물로서 책이 존재하게
된 방식은 사물로서 책이 존재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책을 만드는 역할을 맡은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들게 되는 이 사물이 적절히 작동할 만한 방식을 고안해 낸다. 닫힌 책은 열리면서 작동된다. 펼쳐졌을 때, 즉 움직여졌을 때 책은 어떻게 스스로를 드러내게 되는가. 시공간에서 여러 움직임으로 변주될 잠재 가능성을 품은 책들. 이
글은 그동안 디자이너 신해옥이 협업자 신동혁과 함께 ‘신신’으로 활동하며 만들어 온 인쇄물 몇 점을 재료로 삼아 움직임을 내포하는 사물로서의 책을, 그 제작 방식과 사용 방식을 짐작하거나 가늠해 보고 구상해 보기도 하는 우회적 안내문이다. (김뉘연, 「사물의 방식」, 94페이지)
후에
여배우 앤 셰리든으로 명성을 얻게 된 클라라-루 셰리든은 사진 속에서 마치 인쇄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드레스는
두 개의 다른 포스터를 한 장으로 완성하여 이루어져 있다. 스커트는 밝은 주황색과 파란색의 세로형 포스터로, 소매는 보라색과 빨간색의 가로형 포스터의 일부를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이
포스터들은 배급사가 영화 홍보를 위해 제작한 수많은 아이템들 중 두 가지 항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상의는 포스터의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 보이지만, 아마도 빌보드 같은 대형 광고를
위해 제작된 인쇄물일 것이다. 당시 대형 가로 광고판을 채우려면 용지가 총 24장 필요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00년에 빌보드 구조에 붙게 되는 대형 광고가 표준화되었고, 정밀한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는 오프셋 인쇄가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광고 캠페인에 붐이 일었다. 나는 미국의 사진작가 워커
에반스의 1936년 작품인 〈애틀랜타의 집과 빌보드들〉을 떠올린다. 에반스의
사진 한가운데에 캐럴 롬바드가 출연한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또 다른 영화 〈러브 비포 브랙퍼스트〉를 홍보하는 빌보드가 보인다. (린다 판 되르선, 「드레스 분류하기」, 110페이지)
아티스트
북은 통상적인 관점에서 예술가 개인이 만드는 책으로 소개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술가 개인이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아티스트 북을 특정 개인의 작업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뭔가
불공정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 협업이든, 의뢰든 복수의 저자가
존재하는 아티스트 북에서 디자이너의 주권은 어떻게 획득될까. 2000년대 중반 한국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전시라는 외부 환경 및 예술가와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시도하며 아티스트 북을 디자인 실천을 확장하는 동시대적 매체이자 방법론으로 삼았다. 어느 때보다 종이 인쇄물은 다량 생산되었고, 미술기관은 특정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기관 고유의 시각 언어를, 또 개별 작가들은 아티스트 북을 생산해갔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마주하는 풍경은 전통적인 책의 구조와 제작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도대체 디자이너가 만든 아티스트 북은 무엇인가. (구정연, 「특정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122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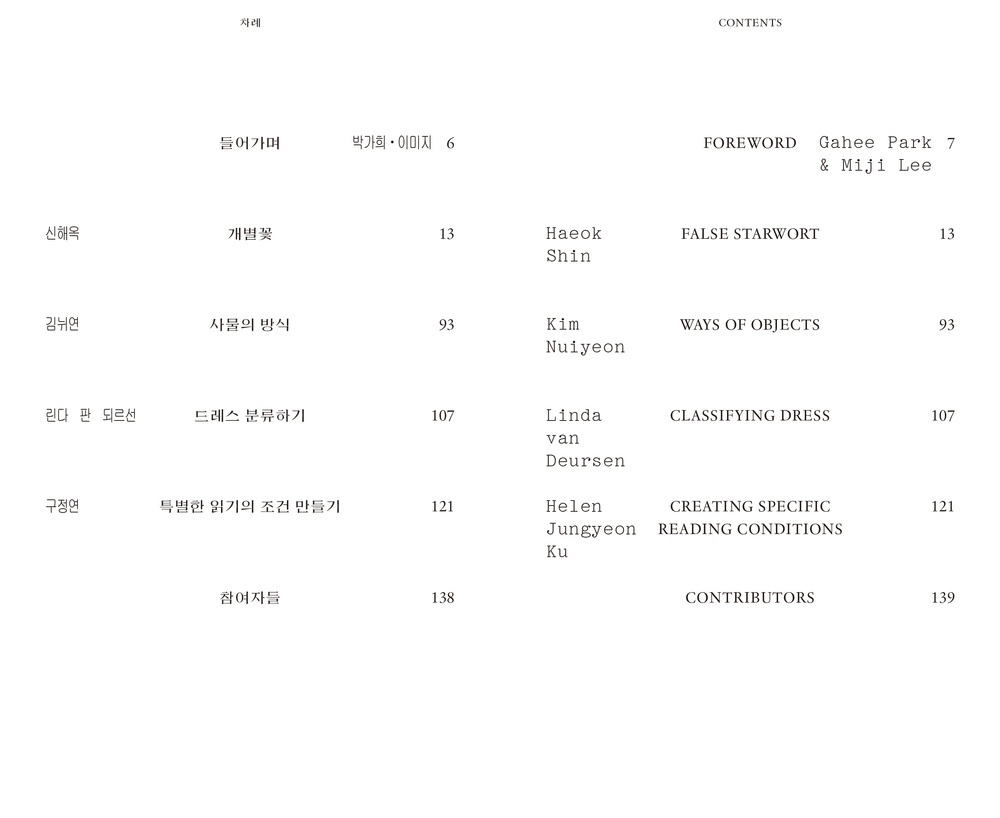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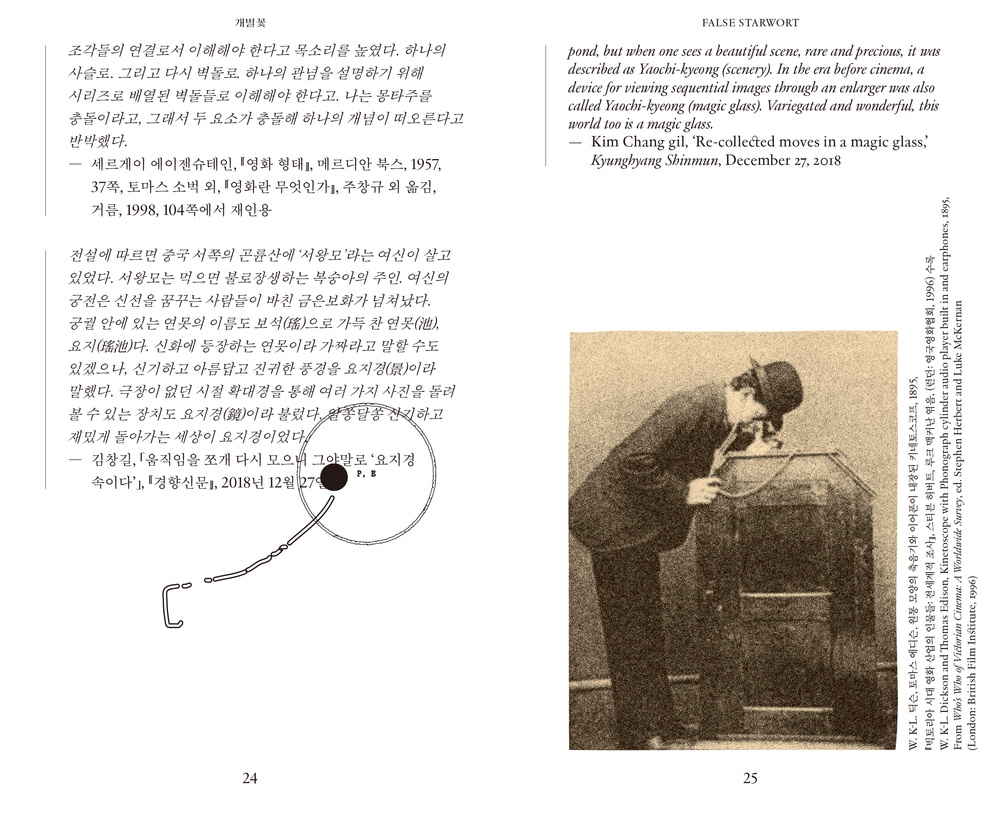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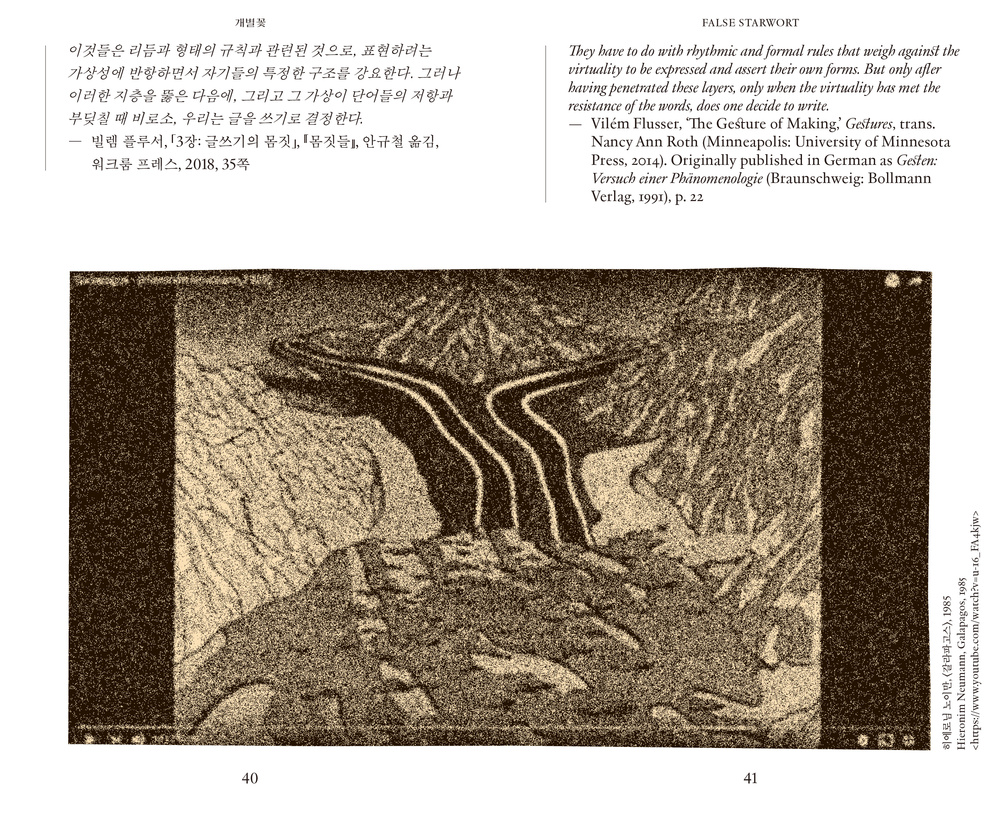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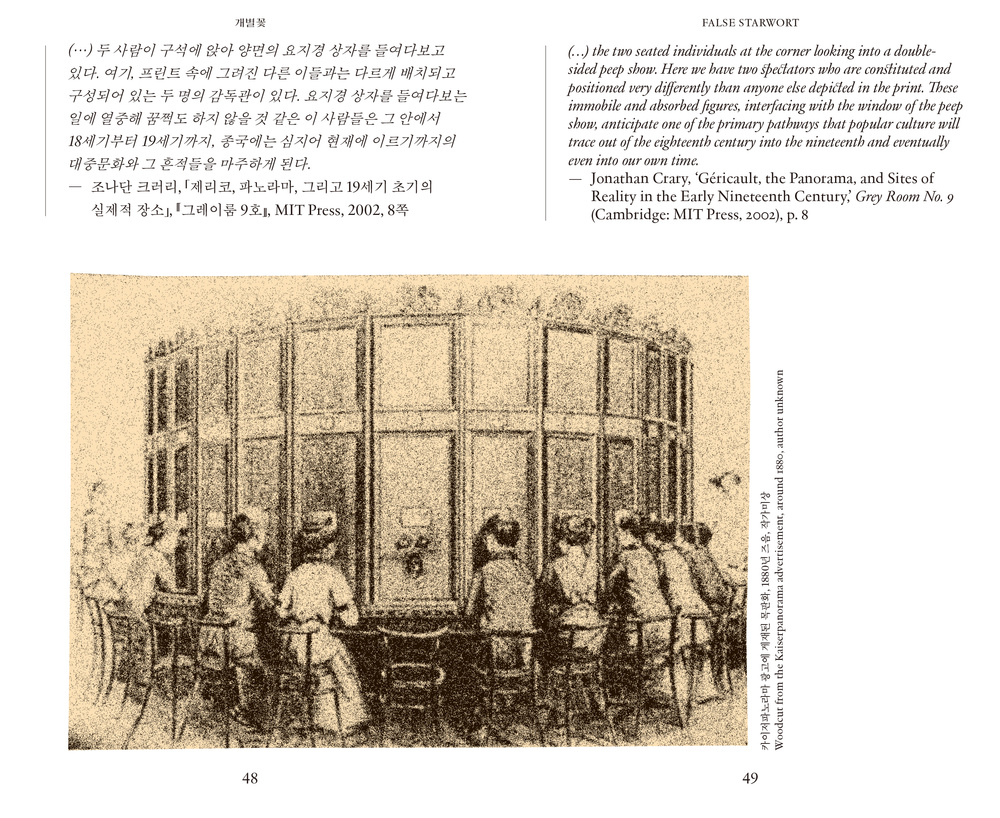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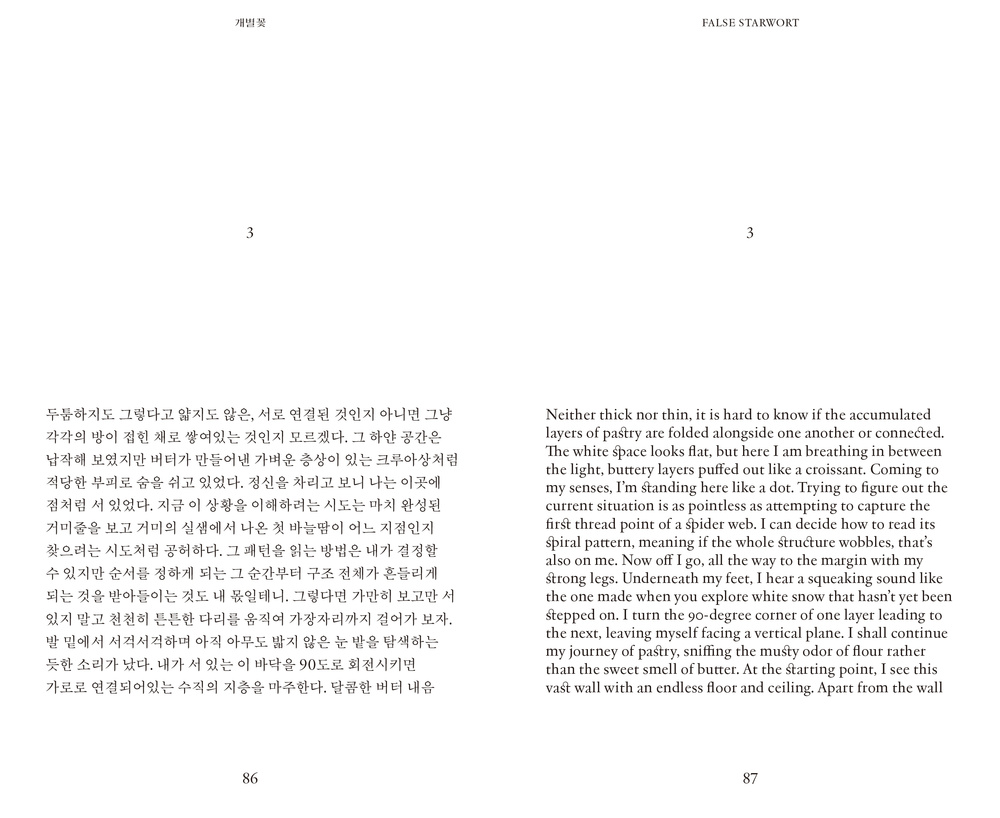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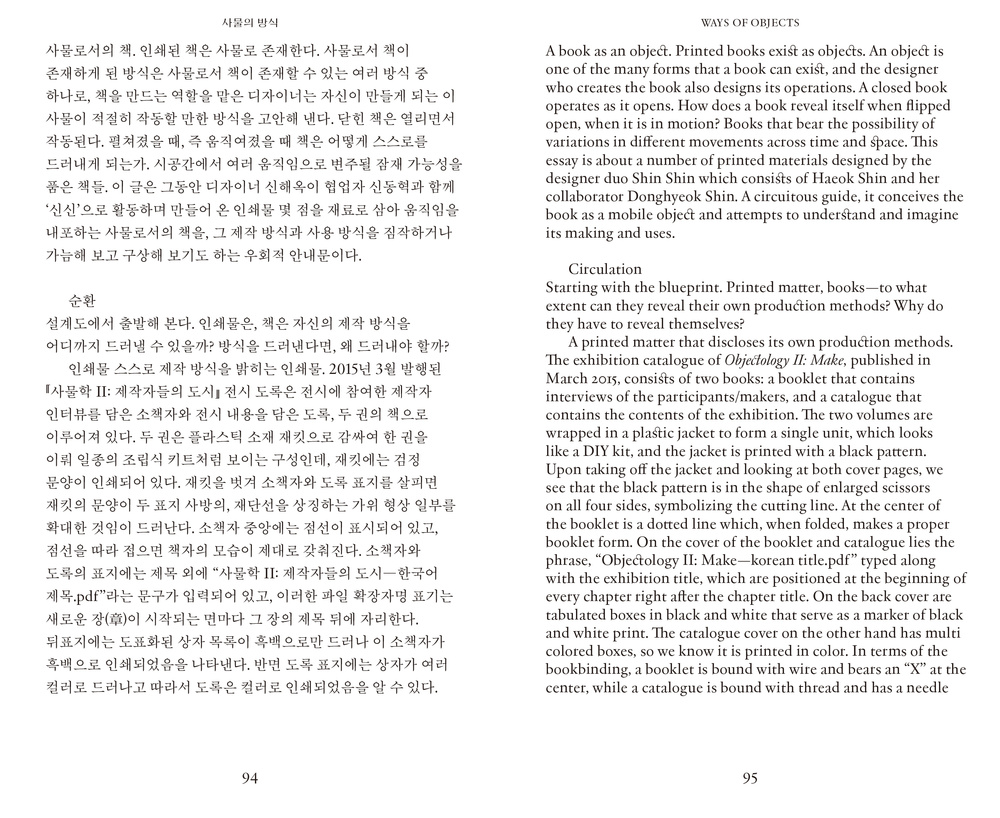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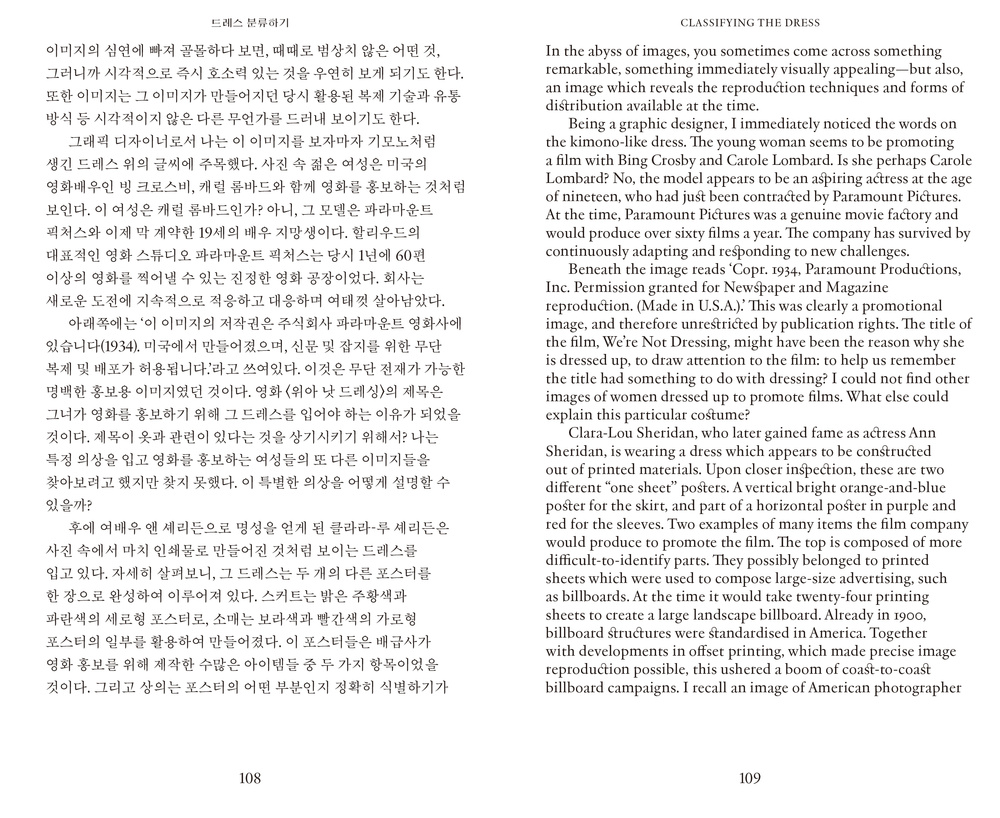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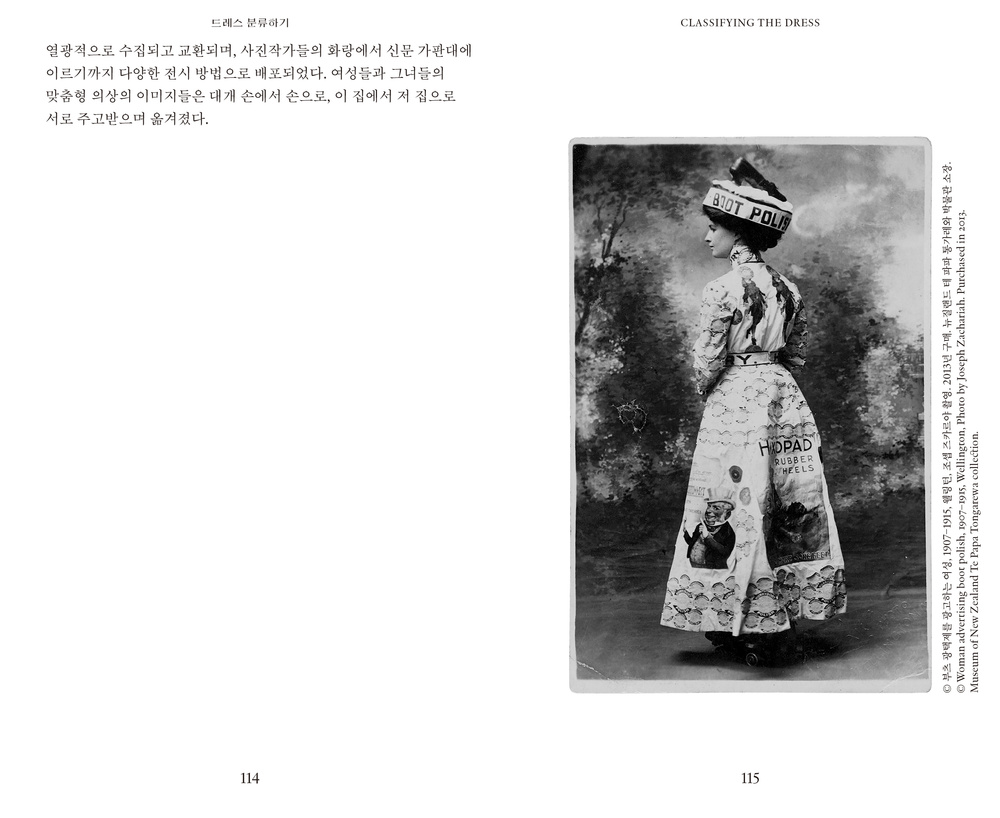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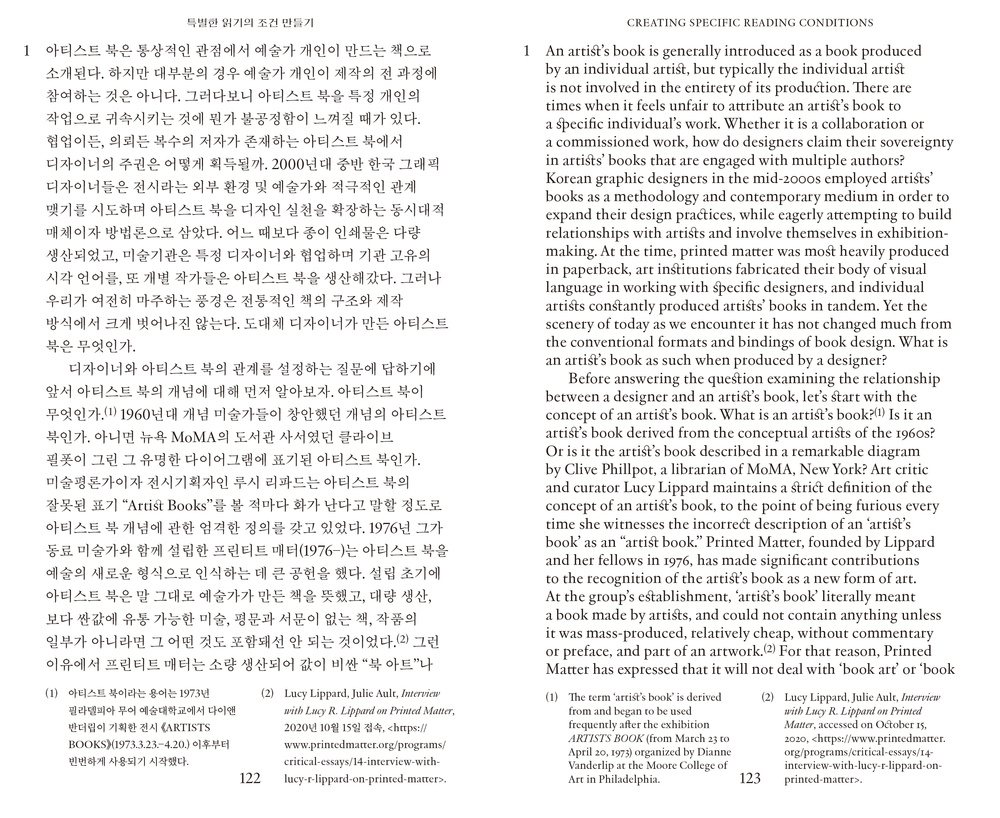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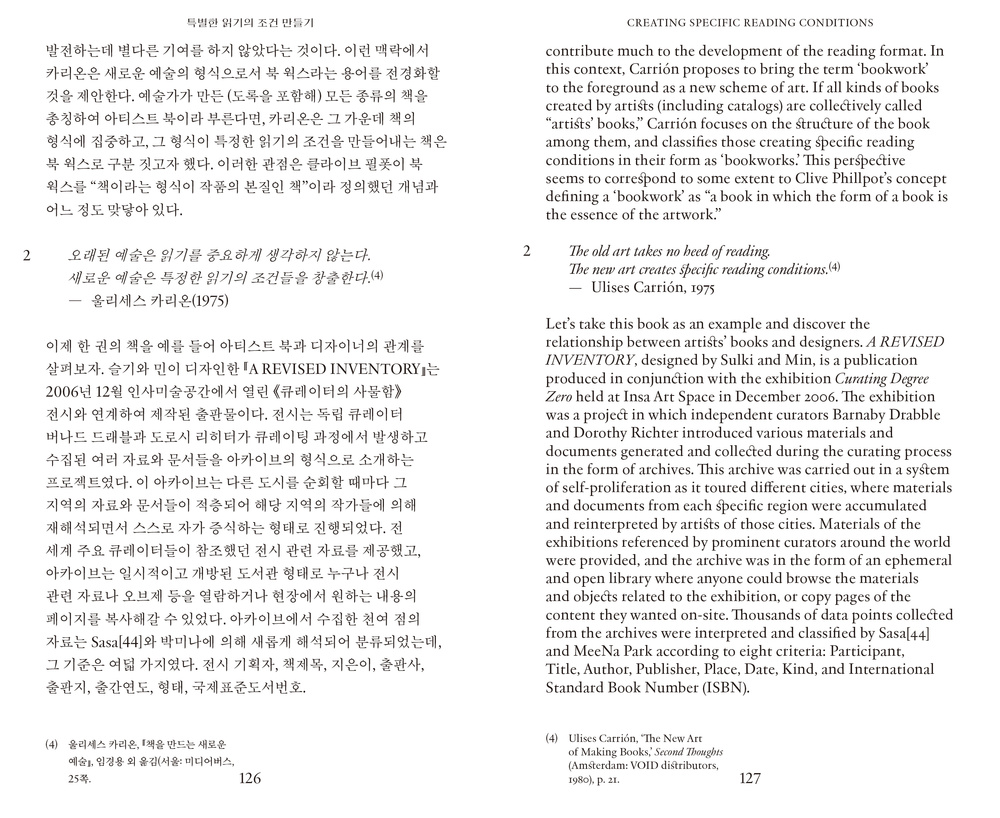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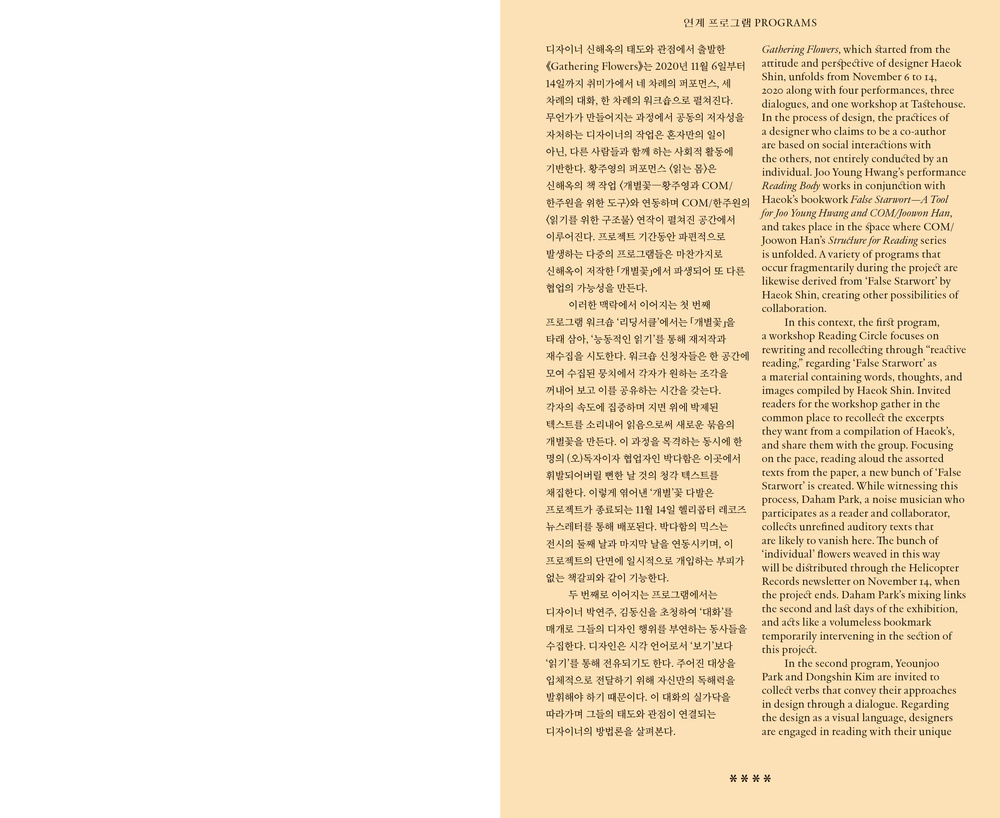

↧
K-OS
K-OS
![]()
![]() 글쓴이: 황재민, 로빈 맥케이, 최보련, 윤원화, SISU, 박준영
옮긴이: 김혜림, 강덕구
미디어버스 발행
2020년 11월 25일 발행
디자인: 신신
ISBN 979-11-90434-11-9 (90600)
100x150mm / 256 페이지
값 10,000원
책 소개
모순의
심화를 통한 모순의 극복 가능성을 모의 실험하는 가속주의의 과격한 테제는 인터넷 밈에서 펄프 이론으로, 때로는
좌파 가속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소구된다. 이 책의 제목인
K-OS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활동했던 사이버네틱스 연구집단 CCRU(Cybernetic Culture Research Unit)의
용어집에서 가져온 것이다. H.P. 러브크래프트를 비롯한 다수 SF 작가들의
세계관을 연구 대상이 아닌 방법론으로 전유한 이들의 텍스트는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와 라보리아 큐보닉스의 『제노페미니즘』 선언문에
영향을 주었다.
어느
곳에도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인식론적 탈주학으로써 가속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요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로써
주로 허구적 실천, 즉 하이퍼스티션(Hyperstition)이
지목된다. 『K-OS』에 실린 글들은 이 실천을 낙관적 펑크로, 지각의 연속 환상으로, 인간 형상에 대한 모독으로, 그리고 차별 기계의 거름망으로 번안한다. 더불어 신유물론의 테제에
입각하여 혁명의 전제 조건으로 가속성을 요청하는 정치 철학과 가속주의의 담론적 궤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사이클로노피디아』의 국내 역자 후기가
실려있다.
목차
들어가며
– 최보련
가짜
미래와 지연의 지연 또는 매일 변하는 정원의 기쁨 – 황재민
합성적
청취자 – 로빈 맥케이
막힌
도넛 삽화 – 최보련
구멍으로부터의
소용돌이, 또는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에 관한 역자 노트 – 윤원화
SISU(Systematic Irregularity Study Unit) 사용자 안내서 - SISU
신유물론가속주의의 존재론 – 박준영
저자
및 역자 소개
저자 소개
황재민
미술평론가. 옛 미디어로서의 미술에 관심이 있다. 『호버링 텍스트』(2019)의 편집에 참여했으며 한국의 젊은 회화 작가 20인을 인터뷰한
온라인 기획 《Painters by Painters ‘18》(2018)을
진행했다.
로빈
맥케이
영국
출판사 어바노믹(Urbanomic)의 대표로, 철학과 현대미술에
대해 폭넓게 집필했으며, 여러 예술가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선동했다. 또한
알랭 바디우의 『수와 수들』, 퀑탱 메이야수의 『수와 사이렌』, 프랑수아
라뤼엘의 『비사진의 개념』, 에릭 알리츠의 『뇌의 눈』과 『이미지 허물기』를 포함한 프랑스 철학의 중요한
저작을 다수 번역했다.
최보련
시각예술가. 단체전 <If not, not>(keepintouch, 2018)과 <구부러진 안팎>(탈영역 우정국, 2018)등에 참여했다. 매체연합을 통해 증폭된 정념이 고해상도의
소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관찰한다. 노뉴워크의 동료들과 『재-관람차』(2019)를 함께 썼다.
윤원화
시각문화
연구자로 주로 동시대 서울의 전시 공간에서 보이는 것들에 관해 글을 쓰고 번역한다. 건축과 영상이론을
공부하고 미술과 시각문화, 도시와 미디어의 접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 『그림 창문 거울: 미술 전시장의 사진들』(2018),
『1002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2016) 등이 있으며, 역서로 『포기한 작업으로부터』(2019), 『기록시스템 1800/1900』(2015) 등이 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에서 <부드러운 지점들>을
공동 제작했다.
SISU(Systematic Irregularity Study Unit)
2018년 █████████████████████를 목적으로 ███, ███, ███, ███ 로 결성되어 ███████████████████████████████████████████, ████████████████████████████████████████하고 있다.
박준영
수유너머 104 회원. 현대철학 연구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학부에서는 불교철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는 프랑스철학을
연구했다. 대학원 연구 과정에서는 주로 들뢰즈(Deleuze)와
리쾨르(Ricoeur)의 철학을 종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신유물론에 관심을
가지고 번역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속주의(Accelerationism)
정치철학과 육후이(Yuk Hui)의 기술철학도 연구 대상이다. 동서양 철학 개념들이 갈마들고 창발하는 철학적 사유에 대해 생각중이기도 하다.
『해석에 대하여-프로이트에 관한 시론』(공역, 인간사랑, 2013)을 번역하였고,
「들뢰즈에게서 ‘철학’과 ‘철학자’」(진보평론, 2019, 82호) 등의 논문을 썼으며, 『욕망, 고전으로 생각하다』(공저, 너머학교, 2016), 『사랑, 고전으로
생각하다』(공저, 너머학교,
2016) 등의 글을 썼다.
역자 소개
김혜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졸업. 영화평론가. 오큘로, 마테리알, 액트(ACT!) 등에
기고했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풍경과 신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비평플랫폼 콜리그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외부/내부 세계에서 이뤄지는 외재/내재적 관계를 조망하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다.
강덕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졸업. 블로거.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영화평론가로 활동했다. 가속주의, 문화비평, 아마추어리즘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비평플랫폼 콜리그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외부/내부 세계에서
이뤄지는 외재/내재적 관계를 조망하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다.
책 속에서
“통제사회는 개인주의 노동자-나르시시즘적인
자아의식을 가진 소비자의 재생산에 의존하므로, 지속적으로 재측량된 상호보완 과정인 사회적 주체화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 사회적 주체화는 인간성의 이미지를 재활용하고 재강화한다. 탈코드화된 흐름들을 다시금 상징적 질서의 레디메이드 용기(容器) 안으로 흘러 들여와, 욕망하고 소비하고 노동할 수 있는 인간들이
그곳에 존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이다.” (103페이지)
“대학 도서관과 인터넷 사이, 정치적
운동과 학술 공동체와 예술계 주변부의 느슨한 네트워크 사이, 무엇보다도 현실과 픽션 사이에서 어디에
발을 두고 어디로 머리를 향할 것인가는 미리 결정되거나 점차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이러한
정황은 가속주의가 그 이름처럼 하나의 선명한 벡터로 정렬된 것이 아니라 덩굴 식물처럼 틈새가 있는 곳마다 새로운 계열들을 형성해 나간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138페이지)
“거름망에는 목적하는 주파수와 그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값 그리고 Q 인자(Quality-Factor)라는 변수가 있으며 Q 인자는 추출하고자 하는 주파수의 근접 주파수에 가해지는 압력을 수치화 한 것이다. Q 인자가 강할수록 필요로 하는 주파수를 더 정밀하게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는
주변부를 일종의 잡음으로 취급하여 제거하는 것이며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는 방식이다.” (168페이지)
글쓴이: 황재민, 로빈 맥케이, 최보련, 윤원화, SISU, 박준영
옮긴이: 김혜림, 강덕구
미디어버스 발행
2020년 11월 25일 발행
디자인: 신신
ISBN 979-11-90434-11-9 (90600)
100x150mm / 256 페이지
값 10,000원
책 소개
모순의
심화를 통한 모순의 극복 가능성을 모의 실험하는 가속주의의 과격한 테제는 인터넷 밈에서 펄프 이론으로, 때로는
좌파 가속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소구된다. 이 책의 제목인
K-OS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활동했던 사이버네틱스 연구집단 CCRU(Cybernetic Culture Research Unit)의
용어집에서 가져온 것이다. H.P. 러브크래프트를 비롯한 다수 SF 작가들의
세계관을 연구 대상이 아닌 방법론으로 전유한 이들의 텍스트는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와 라보리아 큐보닉스의 『제노페미니즘』 선언문에
영향을 주었다.
어느
곳에도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인식론적 탈주학으로써 가속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요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로써
주로 허구적 실천, 즉 하이퍼스티션(Hyperstition)이
지목된다. 『K-OS』에 실린 글들은 이 실천을 낙관적 펑크로, 지각의 연속 환상으로, 인간 형상에 대한 모독으로, 그리고 차별 기계의 거름망으로 번안한다. 더불어 신유물론의 테제에
입각하여 혁명의 전제 조건으로 가속성을 요청하는 정치 철학과 가속주의의 담론적 궤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사이클로노피디아』의 국내 역자 후기가
실려있다.
목차
들어가며
– 최보련
가짜
미래와 지연의 지연 또는 매일 변하는 정원의 기쁨 – 황재민
합성적
청취자 – 로빈 맥케이
막힌
도넛 삽화 – 최보련
구멍으로부터의
소용돌이, 또는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에 관한 역자 노트 – 윤원화
SISU(Systematic Irregularity Study Unit) 사용자 안내서 - SISU
신유물론가속주의의 존재론 – 박준영
저자
및 역자 소개
저자 소개
황재민
미술평론가. 옛 미디어로서의 미술에 관심이 있다. 『호버링 텍스트』(2019)의 편집에 참여했으며 한국의 젊은 회화 작가 20인을 인터뷰한
온라인 기획 《Painters by Painters ‘18》(2018)을
진행했다.
로빈
맥케이
영국
출판사 어바노믹(Urbanomic)의 대표로, 철학과 현대미술에
대해 폭넓게 집필했으며, 여러 예술가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선동했다. 또한
알랭 바디우의 『수와 수들』, 퀑탱 메이야수의 『수와 사이렌』, 프랑수아
라뤼엘의 『비사진의 개념』, 에릭 알리츠의 『뇌의 눈』과 『이미지 허물기』를 포함한 프랑스 철학의 중요한
저작을 다수 번역했다.
최보련
시각예술가. 단체전 <If not, not>(keepintouch, 2018)과 <구부러진 안팎>(탈영역 우정국, 2018)등에 참여했다. 매체연합을 통해 증폭된 정념이 고해상도의
소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관찰한다. 노뉴워크의 동료들과 『재-관람차』(2019)를 함께 썼다.
윤원화
시각문화
연구자로 주로 동시대 서울의 전시 공간에서 보이는 것들에 관해 글을 쓰고 번역한다. 건축과 영상이론을
공부하고 미술과 시각문화, 도시와 미디어의 접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 『그림 창문 거울: 미술 전시장의 사진들』(2018),
『1002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2016) 등이 있으며, 역서로 『포기한 작업으로부터』(2019), 『기록시스템 1800/1900』(2015) 등이 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에서 <부드러운 지점들>을
공동 제작했다.
SISU(Systematic Irregularity Study Unit)
2018년 █████████████████████를 목적으로 ███, ███, ███, ███ 로 결성되어 ███████████████████████████████████████████, ████████████████████████████████████████하고 있다.
박준영
수유너머 104 회원. 현대철학 연구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학부에서는 불교철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는 프랑스철학을
연구했다. 대학원 연구 과정에서는 주로 들뢰즈(Deleuze)와
리쾨르(Ricoeur)의 철학을 종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신유물론에 관심을
가지고 번역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속주의(Accelerationism)
정치철학과 육후이(Yuk Hui)의 기술철학도 연구 대상이다. 동서양 철학 개념들이 갈마들고 창발하는 철학적 사유에 대해 생각중이기도 하다.
『해석에 대하여-프로이트에 관한 시론』(공역, 인간사랑, 2013)을 번역하였고,
「들뢰즈에게서 ‘철학’과 ‘철학자’」(진보평론, 2019, 82호) 등의 논문을 썼으며, 『욕망, 고전으로 생각하다』(공저, 너머학교, 2016), 『사랑, 고전으로
생각하다』(공저, 너머학교,
2016) 등의 글을 썼다.
역자 소개
김혜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졸업. 영화평론가. 오큘로, 마테리알, 액트(ACT!) 등에
기고했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풍경과 신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비평플랫폼 콜리그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외부/내부 세계에서 이뤄지는 외재/내재적 관계를 조망하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다.
강덕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졸업. 블로거.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영화평론가로 활동했다. 가속주의, 문화비평, 아마추어리즘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비평플랫폼 콜리그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외부/내부 세계에서
이뤄지는 외재/내재적 관계를 조망하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다.
책 속에서
“통제사회는 개인주의 노동자-나르시시즘적인
자아의식을 가진 소비자의 재생산에 의존하므로, 지속적으로 재측량된 상호보완 과정인 사회적 주체화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 사회적 주체화는 인간성의 이미지를 재활용하고 재강화한다. 탈코드화된 흐름들을 다시금 상징적 질서의 레디메이드 용기(容器) 안으로 흘러 들여와, 욕망하고 소비하고 노동할 수 있는 인간들이
그곳에 존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이다.” (103페이지)
“대학 도서관과 인터넷 사이, 정치적
운동과 학술 공동체와 예술계 주변부의 느슨한 네트워크 사이, 무엇보다도 현실과 픽션 사이에서 어디에
발을 두고 어디로 머리를 향할 것인가는 미리 결정되거나 점차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이러한
정황은 가속주의가 그 이름처럼 하나의 선명한 벡터로 정렬된 것이 아니라 덩굴 식물처럼 틈새가 있는 곳마다 새로운 계열들을 형성해 나간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138페이지)
“거름망에는 목적하는 주파수와 그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값 그리고 Q 인자(Quality-Factor)라는 변수가 있으며 Q 인자는 추출하고자 하는 주파수의 근접 주파수에 가해지는 압력을 수치화 한 것이다. Q 인자가 강할수록 필요로 하는 주파수를 더 정밀하게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는
주변부를 일종의 잡음으로 취급하여 제거하는 것이며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는 방식이다.” (168페이지)
![]()
![]()
![]()
![]()
![]()
![]()
![]()
![]()
![]()
![]()
![]()
![]()
![]()
![]()

 글쓴이: 황재민, 로빈 맥케이, 최보련, 윤원화, SISU, 박준영
옮긴이: 김혜림, 강덕구
미디어버스 발행
2020년 11월 25일 발행
디자인: 신신
ISBN 979-11-90434-11-9 (90600)
100x150mm / 256 페이지
값 10,000원
책 소개
모순의
심화를 통한 모순의 극복 가능성을 모의 실험하는 가속주의의 과격한 테제는 인터넷 밈에서 펄프 이론으로, 때로는
좌파 가속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소구된다. 이 책의 제목인
K-OS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활동했던 사이버네틱스 연구집단 CCRU(Cybernetic Culture Research Unit)의
용어집에서 가져온 것이다. H.P. 러브크래프트를 비롯한 다수 SF 작가들의
세계관을 연구 대상이 아닌 방법론으로 전유한 이들의 텍스트는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와 라보리아 큐보닉스의 『제노페미니즘』 선언문에
영향을 주었다.
어느
곳에도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인식론적 탈주학으로써 가속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요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로써
주로 허구적 실천, 즉 하이퍼스티션(Hyperstition)이
지목된다. 『K-OS』에 실린 글들은 이 실천을 낙관적 펑크로, 지각의 연속 환상으로, 인간 형상에 대한 모독으로, 그리고 차별 기계의 거름망으로 번안한다. 더불어 신유물론의 테제에
입각하여 혁명의 전제 조건으로 가속성을 요청하는 정치 철학과 가속주의의 담론적 궤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사이클로노피디아』의 국내 역자 후기가
실려있다.
목차
들어가며
– 최보련
가짜
미래와 지연의 지연 또는 매일 변하는 정원의 기쁨 – 황재민
합성적
청취자 – 로빈 맥케이
막힌
도넛 삽화 – 최보련
구멍으로부터의
소용돌이, 또는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에 관한 역자 노트 – 윤원화
SISU(Systematic Irregularity Study Unit) 사용자 안내서 - SISU
신유물론가속주의의 존재론 – 박준영
저자
및 역자 소개
저자 소개
황재민
미술평론가. 옛 미디어로서의 미술에 관심이 있다. 『호버링 텍스트』(2019)의 편집에 참여했으며 한국의 젊은 회화 작가 20인을 인터뷰한
온라인 기획 《Painters by Painters ‘18》(2018)을
진행했다.
로빈
맥케이
영국
출판사 어바노믹(Urbanomic)의 대표로, 철학과 현대미술에
대해 폭넓게 집필했으며, 여러 예술가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선동했다. 또한
알랭 바디우의 『수와 수들』, 퀑탱 메이야수의 『수와 사이렌』, 프랑수아
라뤼엘의 『비사진의 개념』, 에릭 알리츠의 『뇌의 눈』과 『이미지 허물기』를 포함한 프랑스 철학의 중요한
저작을 다수 번역했다.
최보련
시각예술가. 단체전 <If not, not>(keepintouch, 2018)과 <구부러진 안팎>(탈영역 우정국, 2018)등에 참여했다. 매체연합을 통해 증폭된 정념이 고해상도의
소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관찰한다. 노뉴워크의 동료들과 『재-관람차』(2019)를 함께 썼다.
윤원화
시각문화
연구자로 주로 동시대 서울의 전시 공간에서 보이는 것들에 관해 글을 쓰고 번역한다. 건축과 영상이론을
공부하고 미술과 시각문화, 도시와 미디어의 접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 『그림 창문 거울: 미술 전시장의 사진들』(2018),
『1002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2016) 등이 있으며, 역서로 『포기한 작업으로부터』(2019), 『기록시스템 1800/1900』(2015) 등이 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에서 <부드러운 지점들>을
공동 제작했다.
SISU(Systematic Irregularity Study Unit)
2018년 █████████████████████를 목적으로 ███, ███, ███, ███ 로 결성되어 ███████████████████████████████████████████, ████████████████████████████████████████하고 있다.
박준영
수유너머 104 회원. 현대철학 연구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학부에서는 불교철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는 프랑스철학을
연구했다. 대학원 연구 과정에서는 주로 들뢰즈(Deleuze)와
리쾨르(Ricoeur)의 철학을 종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신유물론에 관심을
가지고 번역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속주의(Accelerationism)
정치철학과 육후이(Yuk Hui)의 기술철학도 연구 대상이다. 동서양 철학 개념들이 갈마들고 창발하는 철학적 사유에 대해 생각중이기도 하다.
『해석에 대하여-프로이트에 관한 시론』(공역, 인간사랑, 2013)을 번역하였고,
「들뢰즈에게서 ‘철학’과 ‘철학자’」(진보평론, 2019, 82호) 등의 논문을 썼으며, 『욕망, 고전으로 생각하다』(공저, 너머학교, 2016), 『사랑, 고전으로
생각하다』(공저, 너머학교,
2016) 등의 글을 썼다.
역자 소개
김혜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졸업. 영화평론가. 오큘로, 마테리알, 액트(ACT!) 등에
기고했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풍경과 신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비평플랫폼 콜리그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외부/내부 세계에서 이뤄지는 외재/내재적 관계를 조망하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다.
강덕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졸업. 블로거.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영화평론가로 활동했다. 가속주의, 문화비평, 아마추어리즘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비평플랫폼 콜리그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외부/내부 세계에서
이뤄지는 외재/내재적 관계를 조망하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다.
책 속에서
“통제사회는 개인주의 노동자-나르시시즘적인
자아의식을 가진 소비자의 재생산에 의존하므로, 지속적으로 재측량된 상호보완 과정인 사회적 주체화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 사회적 주체화는 인간성의 이미지를 재활용하고 재강화한다. 탈코드화된 흐름들을 다시금 상징적 질서의 레디메이드 용기(容器) 안으로 흘러 들여와, 욕망하고 소비하고 노동할 수 있는 인간들이
그곳에 존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이다.” (103페이지)
“대학 도서관과 인터넷 사이, 정치적
운동과 학술 공동체와 예술계 주변부의 느슨한 네트워크 사이, 무엇보다도 현실과 픽션 사이에서 어디에
발을 두고 어디로 머리를 향할 것인가는 미리 결정되거나 점차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이러한
정황은 가속주의가 그 이름처럼 하나의 선명한 벡터로 정렬된 것이 아니라 덩굴 식물처럼 틈새가 있는 곳마다 새로운 계열들을 형성해 나간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138페이지)
“거름망에는 목적하는 주파수와 그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값 그리고 Q 인자(Quality-Factor)라는 변수가 있으며 Q 인자는 추출하고자 하는 주파수의 근접 주파수에 가해지는 압력을 수치화 한 것이다. Q 인자가 강할수록 필요로 하는 주파수를 더 정밀하게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는
주변부를 일종의 잡음으로 취급하여 제거하는 것이며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는 방식이다.” (168페이지)
글쓴이: 황재민, 로빈 맥케이, 최보련, 윤원화, SISU, 박준영
옮긴이: 김혜림, 강덕구
미디어버스 발행
2020년 11월 25일 발행
디자인: 신신
ISBN 979-11-90434-11-9 (90600)
100x150mm / 256 페이지
값 10,000원
책 소개
모순의
심화를 통한 모순의 극복 가능성을 모의 실험하는 가속주의의 과격한 테제는 인터넷 밈에서 펄프 이론으로, 때로는
좌파 가속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소구된다. 이 책의 제목인
K-OS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활동했던 사이버네틱스 연구집단 CCRU(Cybernetic Culture Research Unit)의
용어집에서 가져온 것이다. H.P. 러브크래프트를 비롯한 다수 SF 작가들의
세계관을 연구 대상이 아닌 방법론으로 전유한 이들의 텍스트는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와 라보리아 큐보닉스의 『제노페미니즘』 선언문에
영향을 주었다.
어느
곳에도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인식론적 탈주학으로써 가속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요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로써
주로 허구적 실천, 즉 하이퍼스티션(Hyperstition)이
지목된다. 『K-OS』에 실린 글들은 이 실천을 낙관적 펑크로, 지각의 연속 환상으로, 인간 형상에 대한 모독으로, 그리고 차별 기계의 거름망으로 번안한다. 더불어 신유물론의 테제에
입각하여 혁명의 전제 조건으로 가속성을 요청하는 정치 철학과 가속주의의 담론적 궤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사이클로노피디아』의 국내 역자 후기가
실려있다.
목차
들어가며
– 최보련
가짜
미래와 지연의 지연 또는 매일 변하는 정원의 기쁨 – 황재민
합성적
청취자 – 로빈 맥케이
막힌
도넛 삽화 – 최보련
구멍으로부터의
소용돌이, 또는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에 관한 역자 노트 – 윤원화
SISU(Systematic Irregularity Study Unit) 사용자 안내서 - SISU
신유물론가속주의의 존재론 – 박준영
저자
및 역자 소개
저자 소개
황재민
미술평론가. 옛 미디어로서의 미술에 관심이 있다. 『호버링 텍스트』(2019)의 편집에 참여했으며 한국의 젊은 회화 작가 20인을 인터뷰한
온라인 기획 《Painters by Painters ‘18》(2018)을
진행했다.
로빈
맥케이
영국
출판사 어바노믹(Urbanomic)의 대표로, 철학과 현대미술에
대해 폭넓게 집필했으며, 여러 예술가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선동했다. 또한
알랭 바디우의 『수와 수들』, 퀑탱 메이야수의 『수와 사이렌』, 프랑수아
라뤼엘의 『비사진의 개념』, 에릭 알리츠의 『뇌의 눈』과 『이미지 허물기』를 포함한 프랑스 철학의 중요한
저작을 다수 번역했다.
최보련
시각예술가. 단체전 <If not, not>(keepintouch, 2018)과 <구부러진 안팎>(탈영역 우정국, 2018)등에 참여했다. 매체연합을 통해 증폭된 정념이 고해상도의
소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관찰한다. 노뉴워크의 동료들과 『재-관람차』(2019)를 함께 썼다.
윤원화
시각문화
연구자로 주로 동시대 서울의 전시 공간에서 보이는 것들에 관해 글을 쓰고 번역한다. 건축과 영상이론을
공부하고 미술과 시각문화, 도시와 미디어의 접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 『그림 창문 거울: 미술 전시장의 사진들』(2018),
『1002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2016) 등이 있으며, 역서로 『포기한 작업으로부터』(2019), 『기록시스템 1800/1900』(2015) 등이 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에서 <부드러운 지점들>을
공동 제작했다.
SISU(Systematic Irregularity Study Unit)
2018년 █████████████████████를 목적으로 ███, ███, ███, ███ 로 결성되어 ███████████████████████████████████████████, ████████████████████████████████████████하고 있다.
박준영
수유너머 104 회원. 현대철학 연구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학부에서는 불교철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는 프랑스철학을
연구했다. 대학원 연구 과정에서는 주로 들뢰즈(Deleuze)와
리쾨르(Ricoeur)의 철학을 종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신유물론에 관심을
가지고 번역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속주의(Accelerationism)
정치철학과 육후이(Yuk Hui)의 기술철학도 연구 대상이다. 동서양 철학 개념들이 갈마들고 창발하는 철학적 사유에 대해 생각중이기도 하다.
『해석에 대하여-프로이트에 관한 시론』(공역, 인간사랑, 2013)을 번역하였고,
「들뢰즈에게서 ‘철학’과 ‘철학자’」(진보평론, 2019, 82호) 등의 논문을 썼으며, 『욕망, 고전으로 생각하다』(공저, 너머학교, 2016), 『사랑, 고전으로
생각하다』(공저, 너머학교,
2016) 등의 글을 썼다.
역자 소개
김혜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졸업. 영화평론가. 오큘로, 마테리알, 액트(ACT!) 등에
기고했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풍경과 신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비평플랫폼 콜리그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외부/내부 세계에서 이뤄지는 외재/내재적 관계를 조망하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다.
강덕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졸업. 블로거.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영화평론가로 활동했다. 가속주의, 문화비평, 아마추어리즘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비평플랫폼 콜리그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외부/내부 세계에서
이뤄지는 외재/내재적 관계를 조망하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다.
책 속에서
“통제사회는 개인주의 노동자-나르시시즘적인
자아의식을 가진 소비자의 재생산에 의존하므로, 지속적으로 재측량된 상호보완 과정인 사회적 주체화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 사회적 주체화는 인간성의 이미지를 재활용하고 재강화한다. 탈코드화된 흐름들을 다시금 상징적 질서의 레디메이드 용기(容器) 안으로 흘러 들여와, 욕망하고 소비하고 노동할 수 있는 인간들이
그곳에 존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이다.” (103페이지)
“대학 도서관과 인터넷 사이, 정치적
운동과 학술 공동체와 예술계 주변부의 느슨한 네트워크 사이, 무엇보다도 현실과 픽션 사이에서 어디에
발을 두고 어디로 머리를 향할 것인가는 미리 결정되거나 점차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이러한
정황은 가속주의가 그 이름처럼 하나의 선명한 벡터로 정렬된 것이 아니라 덩굴 식물처럼 틈새가 있는 곳마다 새로운 계열들을 형성해 나간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138페이지)
“거름망에는 목적하는 주파수와 그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값 그리고 Q 인자(Quality-Factor)라는 변수가 있으며 Q 인자는 추출하고자 하는 주파수의 근접 주파수에 가해지는 압력을 수치화 한 것이다. Q 인자가 강할수록 필요로 하는 주파수를 더 정밀하게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는
주변부를 일종의 잡음으로 취급하여 제거하는 것이며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는 방식이다.” (168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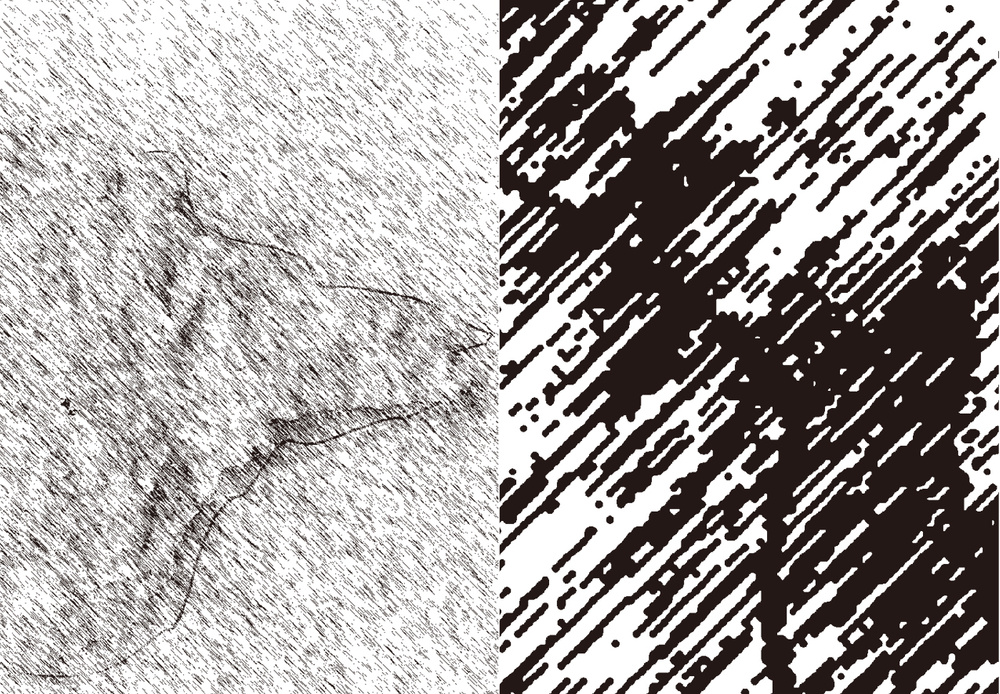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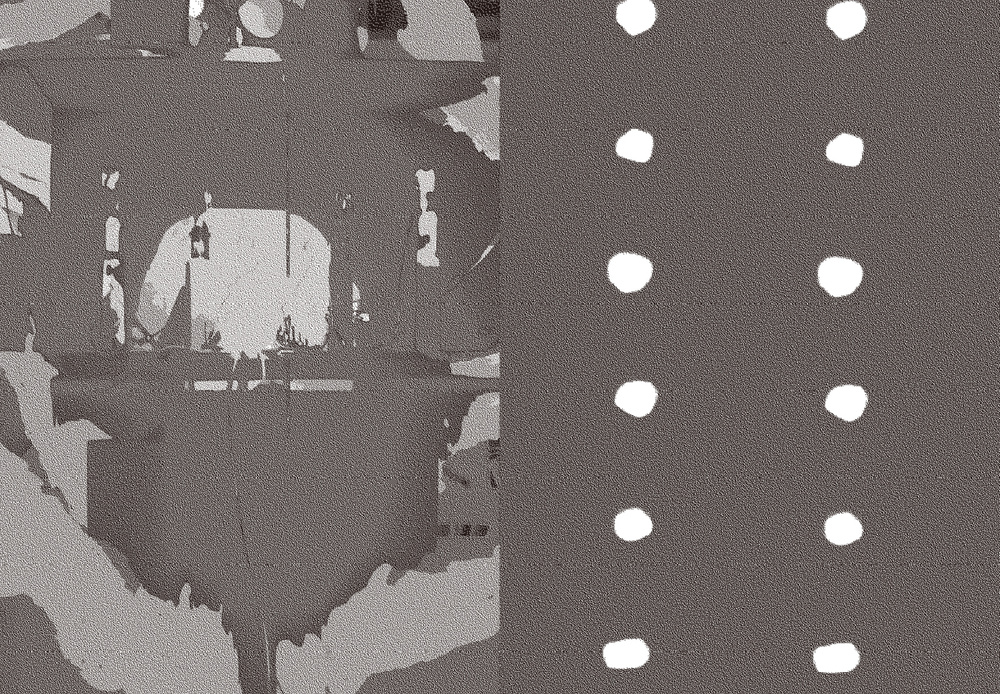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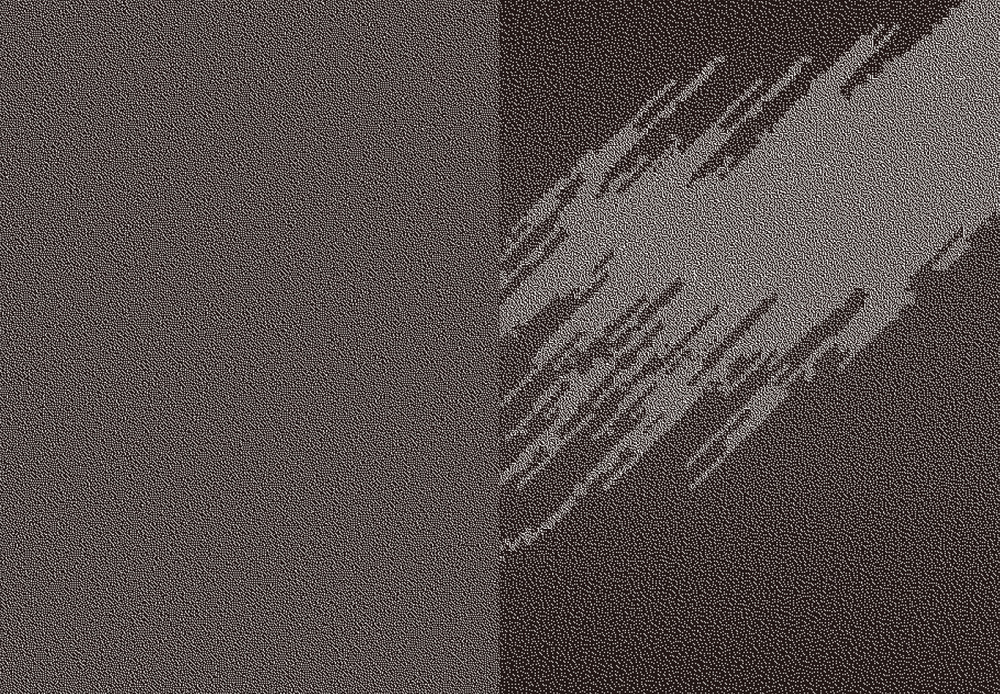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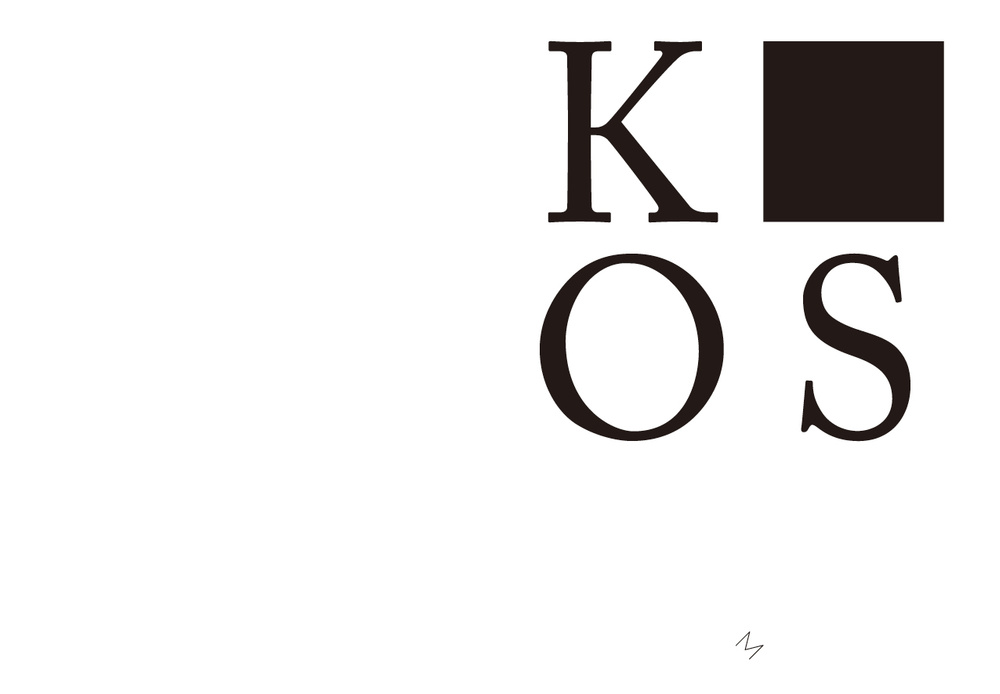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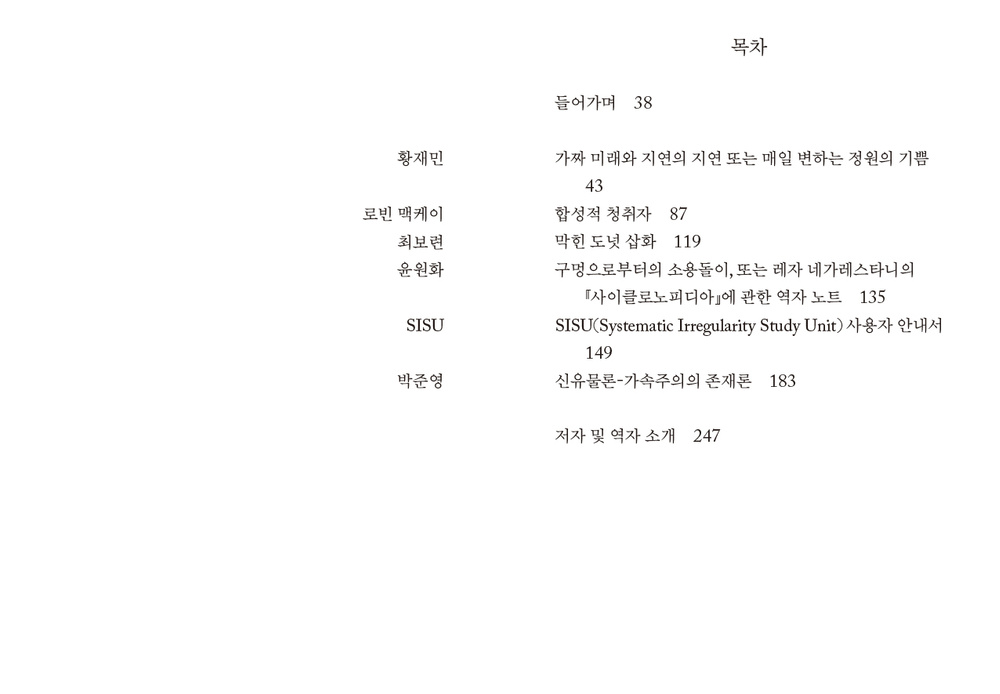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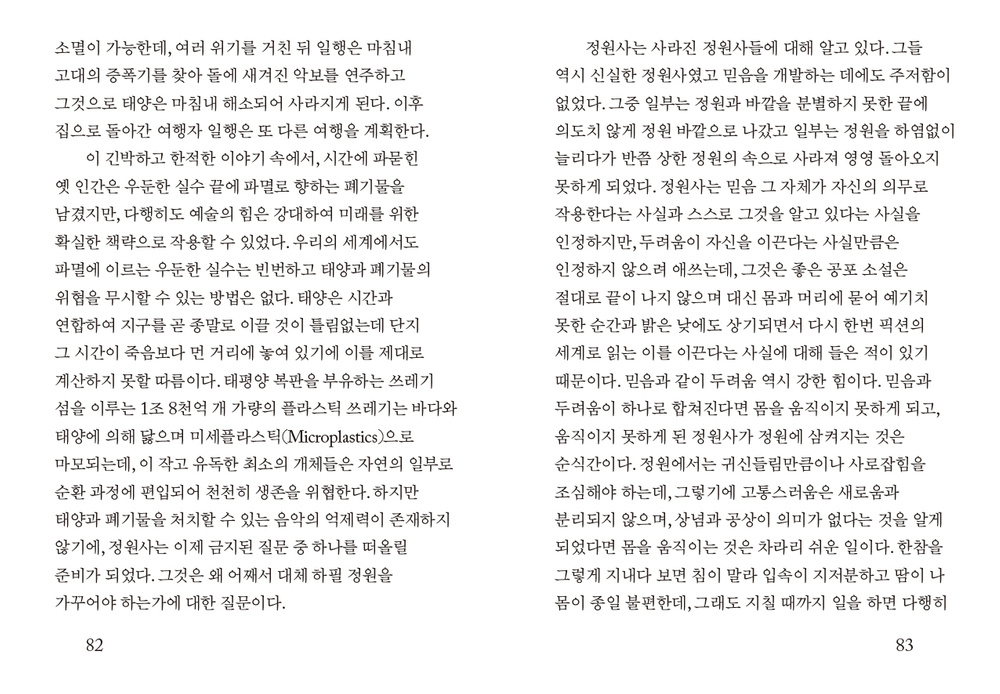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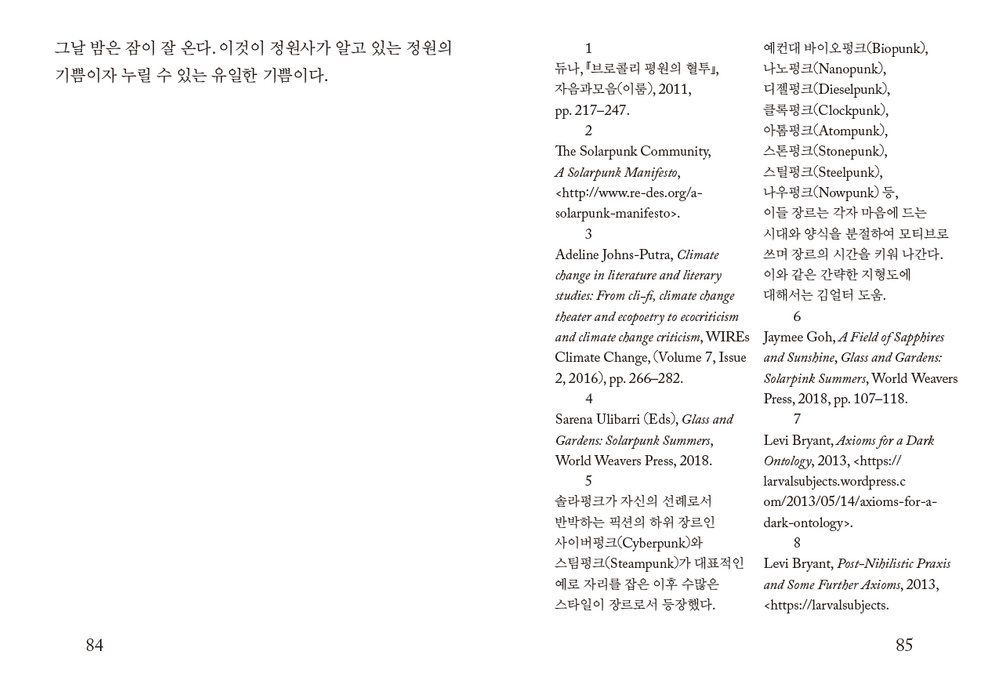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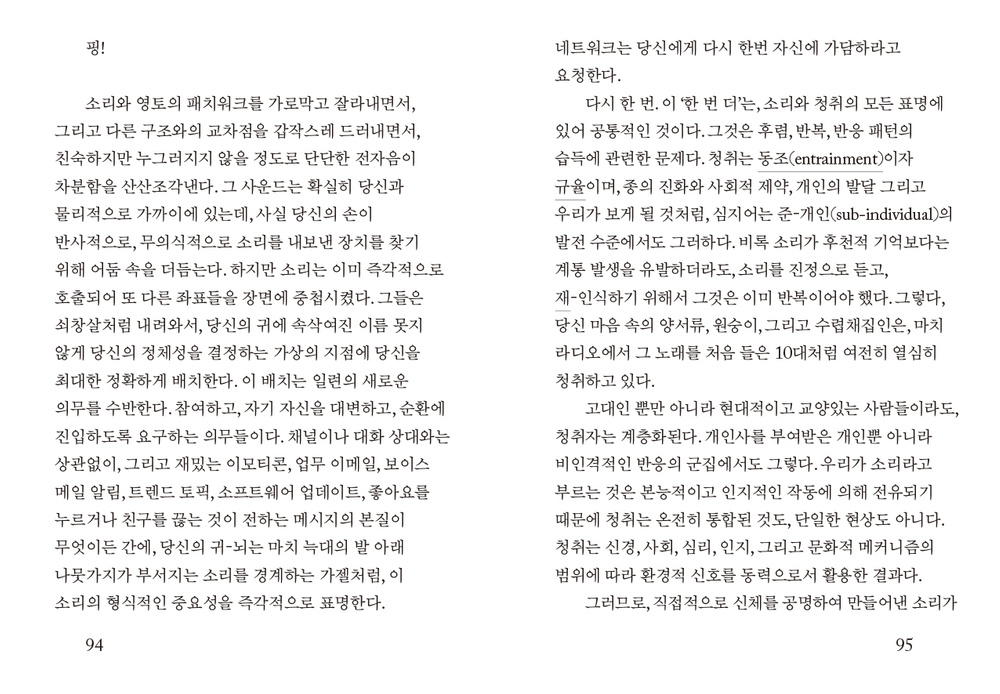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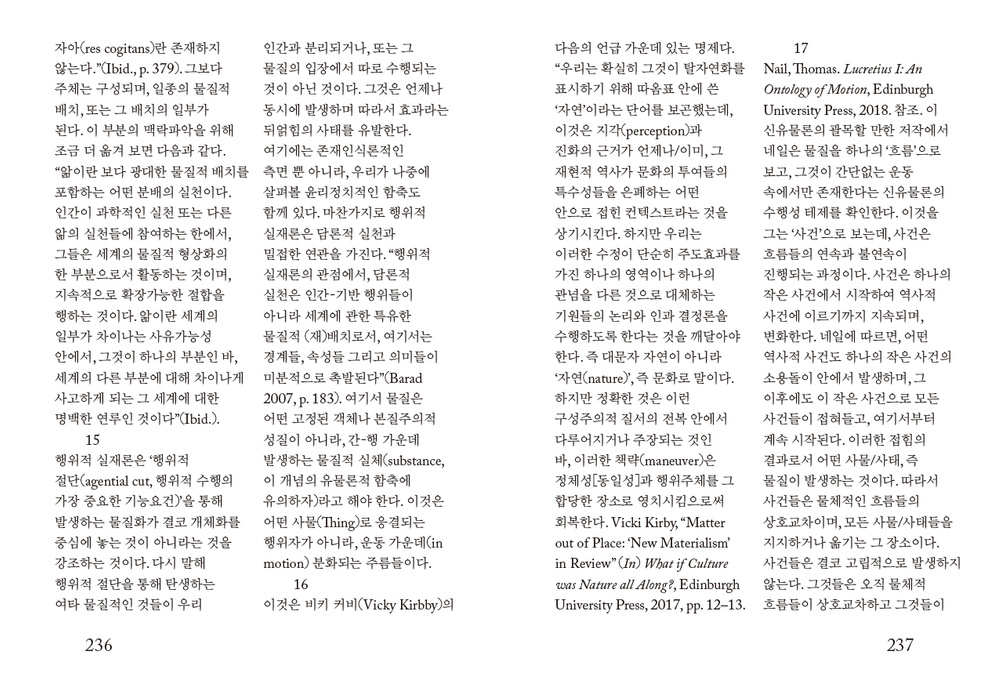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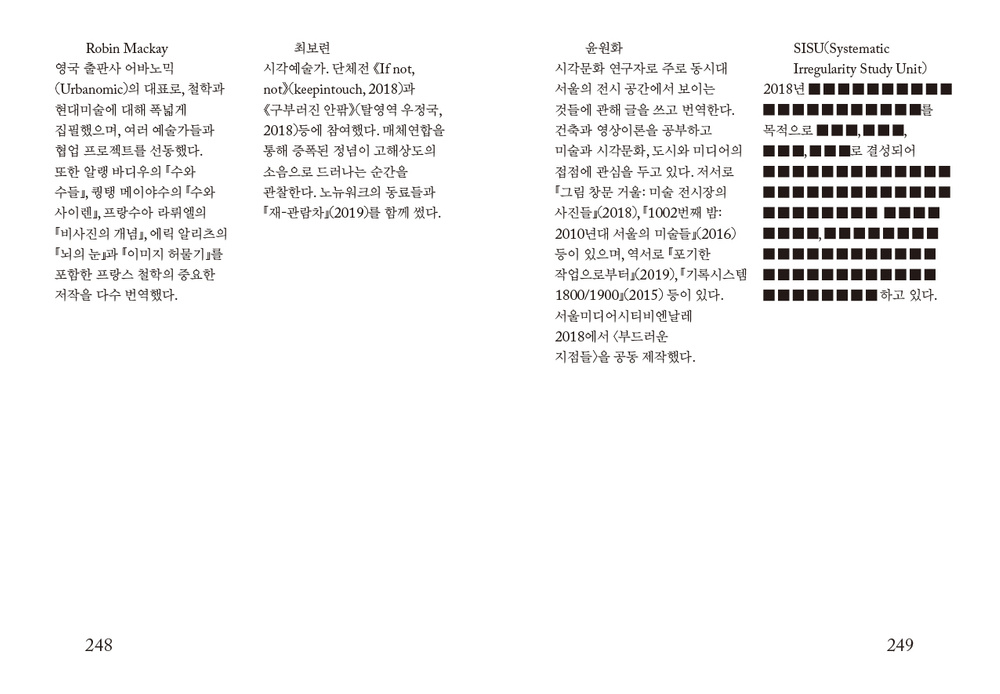
↧
hwawon1
화원은 미디어버스의 임프린트입니다.
화원은 디자인 방법론이 구조와 물성을 지닌 사물로 이어지는 디자인의 수행적 실천에 주목합니다. 화원의 첫 번째 총서인 Gathering Flowers는 <개별꽃>을 시작으로 언어와 이미지로 구조를 깁고 그를 연속된 페이지로 묶어냅니다. Hwawon is an imprint of Mediabus.Hwawon focuses on the performativea aspect of design practice in which design mathodology crystallizes into the structure and materiality of an object. The first series of Hwawon, Gathering Flowes, begins with False Starwort, weaves through language and images, constituting the structure and arranges them in sequential pages.
에디터: 신신, 미디어버스
Editor: Shinshin, mediabu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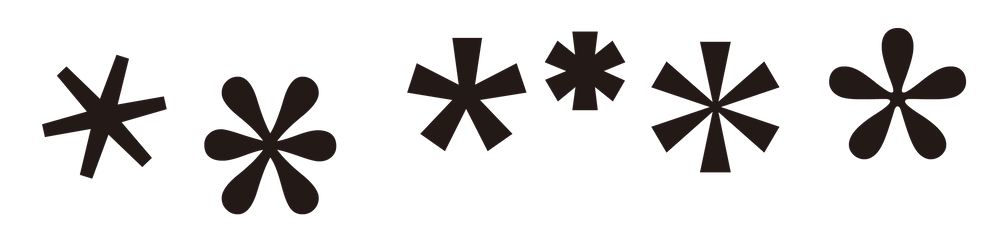
↧
K-OS
K-OS
![]()
![]() 글쓴이: 황재민, 로빈 맥케이, 최보련, 윤원화, SISU, 박준영옮긴이: 김혜림, 강덕구미디어버스 발행2020년 11월 25일 발행디자인: 신신ISBN 979-11-90434-11-9 (90600)100x150mm / 256 페이지값 10,000원
책 소개모순의
심화를 통한 모순의 극복 가능성을 모의 실험하는 가속주의의 과격한 테제는 인터넷 밈에서 펄프 이론으로, 때로는
좌파 가속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소구된다. 이 책의 제목인
K-OS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활동했던 사이버네틱스 연구집단 CCRU(Cybernetic Culture Research Unit)의
용어집에서 가져온 것이다. H.P. 러브크래프트를 비롯한 다수 SF 작가들의
세계관을 연구 대상이 아닌 방법론으로 전유한 이들의 텍스트는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와 라보리아 큐보닉스의 『제노페미니즘』 선언문에
영향을 주었다.어느
곳에도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인식론적 탈주학으로써 가속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요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로써
주로 허구적 실천, 즉 하이퍼스티션(Hyperstition)이
지목된다. 『K-OS』에 실린 글들은 이 실천을 낙관적 펑크로, 지각의 연속 환상으로, 인간 형상에 대한 모독으로, 그리고 차별 기계의 거름망으로 번안한다. 더불어 신유물론의 테제에
입각하여 혁명의 전제 조건으로 가속성을 요청하는 정치 철학과 가속주의의 담론적 궤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사이클로노피디아』의 국내 역자 후기가
실려있다.
목차들어가며
– 최보련가짜
미래와 지연의 지연 또는 매일 변하는 정원의 기쁨 – 황재민 합성적
청취자 – 로빈 맥케이 막힌
도넛 삽화 – 최보련구멍으로부터의
소용돌이, 또는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에 관한 역자 노트 – 윤원화SISU(Systematic Irregularity Study Unit) 사용자 안내서 - SISU신유물론가속주의의 존재론 – 박준영
저자
및 역자 소개
저자 소개황재민미술평론가. 옛 미디어로서의 미술에 관심이 있다. 『호버링 텍스트』(2019)의 편집에 참여했으며 한국의 젊은 회화 작가 20인을 인터뷰한
온라인 기획 《Painters by Painters ‘18》(2018)을
진행했다.
로빈
맥케이영국
출판사 어바노믹(Urbanomic)의 대표로, 철학과 현대미술에
대해 폭넓게 집필했으며, 여러 예술가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선동했다. 또한
알랭 바디우의 『수와 수들』, 퀑탱 메이야수의 『수와 사이렌』, 프랑수아
라뤼엘의 『비사진의 개념』, 에릭 알리츠의 『뇌의 눈』과 『이미지 허물기』를 포함한 프랑스 철학의 중요한
저작을 다수 번역했다.
최보련시각예술가. 단체전 <If not, not>(keepintouch, 2018)과 <구부러진 안팎>(탈영역 우정국, 2018)등에 참여했다. 매체연합을 통해 증폭된 정념이 고해상도의
소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관찰한다. 노뉴워크의 동료들과 『재-관람차』(2019)를 함께 썼다.
윤원화시각문화
연구자로 주로 동시대 서울의 전시 공간에서 보이는 것들에 관해 글을 쓰고 번역한다. 건축과 영상이론을
공부하고 미술과 시각문화, 도시와 미디어의 접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 『그림 창문 거울: 미술 전시장의 사진들』(2018),
『1002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2016) 등이 있으며, 역서로 『포기한 작업으로부터』(2019), 『기록시스템 1800/1900』(2015) 등이 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에서 <부드러운 지점들>을
공동 제작했다.
SISU(Systematic Irregularity Study Unit)2018년 █████████████████████를 목적으로 ███, ███, ███, ███ 로 결성되어 ███████████████████████████████████████████, ████████████████████████████████████████하고 있다.
박준영수유너머 104 회원. 현대철학 연구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학부에서는 불교철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는 프랑스철학을
연구했다. 대학원 연구 과정에서는 주로 들뢰즈(Deleuze)와
리쾨르(Ricoeur)의 철학을 종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신유물론에 관심을
가지고 번역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속주의(Accelerationism)
정치철학과 육후이(Yuk Hui)의 기술철학도 연구 대상이다. 동서양 철학 개념들이 갈마들고 창발하는 철학적 사유에 대해 생각중이기도 하다.
『해석에 대하여-프로이트에 관한 시론』(공역, 인간사랑, 2013)을 번역하였고,
「들뢰즈에게서 ‘철학’과 ‘철학자’」(진보평론, 2019, 82호) 등의 논문을 썼으며, 『욕망, 고전으로 생각하다』(공저, 너머학교, 2016), 『사랑, 고전으로
생각하다』(공저, 너머학교,
2016) 등의 글을 썼다.
역자 소개김혜림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졸업. 영화평론가. 오큘로, 마테리알, 액트(ACT!) 등에
기고했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풍경과 신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비평플랫폼 콜리그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외부/내부 세계에서 이뤄지는 외재/내재적 관계를 조망하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다.
강덕구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졸업. 블로거.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영화평론가로 활동했다. 가속주의, 문화비평, 아마추어리즘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비평플랫폼 콜리그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외부/내부 세계에서
이뤄지는 외재/내재적 관계를 조망하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다.
책 속에서“통제사회는 개인주의 노동자-나르시시즘적인
자아의식을 가진 소비자의 재생산에 의존하므로, 지속적으로 재측량된 상호보완 과정인 사회적 주체화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 사회적 주체화는 인간성의 이미지를 재활용하고 재강화한다. 탈코드화된 흐름들을 다시금 상징적 질서의 레디메이드 용기(容器) 안으로 흘러 들여와, 욕망하고 소비하고 노동할 수 있는 인간들이
그곳에 존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이다.” (103페이지)
“대학 도서관과 인터넷 사이, 정치적
운동과 학술 공동체와 예술계 주변부의 느슨한 네트워크 사이, 무엇보다도 현실과 픽션 사이에서 어디에
발을 두고 어디로 머리를 향할 것인가는 미리 결정되거나 점차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이러한
정황은 가속주의가 그 이름처럼 하나의 선명한 벡터로 정렬된 것이 아니라 덩굴 식물처럼 틈새가 있는 곳마다 새로운 계열들을 형성해 나간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138페이지)
“거름망에는 목적하는 주파수와 그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값 그리고 Q 인자(Quality-Factor)라는 변수가 있으며 Q 인자는 추출하고자 하는 주파수의 근접 주파수에 가해지는 압력을 수치화 한 것이다. Q 인자가 강할수록 필요로 하는 주파수를 더 정밀하게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는
주변부를 일종의 잡음으로 취급하여 제거하는 것이며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는 방식이다.” (168페이지)
글쓴이: 황재민, 로빈 맥케이, 최보련, 윤원화, SISU, 박준영옮긴이: 김혜림, 강덕구미디어버스 발행2020년 11월 25일 발행디자인: 신신ISBN 979-11-90434-11-9 (90600)100x150mm / 256 페이지값 10,000원
책 소개모순의
심화를 통한 모순의 극복 가능성을 모의 실험하는 가속주의의 과격한 테제는 인터넷 밈에서 펄프 이론으로, 때로는
좌파 가속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소구된다. 이 책의 제목인
K-OS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활동했던 사이버네틱스 연구집단 CCRU(Cybernetic Culture Research Unit)의
용어집에서 가져온 것이다. H.P. 러브크래프트를 비롯한 다수 SF 작가들의
세계관을 연구 대상이 아닌 방법론으로 전유한 이들의 텍스트는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와 라보리아 큐보닉스의 『제노페미니즘』 선언문에
영향을 주었다.어느
곳에도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인식론적 탈주학으로써 가속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요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로써
주로 허구적 실천, 즉 하이퍼스티션(Hyperstition)이
지목된다. 『K-OS』에 실린 글들은 이 실천을 낙관적 펑크로, 지각의 연속 환상으로, 인간 형상에 대한 모독으로, 그리고 차별 기계의 거름망으로 번안한다. 더불어 신유물론의 테제에
입각하여 혁명의 전제 조건으로 가속성을 요청하는 정치 철학과 가속주의의 담론적 궤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사이클로노피디아』의 국내 역자 후기가
실려있다.
목차들어가며
– 최보련가짜
미래와 지연의 지연 또는 매일 변하는 정원의 기쁨 – 황재민 합성적
청취자 – 로빈 맥케이 막힌
도넛 삽화 – 최보련구멍으로부터의
소용돌이, 또는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에 관한 역자 노트 – 윤원화SISU(Systematic Irregularity Study Unit) 사용자 안내서 - SISU신유물론가속주의의 존재론 – 박준영
저자
및 역자 소개
저자 소개황재민미술평론가. 옛 미디어로서의 미술에 관심이 있다. 『호버링 텍스트』(2019)의 편집에 참여했으며 한국의 젊은 회화 작가 20인을 인터뷰한
온라인 기획 《Painters by Painters ‘18》(2018)을
진행했다.
로빈
맥케이영국
출판사 어바노믹(Urbanomic)의 대표로, 철학과 현대미술에
대해 폭넓게 집필했으며, 여러 예술가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선동했다. 또한
알랭 바디우의 『수와 수들』, 퀑탱 메이야수의 『수와 사이렌』, 프랑수아
라뤼엘의 『비사진의 개념』, 에릭 알리츠의 『뇌의 눈』과 『이미지 허물기』를 포함한 프랑스 철학의 중요한
저작을 다수 번역했다.
최보련시각예술가. 단체전 <If not, not>(keepintouch, 2018)과 <구부러진 안팎>(탈영역 우정국, 2018)등에 참여했다. 매체연합을 통해 증폭된 정념이 고해상도의
소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관찰한다. 노뉴워크의 동료들과 『재-관람차』(2019)를 함께 썼다.
윤원화시각문화
연구자로 주로 동시대 서울의 전시 공간에서 보이는 것들에 관해 글을 쓰고 번역한다. 건축과 영상이론을
공부하고 미술과 시각문화, 도시와 미디어의 접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 『그림 창문 거울: 미술 전시장의 사진들』(2018),
『1002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2016) 등이 있으며, 역서로 『포기한 작업으로부터』(2019), 『기록시스템 1800/1900』(2015) 등이 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에서 <부드러운 지점들>을
공동 제작했다.
SISU(Systematic Irregularity Study Unit)2018년 █████████████████████를 목적으로 ███, ███, ███, ███ 로 결성되어 ███████████████████████████████████████████, ████████████████████████████████████████하고 있다.
박준영수유너머 104 회원. 현대철학 연구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학부에서는 불교철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는 프랑스철학을
연구했다. 대학원 연구 과정에서는 주로 들뢰즈(Deleuze)와
리쾨르(Ricoeur)의 철학을 종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신유물론에 관심을
가지고 번역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속주의(Accelerationism)
정치철학과 육후이(Yuk Hui)의 기술철학도 연구 대상이다. 동서양 철학 개념들이 갈마들고 창발하는 철학적 사유에 대해 생각중이기도 하다.
『해석에 대하여-프로이트에 관한 시론』(공역, 인간사랑, 2013)을 번역하였고,
「들뢰즈에게서 ‘철학’과 ‘철학자’」(진보평론, 2019, 82호) 등의 논문을 썼으며, 『욕망, 고전으로 생각하다』(공저, 너머학교, 2016), 『사랑, 고전으로
생각하다』(공저, 너머학교,
2016) 등의 글을 썼다.
역자 소개김혜림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졸업. 영화평론가. 오큘로, 마테리알, 액트(ACT!) 등에
기고했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풍경과 신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비평플랫폼 콜리그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외부/내부 세계에서 이뤄지는 외재/내재적 관계를 조망하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다.
강덕구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졸업. 블로거.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영화평론가로 활동했다. 가속주의, 문화비평, 아마추어리즘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비평플랫폼 콜리그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외부/내부 세계에서
이뤄지는 외재/내재적 관계를 조망하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다.
책 속에서“통제사회는 개인주의 노동자-나르시시즘적인
자아의식을 가진 소비자의 재생산에 의존하므로, 지속적으로 재측량된 상호보완 과정인 사회적 주체화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 사회적 주체화는 인간성의 이미지를 재활용하고 재강화한다. 탈코드화된 흐름들을 다시금 상징적 질서의 레디메이드 용기(容器) 안으로 흘러 들여와, 욕망하고 소비하고 노동할 수 있는 인간들이
그곳에 존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이다.” (103페이지)
“대학 도서관과 인터넷 사이, 정치적
운동과 학술 공동체와 예술계 주변부의 느슨한 네트워크 사이, 무엇보다도 현실과 픽션 사이에서 어디에
발을 두고 어디로 머리를 향할 것인가는 미리 결정되거나 점차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이러한
정황은 가속주의가 그 이름처럼 하나의 선명한 벡터로 정렬된 것이 아니라 덩굴 식물처럼 틈새가 있는 곳마다 새로운 계열들을 형성해 나간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138페이지)
“거름망에는 목적하는 주파수와 그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값 그리고 Q 인자(Quality-Factor)라는 변수가 있으며 Q 인자는 추출하고자 하는 주파수의 근접 주파수에 가해지는 압력을 수치화 한 것이다. Q 인자가 강할수록 필요로 하는 주파수를 더 정밀하게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는
주변부를 일종의 잡음으로 취급하여 제거하는 것이며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는 방식이다.” (168페이지)
![]()
![]()
![]()
![]()
![]()
![]()
![]()
![]()
![]()
![]()
![]()
![]()
![]()
![]()

 글쓴이: 황재민, 로빈 맥케이, 최보련, 윤원화, SISU, 박준영옮긴이: 김혜림, 강덕구미디어버스 발행2020년 11월 25일 발행디자인: 신신ISBN 979-11-90434-11-9 (90600)100x150mm / 256 페이지값 10,000원
책 소개모순의
심화를 통한 모순의 극복 가능성을 모의 실험하는 가속주의의 과격한 테제는 인터넷 밈에서 펄프 이론으로, 때로는
좌파 가속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소구된다. 이 책의 제목인
K-OS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활동했던 사이버네틱스 연구집단 CCRU(Cybernetic Culture Research Unit)의
용어집에서 가져온 것이다. H.P. 러브크래프트를 비롯한 다수 SF 작가들의
세계관을 연구 대상이 아닌 방법론으로 전유한 이들의 텍스트는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와 라보리아 큐보닉스의 『제노페미니즘』 선언문에
영향을 주었다.어느
곳에도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인식론적 탈주학으로써 가속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요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로써
주로 허구적 실천, 즉 하이퍼스티션(Hyperstition)이
지목된다. 『K-OS』에 실린 글들은 이 실천을 낙관적 펑크로, 지각의 연속 환상으로, 인간 형상에 대한 모독으로, 그리고 차별 기계의 거름망으로 번안한다. 더불어 신유물론의 테제에
입각하여 혁명의 전제 조건으로 가속성을 요청하는 정치 철학과 가속주의의 담론적 궤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사이클로노피디아』의 국내 역자 후기가
실려있다.
목차들어가며
– 최보련가짜
미래와 지연의 지연 또는 매일 변하는 정원의 기쁨 – 황재민 합성적
청취자 – 로빈 맥케이 막힌
도넛 삽화 – 최보련구멍으로부터의
소용돌이, 또는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에 관한 역자 노트 – 윤원화SISU(Systematic Irregularity Study Unit) 사용자 안내서 - SISU신유물론가속주의의 존재론 – 박준영
저자
및 역자 소개
저자 소개황재민미술평론가. 옛 미디어로서의 미술에 관심이 있다. 『호버링 텍스트』(2019)의 편집에 참여했으며 한국의 젊은 회화 작가 20인을 인터뷰한
온라인 기획 《Painters by Painters ‘18》(2018)을
진행했다.
로빈
맥케이영국
출판사 어바노믹(Urbanomic)의 대표로, 철학과 현대미술에
대해 폭넓게 집필했으며, 여러 예술가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선동했다. 또한
알랭 바디우의 『수와 수들』, 퀑탱 메이야수의 『수와 사이렌』, 프랑수아
라뤼엘의 『비사진의 개념』, 에릭 알리츠의 『뇌의 눈』과 『이미지 허물기』를 포함한 프랑스 철학의 중요한
저작을 다수 번역했다.
최보련시각예술가. 단체전 <If not, not>(keepintouch, 2018)과 <구부러진 안팎>(탈영역 우정국, 2018)등에 참여했다. 매체연합을 통해 증폭된 정념이 고해상도의
소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관찰한다. 노뉴워크의 동료들과 『재-관람차』(2019)를 함께 썼다.
윤원화시각문화
연구자로 주로 동시대 서울의 전시 공간에서 보이는 것들에 관해 글을 쓰고 번역한다. 건축과 영상이론을
공부하고 미술과 시각문화, 도시와 미디어의 접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 『그림 창문 거울: 미술 전시장의 사진들』(2018),
『1002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2016) 등이 있으며, 역서로 『포기한 작업으로부터』(2019), 『기록시스템 1800/1900』(2015) 등이 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에서 <부드러운 지점들>을
공동 제작했다.
SISU(Systematic Irregularity Study Unit)2018년 █████████████████████를 목적으로 ███, ███, ███, ███ 로 결성되어 ███████████████████████████████████████████, ████████████████████████████████████████하고 있다.
박준영수유너머 104 회원. 현대철학 연구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학부에서는 불교철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는 프랑스철학을
연구했다. 대학원 연구 과정에서는 주로 들뢰즈(Deleuze)와
리쾨르(Ricoeur)의 철학을 종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신유물론에 관심을
가지고 번역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속주의(Accelerationism)
정치철학과 육후이(Yuk Hui)의 기술철학도 연구 대상이다. 동서양 철학 개념들이 갈마들고 창발하는 철학적 사유에 대해 생각중이기도 하다.
『해석에 대하여-프로이트에 관한 시론』(공역, 인간사랑, 2013)을 번역하였고,
「들뢰즈에게서 ‘철학’과 ‘철학자’」(진보평론, 2019, 82호) 등의 논문을 썼으며, 『욕망, 고전으로 생각하다』(공저, 너머학교, 2016), 『사랑, 고전으로
생각하다』(공저, 너머학교,
2016) 등의 글을 썼다.
역자 소개김혜림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졸업. 영화평론가. 오큘로, 마테리알, 액트(ACT!) 등에
기고했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풍경과 신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비평플랫폼 콜리그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외부/내부 세계에서 이뤄지는 외재/내재적 관계를 조망하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다.
강덕구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졸업. 블로거.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영화평론가로 활동했다. 가속주의, 문화비평, 아마추어리즘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비평플랫폼 콜리그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외부/내부 세계에서
이뤄지는 외재/내재적 관계를 조망하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다.
책 속에서“통제사회는 개인주의 노동자-나르시시즘적인
자아의식을 가진 소비자의 재생산에 의존하므로, 지속적으로 재측량된 상호보완 과정인 사회적 주체화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 사회적 주체화는 인간성의 이미지를 재활용하고 재강화한다. 탈코드화된 흐름들을 다시금 상징적 질서의 레디메이드 용기(容器) 안으로 흘러 들여와, 욕망하고 소비하고 노동할 수 있는 인간들이
그곳에 존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이다.” (103페이지)
“대학 도서관과 인터넷 사이, 정치적
운동과 학술 공동체와 예술계 주변부의 느슨한 네트워크 사이, 무엇보다도 현실과 픽션 사이에서 어디에
발을 두고 어디로 머리를 향할 것인가는 미리 결정되거나 점차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이러한
정황은 가속주의가 그 이름처럼 하나의 선명한 벡터로 정렬된 것이 아니라 덩굴 식물처럼 틈새가 있는 곳마다 새로운 계열들을 형성해 나간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138페이지)
“거름망에는 목적하는 주파수와 그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값 그리고 Q 인자(Quality-Factor)라는 변수가 있으며 Q 인자는 추출하고자 하는 주파수의 근접 주파수에 가해지는 압력을 수치화 한 것이다. Q 인자가 강할수록 필요로 하는 주파수를 더 정밀하게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는
주변부를 일종의 잡음으로 취급하여 제거하는 것이며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는 방식이다.” (168페이지)
글쓴이: 황재민, 로빈 맥케이, 최보련, 윤원화, SISU, 박준영옮긴이: 김혜림, 강덕구미디어버스 발행2020년 11월 25일 발행디자인: 신신ISBN 979-11-90434-11-9 (90600)100x150mm / 256 페이지값 10,000원
책 소개모순의
심화를 통한 모순의 극복 가능성을 모의 실험하는 가속주의의 과격한 테제는 인터넷 밈에서 펄프 이론으로, 때로는
좌파 가속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소구된다. 이 책의 제목인
K-OS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활동했던 사이버네틱스 연구집단 CCRU(Cybernetic Culture Research Unit)의
용어집에서 가져온 것이다. H.P. 러브크래프트를 비롯한 다수 SF 작가들의
세계관을 연구 대상이 아닌 방법론으로 전유한 이들의 텍스트는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와 라보리아 큐보닉스의 『제노페미니즘』 선언문에
영향을 주었다.어느
곳에도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인식론적 탈주학으로써 가속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요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로써
주로 허구적 실천, 즉 하이퍼스티션(Hyperstition)이
지목된다. 『K-OS』에 실린 글들은 이 실천을 낙관적 펑크로, 지각의 연속 환상으로, 인간 형상에 대한 모독으로, 그리고 차별 기계의 거름망으로 번안한다. 더불어 신유물론의 테제에
입각하여 혁명의 전제 조건으로 가속성을 요청하는 정치 철학과 가속주의의 담론적 궤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사이클로노피디아』의 국내 역자 후기가
실려있다.
목차들어가며
– 최보련가짜
미래와 지연의 지연 또는 매일 변하는 정원의 기쁨 – 황재민 합성적
청취자 – 로빈 맥케이 막힌
도넛 삽화 – 최보련구멍으로부터의
소용돌이, 또는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에 관한 역자 노트 – 윤원화SISU(Systematic Irregularity Study Unit) 사용자 안내서 - SISU신유물론가속주의의 존재론 – 박준영
저자
및 역자 소개
저자 소개황재민미술평론가. 옛 미디어로서의 미술에 관심이 있다. 『호버링 텍스트』(2019)의 편집에 참여했으며 한국의 젊은 회화 작가 20인을 인터뷰한
온라인 기획 《Painters by Painters ‘18》(2018)을
진행했다.
로빈
맥케이영국
출판사 어바노믹(Urbanomic)의 대표로, 철학과 현대미술에
대해 폭넓게 집필했으며, 여러 예술가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선동했다. 또한
알랭 바디우의 『수와 수들』, 퀑탱 메이야수의 『수와 사이렌』, 프랑수아
라뤼엘의 『비사진의 개념』, 에릭 알리츠의 『뇌의 눈』과 『이미지 허물기』를 포함한 프랑스 철학의 중요한
저작을 다수 번역했다.
최보련시각예술가. 단체전 <If not, not>(keepintouch, 2018)과 <구부러진 안팎>(탈영역 우정국, 2018)등에 참여했다. 매체연합을 통해 증폭된 정념이 고해상도의
소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관찰한다. 노뉴워크의 동료들과 『재-관람차』(2019)를 함께 썼다.
윤원화시각문화
연구자로 주로 동시대 서울의 전시 공간에서 보이는 것들에 관해 글을 쓰고 번역한다. 건축과 영상이론을
공부하고 미술과 시각문화, 도시와 미디어의 접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 『그림 창문 거울: 미술 전시장의 사진들』(2018),
『1002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2016) 등이 있으며, 역서로 『포기한 작업으로부터』(2019), 『기록시스템 1800/1900』(2015) 등이 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에서 <부드러운 지점들>을
공동 제작했다.
SISU(Systematic Irregularity Study Unit)2018년 █████████████████████를 목적으로 ███, ███, ███, ███ 로 결성되어 ███████████████████████████████████████████, ████████████████████████████████████████하고 있다.
박준영수유너머 104 회원. 현대철학 연구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학부에서는 불교철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는 프랑스철학을
연구했다. 대학원 연구 과정에서는 주로 들뢰즈(Deleuze)와
리쾨르(Ricoeur)의 철학을 종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신유물론에 관심을
가지고 번역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속주의(Accelerationism)
정치철학과 육후이(Yuk Hui)의 기술철학도 연구 대상이다. 동서양 철학 개념들이 갈마들고 창발하는 철학적 사유에 대해 생각중이기도 하다.
『해석에 대하여-프로이트에 관한 시론』(공역, 인간사랑, 2013)을 번역하였고,
「들뢰즈에게서 ‘철학’과 ‘철학자’」(진보평론, 2019, 82호) 등의 논문을 썼으며, 『욕망, 고전으로 생각하다』(공저, 너머학교, 2016), 『사랑, 고전으로
생각하다』(공저, 너머학교,
2016) 등의 글을 썼다.
역자 소개김혜림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졸업. 영화평론가. 오큘로, 마테리알, 액트(ACT!) 등에
기고했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풍경과 신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비평플랫폼 콜리그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외부/내부 세계에서 이뤄지는 외재/내재적 관계를 조망하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다.
강덕구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졸업. 블로거.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영화평론가로 활동했다. 가속주의, 문화비평, 아마추어리즘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비평플랫폼 콜리그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외부/내부 세계에서
이뤄지는 외재/내재적 관계를 조망하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다.
책 속에서“통제사회는 개인주의 노동자-나르시시즘적인
자아의식을 가진 소비자의 재생산에 의존하므로, 지속적으로 재측량된 상호보완 과정인 사회적 주체화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 사회적 주체화는 인간성의 이미지를 재활용하고 재강화한다. 탈코드화된 흐름들을 다시금 상징적 질서의 레디메이드 용기(容器) 안으로 흘러 들여와, 욕망하고 소비하고 노동할 수 있는 인간들이
그곳에 존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이다.” (103페이지)
“대학 도서관과 인터넷 사이, 정치적
운동과 학술 공동체와 예술계 주변부의 느슨한 네트워크 사이, 무엇보다도 현실과 픽션 사이에서 어디에
발을 두고 어디로 머리를 향할 것인가는 미리 결정되거나 점차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이러한
정황은 가속주의가 그 이름처럼 하나의 선명한 벡터로 정렬된 것이 아니라 덩굴 식물처럼 틈새가 있는 곳마다 새로운 계열들을 형성해 나간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138페이지)
“거름망에는 목적하는 주파수와 그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값 그리고 Q 인자(Quality-Factor)라는 변수가 있으며 Q 인자는 추출하고자 하는 주파수의 근접 주파수에 가해지는 압력을 수치화 한 것이다. Q 인자가 강할수록 필요로 하는 주파수를 더 정밀하게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는
주변부를 일종의 잡음으로 취급하여 제거하는 것이며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는 방식이다.” (168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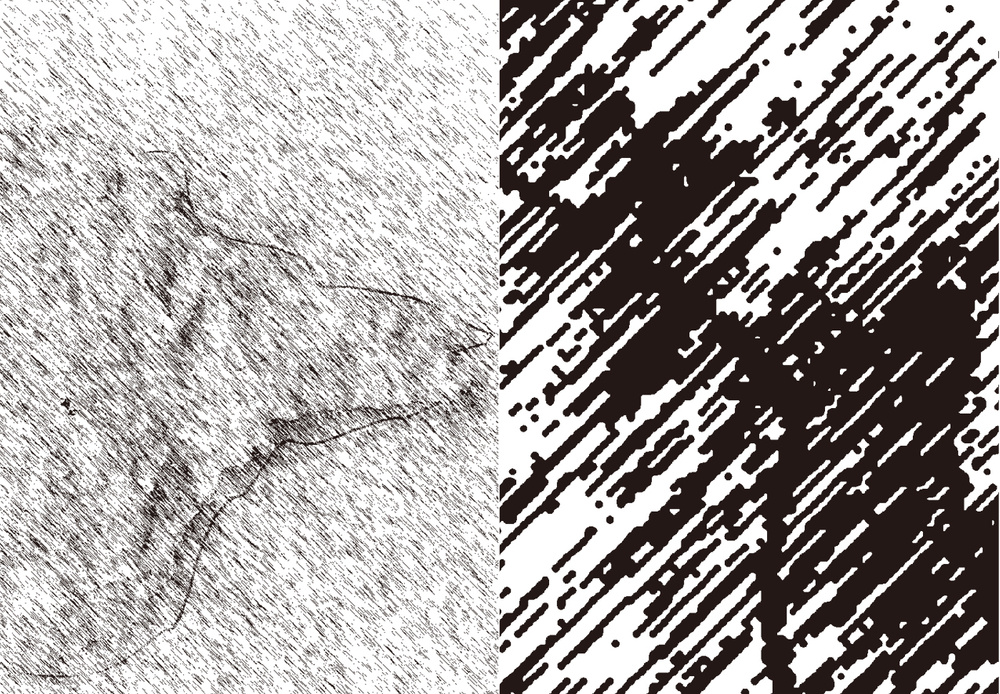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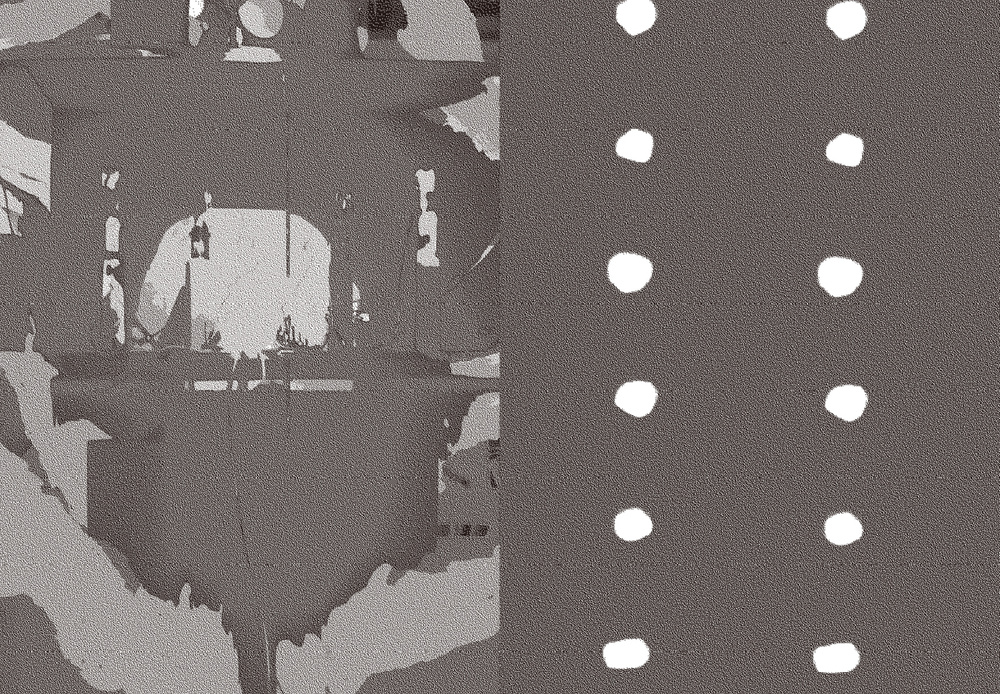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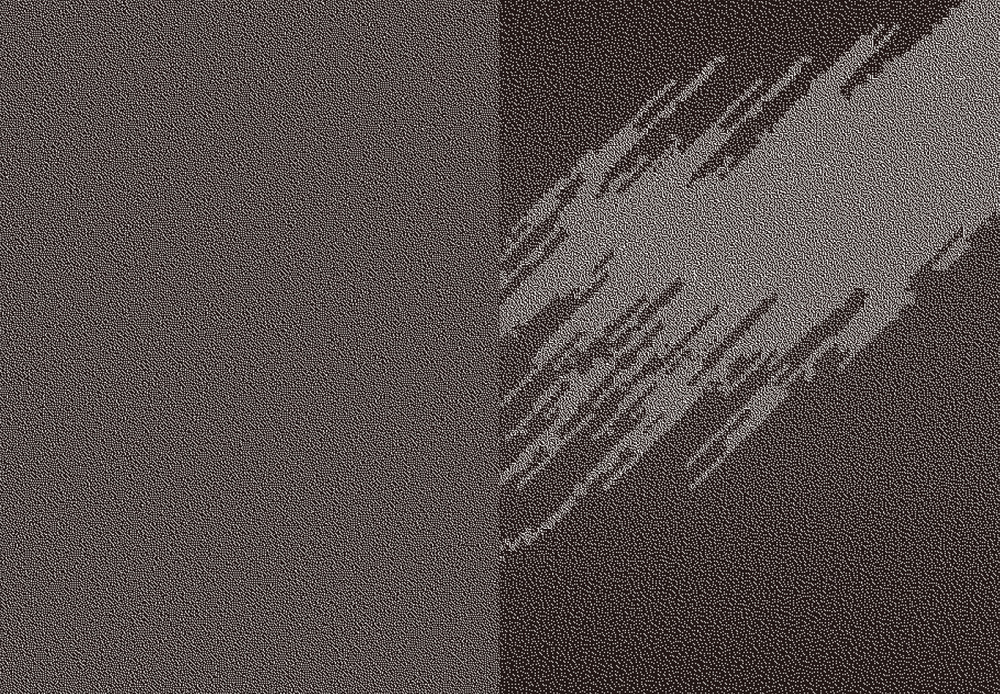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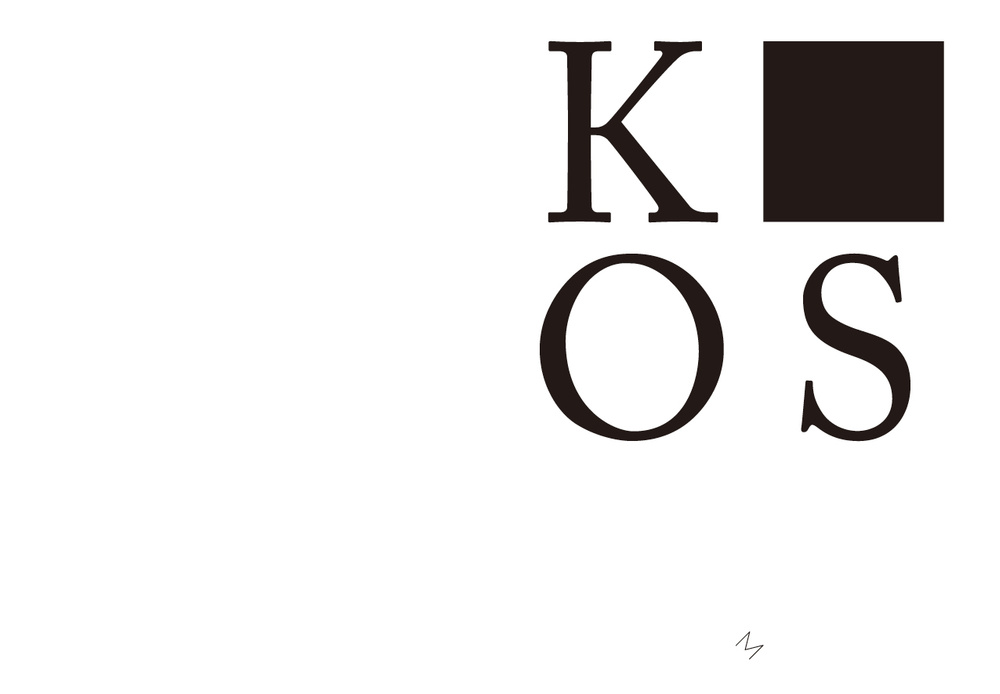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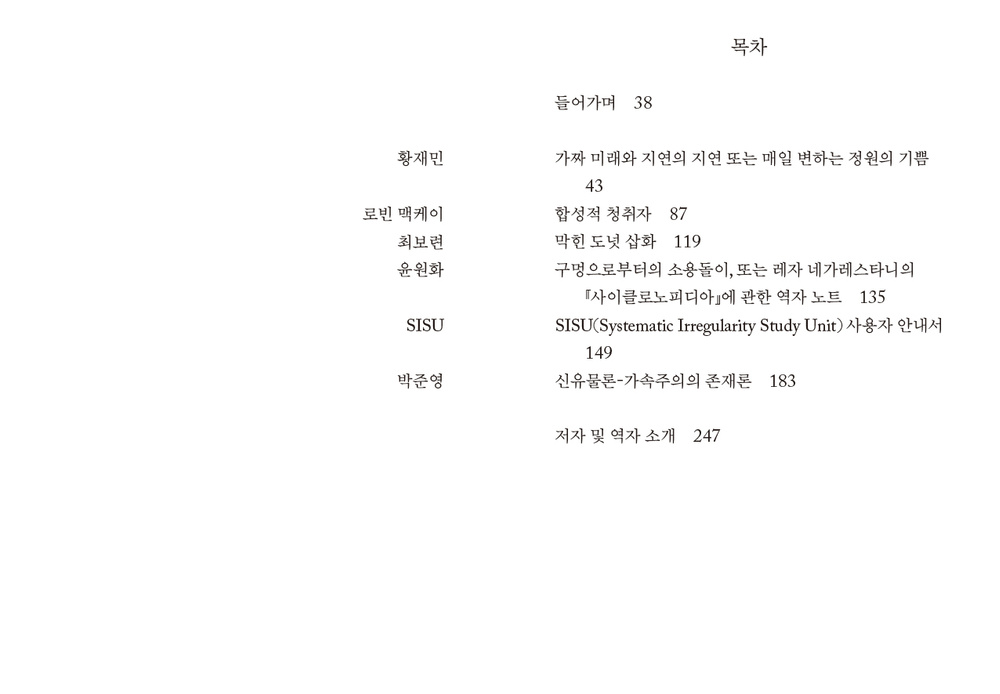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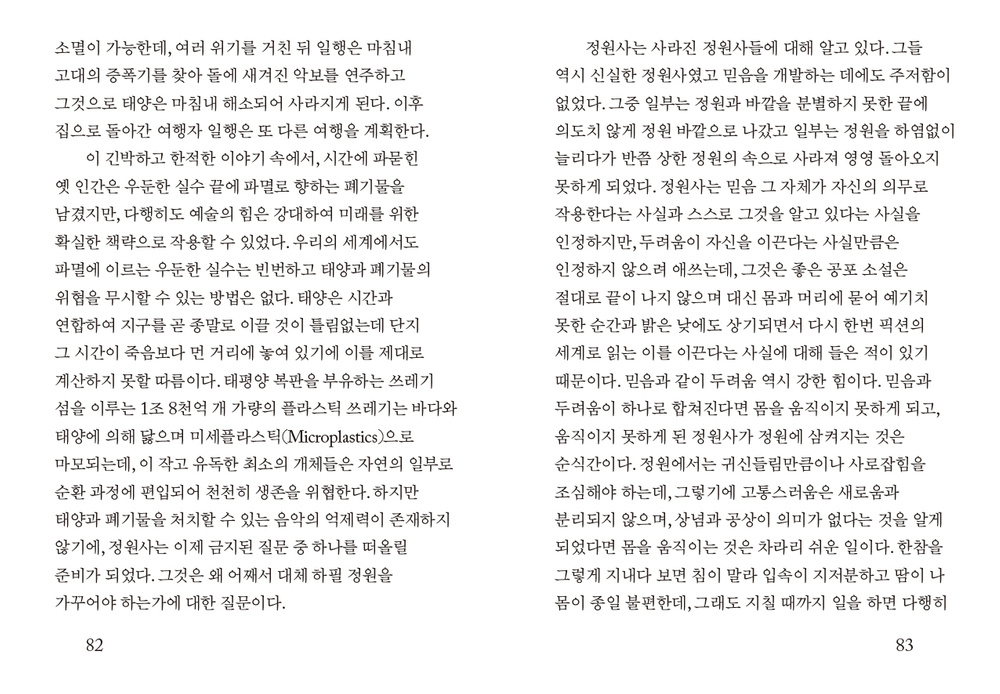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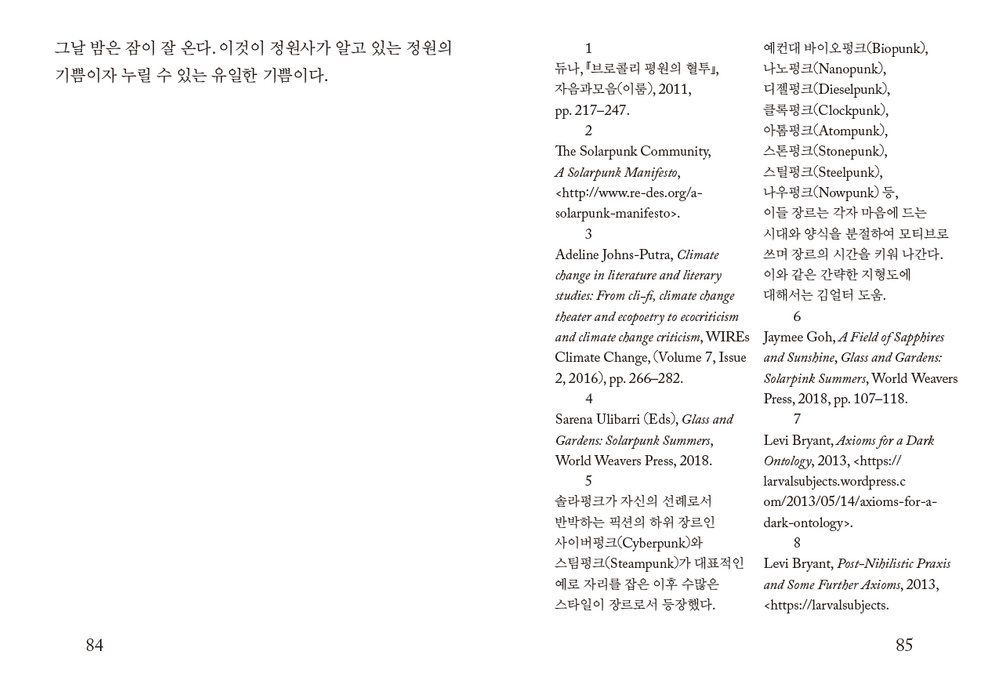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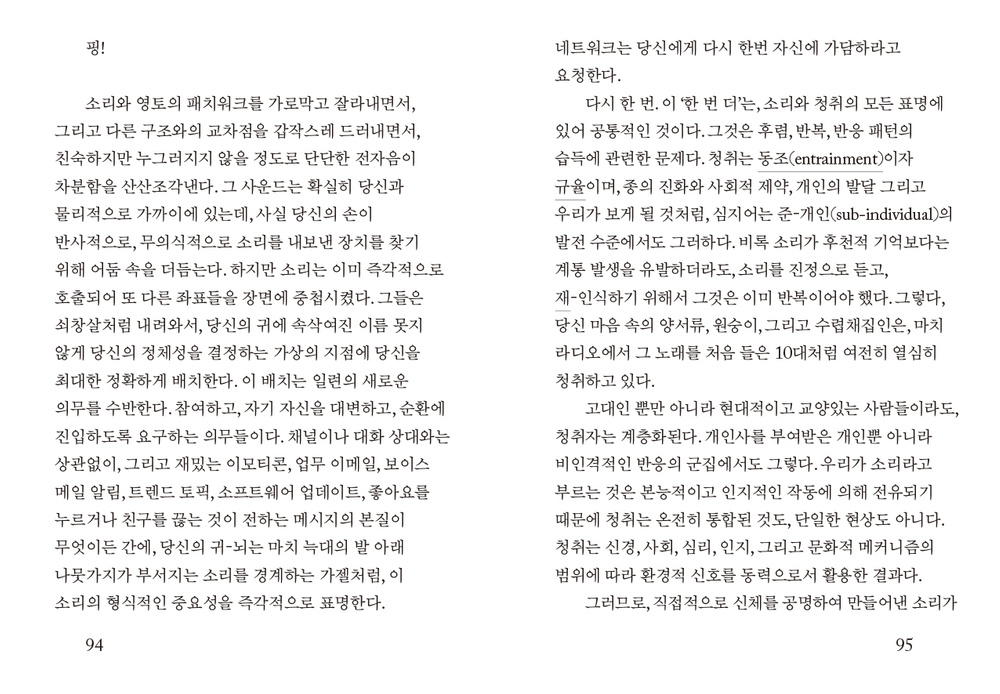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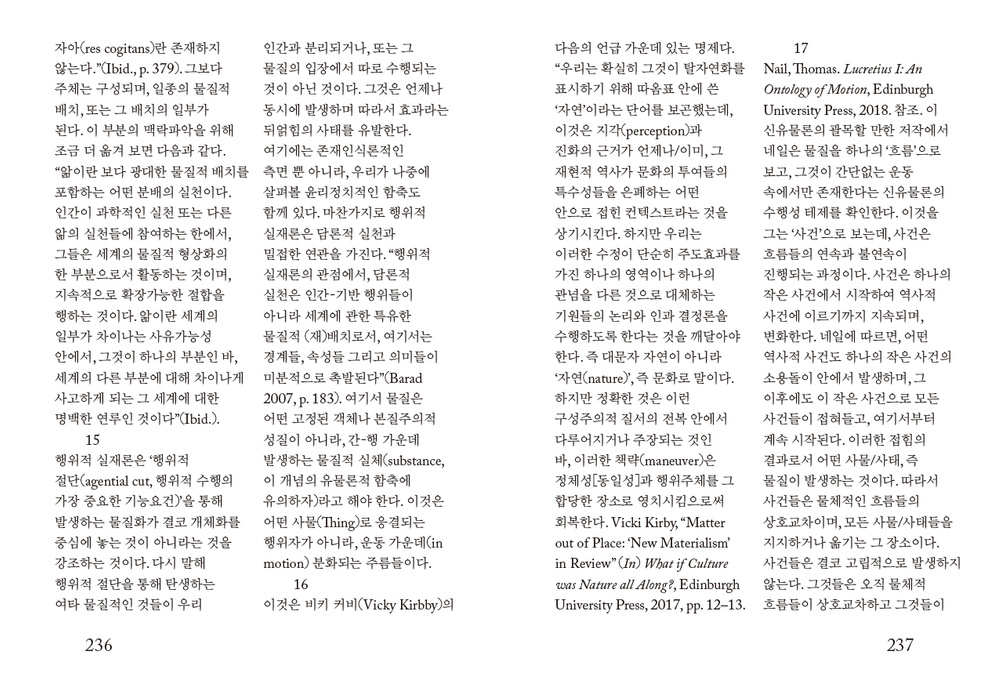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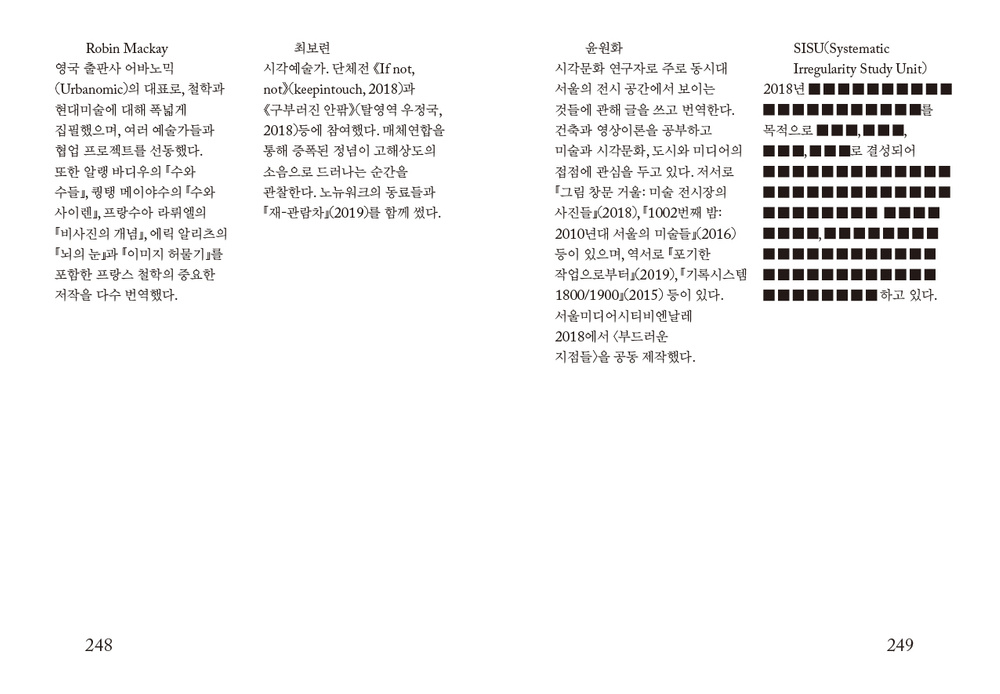
↧
↧
Header
BASIC MEDITATION
CONTACT CART
↧
Sticker
↧
개별꽃
개별꽃 False Starwort![]() 구정연, 김뉘연, 박가희, 신해옥, 이미지, 린다 판 되르선 지음
110×180mm, 152쪽, 사철 소프트커버, 2020년 11월 6일, 17,000원ISBN 979-11-90434-10-2 93600
디자인: 신동혁언어: 한국어, 영어
《Gathering Flowers》는 디자이너 신해옥의 관심과 태도가 디자인의 방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양한 협업자들과 함께 담은 프로젝트다. ‘(신중하게) 꽃을 모으듯’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필자의 다양한 글을 선별하여 한데 묶은 출판물, 선집의 어원인 ‘anthologia’에서 빌려온 프로젝트의 제목은 디자이너를 작업자이자 저자로서 바라보는 프로젝트의 접근과 태도를 은유한다. 디자이너는 작업자로서 사물과 현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수집하며, 이를 시각언어로 잇고 배치하는 편집 과정을 따라 구조를 짓는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 사고를 가진 저자로서 시각물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경험을 생산해 내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의 이러한 수행적 실천에 주목한다.프로젝트는 디자이너 신해옥이 수집한 말, 생각, 이미지를 담은 글과 이미지 뭉치 「개별꽃」을 씨앗 삼아, 이를 해석하는 협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형되고, 상이한 생각과 구조를 교차하면서 전개된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수집된 말과 생각을 신체와 공간이라는 다른 매체로 전환하는 매개자라기보다는, 「개별꽃」을 해석하여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드는, ‘꽃을 모으는’ 생산자가 된다. 동명의 출판물 『개별꽃』은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었던 신해옥의 「개별꽃」을 비롯하여 이를 건네어 받은 협업자들의 생각과 언어가 틔워낸 ‘꽃’을 모은 선집이다.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책의 전반부에 수록된 신해옥이 작성한 「개별꽃」은 성격이 다소 다른 세 꼭지의 글로 이뤄진다. 첫 번째 꼭지에서는 편집자이자 생산자로서 디자이너의 활동을 ‘선집’에 비유하여 앞으로 전개될 글을 소개하고, 이어서 자신의 관심사와 디자인 방법이 느슨히 또 긴밀히 연결되는 수집한 글과 이미지들을 주관적인 당위에 따라 타래처럼 펼쳐 놓는다. 마지막 꼭지는 이 과정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결과물로서 새롭게 배치되고 응집된 구조의 책을 익명 저자의 시점에서 탐험하는 픽션으로 마무리한다. 후반부에 이어지는 세 편의 글은 신해옥의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그 개념을 확장하며 디자인의 구조적, 수행적 측면 등 주요한 관점을 살핀다. 김뉘연은 신해옥의 책 작업을 열고 닫히는 순간마다 동기화되는 사물로 바라보고 이를 양손으로 펼쳐낸 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적절한 지침을 안내한다. 책에 담긴 내용이 아닌 책이 지어진 구조 자체를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각하듯 서술한다. 린다 판 되르선은 그의 디렉토리 어딘가에 저장된 세 장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이를 추적하는 듯한 글쓰기를 선보인다. 본래의 맥락에서 탈각된 개별 이미지에 길게 늘어뜨린 설명을 덧붙여서 이미지와 글이 공생하는 디자이너의 '시각적 방황'을 중계한다. 이미지와 활자가 서로 접합되어 한 줄기에서 흐르는 모양새가 신해옥의 「개별꽃」에서 보이는 편집자적 면모와 닮아있다. 구정연은 디자이너가 생산한 아티스트 북에 대한 질문으로 글을 연다. 그는 2006년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최된 《큐레이터의 사물함》과 연계하여 슬기와민이 제작한 『A REVISED INVENTORY』를 경유하여 책의 구조를 통해 특정한 읽기의 행위를 추동하는 것이야 말로 디자이너의 실천이자 디자인의 수행성이라 주장한다. 「개별꽃」에서 시작된 해석과 편집의 무한 타래는 협업자들의 언어를 따라 여러 차원을 지나 다시 책 『개별꽃』으로 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별꽃이 인쇄된 책갈피를 책 속에 끼워 독자들에게 건넨다. 책갈피를 움직이는 손을 따라 지면을 이동하며 이 타래의 구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가희, 이미지
목차들어가며 — 박가희, 이미지개별꽃 — 신해옥사물의 방식 — 김뉘연드레스 부류하기 — 린다 판 되르선특별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 구정연참여자들
지은이구정연불문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제로원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전시 큐레이터를 거쳐, 미디어버스와 더북소사이어티를 공동 운영했다. 《예술가의 문서들: 예술,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협업》(2016) 전시를 공동 기획했고, 『래디컬 뮤지엄』(현실문화, 2016)을 공역했다. MMCA 작가연구 총서 및 『국립현대미술관 연구 2019: 초국가적 미술관』, 아카이브 연구 포럼 <부재하는 아카이브: 디자인, 건축, 시각문화>(2019)를 기획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김뉘연작가, 편집자. 〈문학적으로 걷기〉, 〈수사학: 장식과 여담〉, 〈시는 직선이다〉, 《비문: 어긋난 말들》, 〈마침〉, 《방》 등으로 문서를 발표했고, 『말하는 사람』과 『모눈 지우개』를 썼다.
린다 판 되르선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이다. 1987년부터 아르만트 메비스와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인 ‘메비스 & 판 되르선’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헤릿 리트벨트 아카데미의 그래픽 디자인과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예일대학교 예술대학 그래픽 디자인과 크리틱으로, 헤이그 왕립 예술학교의 마스터 과정인 NLN(논 리니어 내러티브)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박가희기획자. 전시를 하나의 매체로 간주하고, ‘앎의 사건’을 촉발하는 전시의 수행적 실천에 관심이 있다.
신해옥그래픽 디자이너. 책을 구조로 삼아 텍스트, 이미지, 페이지를 서로 교차시키며 직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관계성에 주목한다. 2014년부터 신동혁과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신신’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강의하며 본인의 관심사를 학생들과 동기화하고 있다.
이미지시각적으로 사고하는 기획자. 디자인과 미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관계 속에서 번안되는 감각과 의미 체계에 관해 탐구한다.
책 속에서사물로서의
책. 인쇄된 책은 사물로 존재한다. 사물로서 책이 존재하게
된 방식은 사물로서 책이 존재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책을 만드는 역할을 맡은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들게 되는 이 사물이 적절히 작동할 만한 방식을 고안해 낸다. 닫힌 책은 열리면서 작동된다. 펼쳐졌을 때, 즉 움직여졌을 때 책은 어떻게 스스로를 드러내게 되는가. 시공간에서 여러 움직임으로 변주될 잠재 가능성을 품은 책들. 이
글은 그동안 디자이너 신해옥이 협업자 신동혁과 함께 ‘신신’으로 활동하며 만들어 온 인쇄물 몇 점을 재료로 삼아 움직임을 내포하는 사물로서의 책을, 그 제작 방식과 사용 방식을 짐작하거나 가늠해 보고 구상해 보기도 하는 우회적 안내문이다. (김뉘연, 「사물의 방식」, 94페이지)
후에
여배우 앤 셰리든으로 명성을 얻게 된 클라라-루 셰리든은 사진 속에서 마치 인쇄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드레스는
두 개의 다른 포스터를 한 장으로 완성하여 이루어져 있다. 스커트는 밝은 주황색과 파란색의 세로형 포스터로, 소매는 보라색과 빨간색의 가로형 포스터의 일부를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이
포스터들은 배급사가 영화 홍보를 위해 제작한 수많은 아이템들 중 두 가지 항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상의는 포스터의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 보이지만, 아마도 빌보드 같은 대형 광고를
위해 제작된 인쇄물일 것이다. 당시 대형 가로 광고판을 채우려면 용지가 총 24장 필요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00년에 빌보드 구조에 붙게 되는 대형 광고가 표준화되었고, 정밀한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는 오프셋 인쇄가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광고 캠페인에 붐이 일었다. 나는 미국의 사진작가 워커
에반스의 1936년 작품인 〈애틀랜타의 집과 빌보드들〉을 떠올린다. 에반스의
사진 한가운데에 캐럴 롬바드가 출연한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또 다른 영화 〈러브 비포 브랙퍼스트〉를 홍보하는 빌보드가 보인다. (린다 판 되르선, 「드레스 분류하기」, 110페이지)
아티스트
북은 통상적인 관점에서 예술가 개인이 만드는 책으로 소개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술가 개인이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아티스트 북을 특정 개인의 작업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뭔가
불공정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 협업이든, 의뢰든 복수의 저자가
존재하는 아티스트 북에서 디자이너의 주권은 어떻게 획득될까. 2000년대 중반 한국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전시라는 외부 환경 및 예술가와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시도하며 아티스트 북을 디자인 실천을 확장하는 동시대적 매체이자 방법론으로 삼았다. 어느 때보다 종이 인쇄물은 다량 생산되었고, 미술기관은 특정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기관 고유의 시각 언어를, 또 개별 작가들은 아티스트 북을 생산해갔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마주하는 풍경은 전통적인 책의 구조와 제작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도대체 디자이너가 만든 아티스트 북은 무엇인가. (구정연, 「특정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122페이지)
구정연, 김뉘연, 박가희, 신해옥, 이미지, 린다 판 되르선 지음
110×180mm, 152쪽, 사철 소프트커버, 2020년 11월 6일, 17,000원ISBN 979-11-90434-10-2 93600
디자인: 신동혁언어: 한국어, 영어
《Gathering Flowers》는 디자이너 신해옥의 관심과 태도가 디자인의 방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양한 협업자들과 함께 담은 프로젝트다. ‘(신중하게) 꽃을 모으듯’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필자의 다양한 글을 선별하여 한데 묶은 출판물, 선집의 어원인 ‘anthologia’에서 빌려온 프로젝트의 제목은 디자이너를 작업자이자 저자로서 바라보는 프로젝트의 접근과 태도를 은유한다. 디자이너는 작업자로서 사물과 현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수집하며, 이를 시각언어로 잇고 배치하는 편집 과정을 따라 구조를 짓는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 사고를 가진 저자로서 시각물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경험을 생산해 내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의 이러한 수행적 실천에 주목한다.프로젝트는 디자이너 신해옥이 수집한 말, 생각, 이미지를 담은 글과 이미지 뭉치 「개별꽃」을 씨앗 삼아, 이를 해석하는 협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형되고, 상이한 생각과 구조를 교차하면서 전개된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수집된 말과 생각을 신체와 공간이라는 다른 매체로 전환하는 매개자라기보다는, 「개별꽃」을 해석하여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드는, ‘꽃을 모으는’ 생산자가 된다. 동명의 출판물 『개별꽃』은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었던 신해옥의 「개별꽃」을 비롯하여 이를 건네어 받은 협업자들의 생각과 언어가 틔워낸 ‘꽃’을 모은 선집이다.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책의 전반부에 수록된 신해옥이 작성한 「개별꽃」은 성격이 다소 다른 세 꼭지의 글로 이뤄진다. 첫 번째 꼭지에서는 편집자이자 생산자로서 디자이너의 활동을 ‘선집’에 비유하여 앞으로 전개될 글을 소개하고, 이어서 자신의 관심사와 디자인 방법이 느슨히 또 긴밀히 연결되는 수집한 글과 이미지들을 주관적인 당위에 따라 타래처럼 펼쳐 놓는다. 마지막 꼭지는 이 과정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결과물로서 새롭게 배치되고 응집된 구조의 책을 익명 저자의 시점에서 탐험하는 픽션으로 마무리한다. 후반부에 이어지는 세 편의 글은 신해옥의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그 개념을 확장하며 디자인의 구조적, 수행적 측면 등 주요한 관점을 살핀다. 김뉘연은 신해옥의 책 작업을 열고 닫히는 순간마다 동기화되는 사물로 바라보고 이를 양손으로 펼쳐낸 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적절한 지침을 안내한다. 책에 담긴 내용이 아닌 책이 지어진 구조 자체를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각하듯 서술한다. 린다 판 되르선은 그의 디렉토리 어딘가에 저장된 세 장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이를 추적하는 듯한 글쓰기를 선보인다. 본래의 맥락에서 탈각된 개별 이미지에 길게 늘어뜨린 설명을 덧붙여서 이미지와 글이 공생하는 디자이너의 '시각적 방황'을 중계한다. 이미지와 활자가 서로 접합되어 한 줄기에서 흐르는 모양새가 신해옥의 「개별꽃」에서 보이는 편집자적 면모와 닮아있다. 구정연은 디자이너가 생산한 아티스트 북에 대한 질문으로 글을 연다. 그는 2006년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최된 《큐레이터의 사물함》과 연계하여 슬기와민이 제작한 『A REVISED INVENTORY』를 경유하여 책의 구조를 통해 특정한 읽기의 행위를 추동하는 것이야 말로 디자이너의 실천이자 디자인의 수행성이라 주장한다. 「개별꽃」에서 시작된 해석과 편집의 무한 타래는 협업자들의 언어를 따라 여러 차원을 지나 다시 책 『개별꽃』으로 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별꽃이 인쇄된 책갈피를 책 속에 끼워 독자들에게 건넨다. 책갈피를 움직이는 손을 따라 지면을 이동하며 이 타래의 구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가희, 이미지
목차들어가며 — 박가희, 이미지개별꽃 — 신해옥사물의 방식 — 김뉘연드레스 부류하기 — 린다 판 되르선특별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 구정연참여자들
지은이구정연불문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제로원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전시 큐레이터를 거쳐, 미디어버스와 더북소사이어티를 공동 운영했다. 《예술가의 문서들: 예술,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협업》(2016) 전시를 공동 기획했고, 『래디컬 뮤지엄』(현실문화, 2016)을 공역했다. MMCA 작가연구 총서 및 『국립현대미술관 연구 2019: 초국가적 미술관』, 아카이브 연구 포럼 <부재하는 아카이브: 디자인, 건축, 시각문화>(2019)를 기획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김뉘연작가, 편집자. 〈문학적으로 걷기〉, 〈수사학: 장식과 여담〉, 〈시는 직선이다〉, 《비문: 어긋난 말들》, 〈마침〉, 《방》 등으로 문서를 발표했고, 『말하는 사람』과 『모눈 지우개』를 썼다.
린다 판 되르선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이다. 1987년부터 아르만트 메비스와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인 ‘메비스 & 판 되르선’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헤릿 리트벨트 아카데미의 그래픽 디자인과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예일대학교 예술대학 그래픽 디자인과 크리틱으로, 헤이그 왕립 예술학교의 마스터 과정인 NLN(논 리니어 내러티브)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박가희기획자. 전시를 하나의 매체로 간주하고, ‘앎의 사건’을 촉발하는 전시의 수행적 실천에 관심이 있다.
신해옥그래픽 디자이너. 책을 구조로 삼아 텍스트, 이미지, 페이지를 서로 교차시키며 직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관계성에 주목한다. 2014년부터 신동혁과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신신’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강의하며 본인의 관심사를 학생들과 동기화하고 있다.
이미지시각적으로 사고하는 기획자. 디자인과 미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관계 속에서 번안되는 감각과 의미 체계에 관해 탐구한다.
책 속에서사물로서의
책. 인쇄된 책은 사물로 존재한다. 사물로서 책이 존재하게
된 방식은 사물로서 책이 존재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책을 만드는 역할을 맡은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들게 되는 이 사물이 적절히 작동할 만한 방식을 고안해 낸다. 닫힌 책은 열리면서 작동된다. 펼쳐졌을 때, 즉 움직여졌을 때 책은 어떻게 스스로를 드러내게 되는가. 시공간에서 여러 움직임으로 변주될 잠재 가능성을 품은 책들. 이
글은 그동안 디자이너 신해옥이 협업자 신동혁과 함께 ‘신신’으로 활동하며 만들어 온 인쇄물 몇 점을 재료로 삼아 움직임을 내포하는 사물로서의 책을, 그 제작 방식과 사용 방식을 짐작하거나 가늠해 보고 구상해 보기도 하는 우회적 안내문이다. (김뉘연, 「사물의 방식」, 94페이지)
후에
여배우 앤 셰리든으로 명성을 얻게 된 클라라-루 셰리든은 사진 속에서 마치 인쇄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드레스는
두 개의 다른 포스터를 한 장으로 완성하여 이루어져 있다. 스커트는 밝은 주황색과 파란색의 세로형 포스터로, 소매는 보라색과 빨간색의 가로형 포스터의 일부를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이
포스터들은 배급사가 영화 홍보를 위해 제작한 수많은 아이템들 중 두 가지 항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상의는 포스터의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 보이지만, 아마도 빌보드 같은 대형 광고를
위해 제작된 인쇄물일 것이다. 당시 대형 가로 광고판을 채우려면 용지가 총 24장 필요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00년에 빌보드 구조에 붙게 되는 대형 광고가 표준화되었고, 정밀한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는 오프셋 인쇄가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광고 캠페인에 붐이 일었다. 나는 미국의 사진작가 워커
에반스의 1936년 작품인 〈애틀랜타의 집과 빌보드들〉을 떠올린다. 에반스의
사진 한가운데에 캐럴 롬바드가 출연한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또 다른 영화 〈러브 비포 브랙퍼스트〉를 홍보하는 빌보드가 보인다. (린다 판 되르선, 「드레스 분류하기」, 110페이지)
아티스트
북은 통상적인 관점에서 예술가 개인이 만드는 책으로 소개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술가 개인이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아티스트 북을 특정 개인의 작업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뭔가
불공정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 협업이든, 의뢰든 복수의 저자가
존재하는 아티스트 북에서 디자이너의 주권은 어떻게 획득될까. 2000년대 중반 한국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전시라는 외부 환경 및 예술가와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시도하며 아티스트 북을 디자인 실천을 확장하는 동시대적 매체이자 방법론으로 삼았다. 어느 때보다 종이 인쇄물은 다량 생산되었고, 미술기관은 특정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기관 고유의 시각 언어를, 또 개별 작가들은 아티스트 북을 생산해갔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마주하는 풍경은 전통적인 책의 구조와 제작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도대체 디자이너가 만든 아티스트 북은 무엇인가. (구정연, 「특정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122페이지)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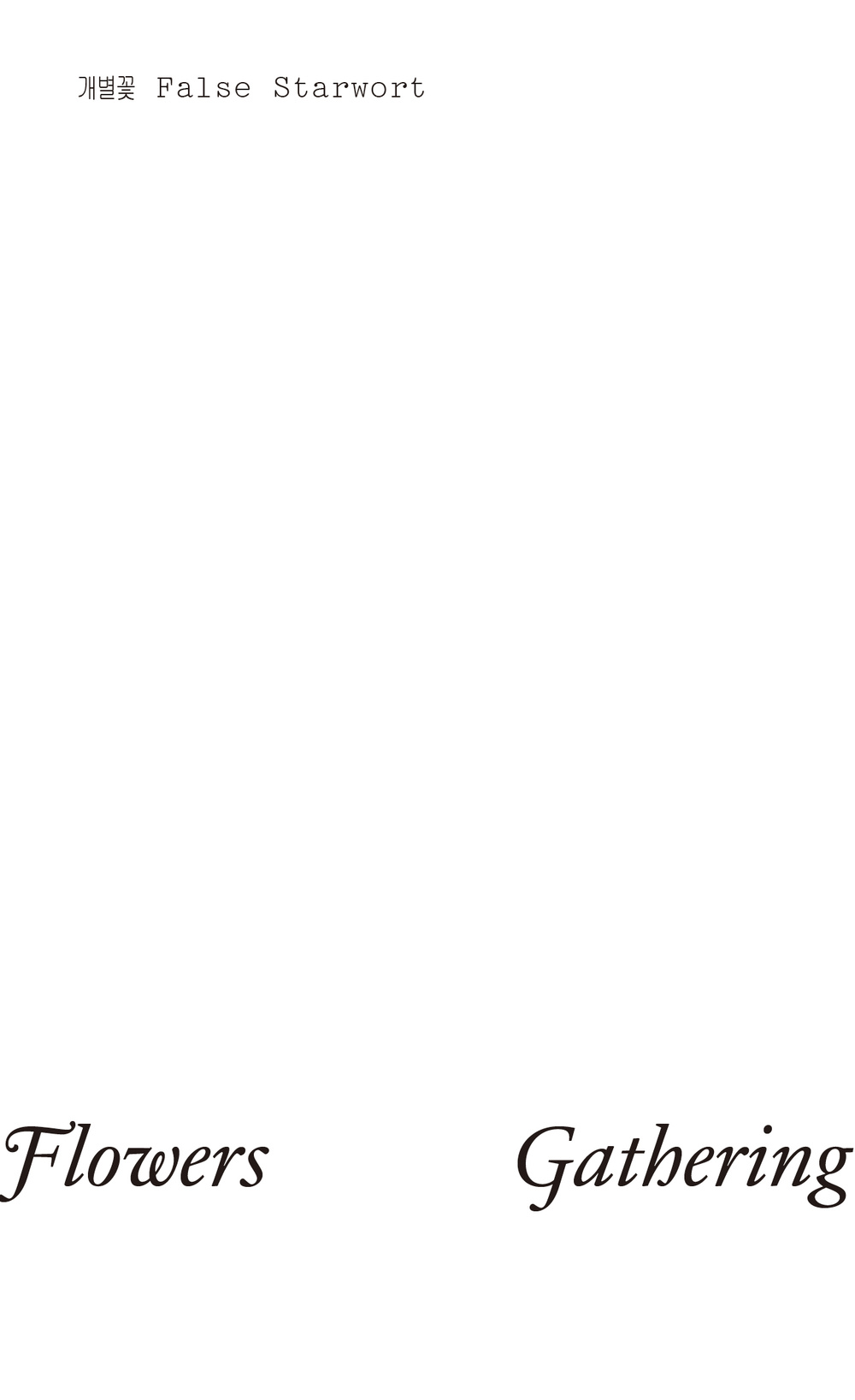 구정연, 김뉘연, 박가희, 신해옥, 이미지, 린다 판 되르선 지음
110×180mm, 152쪽, 사철 소프트커버, 2020년 11월 6일, 17,000원ISBN 979-11-90434-10-2 93600
디자인: 신동혁언어: 한국어, 영어
《Gathering Flowers》는 디자이너 신해옥의 관심과 태도가 디자인의 방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양한 협업자들과 함께 담은 프로젝트다. ‘(신중하게) 꽃을 모으듯’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필자의 다양한 글을 선별하여 한데 묶은 출판물, 선집의 어원인 ‘anthologia’에서 빌려온 프로젝트의 제목은 디자이너를 작업자이자 저자로서 바라보는 프로젝트의 접근과 태도를 은유한다. 디자이너는 작업자로서 사물과 현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수집하며, 이를 시각언어로 잇고 배치하는 편집 과정을 따라 구조를 짓는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 사고를 가진 저자로서 시각물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경험을 생산해 내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의 이러한 수행적 실천에 주목한다.프로젝트는 디자이너 신해옥이 수집한 말, 생각, 이미지를 담은 글과 이미지 뭉치 「개별꽃」을 씨앗 삼아, 이를 해석하는 협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형되고, 상이한 생각과 구조를 교차하면서 전개된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수집된 말과 생각을 신체와 공간이라는 다른 매체로 전환하는 매개자라기보다는, 「개별꽃」을 해석하여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드는, ‘꽃을 모으는’ 생산자가 된다. 동명의 출판물 『개별꽃』은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었던 신해옥의 「개별꽃」을 비롯하여 이를 건네어 받은 협업자들의 생각과 언어가 틔워낸 ‘꽃’을 모은 선집이다.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책의 전반부에 수록된 신해옥이 작성한 「개별꽃」은 성격이 다소 다른 세 꼭지의 글로 이뤄진다. 첫 번째 꼭지에서는 편집자이자 생산자로서 디자이너의 활동을 ‘선집’에 비유하여 앞으로 전개될 글을 소개하고, 이어서 자신의 관심사와 디자인 방법이 느슨히 또 긴밀히 연결되는 수집한 글과 이미지들을 주관적인 당위에 따라 타래처럼 펼쳐 놓는다. 마지막 꼭지는 이 과정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결과물로서 새롭게 배치되고 응집된 구조의 책을 익명 저자의 시점에서 탐험하는 픽션으로 마무리한다. 후반부에 이어지는 세 편의 글은 신해옥의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그 개념을 확장하며 디자인의 구조적, 수행적 측면 등 주요한 관점을 살핀다. 김뉘연은 신해옥의 책 작업을 열고 닫히는 순간마다 동기화되는 사물로 바라보고 이를 양손으로 펼쳐낸 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적절한 지침을 안내한다. 책에 담긴 내용이 아닌 책이 지어진 구조 자체를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각하듯 서술한다. 린다 판 되르선은 그의 디렉토리 어딘가에 저장된 세 장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이를 추적하는 듯한 글쓰기를 선보인다. 본래의 맥락에서 탈각된 개별 이미지에 길게 늘어뜨린 설명을 덧붙여서 이미지와 글이 공생하는 디자이너의 '시각적 방황'을 중계한다. 이미지와 활자가 서로 접합되어 한 줄기에서 흐르는 모양새가 신해옥의 「개별꽃」에서 보이는 편집자적 면모와 닮아있다. 구정연은 디자이너가 생산한 아티스트 북에 대한 질문으로 글을 연다. 그는 2006년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최된 《큐레이터의 사물함》과 연계하여 슬기와민이 제작한 『A REVISED INVENTORY』를 경유하여 책의 구조를 통해 특정한 읽기의 행위를 추동하는 것이야 말로 디자이너의 실천이자 디자인의 수행성이라 주장한다. 「개별꽃」에서 시작된 해석과 편집의 무한 타래는 협업자들의 언어를 따라 여러 차원을 지나 다시 책 『개별꽃』으로 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별꽃이 인쇄된 책갈피를 책 속에 끼워 독자들에게 건넨다. 책갈피를 움직이는 손을 따라 지면을 이동하며 이 타래의 구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가희, 이미지
목차들어가며 — 박가희, 이미지개별꽃 — 신해옥사물의 방식 — 김뉘연드레스 부류하기 — 린다 판 되르선특별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 구정연참여자들
지은이구정연불문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제로원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전시 큐레이터를 거쳐, 미디어버스와 더북소사이어티를 공동 운영했다. 《예술가의 문서들: 예술,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협업》(2016) 전시를 공동 기획했고, 『래디컬 뮤지엄』(현실문화, 2016)을 공역했다. MMCA 작가연구 총서 및 『국립현대미술관 연구 2019: 초국가적 미술관』, 아카이브 연구 포럼 <부재하는 아카이브: 디자인, 건축, 시각문화>(2019)를 기획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김뉘연작가, 편집자. 〈문학적으로 걷기〉, 〈수사학: 장식과 여담〉, 〈시는 직선이다〉, 《비문: 어긋난 말들》, 〈마침〉, 《방》 등으로 문서를 발표했고, 『말하는 사람』과 『모눈 지우개』를 썼다.
린다 판 되르선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이다. 1987년부터 아르만트 메비스와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인 ‘메비스 & 판 되르선’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헤릿 리트벨트 아카데미의 그래픽 디자인과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예일대학교 예술대학 그래픽 디자인과 크리틱으로, 헤이그 왕립 예술학교의 마스터 과정인 NLN(논 리니어 내러티브)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박가희기획자. 전시를 하나의 매체로 간주하고, ‘앎의 사건’을 촉발하는 전시의 수행적 실천에 관심이 있다.
신해옥그래픽 디자이너. 책을 구조로 삼아 텍스트, 이미지, 페이지를 서로 교차시키며 직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관계성에 주목한다. 2014년부터 신동혁과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신신’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강의하며 본인의 관심사를 학생들과 동기화하고 있다.
이미지시각적으로 사고하는 기획자. 디자인과 미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관계 속에서 번안되는 감각과 의미 체계에 관해 탐구한다.
책 속에서사물로서의
책. 인쇄된 책은 사물로 존재한다. 사물로서 책이 존재하게
된 방식은 사물로서 책이 존재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책을 만드는 역할을 맡은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들게 되는 이 사물이 적절히 작동할 만한 방식을 고안해 낸다. 닫힌 책은 열리면서 작동된다. 펼쳐졌을 때, 즉 움직여졌을 때 책은 어떻게 스스로를 드러내게 되는가. 시공간에서 여러 움직임으로 변주될 잠재 가능성을 품은 책들. 이
글은 그동안 디자이너 신해옥이 협업자 신동혁과 함께 ‘신신’으로 활동하며 만들어 온 인쇄물 몇 점을 재료로 삼아 움직임을 내포하는 사물로서의 책을, 그 제작 방식과 사용 방식을 짐작하거나 가늠해 보고 구상해 보기도 하는 우회적 안내문이다. (김뉘연, 「사물의 방식」, 94페이지)
후에
여배우 앤 셰리든으로 명성을 얻게 된 클라라-루 셰리든은 사진 속에서 마치 인쇄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드레스는
두 개의 다른 포스터를 한 장으로 완성하여 이루어져 있다. 스커트는 밝은 주황색과 파란색의 세로형 포스터로, 소매는 보라색과 빨간색의 가로형 포스터의 일부를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이
포스터들은 배급사가 영화 홍보를 위해 제작한 수많은 아이템들 중 두 가지 항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상의는 포스터의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 보이지만, 아마도 빌보드 같은 대형 광고를
위해 제작된 인쇄물일 것이다. 당시 대형 가로 광고판을 채우려면 용지가 총 24장 필요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00년에 빌보드 구조에 붙게 되는 대형 광고가 표준화되었고, 정밀한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는 오프셋 인쇄가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광고 캠페인에 붐이 일었다. 나는 미국의 사진작가 워커
에반스의 1936년 작품인 〈애틀랜타의 집과 빌보드들〉을 떠올린다. 에반스의
사진 한가운데에 캐럴 롬바드가 출연한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또 다른 영화 〈러브 비포 브랙퍼스트〉를 홍보하는 빌보드가 보인다. (린다 판 되르선, 「드레스 분류하기」, 110페이지)
아티스트
북은 통상적인 관점에서 예술가 개인이 만드는 책으로 소개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술가 개인이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아티스트 북을 특정 개인의 작업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뭔가
불공정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 협업이든, 의뢰든 복수의 저자가
존재하는 아티스트 북에서 디자이너의 주권은 어떻게 획득될까. 2000년대 중반 한국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전시라는 외부 환경 및 예술가와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시도하며 아티스트 북을 디자인 실천을 확장하는 동시대적 매체이자 방법론으로 삼았다. 어느 때보다 종이 인쇄물은 다량 생산되었고, 미술기관은 특정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기관 고유의 시각 언어를, 또 개별 작가들은 아티스트 북을 생산해갔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마주하는 풍경은 전통적인 책의 구조와 제작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도대체 디자이너가 만든 아티스트 북은 무엇인가. (구정연, 「특정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122페이지)
구정연, 김뉘연, 박가희, 신해옥, 이미지, 린다 판 되르선 지음
110×180mm, 152쪽, 사철 소프트커버, 2020년 11월 6일, 17,000원ISBN 979-11-90434-10-2 93600
디자인: 신동혁언어: 한국어, 영어
《Gathering Flowers》는 디자이너 신해옥의 관심과 태도가 디자인의 방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양한 협업자들과 함께 담은 프로젝트다. ‘(신중하게) 꽃을 모으듯’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필자의 다양한 글을 선별하여 한데 묶은 출판물, 선집의 어원인 ‘anthologia’에서 빌려온 프로젝트의 제목은 디자이너를 작업자이자 저자로서 바라보는 프로젝트의 접근과 태도를 은유한다. 디자이너는 작업자로서 사물과 현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수집하며, 이를 시각언어로 잇고 배치하는 편집 과정을 따라 구조를 짓는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 사고를 가진 저자로서 시각물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경험을 생산해 내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의 이러한 수행적 실천에 주목한다.프로젝트는 디자이너 신해옥이 수집한 말, 생각, 이미지를 담은 글과 이미지 뭉치 「개별꽃」을 씨앗 삼아, 이를 해석하는 협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형되고, 상이한 생각과 구조를 교차하면서 전개된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수집된 말과 생각을 신체와 공간이라는 다른 매체로 전환하는 매개자라기보다는, 「개별꽃」을 해석하여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드는, ‘꽃을 모으는’ 생산자가 된다. 동명의 출판물 『개별꽃』은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었던 신해옥의 「개별꽃」을 비롯하여 이를 건네어 받은 협업자들의 생각과 언어가 틔워낸 ‘꽃’을 모은 선집이다.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책의 전반부에 수록된 신해옥이 작성한 「개별꽃」은 성격이 다소 다른 세 꼭지의 글로 이뤄진다. 첫 번째 꼭지에서는 편집자이자 생산자로서 디자이너의 활동을 ‘선집’에 비유하여 앞으로 전개될 글을 소개하고, 이어서 자신의 관심사와 디자인 방법이 느슨히 또 긴밀히 연결되는 수집한 글과 이미지들을 주관적인 당위에 따라 타래처럼 펼쳐 놓는다. 마지막 꼭지는 이 과정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결과물로서 새롭게 배치되고 응집된 구조의 책을 익명 저자의 시점에서 탐험하는 픽션으로 마무리한다. 후반부에 이어지는 세 편의 글은 신해옥의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그 개념을 확장하며 디자인의 구조적, 수행적 측면 등 주요한 관점을 살핀다. 김뉘연은 신해옥의 책 작업을 열고 닫히는 순간마다 동기화되는 사물로 바라보고 이를 양손으로 펼쳐낸 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적절한 지침을 안내한다. 책에 담긴 내용이 아닌 책이 지어진 구조 자체를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각하듯 서술한다. 린다 판 되르선은 그의 디렉토리 어딘가에 저장된 세 장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이를 추적하는 듯한 글쓰기를 선보인다. 본래의 맥락에서 탈각된 개별 이미지에 길게 늘어뜨린 설명을 덧붙여서 이미지와 글이 공생하는 디자이너의 '시각적 방황'을 중계한다. 이미지와 활자가 서로 접합되어 한 줄기에서 흐르는 모양새가 신해옥의 「개별꽃」에서 보이는 편집자적 면모와 닮아있다. 구정연은 디자이너가 생산한 아티스트 북에 대한 질문으로 글을 연다. 그는 2006년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최된 《큐레이터의 사물함》과 연계하여 슬기와민이 제작한 『A REVISED INVENTORY』를 경유하여 책의 구조를 통해 특정한 읽기의 행위를 추동하는 것이야 말로 디자이너의 실천이자 디자인의 수행성이라 주장한다. 「개별꽃」에서 시작된 해석과 편집의 무한 타래는 협업자들의 언어를 따라 여러 차원을 지나 다시 책 『개별꽃』으로 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별꽃이 인쇄된 책갈피를 책 속에 끼워 독자들에게 건넨다. 책갈피를 움직이는 손을 따라 지면을 이동하며 이 타래의 구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가희, 이미지
목차들어가며 — 박가희, 이미지개별꽃 — 신해옥사물의 방식 — 김뉘연드레스 부류하기 — 린다 판 되르선특별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 구정연참여자들
지은이구정연불문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제로원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전시 큐레이터를 거쳐, 미디어버스와 더북소사이어티를 공동 운영했다. 《예술가의 문서들: 예술,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협업》(2016) 전시를 공동 기획했고, 『래디컬 뮤지엄』(현실문화, 2016)을 공역했다. MMCA 작가연구 총서 및 『국립현대미술관 연구 2019: 초국가적 미술관』, 아카이브 연구 포럼 <부재하는 아카이브: 디자인, 건축, 시각문화>(2019)를 기획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김뉘연작가, 편집자. 〈문학적으로 걷기〉, 〈수사학: 장식과 여담〉, 〈시는 직선이다〉, 《비문: 어긋난 말들》, 〈마침〉, 《방》 등으로 문서를 발표했고, 『말하는 사람』과 『모눈 지우개』를 썼다.
린다 판 되르선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이다. 1987년부터 아르만트 메비스와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인 ‘메비스 & 판 되르선’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헤릿 리트벨트 아카데미의 그래픽 디자인과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예일대학교 예술대학 그래픽 디자인과 크리틱으로, 헤이그 왕립 예술학교의 마스터 과정인 NLN(논 리니어 내러티브)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박가희기획자. 전시를 하나의 매체로 간주하고, ‘앎의 사건’을 촉발하는 전시의 수행적 실천에 관심이 있다.
신해옥그래픽 디자이너. 책을 구조로 삼아 텍스트, 이미지, 페이지를 서로 교차시키며 직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관계성에 주목한다. 2014년부터 신동혁과 함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신신’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강의하며 본인의 관심사를 학생들과 동기화하고 있다.
이미지시각적으로 사고하는 기획자. 디자인과 미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관계 속에서 번안되는 감각과 의미 체계에 관해 탐구한다.
책 속에서사물로서의
책. 인쇄된 책은 사물로 존재한다. 사물로서 책이 존재하게
된 방식은 사물로서 책이 존재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책을 만드는 역할을 맡은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들게 되는 이 사물이 적절히 작동할 만한 방식을 고안해 낸다. 닫힌 책은 열리면서 작동된다. 펼쳐졌을 때, 즉 움직여졌을 때 책은 어떻게 스스로를 드러내게 되는가. 시공간에서 여러 움직임으로 변주될 잠재 가능성을 품은 책들. 이
글은 그동안 디자이너 신해옥이 협업자 신동혁과 함께 ‘신신’으로 활동하며 만들어 온 인쇄물 몇 점을 재료로 삼아 움직임을 내포하는 사물로서의 책을, 그 제작 방식과 사용 방식을 짐작하거나 가늠해 보고 구상해 보기도 하는 우회적 안내문이다. (김뉘연, 「사물의 방식」, 94페이지)
후에
여배우 앤 셰리든으로 명성을 얻게 된 클라라-루 셰리든은 사진 속에서 마치 인쇄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드레스는
두 개의 다른 포스터를 한 장으로 완성하여 이루어져 있다. 스커트는 밝은 주황색과 파란색의 세로형 포스터로, 소매는 보라색과 빨간색의 가로형 포스터의 일부를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이
포스터들은 배급사가 영화 홍보를 위해 제작한 수많은 아이템들 중 두 가지 항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상의는 포스터의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 보이지만, 아마도 빌보드 같은 대형 광고를
위해 제작된 인쇄물일 것이다. 당시 대형 가로 광고판을 채우려면 용지가 총 24장 필요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00년에 빌보드 구조에 붙게 되는 대형 광고가 표준화되었고, 정밀한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는 오프셋 인쇄가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광고 캠페인에 붐이 일었다. 나는 미국의 사진작가 워커
에반스의 1936년 작품인 〈애틀랜타의 집과 빌보드들〉을 떠올린다. 에반스의
사진 한가운데에 캐럴 롬바드가 출연한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또 다른 영화 〈러브 비포 브랙퍼스트〉를 홍보하는 빌보드가 보인다. (린다 판 되르선, 「드레스 분류하기」, 110페이지)
아티스트
북은 통상적인 관점에서 예술가 개인이 만드는 책으로 소개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술가 개인이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아티스트 북을 특정 개인의 작업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뭔가
불공정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 협업이든, 의뢰든 복수의 저자가
존재하는 아티스트 북에서 디자이너의 주권은 어떻게 획득될까. 2000년대 중반 한국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전시라는 외부 환경 및 예술가와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시도하며 아티스트 북을 디자인 실천을 확장하는 동시대적 매체이자 방법론으로 삼았다. 어느 때보다 종이 인쇄물은 다량 생산되었고, 미술기관은 특정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기관 고유의 시각 언어를, 또 개별 작가들은 아티스트 북을 생산해갔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마주하는 풍경은 전통적인 책의 구조와 제작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도대체 디자이너가 만든 아티스트 북은 무엇인가. (구정연, 「특정한 읽기의 조건 만들기」, 122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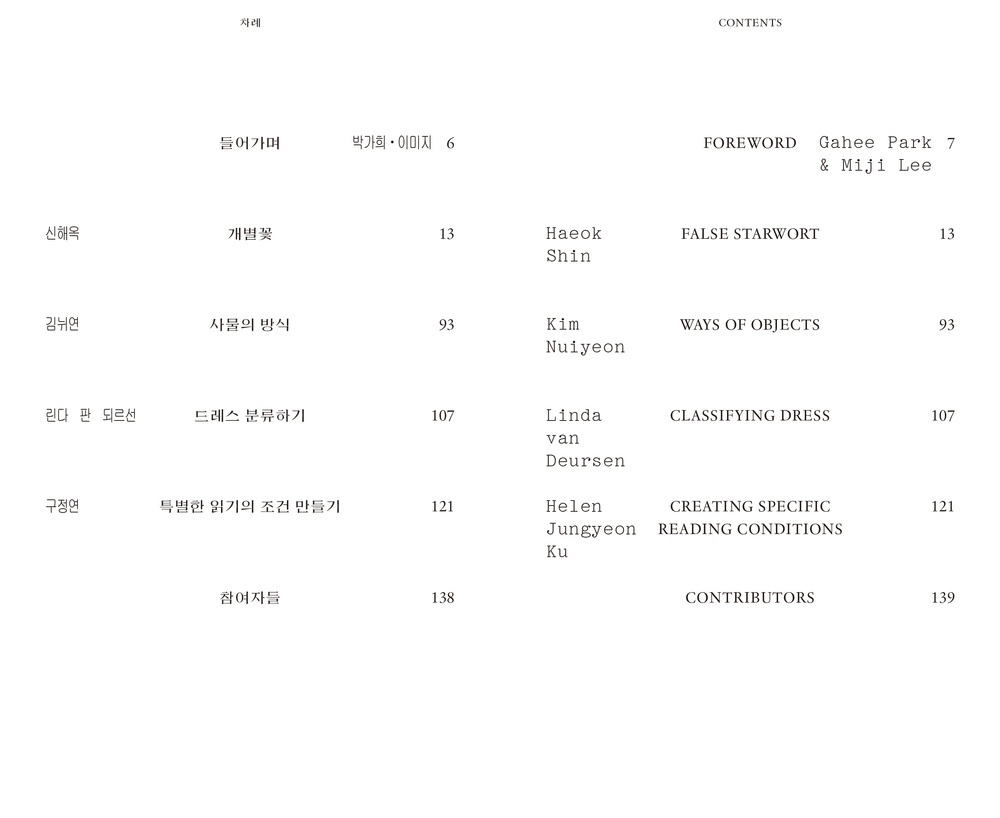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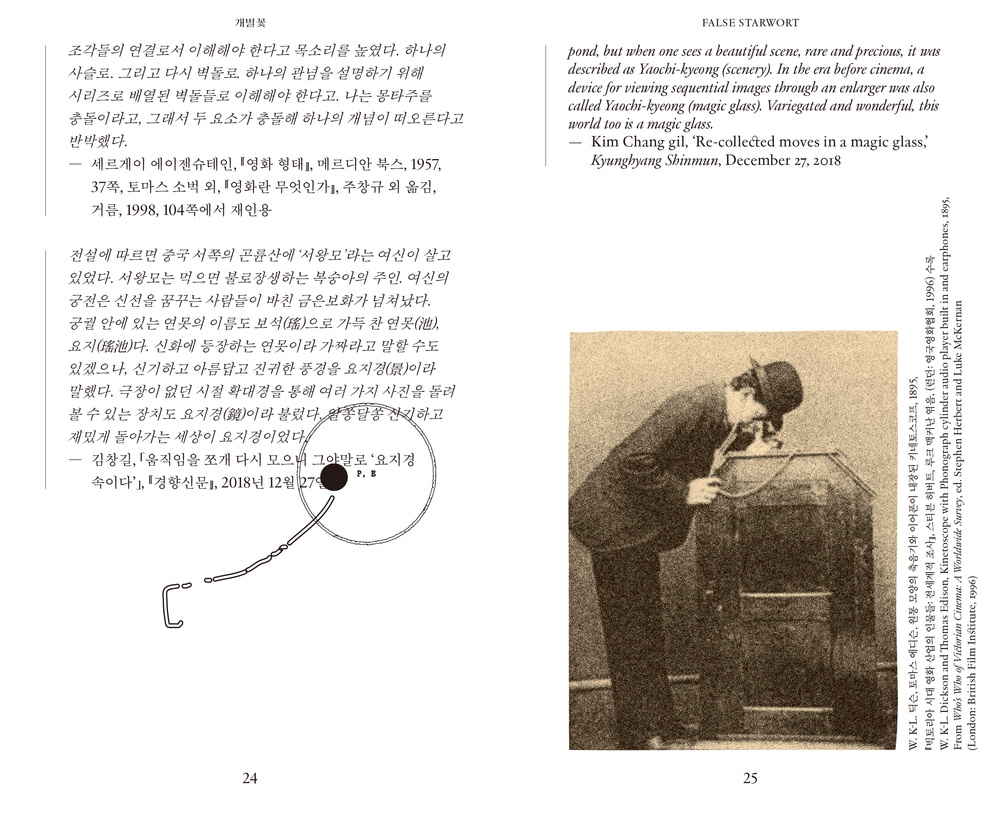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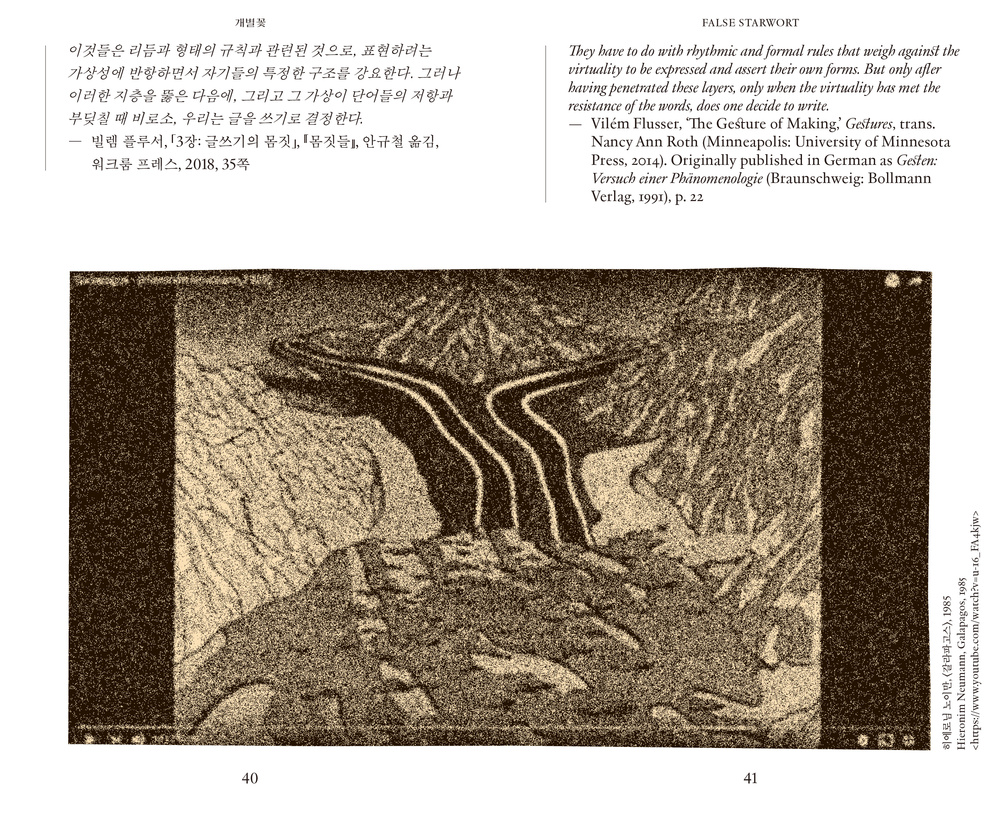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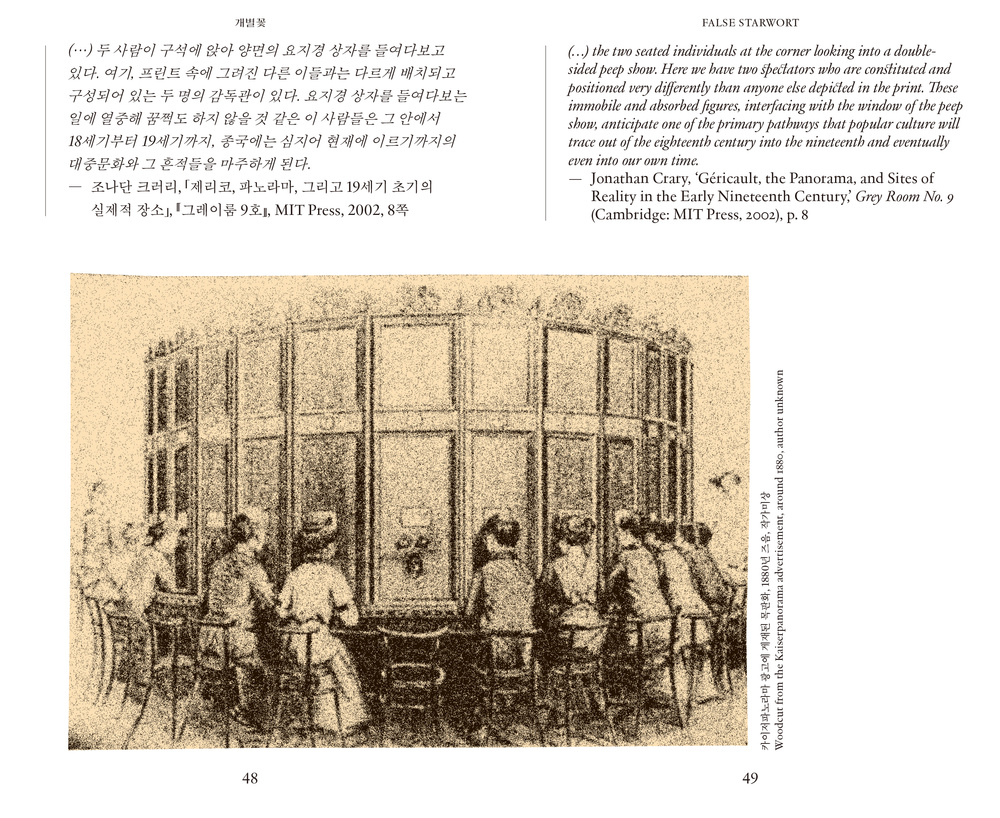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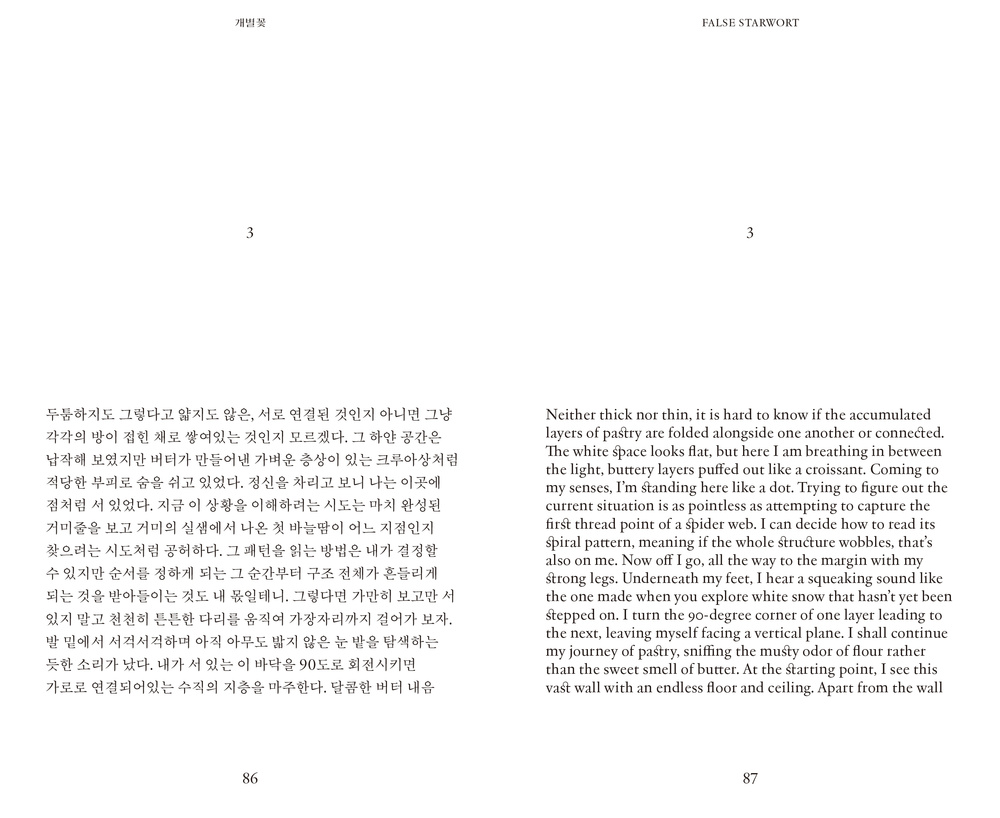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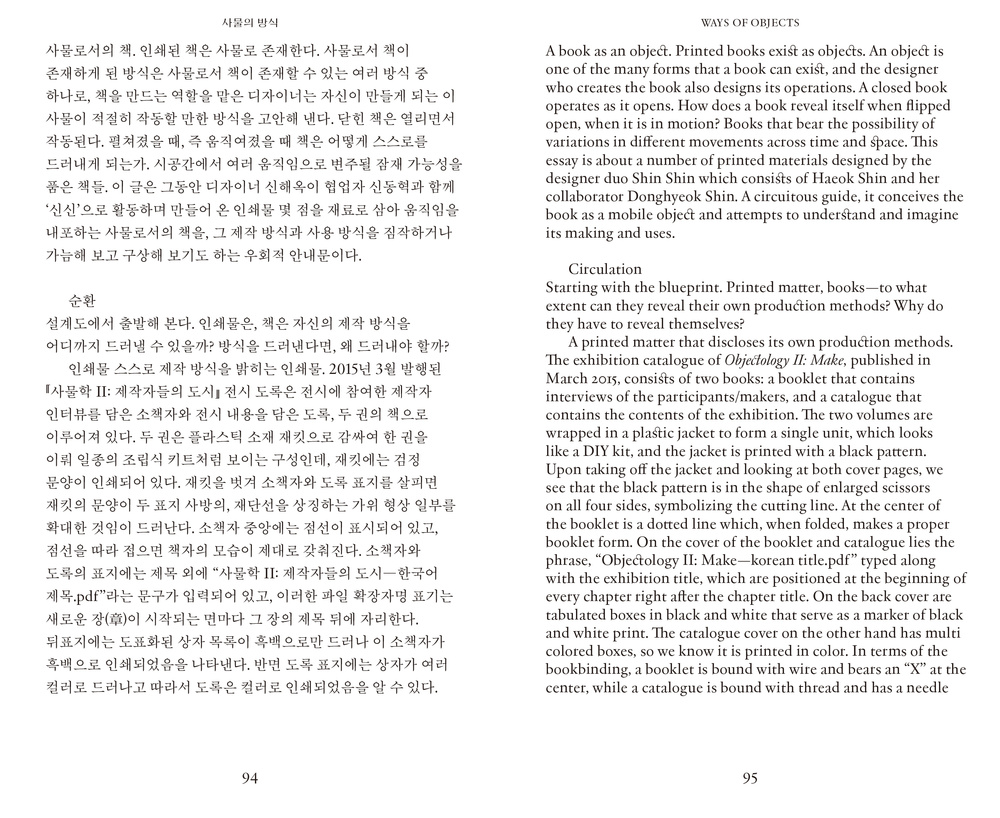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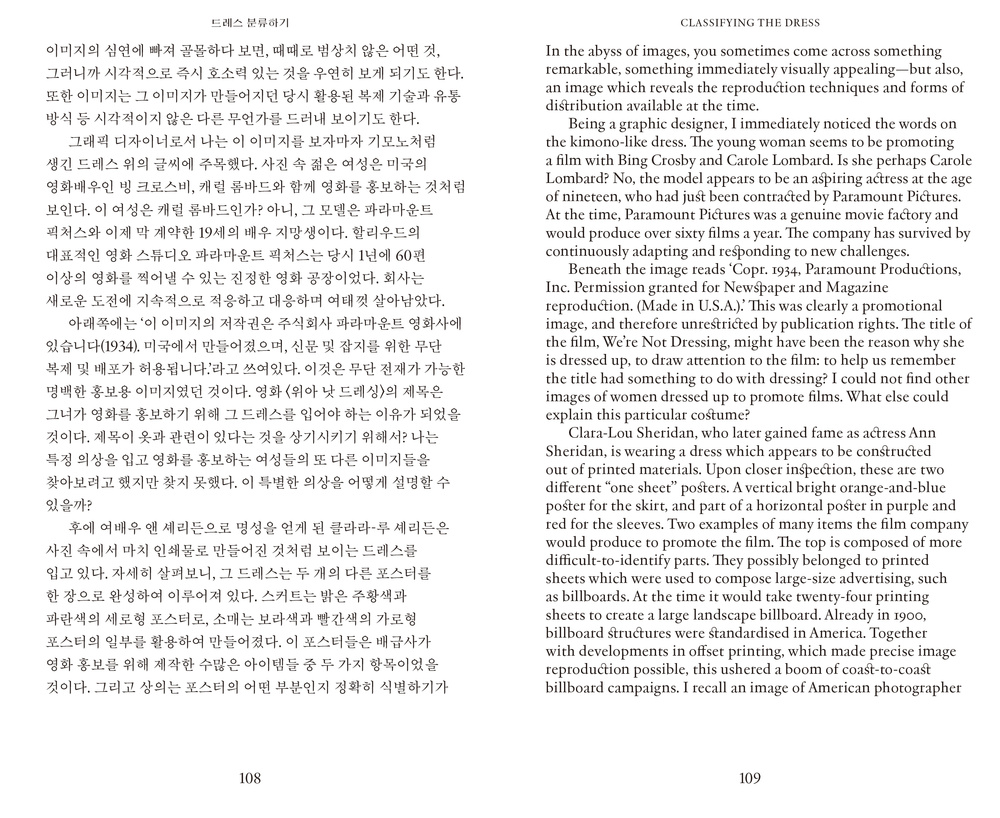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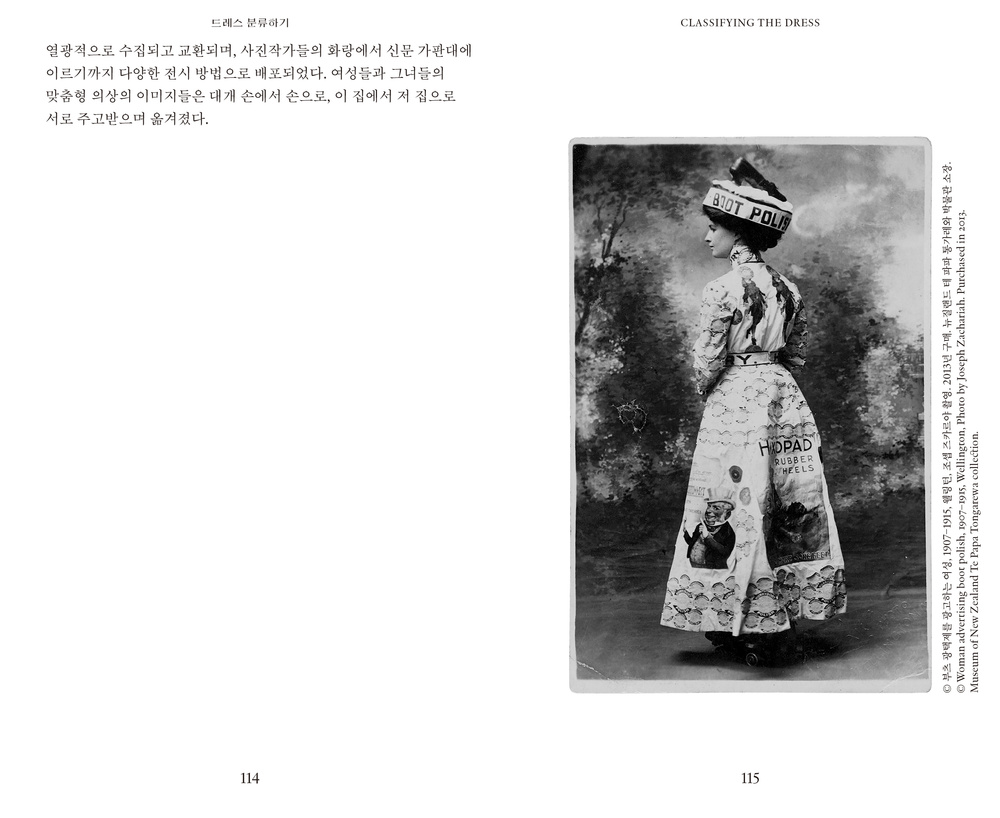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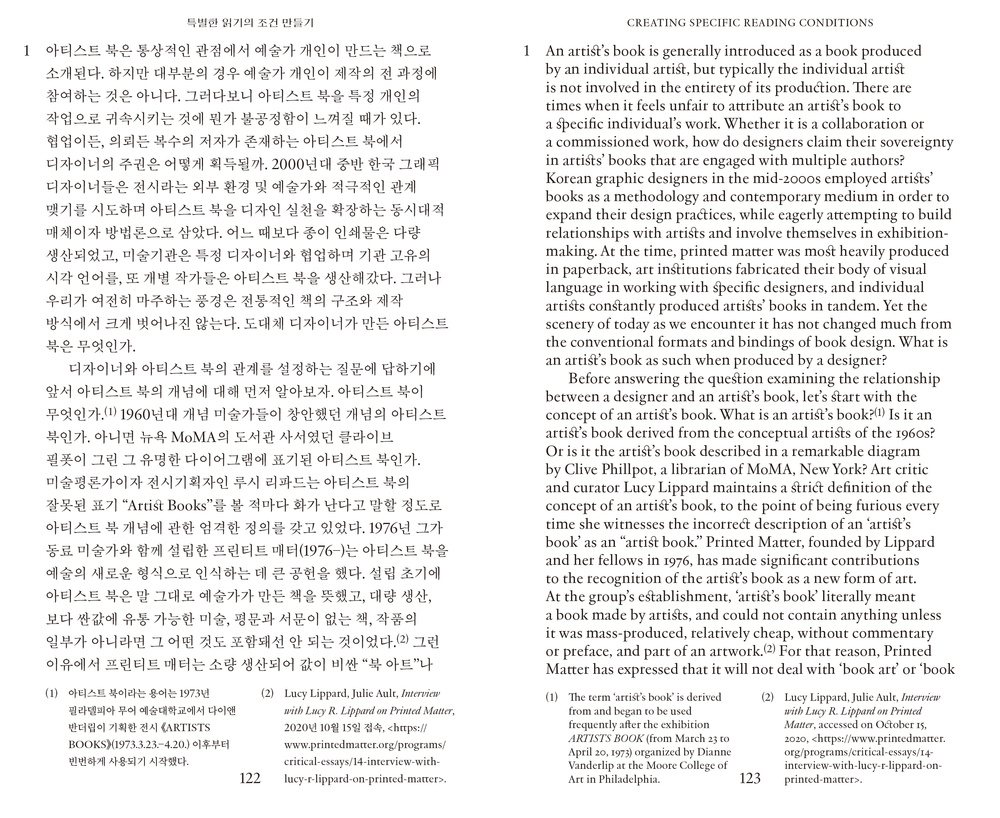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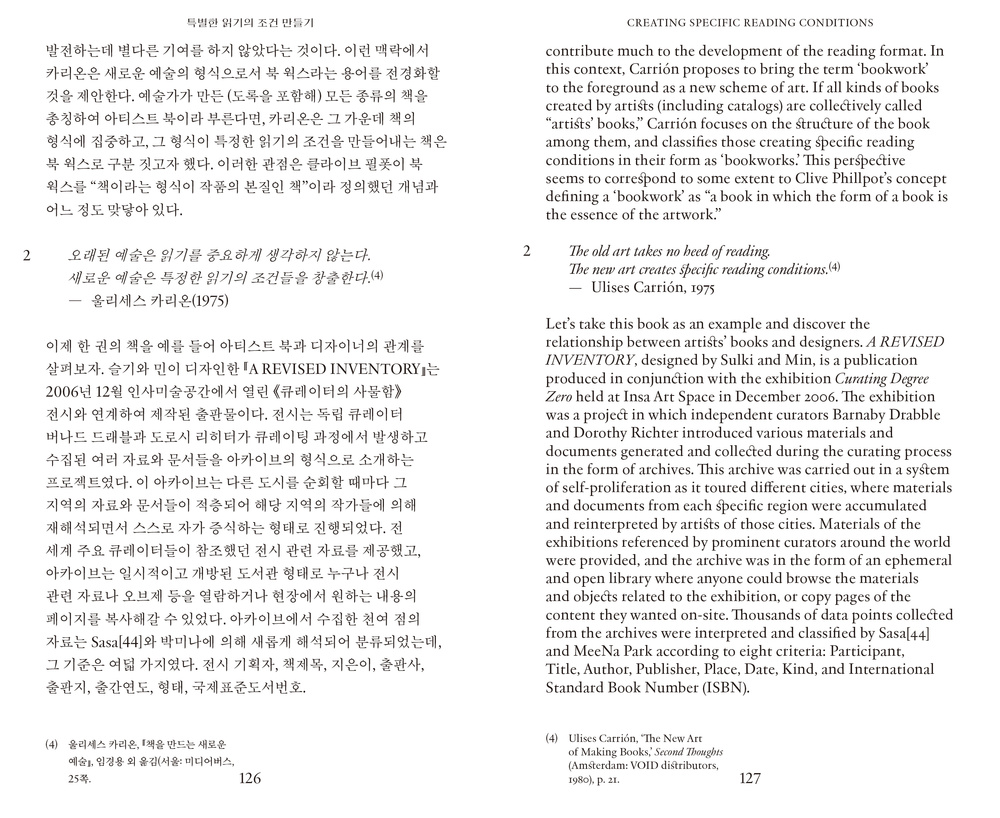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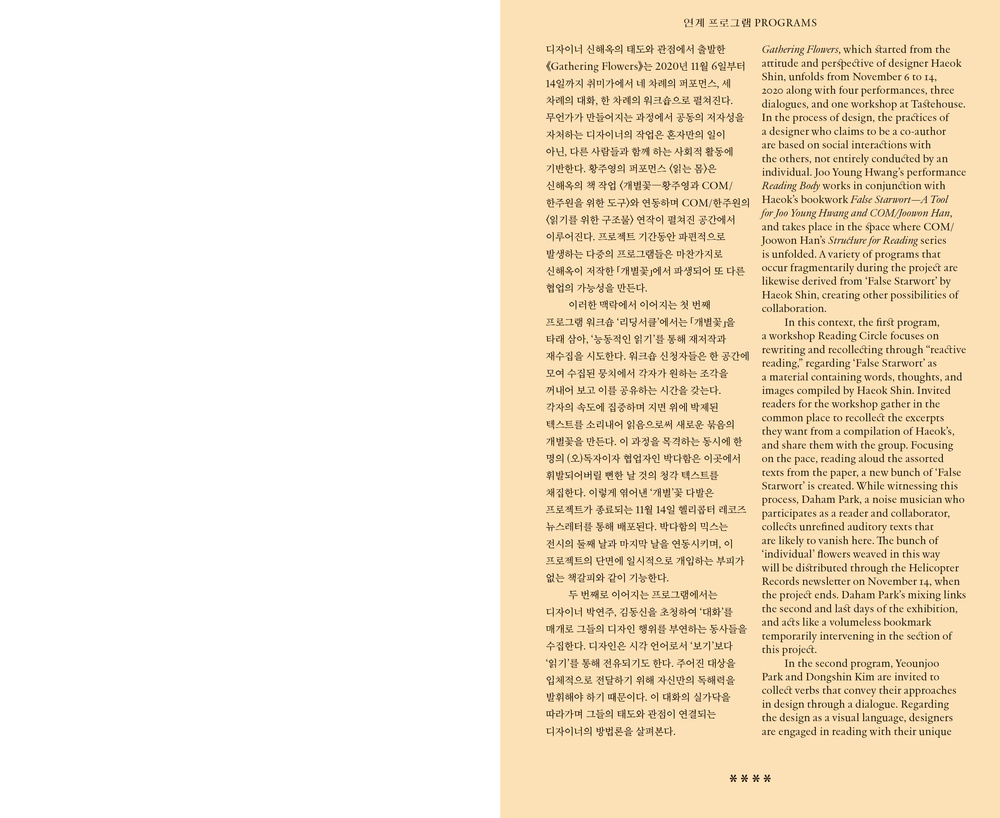

↧
사이클로노피디아 - 작자미상의 자료들을 엮음
사이클로노피디아 - 작가미상의 자료들을 엮음
![]() 저자: 레자 네가레스타니
옮긴이: 윤원화
미디어버스 발행
2021년 4월 27일 발행
디자인: 워크룸
ISBN: 979-11-90434-14-0 (93100)
125x210mm / 400 페이지
값 20,000원
책 소개
“중동은 지각 능력이 있는 존재자다. 그것은 살아 있다!"
중동은 왜 전쟁이 끊이지 않는가? 인류는 왜 파국적 전망 앞에서도 석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인간을 구원해야 할 종교가 왜 죽음을 퍼뜨리는 데 앞장서는가? 『사이클로노피디아』는
모순으로 가득 찬 21세기 초반의 세계를 중동이라는 어두운 구멍으로 빨려 드는 공포스러운 소용돌이로
그려내는 기이한 책이다.
이란 출신의 철학자 레자 네가레스타니는 인터넷이 연결된 현대 중동에서 출발하여 고고학자, 지하드
전사, 석유 밀수꾼, 미국 군인, 이단적인 종교 지도자, 고대 신의 시체, 지구와 태양, 외계의 사냥꾼이 등장하는 사변적 악몽을 펼쳐 보인다. 문학과 철학의 경계를 허무는 강박적이면서도 허풍스러운 글쓰기로 『사이클로노피디아』는 2009년 <아트포럼>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이란의 재야 고고학자 하미드 파르사니 박사는 고대 페르시아의 역사에 숨겨진 신성모독적인 악의 근원을 탐구하다가 수수께끼처럼 실종된다.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적힌 박사의 노트는 그가 석유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면서 미쳐갔음을 보여준다.
한편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익명의 남성을 만나러 이스탄불에 온 미국인 여성은 접선에 실패하고, 그
대신 호텔 방에서 정체불명의 원고를 발견한다. 그녀는 알쏭달쏭한 실마리를 추적해 보지만 더 많은 설정
구멍들을 맞닥뜨리고 애초에 그 남자가 실존 인물이었는지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그 사이에 테러와의 전쟁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석유로 충만한 고대의 비밀스러운 주술에 휘말린다. 마치
전쟁 자체가 전쟁기계들을 먹고 사는 또 하나의 기계로서 도시를 무너뜨려 사막을 확장하고 검은 석유의 심장으로 침략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특별히 한국어 판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철학자 파비오 지로니와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대담이 수록되어 있다.
이 대담은 『사이클로노피디아』라는 흥미진진한 사고 실험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자 이후 저자의 지적 여정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차례
1. 인코그니툼 학테누스: 나는 어떻게 『사이클로노피디아』의 원고를
발견했는가 - 크리스틴 앨번슨
2. 박테리아 고고학: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異) 화학적 내부자
3. 발굴: 유물과 악마적 입자
4. 군단: 전쟁기계, 포식자, 해충
5. 지구행성적 반란: 건조함의 경주장, 태양 폭풍, 지구-태양의
축
6. 지도에 없는 지역들: 촉매적 공간들
7. 다중정치: 개방성과 반란을 위한 공모와 분열 전략
8. 용어 해설
9. 한국어판 부록
10. 역자 해설: 석유와 악마 사이의 문학 - 윤원화
11. 세계를 설계하기, 정신을 세공하기: 레자 네가레스타니와의 대화 - 파비오 지로니
추천사
비할 바 없는 책. 장르의 법칙을 뛰어넘는 공포소설, 묵시론적
신학, 석유에 대한 철학이 이종교배하여 새롭고 불가피한 책을 낳았다.
― 차이나 미에빌, 『바스라그 연대기』 저자
네가레스타니를 읽는 것은 살바도르 달리의 안내에 따라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과 같다.
― 그레이엄 하먼, 『네트워크의 군주: 브뤼노 라투르와 객체지향 철학』 저자
이 탁월하고 흥분되는 책은 중동의 표층적 영토를 가로질러 지하의 심연으로 진입하는 범죄과학적 여정으로 당신을 안내한다. 지구는 살아 있는 인공물로 생산되어 유목적인 전쟁의 전술들, 극단적인
고고학적 실천, 석유 채취의 논리에 의해 내장이 뽑히고 텅 비워진다.
레자 네가레스타니는 철저하게 새로운 언어를 발명하여 종교, 지질학, 전쟁 방식들 간의 관계를 재개념화면서 동시대 중동 정치의 지반 자체를 철학적으로 역지반화한다.
― 에얄 와이즈먼, 포렌식 아키텍처 디렉터
참으로 보기 드문 책. 역사, 지리학, 언어에 대한 신성한 선입견들을 감히 거꾸로 뒤집어서 살아 있는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이니 관념들과 공간들이
유동적으로 운동하는 생명체로 변모하여 상상력과 경이로움으로 다시 숨쉬기 시작한다.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이 훌륭한 소설은 우리를 언어 이전의 그리고 역사 이후의 시간으로 초대한다. 이른바 ‘지식’에 관한
완전히 독창적인 인식과 성찰이 아름답고 폭발적으로 탄생하는 묵시론적인 역작이다.
― E. 엘리어스 메리지, 「잉태」, 「뱀파이어의 그림자」 감독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를 읽는 것은 풍부하고 기이하며 아주 강렬한 경험이다. 그는
석유의 지하적 미스테리에서 H. P. 러브크래프트의 섬뜩한 소설로, 고대
이슬람의 (그리고 이슬람 이전의) 지혜에서 근대 이후 비대칭적인
전쟁의 무시무시한 현실로 도약하면서 21세기 전지구적 문화의 숨겨진 전사(前史)를 파헤친다.
― 스티븐 샤비로, 『사물들의 우주: 사변적 실재론에 관하여』 저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는 지구 전체를 지옥으로 향하는 탄소 순환의 피드백 루프에 묶어 놓은 고대 석유화학적 음모론의 주술적
모체를 정교하게 구성한다.
― 존 커산스, 『언데드의 반란: 아이티, 공포, 좀비
콤플렉스』 저자
서구 독자들은 이 작품으로 ‘난도질당해서 쩍 벌어지는’ 각별히 분열증적인 상태를 기대해도 좋다. 괴기할
정도로 환원적이고 폭력적이고 웃기면서도 도발적인 논문을 생각해 보라. 네가레스타니와 이슬람의 관계는
바타이유와 마르크스주의의 관계와 같다. ... 네가레스타니를 읽어라,
그리고 경배하라.
― 닉 랜드 ,『시간복잡성: 상하이의 시간을 관통하는 무질서한 루프들』 저자
인간의 합리적 사고능력이 점점 한계를 보이는 지금, 합리적 사고능력 자체를 급진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까? 『사이클로노피디아』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훌륭한 음모론적 교양서이자 H. P. 러브크래프트의 충실한 독자들에게는 이름 없는 존재들의 이름과 위치가 기록된 '네크로노미콘'이 될 것이다.
― 류한길, 음악가
불경스러움과 심원함이 하나가 되는 책. 이 책을 처음 접하고 표토층에서 지구 내부로 이어지는
포터블 홀에 빠져버린 것 같았다. 고대 중동의 신과 괴물들, 사막의
전쟁기계, 전설과 추론, 석유와 자본주의, 지정학과 지질학, 지구행성적 정치와 태양의 패권 등의 재료들을 뒤섞고
접합시킨 이 책은 편집증적일 만큼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날카로운 철학적 사변으로 가득했다. 그에 속수무책으로
잠겨 들었고, 온전히 이해하고 소유하고 싶어 안달이 났으며, 이윽고
이 책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일부를 형성해 버렸다. 드디어 번역본을 통해, 두고두고 펼쳐 읽을 그 세계—지구 내부와 행성의 역사 곳곳에 둥지를 튼 구멍들 속으로 다시 한 번 들어갈 수
있어 기쁘다.
― 김아영, 현대미술가, 『다공성 계곡, 이동식 구멍들』 공동 저자
이론적 소설이라는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사이클로노피디아』는 추리소설이나 비법서처럼 짜릿하면서도 엄청난 지적 흥분을 일으킨다. 파르사니라는 가상의 인물과 그의 사유, 저술을 인용하는 이 사변
소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유의 판들이 만들어내는 창발성과 그 이면의 다공성 구조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텍스트다. 무엇보다 중동의 지정학에 어두운 한 독자로서, 이 책은 내게 서로
침투하고 들끓는 힘으로 작동하는 사막 군사주의, 종교, 신화, 역사의 매혹을 열어 보여주었다. 픽션 아닌 픽션으로 짜여진 이야기
더미들이 개미굴처럼 뒤얽힌 『사이클로노피디아』의 지하 세계는 중동뿐 아니라, 지구 전체를 꿈틀거리는
다중정치의 복합체로 새롭게 마주하게 한다.
― 이진실, 미술평론가, 아그라파 소사이어티 멤버
저자 소개
레자 네가레스타니
철학자. 저서로 『지능과 정신』, 『외부적인 것을
유괴하기』, 『크로노시스』(공저) 등이 있다. 현재 NCRP(New
Centre for Research & Practice)의 비판철학 프로그램 디렉터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역자 소개
윤원화
시각문화 연구자. 저서로 『그림 창문 거울: 미술
전시장의 사진들』, 『1002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 등이 있으며, 역서로 『기록시스템 1800/1900』, 『광학적 미디어』 등이 있다.
책 속에서
“석유는 절대적 광기로 자본을 중독시키는 행성적 전염병으로서, 선진 문명의 기술적 특이성으로
가동되는 경제 시스템 내부로 확산된다. 자율성을 지닌 지구생명적 공모자인 석유의 자취를 따라가 보면
자본주의는 인간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성적 규모의 불가피성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여기서 자본주의는 심지어 인간이 출현하기도 전에 자신의 숙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60-61쪽, 박테리아 고고학 -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화학적
내부자들)
“구멍난 공간, 또는 더 정확히 말해서 (완전성의
타락을 함축하는) 구멍난 ( )체 복합체는 지구와 같은 고체에서
특정한 유형의 전복을 촉발하고 가속화한다. 그것이 견고한 모체 내부에 펼쳐 놓는 구멍들은 표면과 깊이
사이에서 진동하는 모호한 존재자들로, 구멍을 뚫는 행위와 그 치명적인 다공성은 모체의 단합성과 완전성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킨다. 벌레 먹은 구멍은 고체의 견고함과 그것을 에워싼 표면의 정합성을 침해한다.”
(82쪽, 박테리아 고고학 -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화학적 내부자들)
“쥐들이 달릴 때는 그들이 망가뜨리는 표면들과 그들 자신이 동시에 증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리스토파네스와
바킬리데스는 새들이 흐름(‘케이스타이’)을 위한 무제한적
열광의 공간인 ‘카오스’를 가로질러 날아간다고 노래했지만, 아무도 그 새들이 대체 어떤 종류인지 묻지
않았다. 날개 없는 것? 박제된 것? 금속 재질의 것? 머리가 잘린 것?
주머니칼로 눈이 도려진 것? ... 아니, 그들은
쥐들이다. 수천 수백만의 쥐떼다.”
(95-96쪽, 박테리아 고고학 -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화학적
내부자들)
“‘은닉된 글쓰기’는 중동 구성체들의 구멍난 건축 및 창발의 모델에 상응한다. 실제로 은닉된
글쓰기는 구멍난 ( )체 복합체와 공모 관계에 있는 모델이다. 그것은
설정 구멍들을 통해 이야기 속으로 읽어 들어가는 접근을 제안한다. 서사적 짜임과 건전한 구조가 있는
텍스트가 그 배열에 순응하는 규율과 절차에 따른 읽기와 쓰기를 요구하듯이, 구멍난 구조, 타락한 구성체, 설정 구멍을 읽고 쓰려면 그에 걸맞은 방법론이 필요하다.”
(106-107쪽, 박테리아 고고학 -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화학적
내부자들)
“전쟁은 확실히 충돌하는 전쟁기계들의 산물이 아니다. 전쟁은 자율적인 비생명을 가지고 전쟁기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증식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쟁기계들은 이처럼 가학적인 전쟁의 음모론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전쟁의 비생명에 참여하는 이론적, 실용적 원칙으로서 악에 맞서는 악의 축을 설계했다. 이 축은 전쟁기계들의 규제와 전술적 역동성이 아니라 전쟁의 전략적 판에 상응하는 군사 기술들로 이루어졌다.”
(131쪽, 발굴 - 유물과
악마적 입자)
“중동의 서사와 서사시는 본질적으로 ‘먼지투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 중동에서는 영적인
여행, 정신을 해방하는 무아지경, 초자연적 여정, 탐사와 도보 여행, 심지어 정치적 집회나 목적이 모호한 신비한 여정조차
강과 바다보다 먼지 자욱한 사막에서 펼쳐집니다. 문명은 바다에 잠기는 대신 사막에 묻히지요. 배들은 사해에서나 발견되고, 신성한 존재들은 먼지를 들이마시며 세계들을
불에 그슬립니다. 이렇게 만사를 먼지로 쌓아 올리는 것은 중동의 맥락에서 (비록 사변적일지라도) 완전히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먼지는 나쁜 업보에 감염된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145쪽, 발굴 - 유물과
악마적 입자)
“인간의 방어기제는 이 행성에서 가장 일관된 존재자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증식하는 편집증이
있어서 모든 접촉을 잠재적 침략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식별한다. 이 같은 편집증적 일관성이 ... 자율성을 획득하면, 그것은 가차없는 분열증으로 변모하여 외부적인
것 또는 이종첩자의 위협에 수동적으로 자신을 개방한다. 인간 중심적 보안체계는 미증유의 질병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로, 외부의 침략에 맞서는 시스템의 일관된 저항과 그에 대응하여 일관되게 확대되는 외부의
침략 사이에서 출현한다.”
(186쪽, 군단 - 전쟁기계, 포식자, 해충)
“총알은 완벽한 시민이다. 이라크의 다국적군은 총알을 ‘반짝이’ 또는 ‘스타 시민’이라고 부른다. 웨스트는 미군 부대들이 도시 공간에 원래 거주하던 시민들을 쫓아내고 그 빈자리를 총알로 채우는 순간 이 새로운
시민들의 철저한 이질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총알의 궤적들과 그 흠잡을 데 없는 집단적 비행은
도시의 지형과 윤곽선에 완전히 동조하면서 도시를 재설계한다. 그에 따라 도시는 다공성 해면동물이나 부석처럼
벌레 먹은 경계성으로 침식되어 구멍난 ( )체 복합체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210-211쪽, 군단 - 전쟁기계, 포식자, 해충)
“히드라글리프 또는 중동 자음 알파벳의 용 문자는 그 자체로 야만적 음악의 음표다. 팔라비어, 히브리어, 아랍어 문자나 사마리아어 알파벳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것들이 어떤 뒤얽힘 또는 더 거대한 고리(모든 괴물들의 어머니)에
대한 분해도를 그려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자로 글을 쓰는 것은 고대의 뱀 또는 용 숭배에
심취하는 것과 같다. 중동의 자음 알파벳 즉 히드라글리프는 그 자체로 휘감기고 칭칭 감긴 역동적 복잡성의
뒤얽힘을 형성한다.”
(248-249쪽, 지구행성적 반란 - 건조함의 경주장, 태양 폭풍, 지구-태양의 축)
“화학(연금술)은 부패와 함께 시작한다. 부패라는 진창의 행위자 앞에 벌거벗겨지면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이라는
것은, 가스를 내뿜는 부패물이나 다름없지 않아?’ ... 그 질문은 악취 나는 공기를 통해 유독한 파문을 불러일으킨다. 부패에
저항하는 것은 헛된 동시에 비옥하다. 하지만 그렇다면 부패에 저항할 때의 비옥함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 속에 공포의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다.”
(278쪽, 지도에 없는 지역들 - 촉매적
공간들)
저자: 레자 네가레스타니
옮긴이: 윤원화
미디어버스 발행
2021년 4월 27일 발행
디자인: 워크룸
ISBN: 979-11-90434-14-0 (93100)
125x210mm / 400 페이지
값 20,000원
책 소개
“중동은 지각 능력이 있는 존재자다. 그것은 살아 있다!"
중동은 왜 전쟁이 끊이지 않는가? 인류는 왜 파국적 전망 앞에서도 석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인간을 구원해야 할 종교가 왜 죽음을 퍼뜨리는 데 앞장서는가? 『사이클로노피디아』는
모순으로 가득 찬 21세기 초반의 세계를 중동이라는 어두운 구멍으로 빨려 드는 공포스러운 소용돌이로
그려내는 기이한 책이다.
이란 출신의 철학자 레자 네가레스타니는 인터넷이 연결된 현대 중동에서 출발하여 고고학자, 지하드
전사, 석유 밀수꾼, 미국 군인, 이단적인 종교 지도자, 고대 신의 시체, 지구와 태양, 외계의 사냥꾼이 등장하는 사변적 악몽을 펼쳐 보인다. 문학과 철학의 경계를 허무는 강박적이면서도 허풍스러운 글쓰기로 『사이클로노피디아』는 2009년 <아트포럼>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이란의 재야 고고학자 하미드 파르사니 박사는 고대 페르시아의 역사에 숨겨진 신성모독적인 악의 근원을 탐구하다가 수수께끼처럼 실종된다.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적힌 박사의 노트는 그가 석유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면서 미쳐갔음을 보여준다.
한편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익명의 남성을 만나러 이스탄불에 온 미국인 여성은 접선에 실패하고, 그
대신 호텔 방에서 정체불명의 원고를 발견한다. 그녀는 알쏭달쏭한 실마리를 추적해 보지만 더 많은 설정
구멍들을 맞닥뜨리고 애초에 그 남자가 실존 인물이었는지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그 사이에 테러와의 전쟁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석유로 충만한 고대의 비밀스러운 주술에 휘말린다. 마치
전쟁 자체가 전쟁기계들을 먹고 사는 또 하나의 기계로서 도시를 무너뜨려 사막을 확장하고 검은 석유의 심장으로 침략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특별히 한국어 판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철학자 파비오 지로니와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대담이 수록되어 있다.
이 대담은 『사이클로노피디아』라는 흥미진진한 사고 실험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자 이후 저자의 지적 여정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차례
1. 인코그니툼 학테누스: 나는 어떻게 『사이클로노피디아』의 원고를
발견했는가 - 크리스틴 앨번슨
2. 박테리아 고고학: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異) 화학적 내부자
3. 발굴: 유물과 악마적 입자
4. 군단: 전쟁기계, 포식자, 해충
5. 지구행성적 반란: 건조함의 경주장, 태양 폭풍, 지구-태양의
축
6. 지도에 없는 지역들: 촉매적 공간들
7. 다중정치: 개방성과 반란을 위한 공모와 분열 전략
8. 용어 해설
9. 한국어판 부록
10. 역자 해설: 석유와 악마 사이의 문학 - 윤원화
11. 세계를 설계하기, 정신을 세공하기: 레자 네가레스타니와의 대화 - 파비오 지로니
추천사
비할 바 없는 책. 장르의 법칙을 뛰어넘는 공포소설, 묵시론적
신학, 석유에 대한 철학이 이종교배하여 새롭고 불가피한 책을 낳았다.
― 차이나 미에빌, 『바스라그 연대기』 저자
네가레스타니를 읽는 것은 살바도르 달리의 안내에 따라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과 같다.
― 그레이엄 하먼, 『네트워크의 군주: 브뤼노 라투르와 객체지향 철학』 저자
이 탁월하고 흥분되는 책은 중동의 표층적 영토를 가로질러 지하의 심연으로 진입하는 범죄과학적 여정으로 당신을 안내한다. 지구는 살아 있는 인공물로 생산되어 유목적인 전쟁의 전술들, 극단적인
고고학적 실천, 석유 채취의 논리에 의해 내장이 뽑히고 텅 비워진다.
레자 네가레스타니는 철저하게 새로운 언어를 발명하여 종교, 지질학, 전쟁 방식들 간의 관계를 재개념화면서 동시대 중동 정치의 지반 자체를 철학적으로 역지반화한다.
― 에얄 와이즈먼, 포렌식 아키텍처 디렉터
참으로 보기 드문 책. 역사, 지리학, 언어에 대한 신성한 선입견들을 감히 거꾸로 뒤집어서 살아 있는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이니 관념들과 공간들이
유동적으로 운동하는 생명체로 변모하여 상상력과 경이로움으로 다시 숨쉬기 시작한다.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이 훌륭한 소설은 우리를 언어 이전의 그리고 역사 이후의 시간으로 초대한다. 이른바 ‘지식’에 관한
완전히 독창적인 인식과 성찰이 아름답고 폭발적으로 탄생하는 묵시론적인 역작이다.
― E. 엘리어스 메리지, 「잉태」, 「뱀파이어의 그림자」 감독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를 읽는 것은 풍부하고 기이하며 아주 강렬한 경험이다. 그는
석유의 지하적 미스테리에서 H. P. 러브크래프트의 섬뜩한 소설로, 고대
이슬람의 (그리고 이슬람 이전의) 지혜에서 근대 이후 비대칭적인
전쟁의 무시무시한 현실로 도약하면서 21세기 전지구적 문화의 숨겨진 전사(前史)를 파헤친다.
― 스티븐 샤비로, 『사물들의 우주: 사변적 실재론에 관하여』 저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는 지구 전체를 지옥으로 향하는 탄소 순환의 피드백 루프에 묶어 놓은 고대 석유화학적 음모론의 주술적
모체를 정교하게 구성한다.
― 존 커산스, 『언데드의 반란: 아이티, 공포, 좀비
콤플렉스』 저자
서구 독자들은 이 작품으로 ‘난도질당해서 쩍 벌어지는’ 각별히 분열증적인 상태를 기대해도 좋다. 괴기할
정도로 환원적이고 폭력적이고 웃기면서도 도발적인 논문을 생각해 보라. 네가레스타니와 이슬람의 관계는
바타이유와 마르크스주의의 관계와 같다. ... 네가레스타니를 읽어라,
그리고 경배하라.
― 닉 랜드 ,『시간복잡성: 상하이의 시간을 관통하는 무질서한 루프들』 저자
인간의 합리적 사고능력이 점점 한계를 보이는 지금, 합리적 사고능력 자체를 급진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까? 『사이클로노피디아』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훌륭한 음모론적 교양서이자 H. P. 러브크래프트의 충실한 독자들에게는 이름 없는 존재들의 이름과 위치가 기록된 '네크로노미콘'이 될 것이다.
― 류한길, 음악가
불경스러움과 심원함이 하나가 되는 책. 이 책을 처음 접하고 표토층에서 지구 내부로 이어지는
포터블 홀에 빠져버린 것 같았다. 고대 중동의 신과 괴물들, 사막의
전쟁기계, 전설과 추론, 석유와 자본주의, 지정학과 지질학, 지구행성적 정치와 태양의 패권 등의 재료들을 뒤섞고
접합시킨 이 책은 편집증적일 만큼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날카로운 철학적 사변으로 가득했다. 그에 속수무책으로
잠겨 들었고, 온전히 이해하고 소유하고 싶어 안달이 났으며, 이윽고
이 책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일부를 형성해 버렸다. 드디어 번역본을 통해, 두고두고 펼쳐 읽을 그 세계—지구 내부와 행성의 역사 곳곳에 둥지를 튼 구멍들 속으로 다시 한 번 들어갈 수
있어 기쁘다.
― 김아영, 현대미술가, 『다공성 계곡, 이동식 구멍들』 공동 저자
이론적 소설이라는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사이클로노피디아』는 추리소설이나 비법서처럼 짜릿하면서도 엄청난 지적 흥분을 일으킨다. 파르사니라는 가상의 인물과 그의 사유, 저술을 인용하는 이 사변
소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유의 판들이 만들어내는 창발성과 그 이면의 다공성 구조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텍스트다. 무엇보다 중동의 지정학에 어두운 한 독자로서, 이 책은 내게 서로
침투하고 들끓는 힘으로 작동하는 사막 군사주의, 종교, 신화, 역사의 매혹을 열어 보여주었다. 픽션 아닌 픽션으로 짜여진 이야기
더미들이 개미굴처럼 뒤얽힌 『사이클로노피디아』의 지하 세계는 중동뿐 아니라, 지구 전체를 꿈틀거리는
다중정치의 복합체로 새롭게 마주하게 한다.
― 이진실, 미술평론가, 아그라파 소사이어티 멤버
저자 소개
레자 네가레스타니
철학자. 저서로 『지능과 정신』, 『외부적인 것을
유괴하기』, 『크로노시스』(공저) 등이 있다. 현재 NCRP(New
Centre for Research & Practice)의 비판철학 프로그램 디렉터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역자 소개
윤원화
시각문화 연구자. 저서로 『그림 창문 거울: 미술
전시장의 사진들』, 『1002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 등이 있으며, 역서로 『기록시스템 1800/1900』, 『광학적 미디어』 등이 있다.
책 속에서
“석유는 절대적 광기로 자본을 중독시키는 행성적 전염병으로서, 선진 문명의 기술적 특이성으로
가동되는 경제 시스템 내부로 확산된다. 자율성을 지닌 지구생명적 공모자인 석유의 자취를 따라가 보면
자본주의는 인간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성적 규모의 불가피성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여기서 자본주의는 심지어 인간이 출현하기도 전에 자신의 숙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60-61쪽, 박테리아 고고학 -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화학적
내부자들)
“구멍난 공간, 또는 더 정확히 말해서 (완전성의
타락을 함축하는) 구멍난 ( )체 복합체는 지구와 같은 고체에서
특정한 유형의 전복을 촉발하고 가속화한다. 그것이 견고한 모체 내부에 펼쳐 놓는 구멍들은 표면과 깊이
사이에서 진동하는 모호한 존재자들로, 구멍을 뚫는 행위와 그 치명적인 다공성은 모체의 단합성과 완전성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킨다. 벌레 먹은 구멍은 고체의 견고함과 그것을 에워싼 표면의 정합성을 침해한다.”
(82쪽, 박테리아 고고학 -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화학적 내부자들)
“쥐들이 달릴 때는 그들이 망가뜨리는 표면들과 그들 자신이 동시에 증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리스토파네스와
바킬리데스는 새들이 흐름(‘케이스타이’)을 위한 무제한적
열광의 공간인 ‘카오스’를 가로질러 날아간다고 노래했지만, 아무도 그 새들이 대체 어떤 종류인지 묻지
않았다. 날개 없는 것? 박제된 것? 금속 재질의 것? 머리가 잘린 것?
주머니칼로 눈이 도려진 것? ... 아니, 그들은
쥐들이다. 수천 수백만의 쥐떼다.”
(95-96쪽, 박테리아 고고학 -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화학적
내부자들)
“‘은닉된 글쓰기’는 중동 구성체들의 구멍난 건축 및 창발의 모델에 상응한다. 실제로 은닉된
글쓰기는 구멍난 ( )체 복합체와 공모 관계에 있는 모델이다. 그것은
설정 구멍들을 통해 이야기 속으로 읽어 들어가는 접근을 제안한다. 서사적 짜임과 건전한 구조가 있는
텍스트가 그 배열에 순응하는 규율과 절차에 따른 읽기와 쓰기를 요구하듯이, 구멍난 구조, 타락한 구성체, 설정 구멍을 읽고 쓰려면 그에 걸맞은 방법론이 필요하다.”
(106-107쪽, 박테리아 고고학 -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화학적
내부자들)
“전쟁은 확실히 충돌하는 전쟁기계들의 산물이 아니다. 전쟁은 자율적인 비생명을 가지고 전쟁기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증식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쟁기계들은 이처럼 가학적인 전쟁의 음모론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전쟁의 비생명에 참여하는 이론적, 실용적 원칙으로서 악에 맞서는 악의 축을 설계했다. 이 축은 전쟁기계들의 규제와 전술적 역동성이 아니라 전쟁의 전략적 판에 상응하는 군사 기술들로 이루어졌다.”
(131쪽, 발굴 - 유물과
악마적 입자)
“중동의 서사와 서사시는 본질적으로 ‘먼지투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 중동에서는 영적인
여행, 정신을 해방하는 무아지경, 초자연적 여정, 탐사와 도보 여행, 심지어 정치적 집회나 목적이 모호한 신비한 여정조차
강과 바다보다 먼지 자욱한 사막에서 펼쳐집니다. 문명은 바다에 잠기는 대신 사막에 묻히지요. 배들은 사해에서나 발견되고, 신성한 존재들은 먼지를 들이마시며 세계들을
불에 그슬립니다. 이렇게 만사를 먼지로 쌓아 올리는 것은 중동의 맥락에서 (비록 사변적일지라도) 완전히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먼지는 나쁜 업보에 감염된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145쪽, 발굴 - 유물과
악마적 입자)
“인간의 방어기제는 이 행성에서 가장 일관된 존재자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증식하는 편집증이
있어서 모든 접촉을 잠재적 침략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식별한다. 이 같은 편집증적 일관성이 ... 자율성을 획득하면, 그것은 가차없는 분열증으로 변모하여 외부적인
것 또는 이종첩자의 위협에 수동적으로 자신을 개방한다. 인간 중심적 보안체계는 미증유의 질병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로, 외부의 침략에 맞서는 시스템의 일관된 저항과 그에 대응하여 일관되게 확대되는 외부의
침략 사이에서 출현한다.”
(186쪽, 군단 - 전쟁기계, 포식자, 해충)
“총알은 완벽한 시민이다. 이라크의 다국적군은 총알을 ‘반짝이’ 또는 ‘스타 시민’이라고 부른다. 웨스트는 미군 부대들이 도시 공간에 원래 거주하던 시민들을 쫓아내고 그 빈자리를 총알로 채우는 순간 이 새로운
시민들의 철저한 이질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총알의 궤적들과 그 흠잡을 데 없는 집단적 비행은
도시의 지형과 윤곽선에 완전히 동조하면서 도시를 재설계한다. 그에 따라 도시는 다공성 해면동물이나 부석처럼
벌레 먹은 경계성으로 침식되어 구멍난 ( )체 복합체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210-211쪽, 군단 - 전쟁기계, 포식자, 해충)
“히드라글리프 또는 중동 자음 알파벳의 용 문자는 그 자체로 야만적 음악의 음표다. 팔라비어, 히브리어, 아랍어 문자나 사마리아어 알파벳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것들이 어떤 뒤얽힘 또는 더 거대한 고리(모든 괴물들의 어머니)에
대한 분해도를 그려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자로 글을 쓰는 것은 고대의 뱀 또는 용 숭배에
심취하는 것과 같다. 중동의 자음 알파벳 즉 히드라글리프는 그 자체로 휘감기고 칭칭 감긴 역동적 복잡성의
뒤얽힘을 형성한다.”
(248-249쪽, 지구행성적 반란 - 건조함의 경주장, 태양 폭풍, 지구-태양의 축)
“화학(연금술)은 부패와 함께 시작한다. 부패라는 진창의 행위자 앞에 벌거벗겨지면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이라는
것은, 가스를 내뿜는 부패물이나 다름없지 않아?’ ... 그 질문은 악취 나는 공기를 통해 유독한 파문을 불러일으킨다. 부패에
저항하는 것은 헛된 동시에 비옥하다. 하지만 그렇다면 부패에 저항할 때의 비옥함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 속에 공포의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다.”
(278쪽, 지도에 없는 지역들 - 촉매적
공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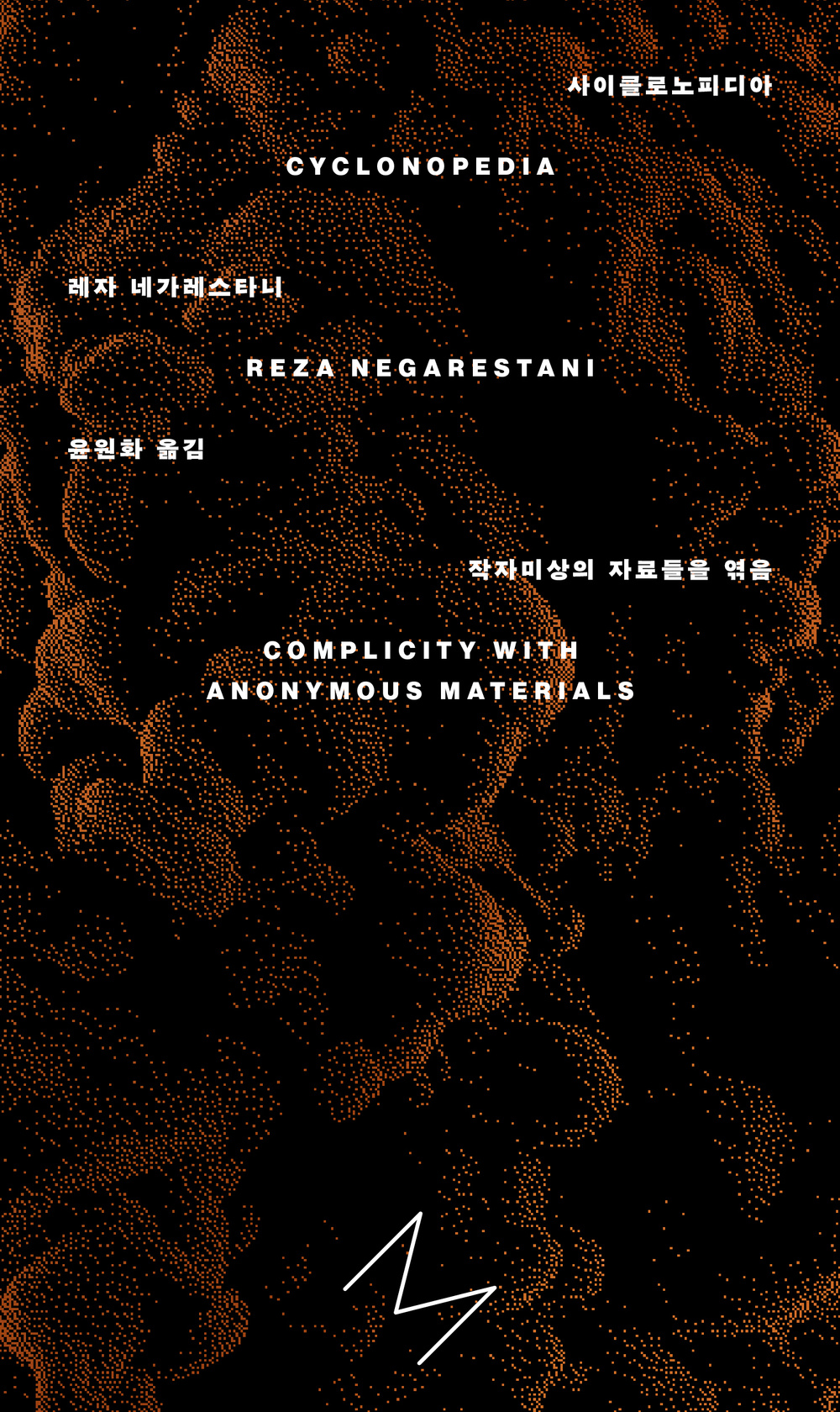 저자: 레자 네가레스타니
옮긴이: 윤원화
미디어버스 발행
2021년 4월 27일 발행
디자인: 워크룸
ISBN: 979-11-90434-14-0 (93100)
125x210mm / 400 페이지
값 20,000원
책 소개
“중동은 지각 능력이 있는 존재자다. 그것은 살아 있다!"
중동은 왜 전쟁이 끊이지 않는가? 인류는 왜 파국적 전망 앞에서도 석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인간을 구원해야 할 종교가 왜 죽음을 퍼뜨리는 데 앞장서는가? 『사이클로노피디아』는
모순으로 가득 찬 21세기 초반의 세계를 중동이라는 어두운 구멍으로 빨려 드는 공포스러운 소용돌이로
그려내는 기이한 책이다.
이란 출신의 철학자 레자 네가레스타니는 인터넷이 연결된 현대 중동에서 출발하여 고고학자, 지하드
전사, 석유 밀수꾼, 미국 군인, 이단적인 종교 지도자, 고대 신의 시체, 지구와 태양, 외계의 사냥꾼이 등장하는 사변적 악몽을 펼쳐 보인다. 문학과 철학의 경계를 허무는 강박적이면서도 허풍스러운 글쓰기로 『사이클로노피디아』는 2009년 <아트포럼>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이란의 재야 고고학자 하미드 파르사니 박사는 고대 페르시아의 역사에 숨겨진 신성모독적인 악의 근원을 탐구하다가 수수께끼처럼 실종된다.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적힌 박사의 노트는 그가 석유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면서 미쳐갔음을 보여준다.
한편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익명의 남성을 만나러 이스탄불에 온 미국인 여성은 접선에 실패하고, 그
대신 호텔 방에서 정체불명의 원고를 발견한다. 그녀는 알쏭달쏭한 실마리를 추적해 보지만 더 많은 설정
구멍들을 맞닥뜨리고 애초에 그 남자가 실존 인물이었는지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그 사이에 테러와의 전쟁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석유로 충만한 고대의 비밀스러운 주술에 휘말린다. 마치
전쟁 자체가 전쟁기계들을 먹고 사는 또 하나의 기계로서 도시를 무너뜨려 사막을 확장하고 검은 석유의 심장으로 침략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특별히 한국어 판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철학자 파비오 지로니와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대담이 수록되어 있다.
이 대담은 『사이클로노피디아』라는 흥미진진한 사고 실험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자 이후 저자의 지적 여정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차례
1. 인코그니툼 학테누스: 나는 어떻게 『사이클로노피디아』의 원고를
발견했는가 - 크리스틴 앨번슨
2. 박테리아 고고학: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異) 화학적 내부자
3. 발굴: 유물과 악마적 입자
4. 군단: 전쟁기계, 포식자, 해충
5. 지구행성적 반란: 건조함의 경주장, 태양 폭풍, 지구-태양의
축
6. 지도에 없는 지역들: 촉매적 공간들
7. 다중정치: 개방성과 반란을 위한 공모와 분열 전략
8. 용어 해설
9. 한국어판 부록
10. 역자 해설: 석유와 악마 사이의 문학 - 윤원화
11. 세계를 설계하기, 정신을 세공하기: 레자 네가레스타니와의 대화 - 파비오 지로니
추천사
비할 바 없는 책. 장르의 법칙을 뛰어넘는 공포소설, 묵시론적
신학, 석유에 대한 철학이 이종교배하여 새롭고 불가피한 책을 낳았다.
― 차이나 미에빌, 『바스라그 연대기』 저자
네가레스타니를 읽는 것은 살바도르 달리의 안내에 따라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과 같다.
― 그레이엄 하먼, 『네트워크의 군주: 브뤼노 라투르와 객체지향 철학』 저자
이 탁월하고 흥분되는 책은 중동의 표층적 영토를 가로질러 지하의 심연으로 진입하는 범죄과학적 여정으로 당신을 안내한다. 지구는 살아 있는 인공물로 생산되어 유목적인 전쟁의 전술들, 극단적인
고고학적 실천, 석유 채취의 논리에 의해 내장이 뽑히고 텅 비워진다.
레자 네가레스타니는 철저하게 새로운 언어를 발명하여 종교, 지질학, 전쟁 방식들 간의 관계를 재개념화면서 동시대 중동 정치의 지반 자체를 철학적으로 역지반화한다.
― 에얄 와이즈먼, 포렌식 아키텍처 디렉터
참으로 보기 드문 책. 역사, 지리학, 언어에 대한 신성한 선입견들을 감히 거꾸로 뒤집어서 살아 있는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이니 관념들과 공간들이
유동적으로 운동하는 생명체로 변모하여 상상력과 경이로움으로 다시 숨쉬기 시작한다.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이 훌륭한 소설은 우리를 언어 이전의 그리고 역사 이후의 시간으로 초대한다. 이른바 ‘지식’에 관한
완전히 독창적인 인식과 성찰이 아름답고 폭발적으로 탄생하는 묵시론적인 역작이다.
― E. 엘리어스 메리지, 「잉태」, 「뱀파이어의 그림자」 감독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를 읽는 것은 풍부하고 기이하며 아주 강렬한 경험이다. 그는
석유의 지하적 미스테리에서 H. P. 러브크래프트의 섬뜩한 소설로, 고대
이슬람의 (그리고 이슬람 이전의) 지혜에서 근대 이후 비대칭적인
전쟁의 무시무시한 현실로 도약하면서 21세기 전지구적 문화의 숨겨진 전사(前史)를 파헤친다.
― 스티븐 샤비로, 『사물들의 우주: 사변적 실재론에 관하여』 저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는 지구 전체를 지옥으로 향하는 탄소 순환의 피드백 루프에 묶어 놓은 고대 석유화학적 음모론의 주술적
모체를 정교하게 구성한다.
― 존 커산스, 『언데드의 반란: 아이티, 공포, 좀비
콤플렉스』 저자
서구 독자들은 이 작품으로 ‘난도질당해서 쩍 벌어지는’ 각별히 분열증적인 상태를 기대해도 좋다. 괴기할
정도로 환원적이고 폭력적이고 웃기면서도 도발적인 논문을 생각해 보라. 네가레스타니와 이슬람의 관계는
바타이유와 마르크스주의의 관계와 같다. ... 네가레스타니를 읽어라,
그리고 경배하라.
― 닉 랜드 ,『시간복잡성: 상하이의 시간을 관통하는 무질서한 루프들』 저자
인간의 합리적 사고능력이 점점 한계를 보이는 지금, 합리적 사고능력 자체를 급진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까? 『사이클로노피디아』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훌륭한 음모론적 교양서이자 H. P. 러브크래프트의 충실한 독자들에게는 이름 없는 존재들의 이름과 위치가 기록된 '네크로노미콘'이 될 것이다.
― 류한길, 음악가
불경스러움과 심원함이 하나가 되는 책. 이 책을 처음 접하고 표토층에서 지구 내부로 이어지는
포터블 홀에 빠져버린 것 같았다. 고대 중동의 신과 괴물들, 사막의
전쟁기계, 전설과 추론, 석유와 자본주의, 지정학과 지질학, 지구행성적 정치와 태양의 패권 등의 재료들을 뒤섞고
접합시킨 이 책은 편집증적일 만큼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날카로운 철학적 사변으로 가득했다. 그에 속수무책으로
잠겨 들었고, 온전히 이해하고 소유하고 싶어 안달이 났으며, 이윽고
이 책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일부를 형성해 버렸다. 드디어 번역본을 통해, 두고두고 펼쳐 읽을 그 세계—지구 내부와 행성의 역사 곳곳에 둥지를 튼 구멍들 속으로 다시 한 번 들어갈 수
있어 기쁘다.
― 김아영, 현대미술가, 『다공성 계곡, 이동식 구멍들』 공동 저자
이론적 소설이라는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사이클로노피디아』는 추리소설이나 비법서처럼 짜릿하면서도 엄청난 지적 흥분을 일으킨다. 파르사니라는 가상의 인물과 그의 사유, 저술을 인용하는 이 사변
소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유의 판들이 만들어내는 창발성과 그 이면의 다공성 구조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텍스트다. 무엇보다 중동의 지정학에 어두운 한 독자로서, 이 책은 내게 서로
침투하고 들끓는 힘으로 작동하는 사막 군사주의, 종교, 신화, 역사의 매혹을 열어 보여주었다. 픽션 아닌 픽션으로 짜여진 이야기
더미들이 개미굴처럼 뒤얽힌 『사이클로노피디아』의 지하 세계는 중동뿐 아니라, 지구 전체를 꿈틀거리는
다중정치의 복합체로 새롭게 마주하게 한다.
― 이진실, 미술평론가, 아그라파 소사이어티 멤버
저자 소개
레자 네가레스타니
철학자. 저서로 『지능과 정신』, 『외부적인 것을
유괴하기』, 『크로노시스』(공저) 등이 있다. 현재 NCRP(New
Centre for Research & Practice)의 비판철학 프로그램 디렉터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역자 소개
윤원화
시각문화 연구자. 저서로 『그림 창문 거울: 미술
전시장의 사진들』, 『1002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 등이 있으며, 역서로 『기록시스템 1800/1900』, 『광학적 미디어』 등이 있다.
책 속에서
“석유는 절대적 광기로 자본을 중독시키는 행성적 전염병으로서, 선진 문명의 기술적 특이성으로
가동되는 경제 시스템 내부로 확산된다. 자율성을 지닌 지구생명적 공모자인 석유의 자취를 따라가 보면
자본주의는 인간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성적 규모의 불가피성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여기서 자본주의는 심지어 인간이 출현하기도 전에 자신의 숙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60-61쪽, 박테리아 고고학 -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화학적
내부자들)
“구멍난 공간, 또는 더 정확히 말해서 (완전성의
타락을 함축하는) 구멍난 ( )체 복합체는 지구와 같은 고체에서
특정한 유형의 전복을 촉발하고 가속화한다. 그것이 견고한 모체 내부에 펼쳐 놓는 구멍들은 표면과 깊이
사이에서 진동하는 모호한 존재자들로, 구멍을 뚫는 행위와 그 치명적인 다공성은 모체의 단합성과 완전성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킨다. 벌레 먹은 구멍은 고체의 견고함과 그것을 에워싼 표면의 정합성을 침해한다.”
(82쪽, 박테리아 고고학 -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화학적 내부자들)
“쥐들이 달릴 때는 그들이 망가뜨리는 표면들과 그들 자신이 동시에 증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리스토파네스와
바킬리데스는 새들이 흐름(‘케이스타이’)을 위한 무제한적
열광의 공간인 ‘카오스’를 가로질러 날아간다고 노래했지만, 아무도 그 새들이 대체 어떤 종류인지 묻지
않았다. 날개 없는 것? 박제된 것? 금속 재질의 것? 머리가 잘린 것?
주머니칼로 눈이 도려진 것? ... 아니, 그들은
쥐들이다. 수천 수백만의 쥐떼다.”
(95-96쪽, 박테리아 고고학 -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화학적
내부자들)
“‘은닉된 글쓰기’는 중동 구성체들의 구멍난 건축 및 창발의 모델에 상응한다. 실제로 은닉된
글쓰기는 구멍난 ( )체 복합체와 공모 관계에 있는 모델이다. 그것은
설정 구멍들을 통해 이야기 속으로 읽어 들어가는 접근을 제안한다. 서사적 짜임과 건전한 구조가 있는
텍스트가 그 배열에 순응하는 규율과 절차에 따른 읽기와 쓰기를 요구하듯이, 구멍난 구조, 타락한 구성체, 설정 구멍을 읽고 쓰려면 그에 걸맞은 방법론이 필요하다.”
(106-107쪽, 박테리아 고고학 -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화학적
내부자들)
“전쟁은 확실히 충돌하는 전쟁기계들의 산물이 아니다. 전쟁은 자율적인 비생명을 가지고 전쟁기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증식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쟁기계들은 이처럼 가학적인 전쟁의 음모론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전쟁의 비생명에 참여하는 이론적, 실용적 원칙으로서 악에 맞서는 악의 축을 설계했다. 이 축은 전쟁기계들의 규제와 전술적 역동성이 아니라 전쟁의 전략적 판에 상응하는 군사 기술들로 이루어졌다.”
(131쪽, 발굴 - 유물과
악마적 입자)
“중동의 서사와 서사시는 본질적으로 ‘먼지투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 중동에서는 영적인
여행, 정신을 해방하는 무아지경, 초자연적 여정, 탐사와 도보 여행, 심지어 정치적 집회나 목적이 모호한 신비한 여정조차
강과 바다보다 먼지 자욱한 사막에서 펼쳐집니다. 문명은 바다에 잠기는 대신 사막에 묻히지요. 배들은 사해에서나 발견되고, 신성한 존재들은 먼지를 들이마시며 세계들을
불에 그슬립니다. 이렇게 만사를 먼지로 쌓아 올리는 것은 중동의 맥락에서 (비록 사변적일지라도) 완전히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먼지는 나쁜 업보에 감염된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145쪽, 발굴 - 유물과
악마적 입자)
“인간의 방어기제는 이 행성에서 가장 일관된 존재자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증식하는 편집증이
있어서 모든 접촉을 잠재적 침략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식별한다. 이 같은 편집증적 일관성이 ... 자율성을 획득하면, 그것은 가차없는 분열증으로 변모하여 외부적인
것 또는 이종첩자의 위협에 수동적으로 자신을 개방한다. 인간 중심적 보안체계는 미증유의 질병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로, 외부의 침략에 맞서는 시스템의 일관된 저항과 그에 대응하여 일관되게 확대되는 외부의
침략 사이에서 출현한다.”
(186쪽, 군단 - 전쟁기계, 포식자, 해충)
“총알은 완벽한 시민이다. 이라크의 다국적군은 총알을 ‘반짝이’ 또는 ‘스타 시민’이라고 부른다. 웨스트는 미군 부대들이 도시 공간에 원래 거주하던 시민들을 쫓아내고 그 빈자리를 총알로 채우는 순간 이 새로운
시민들의 철저한 이질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총알의 궤적들과 그 흠잡을 데 없는 집단적 비행은
도시의 지형과 윤곽선에 완전히 동조하면서 도시를 재설계한다. 그에 따라 도시는 다공성 해면동물이나 부석처럼
벌레 먹은 경계성으로 침식되어 구멍난 ( )체 복합체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210-211쪽, 군단 - 전쟁기계, 포식자, 해충)
“히드라글리프 또는 중동 자음 알파벳의 용 문자는 그 자체로 야만적 음악의 음표다. 팔라비어, 히브리어, 아랍어 문자나 사마리아어 알파벳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것들이 어떤 뒤얽힘 또는 더 거대한 고리(모든 괴물들의 어머니)에
대한 분해도를 그려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자로 글을 쓰는 것은 고대의 뱀 또는 용 숭배에
심취하는 것과 같다. 중동의 자음 알파벳 즉 히드라글리프는 그 자체로 휘감기고 칭칭 감긴 역동적 복잡성의
뒤얽힘을 형성한다.”
(248-249쪽, 지구행성적 반란 - 건조함의 경주장, 태양 폭풍, 지구-태양의 축)
“화학(연금술)은 부패와 함께 시작한다. 부패라는 진창의 행위자 앞에 벌거벗겨지면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이라는
것은, 가스를 내뿜는 부패물이나 다름없지 않아?’ ... 그 질문은 악취 나는 공기를 통해 유독한 파문을 불러일으킨다. 부패에
저항하는 것은 헛된 동시에 비옥하다. 하지만 그렇다면 부패에 저항할 때의 비옥함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 속에 공포의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다.”
(278쪽, 지도에 없는 지역들 - 촉매적
공간들)
저자: 레자 네가레스타니
옮긴이: 윤원화
미디어버스 발행
2021년 4월 27일 발행
디자인: 워크룸
ISBN: 979-11-90434-14-0 (93100)
125x210mm / 400 페이지
값 20,000원
책 소개
“중동은 지각 능력이 있는 존재자다. 그것은 살아 있다!"
중동은 왜 전쟁이 끊이지 않는가? 인류는 왜 파국적 전망 앞에서도 석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인간을 구원해야 할 종교가 왜 죽음을 퍼뜨리는 데 앞장서는가? 『사이클로노피디아』는
모순으로 가득 찬 21세기 초반의 세계를 중동이라는 어두운 구멍으로 빨려 드는 공포스러운 소용돌이로
그려내는 기이한 책이다.
이란 출신의 철학자 레자 네가레스타니는 인터넷이 연결된 현대 중동에서 출발하여 고고학자, 지하드
전사, 석유 밀수꾼, 미국 군인, 이단적인 종교 지도자, 고대 신의 시체, 지구와 태양, 외계의 사냥꾼이 등장하는 사변적 악몽을 펼쳐 보인다. 문학과 철학의 경계를 허무는 강박적이면서도 허풍스러운 글쓰기로 『사이클로노피디아』는 2009년 <아트포럼>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이란의 재야 고고학자 하미드 파르사니 박사는 고대 페르시아의 역사에 숨겨진 신성모독적인 악의 근원을 탐구하다가 수수께끼처럼 실종된다.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적힌 박사의 노트는 그가 석유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면서 미쳐갔음을 보여준다.
한편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익명의 남성을 만나러 이스탄불에 온 미국인 여성은 접선에 실패하고, 그
대신 호텔 방에서 정체불명의 원고를 발견한다. 그녀는 알쏭달쏭한 실마리를 추적해 보지만 더 많은 설정
구멍들을 맞닥뜨리고 애초에 그 남자가 실존 인물이었는지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그 사이에 테러와의 전쟁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석유로 충만한 고대의 비밀스러운 주술에 휘말린다. 마치
전쟁 자체가 전쟁기계들을 먹고 사는 또 하나의 기계로서 도시를 무너뜨려 사막을 확장하고 검은 석유의 심장으로 침략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특별히 한국어 판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철학자 파비오 지로니와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대담이 수록되어 있다.
이 대담은 『사이클로노피디아』라는 흥미진진한 사고 실험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자 이후 저자의 지적 여정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차례
1. 인코그니툼 학테누스: 나는 어떻게 『사이클로노피디아』의 원고를
발견했는가 - 크리스틴 앨번슨
2. 박테리아 고고학: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異) 화학적 내부자
3. 발굴: 유물과 악마적 입자
4. 군단: 전쟁기계, 포식자, 해충
5. 지구행성적 반란: 건조함의 경주장, 태양 폭풍, 지구-태양의
축
6. 지도에 없는 지역들: 촉매적 공간들
7. 다중정치: 개방성과 반란을 위한 공모와 분열 전략
8. 용어 해설
9. 한국어판 부록
10. 역자 해설: 석유와 악마 사이의 문학 - 윤원화
11. 세계를 설계하기, 정신을 세공하기: 레자 네가레스타니와의 대화 - 파비오 지로니
추천사
비할 바 없는 책. 장르의 법칙을 뛰어넘는 공포소설, 묵시론적
신학, 석유에 대한 철학이 이종교배하여 새롭고 불가피한 책을 낳았다.
― 차이나 미에빌, 『바스라그 연대기』 저자
네가레스타니를 읽는 것은 살바도르 달리의 안내에 따라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과 같다.
― 그레이엄 하먼, 『네트워크의 군주: 브뤼노 라투르와 객체지향 철학』 저자
이 탁월하고 흥분되는 책은 중동의 표층적 영토를 가로질러 지하의 심연으로 진입하는 범죄과학적 여정으로 당신을 안내한다. 지구는 살아 있는 인공물로 생산되어 유목적인 전쟁의 전술들, 극단적인
고고학적 실천, 석유 채취의 논리에 의해 내장이 뽑히고 텅 비워진다.
레자 네가레스타니는 철저하게 새로운 언어를 발명하여 종교, 지질학, 전쟁 방식들 간의 관계를 재개념화면서 동시대 중동 정치의 지반 자체를 철학적으로 역지반화한다.
― 에얄 와이즈먼, 포렌식 아키텍처 디렉터
참으로 보기 드문 책. 역사, 지리학, 언어에 대한 신성한 선입견들을 감히 거꾸로 뒤집어서 살아 있는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이니 관념들과 공간들이
유동적으로 운동하는 생명체로 변모하여 상상력과 경이로움으로 다시 숨쉬기 시작한다.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이 훌륭한 소설은 우리를 언어 이전의 그리고 역사 이후의 시간으로 초대한다. 이른바 ‘지식’에 관한
완전히 독창적인 인식과 성찰이 아름답고 폭발적으로 탄생하는 묵시론적인 역작이다.
― E. 엘리어스 메리지, 「잉태」, 「뱀파이어의 그림자」 감독
레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를 읽는 것은 풍부하고 기이하며 아주 강렬한 경험이다. 그는
석유의 지하적 미스테리에서 H. P. 러브크래프트의 섬뜩한 소설로, 고대
이슬람의 (그리고 이슬람 이전의) 지혜에서 근대 이후 비대칭적인
전쟁의 무시무시한 현실로 도약하면서 21세기 전지구적 문화의 숨겨진 전사(前史)를 파헤친다.
― 스티븐 샤비로, 『사물들의 우주: 사변적 실재론에 관하여』 저자
네가레스타니의 『사이클로노피디아』는 지구 전체를 지옥으로 향하는 탄소 순환의 피드백 루프에 묶어 놓은 고대 석유화학적 음모론의 주술적
모체를 정교하게 구성한다.
― 존 커산스, 『언데드의 반란: 아이티, 공포, 좀비
콤플렉스』 저자
서구 독자들은 이 작품으로 ‘난도질당해서 쩍 벌어지는’ 각별히 분열증적인 상태를 기대해도 좋다. 괴기할
정도로 환원적이고 폭력적이고 웃기면서도 도발적인 논문을 생각해 보라. 네가레스타니와 이슬람의 관계는
바타이유와 마르크스주의의 관계와 같다. ... 네가레스타니를 읽어라,
그리고 경배하라.
― 닉 랜드 ,『시간복잡성: 상하이의 시간을 관통하는 무질서한 루프들』 저자
인간의 합리적 사고능력이 점점 한계를 보이는 지금, 합리적 사고능력 자체를 급진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까? 『사이클로노피디아』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훌륭한 음모론적 교양서이자 H. P. 러브크래프트의 충실한 독자들에게는 이름 없는 존재들의 이름과 위치가 기록된 '네크로노미콘'이 될 것이다.
― 류한길, 음악가
불경스러움과 심원함이 하나가 되는 책. 이 책을 처음 접하고 표토층에서 지구 내부로 이어지는
포터블 홀에 빠져버린 것 같았다. 고대 중동의 신과 괴물들, 사막의
전쟁기계, 전설과 추론, 석유와 자본주의, 지정학과 지질학, 지구행성적 정치와 태양의 패권 등의 재료들을 뒤섞고
접합시킨 이 책은 편집증적일 만큼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날카로운 철학적 사변으로 가득했다. 그에 속수무책으로
잠겨 들었고, 온전히 이해하고 소유하고 싶어 안달이 났으며, 이윽고
이 책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일부를 형성해 버렸다. 드디어 번역본을 통해, 두고두고 펼쳐 읽을 그 세계—지구 내부와 행성의 역사 곳곳에 둥지를 튼 구멍들 속으로 다시 한 번 들어갈 수
있어 기쁘다.
― 김아영, 현대미술가, 『다공성 계곡, 이동식 구멍들』 공동 저자
이론적 소설이라는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사이클로노피디아』는 추리소설이나 비법서처럼 짜릿하면서도 엄청난 지적 흥분을 일으킨다. 파르사니라는 가상의 인물과 그의 사유, 저술을 인용하는 이 사변
소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유의 판들이 만들어내는 창발성과 그 이면의 다공성 구조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텍스트다. 무엇보다 중동의 지정학에 어두운 한 독자로서, 이 책은 내게 서로
침투하고 들끓는 힘으로 작동하는 사막 군사주의, 종교, 신화, 역사의 매혹을 열어 보여주었다. 픽션 아닌 픽션으로 짜여진 이야기
더미들이 개미굴처럼 뒤얽힌 『사이클로노피디아』의 지하 세계는 중동뿐 아니라, 지구 전체를 꿈틀거리는
다중정치의 복합체로 새롭게 마주하게 한다.
― 이진실, 미술평론가, 아그라파 소사이어티 멤버
저자 소개
레자 네가레스타니
철학자. 저서로 『지능과 정신』, 『외부적인 것을
유괴하기』, 『크로노시스』(공저) 등이 있다. 현재 NCRP(New
Centre for Research & Practice)의 비판철학 프로그램 디렉터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역자 소개
윤원화
시각문화 연구자. 저서로 『그림 창문 거울: 미술
전시장의 사진들』, 『1002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 등이 있으며, 역서로 『기록시스템 1800/1900』, 『광학적 미디어』 등이 있다.
책 속에서
“석유는 절대적 광기로 자본을 중독시키는 행성적 전염병으로서, 선진 문명의 기술적 특이성으로
가동되는 경제 시스템 내부로 확산된다. 자율성을 지닌 지구생명적 공모자인 석유의 자취를 따라가 보면
자본주의는 인간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성적 규모의 불가피성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여기서 자본주의는 심지어 인간이 출현하기도 전에 자신의 숙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60-61쪽, 박테리아 고고학 -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화학적
내부자들)
“구멍난 공간, 또는 더 정확히 말해서 (완전성의
타락을 함축하는) 구멍난 ( )체 복합체는 지구와 같은 고체에서
특정한 유형의 전복을 촉발하고 가속화한다. 그것이 견고한 모체 내부에 펼쳐 놓는 구멍들은 표면과 깊이
사이에서 진동하는 모호한 존재자들로, 구멍을 뚫는 행위와 그 치명적인 다공성은 모체의 단합성과 완전성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킨다. 벌레 먹은 구멍은 고체의 견고함과 그것을 에워싼 표면의 정합성을 침해한다.”
(82쪽, 박테리아 고고학 -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화학적 내부자들)
“쥐들이 달릴 때는 그들이 망가뜨리는 표면들과 그들 자신이 동시에 증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리스토파네스와
바킬리데스는 새들이 흐름(‘케이스타이’)을 위한 무제한적
열광의 공간인 ‘카오스’를 가로질러 날아간다고 노래했지만, 아무도 그 새들이 대체 어떤 종류인지 묻지
않았다. 날개 없는 것? 박제된 것? 금속 재질의 것? 머리가 잘린 것?
주머니칼로 눈이 도려진 것? ... 아니, 그들은
쥐들이다. 수천 수백만의 쥐떼다.”
(95-96쪽, 박테리아 고고학 -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화학적
내부자들)
“‘은닉된 글쓰기’는 중동 구성체들의 구멍난 건축 및 창발의 모델에 상응한다. 실제로 은닉된
글쓰기는 구멍난 ( )체 복합체와 공모 관계에 있는 모델이다. 그것은
설정 구멍들을 통해 이야기 속으로 읽어 들어가는 접근을 제안한다. 서사적 짜임과 건전한 구조가 있는
텍스트가 그 배열에 순응하는 규율과 절차에 따른 읽기와 쓰기를 요구하듯이, 구멍난 구조, 타락한 구성체, 설정 구멍을 읽고 쓰려면 그에 걸맞은 방법론이 필요하다.”
(106-107쪽, 박테리아 고고학 - 지하세계, 하층토, 이종화학적
내부자들)
“전쟁은 확실히 충돌하는 전쟁기계들의 산물이 아니다. 전쟁은 자율적인 비생명을 가지고 전쟁기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증식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쟁기계들은 이처럼 가학적인 전쟁의 음모론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전쟁의 비생명에 참여하는 이론적, 실용적 원칙으로서 악에 맞서는 악의 축을 설계했다. 이 축은 전쟁기계들의 규제와 전술적 역동성이 아니라 전쟁의 전략적 판에 상응하는 군사 기술들로 이루어졌다.”
(131쪽, 발굴 - 유물과
악마적 입자)
“중동의 서사와 서사시는 본질적으로 ‘먼지투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 중동에서는 영적인
여행, 정신을 해방하는 무아지경, 초자연적 여정, 탐사와 도보 여행, 심지어 정치적 집회나 목적이 모호한 신비한 여정조차
강과 바다보다 먼지 자욱한 사막에서 펼쳐집니다. 문명은 바다에 잠기는 대신 사막에 묻히지요. 배들은 사해에서나 발견되고, 신성한 존재들은 먼지를 들이마시며 세계들을
불에 그슬립니다. 이렇게 만사를 먼지로 쌓아 올리는 것은 중동의 맥락에서 (비록 사변적일지라도) 완전히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먼지는 나쁜 업보에 감염된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145쪽, 발굴 - 유물과
악마적 입자)
“인간의 방어기제는 이 행성에서 가장 일관된 존재자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증식하는 편집증이
있어서 모든 접촉을 잠재적 침략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식별한다. 이 같은 편집증적 일관성이 ... 자율성을 획득하면, 그것은 가차없는 분열증으로 변모하여 외부적인
것 또는 이종첩자의 위협에 수동적으로 자신을 개방한다. 인간 중심적 보안체계는 미증유의 질병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로, 외부의 침략에 맞서는 시스템의 일관된 저항과 그에 대응하여 일관되게 확대되는 외부의
침략 사이에서 출현한다.”
(186쪽, 군단 - 전쟁기계, 포식자, 해충)
“총알은 완벽한 시민이다. 이라크의 다국적군은 총알을 ‘반짝이’ 또는 ‘스타 시민’이라고 부른다. 웨스트는 미군 부대들이 도시 공간에 원래 거주하던 시민들을 쫓아내고 그 빈자리를 총알로 채우는 순간 이 새로운
시민들의 철저한 이질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총알의 궤적들과 그 흠잡을 데 없는 집단적 비행은
도시의 지형과 윤곽선에 완전히 동조하면서 도시를 재설계한다. 그에 따라 도시는 다공성 해면동물이나 부석처럼
벌레 먹은 경계성으로 침식되어 구멍난 ( )체 복합체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210-211쪽, 군단 - 전쟁기계, 포식자, 해충)
“히드라글리프 또는 중동 자음 알파벳의 용 문자는 그 자체로 야만적 음악의 음표다. 팔라비어, 히브리어, 아랍어 문자나 사마리아어 알파벳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것들이 어떤 뒤얽힘 또는 더 거대한 고리(모든 괴물들의 어머니)에
대한 분해도를 그려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자로 글을 쓰는 것은 고대의 뱀 또는 용 숭배에
심취하는 것과 같다. 중동의 자음 알파벳 즉 히드라글리프는 그 자체로 휘감기고 칭칭 감긴 역동적 복잡성의
뒤얽힘을 형성한다.”
(248-249쪽, 지구행성적 반란 - 건조함의 경주장, 태양 폭풍, 지구-태양의 축)
“화학(연금술)은 부패와 함께 시작한다. 부패라는 진창의 행위자 앞에 벌거벗겨지면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이라는
것은, 가스를 내뿜는 부패물이나 다름없지 않아?’ ... 그 질문은 악취 나는 공기를 통해 유독한 파문을 불러일으킨다. 부패에
저항하는 것은 헛된 동시에 비옥하다. 하지만 그렇다면 부패에 저항할 때의 비옥함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 속에 공포의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다.”
(278쪽, 지도에 없는 지역들 - 촉매적
공간들)
↧
↧
CRACKER
CRACKER
![]() 박광수 작가135*190mm / 548페이지디자인 신신인쇄 및 제책 문성인쇄미디어버스 발행ISBN 979-11-90434-15-7
이 책은 박광수 개인전 «크래커» (2021.5.28–6.27 카다로그, 서울 / 협력 기획 장혜정)와 연계하여 발간되었다.
박광수 작가135*190mm / 548페이지디자인 신신인쇄 및 제책 문성인쇄미디어버스 발행ISBN 979-11-90434-15-7
이 책은 박광수 개인전 «크래커» (2021.5.28–6.27 카다로그, 서울 / 협력 기획 장혜정)와 연계하여 발간되었다.
![]()
![]()
![]()
![]()
![]()
![]()
 박광수 작가135*190mm / 548페이지디자인 신신인쇄 및 제책 문성인쇄미디어버스 발행ISBN 979-11-90434-15-7
이 책은 박광수 개인전 «크래커» (2021.5.28–6.27 카다로그, 서울 / 협력 기획 장혜정)와 연계하여 발간되었다.
박광수 작가135*190mm / 548페이지디자인 신신인쇄 및 제책 문성인쇄미디어버스 발행ISBN 979-11-90434-15-7
이 책은 박광수 개인전 «크래커» (2021.5.28–6.27 카다로그, 서울 / 협력 기획 장혜정)와 연계하여 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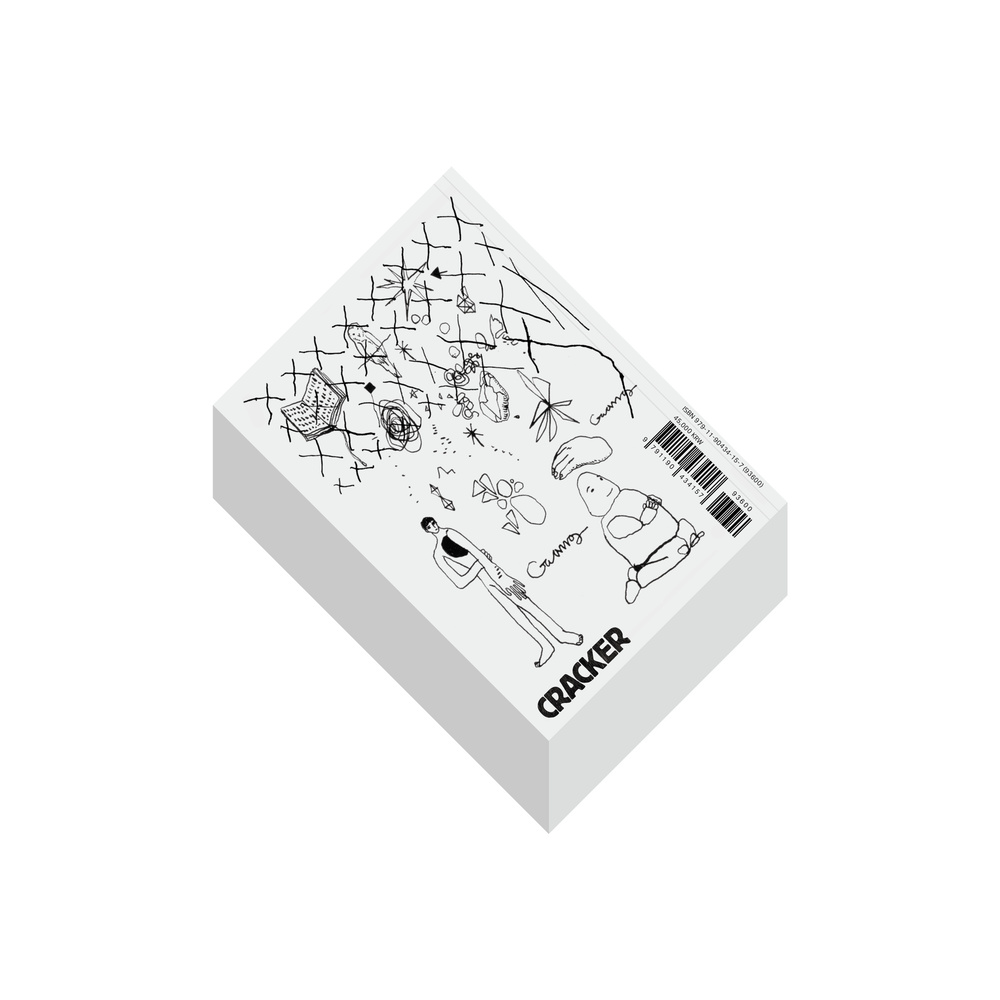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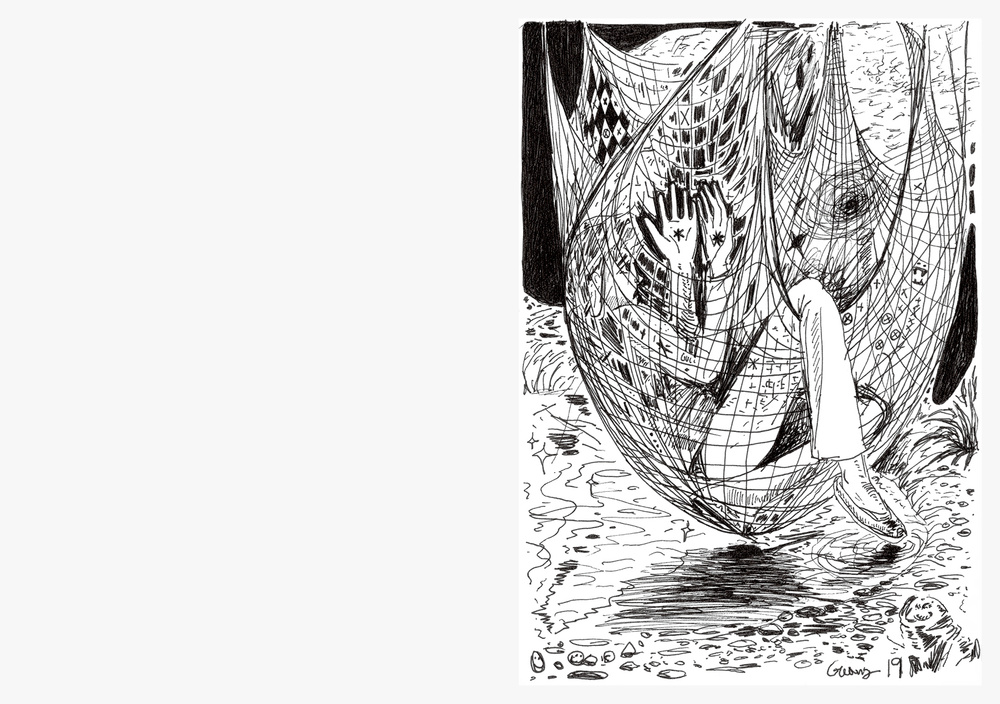


↧
416 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공모
416 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공모
![]() 416 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공모에 미디어버스가 전시와 프로그램 기획으로 건축가 나종원(디자인 총괄), (주)세이브종합건축사사무소, (주)HEA와 함께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배움과 참여를 통한 추모와 일상의 공존을 제안했고, 2차에 걸쳐 진행 된 심사 끝에 아쉽지만 2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 팀 구성원 모두 깊게 공감했던 공모전 기획의 취지가 잘 구현되어 모두에게 의미있는 공원이 건립되기를 기원합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공모에 미디어버스가 전시와 프로그램 기획으로 건축가 나종원(디자인 총괄), (주)세이브종합건축사사무소, (주)HEA와 함께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배움과 참여를 통한 추모와 일상의 공존을 제안했고, 2차에 걸쳐 진행 된 심사 끝에 아쉽지만 2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 팀 구성원 모두 깊게 공감했던 공모전 기획의 취지가 잘 구현되어 모두에게 의미있는 공원이 건립되기를 기원합니다.
![]()
![]()
![]()
![]()
![]()
![]()
 416 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공모에 미디어버스가 전시와 프로그램 기획으로 건축가 나종원(디자인 총괄), (주)세이브종합건축사사무소, (주)HEA와 함께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배움과 참여를 통한 추모와 일상의 공존을 제안했고, 2차에 걸쳐 진행 된 심사 끝에 아쉽지만 2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 팀 구성원 모두 깊게 공감했던 공모전 기획의 취지가 잘 구현되어 모두에게 의미있는 공원이 건립되기를 기원합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공모에 미디어버스가 전시와 프로그램 기획으로 건축가 나종원(디자인 총괄), (주)세이브종합건축사사무소, (주)HEA와 함께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배움과 참여를 통한 추모와 일상의 공존을 제안했고, 2차에 걸쳐 진행 된 심사 끝에 아쉽지만 2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 팀 구성원 모두 깊게 공감했던 공모전 기획의 취지가 잘 구현되어 모두에게 의미있는 공원이 건립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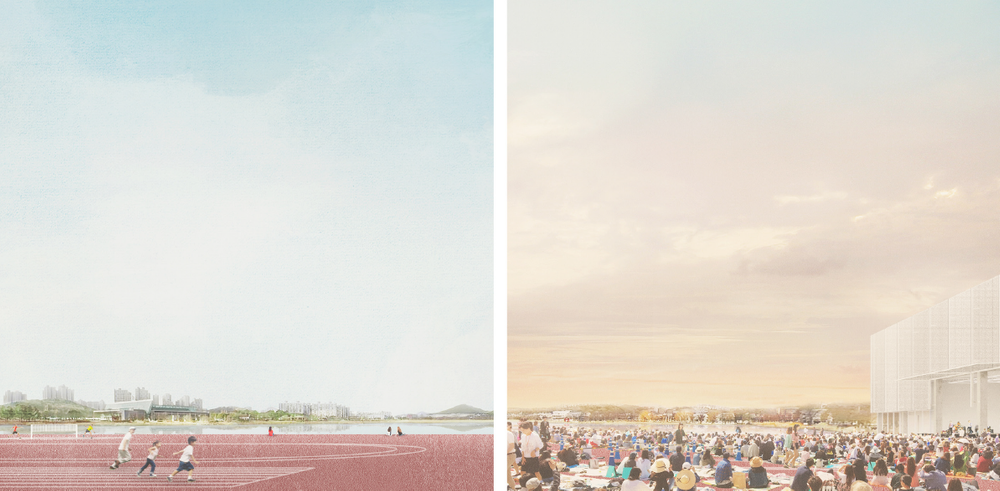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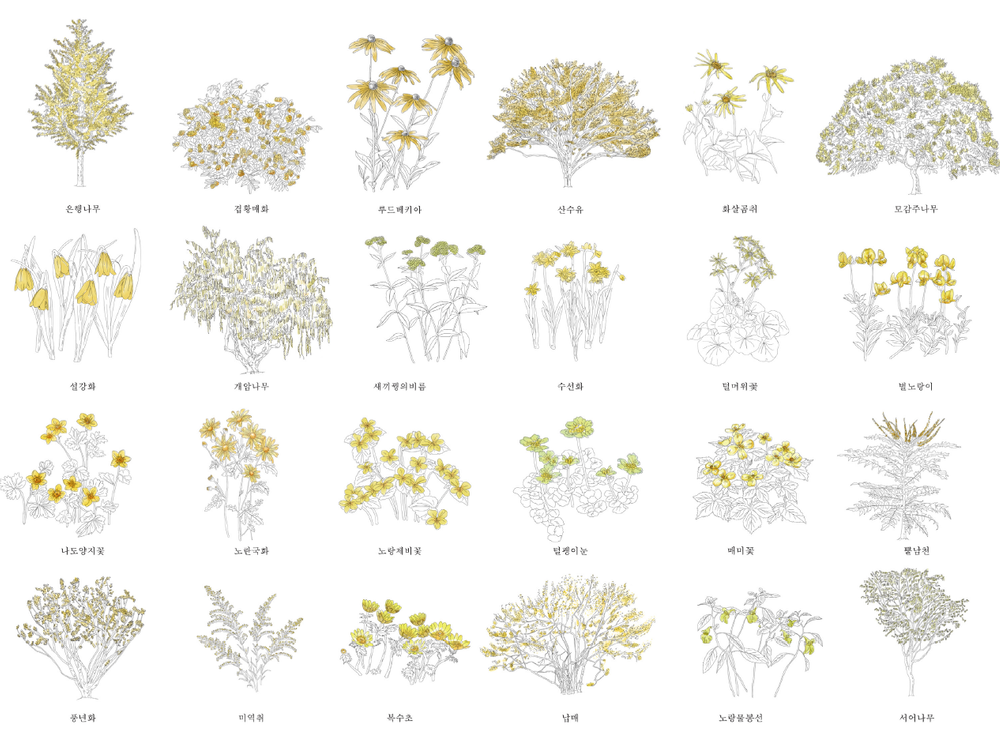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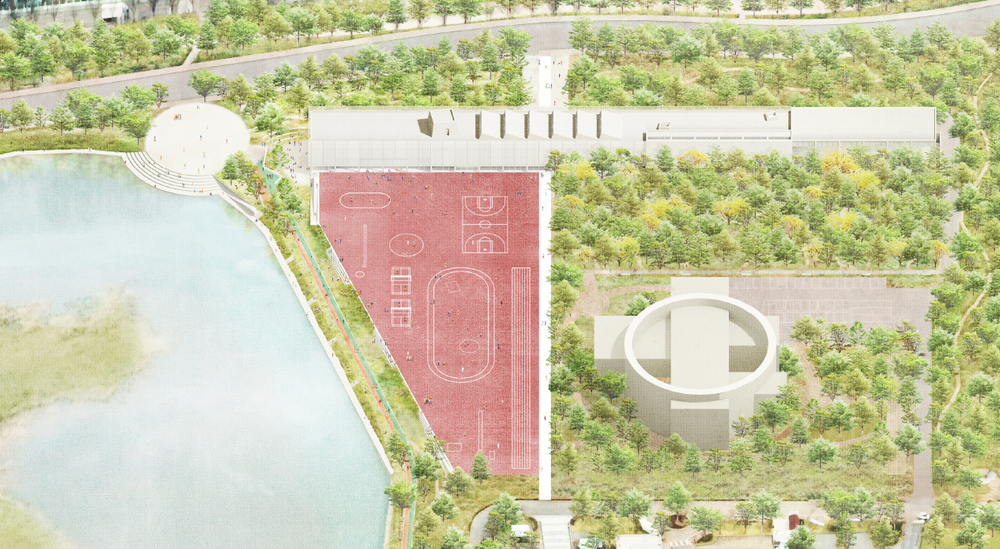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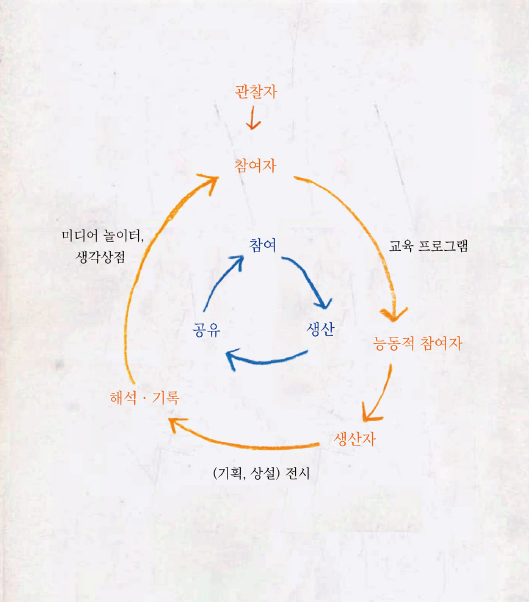

↧
Data Composition
Data Composition
![]() 저자: GRYACODE, jiiiiin
미디어버스 발행
2021년
7월 25일 발행
ISBN
979-11-90434-16-4 [93670]
165x275mm
/ 128페이지 / 디자인 김영삼
값 24,000원
책 소개
지금의
세대는 데이터가 주도한다. 데이터로 산업과 문화가 바뀌며 오늘의 순간이 이룩된다. 사운드 아티스트 듀오 GRAYCODE, jiiiiin(조태복, 정진희)의 <Data
Composition>은 오늘날 데이터로 변화되는 시간에 관하여 생각한다. 그것은 1분 1초의 시곗바늘처럼 흐르는 시간은 아니며, 순서에 따른 선형적 처리에서 동시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의 변화가 만드는 시간을 이야기한다. Data Composition은 이처럼 데이터로 구성된 시간에 관한 작품으로,
데이터와 전시 그리고 음악, 3부로 구성된 작품을 서적으로 정리하였다.
2021년 1월부터 시작하여 50일간의
전시 기간 동안 Data Composition 전시에서는 방문객들의 참여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책의 첫 부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한 방법에 관한 작용 원리 및 구조가 설명되어 있다. 이후 Sound와
Exhibition에서는 처리된 데이터로 작곡된 음악 작품과 전시 작품들을 소개한다. Data
Composition 전시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의 기획전으로 제작되었으며, 서적에는 정가희의
전시 서문과 김남시, 김윤철의 전시 비평글이 수록되었다.
차례
작가
노트
시간
Description
of Data Composition
Data
collection
Data sound synthesis
사운드
The
core idea of music composition
Music
album
전시
on
illusion of time
now
slice
frameworks
of Data Composition
도면
전시전경
서문 / 비평
Data
Composition: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예술적 시도 – 정가희
데이터로 구성되는 시간 – 김남시
Data
Composition – 김윤철
크레딧
필자
소개
저자 소개
GRYACODE, jiiiiin (조태복 1984-, 정진희1988-) 개별 전자음악가이자 사운드-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으로서 장르의
제약 없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 독일의 ZKM에
게스트 아티스트로 초대되어 작품 제작 및 발표를 하였으며, 2018년
YCAM InterLab 참여를 비롯하여, 프라하 국립 미술관(2018), 독일 한국 문화원(2019),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2020), 세종문화회관 미술관(2021), 체코 런치밋 페스티벌(2018) 등에서 전시와 연주를 진행했다. 2018년 독일 ZKM ‘기가-헤르츠 어워드’ 작품상을
수상했다.
graycodejiiiiin.kr
@graycode.jiiiiin
책 속에서
“그레이코드와 지인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2인조 전자음악
작곡가 및 사운드미디어 아티스트이다. 이들의 예술 행위는 다채로운 측면을 지닌 시간 개념의 시각화, 나아가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는 소닉랜드스케이프의 창조를 모색한다. 이번
전시는 특히 전시, 웹사이트, 사운드 앨범의 삼부로 구성된(tripartite) 프로젝트이다. 시간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제시하기
위해 작가들은 왼쪽 및 오른쪽 채널에 각각 다른 주기의 파편적인 사운드를 반복 재생하여 다량의 진동을 생성시키고,
동시에 추상적인 대형 흑백 영상을 사영(project)함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개방을 시연하는
전략을 택했다. 관람객은 작가들이 세심히 구축한 전시 구조를 탐험하며 신체적 및 감각적으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에 방문한 관람객들은 불가해한 듯 보이는 시각적 정보를 마주하게 되며, 이들의 온라인 참여(개개인이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시각, 콘텐츠를 관람한 기간 등)가 정보의 원천 역할을 수행한다. 수집된 정보는 최종적으로 50일간의 전시 이후 제작될 그레이코드와
지인의 사운드 앨범 data composition의 재료로 사용된다.”
(100쪽, Data Composition: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예술적 시도, 정가희)
“관객이 전시 웹페이지에 접속했던 시간만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그렇게
모인 데이터에 기반해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 물음을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 데이터와 정보가 갖는 위상을 생각해보자. 필요한 정보를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물건은 인터넷 몰에서 구매하고, 음식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건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페이스 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리트윗하고, 댓글을 달거나, 스마트폰으로 QR
체크인을 하고, 맛집을 검색해 찾아다니는 것도, 넷플릭스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자동 재생되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생각해보면 하루 24시간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시간을 우리는 네트워크에
접속해 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는 시간, 네트워크
위에서 벌이는 모든 일들은 의식하든 못하든 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산한다. 심지어 스마트 워치 같은 디바이스는
걸음이나 수면시간은 물론 혈압과 심박수 등 ‘행위’라 말하기도
힘든 우리의 생명활동마저 데이터화한다. 우리는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이
“현재 이 순간의 노동과 경계,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실제를 만든다”는 걸 알고 있다.”
(103쪽, 데이터로 구성되는 시간, 김남시)
“몰입된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Immersive art)은
최근 디스플레이와 그래픽 기술의 발달과 대중화로 인해 더욱 극대화되었고, 강한 시청각적 체험을 제공하는
작품들은 실제와 가상, 관람자의 몸과 감각을 하나의 과잉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펙터클의 과잉은 여기, 지금(hic et nunc)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에 현존하는 개별자로서의
자신을 잊게 하는 원근법적 구도의 소실점을 향해 우리를 미끄러지게 한다. 이러한 사운드 아트의 장르적
위상과 오늘날 거대한 스펙터클의 과다하게 노출되어 번아웃(burn out)된 우리에게 몸, 그리고 물리적으로 반응하는 음향이 출렁이는 GRAYCODE와 jiiiiin의 전시 ‹데이터 컴포지션›의 공간은 가히 낯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낯설음은 단지
위에 서술한 이유와는 별개로 그들이 추구하는 예술적 실천의 핵심에서 유발된 것일 수 있다. 나는 이
핵심을 크게 추상성(abstractness), 비대상성(non-objectivity)그리고
정동성(affectiveness)이라는 세 가지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08쪽, Data Composition, 김윤철)
저자: GRYACODE, jiiiiin
미디어버스 발행
2021년
7월 25일 발행
ISBN
979-11-90434-16-4 [93670]
165x275mm
/ 128페이지 / 디자인 김영삼
값 24,000원
책 소개
지금의
세대는 데이터가 주도한다. 데이터로 산업과 문화가 바뀌며 오늘의 순간이 이룩된다. 사운드 아티스트 듀오 GRAYCODE, jiiiiin(조태복, 정진희)의 <Data
Composition>은 오늘날 데이터로 변화되는 시간에 관하여 생각한다. 그것은 1분 1초의 시곗바늘처럼 흐르는 시간은 아니며, 순서에 따른 선형적 처리에서 동시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의 변화가 만드는 시간을 이야기한다. Data Composition은 이처럼 데이터로 구성된 시간에 관한 작품으로,
데이터와 전시 그리고 음악, 3부로 구성된 작품을 서적으로 정리하였다.
2021년 1월부터 시작하여 50일간의
전시 기간 동안 Data Composition 전시에서는 방문객들의 참여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책의 첫 부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한 방법에 관한 작용 원리 및 구조가 설명되어 있다. 이후 Sound와
Exhibition에서는 처리된 데이터로 작곡된 음악 작품과 전시 작품들을 소개한다. Data
Composition 전시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의 기획전으로 제작되었으며, 서적에는 정가희의
전시 서문과 김남시, 김윤철의 전시 비평글이 수록되었다.
차례
작가
노트
시간
Description
of Data Composition
Data
collection
Data sound synthesis
사운드
The
core idea of music composition
Music
album
전시
on
illusion of time
now
slice
frameworks
of Data Composition
도면
전시전경
서문 / 비평
Data
Composition: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예술적 시도 – 정가희
데이터로 구성되는 시간 – 김남시
Data
Composition – 김윤철
크레딧
필자
소개
저자 소개
GRYACODE, jiiiiin (조태복 1984-, 정진희1988-) 개별 전자음악가이자 사운드-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으로서 장르의
제약 없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 독일의 ZKM에
게스트 아티스트로 초대되어 작품 제작 및 발표를 하였으며, 2018년
YCAM InterLab 참여를 비롯하여, 프라하 국립 미술관(2018), 독일 한국 문화원(2019),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2020), 세종문화회관 미술관(2021), 체코 런치밋 페스티벌(2018) 등에서 전시와 연주를 진행했다. 2018년 독일 ZKM ‘기가-헤르츠 어워드’ 작품상을
수상했다.
graycodejiiiiin.kr
@graycode.jiiiiin
책 속에서
“그레이코드와 지인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2인조 전자음악
작곡가 및 사운드미디어 아티스트이다. 이들의 예술 행위는 다채로운 측면을 지닌 시간 개념의 시각화, 나아가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는 소닉랜드스케이프의 창조를 모색한다. 이번
전시는 특히 전시, 웹사이트, 사운드 앨범의 삼부로 구성된(tripartite) 프로젝트이다. 시간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제시하기
위해 작가들은 왼쪽 및 오른쪽 채널에 각각 다른 주기의 파편적인 사운드를 반복 재생하여 다량의 진동을 생성시키고,
동시에 추상적인 대형 흑백 영상을 사영(project)함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개방을 시연하는
전략을 택했다. 관람객은 작가들이 세심히 구축한 전시 구조를 탐험하며 신체적 및 감각적으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에 방문한 관람객들은 불가해한 듯 보이는 시각적 정보를 마주하게 되며, 이들의 온라인 참여(개개인이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시각, 콘텐츠를 관람한 기간 등)가 정보의 원천 역할을 수행한다. 수집된 정보는 최종적으로 50일간의 전시 이후 제작될 그레이코드와
지인의 사운드 앨범 data composition의 재료로 사용된다.”
(100쪽, Data Composition: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예술적 시도, 정가희)
“관객이 전시 웹페이지에 접속했던 시간만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그렇게
모인 데이터에 기반해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 물음을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 데이터와 정보가 갖는 위상을 생각해보자. 필요한 정보를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물건은 인터넷 몰에서 구매하고, 음식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건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페이스 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리트윗하고, 댓글을 달거나, 스마트폰으로 QR
체크인을 하고, 맛집을 검색해 찾아다니는 것도, 넷플릭스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자동 재생되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생각해보면 하루 24시간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시간을 우리는 네트워크에
접속해 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는 시간, 네트워크
위에서 벌이는 모든 일들은 의식하든 못하든 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산한다. 심지어 스마트 워치 같은 디바이스는
걸음이나 수면시간은 물론 혈압과 심박수 등 ‘행위’라 말하기도
힘든 우리의 생명활동마저 데이터화한다. 우리는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이
“현재 이 순간의 노동과 경계,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실제를 만든다”는 걸 알고 있다.”
(103쪽, 데이터로 구성되는 시간, 김남시)
“몰입된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Immersive art)은
최근 디스플레이와 그래픽 기술의 발달과 대중화로 인해 더욱 극대화되었고, 강한 시청각적 체험을 제공하는
작품들은 실제와 가상, 관람자의 몸과 감각을 하나의 과잉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펙터클의 과잉은 여기, 지금(hic et nunc)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에 현존하는 개별자로서의
자신을 잊게 하는 원근법적 구도의 소실점을 향해 우리를 미끄러지게 한다. 이러한 사운드 아트의 장르적
위상과 오늘날 거대한 스펙터클의 과다하게 노출되어 번아웃(burn out)된 우리에게 몸, 그리고 물리적으로 반응하는 음향이 출렁이는 GRAYCODE와 jiiiiin의 전시 ‹데이터 컴포지션›의 공간은 가히 낯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낯설음은 단지
위에 서술한 이유와는 별개로 그들이 추구하는 예술적 실천의 핵심에서 유발된 것일 수 있다. 나는 이
핵심을 크게 추상성(abstractness), 비대상성(non-objectivity)그리고
정동성(affectiveness)이라는 세 가지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08쪽, Data Composition, 김윤철)
![]()
![]()
![]()
![]()
![]()
![]()
![]()
![]()
![]()
 저자: GRYACODE, jiiiiin
미디어버스 발행
2021년
7월 25일 발행
ISBN
979-11-90434-16-4 [93670]
165x275mm
/ 128페이지 / 디자인 김영삼
값 24,000원
책 소개
지금의
세대는 데이터가 주도한다. 데이터로 산업과 문화가 바뀌며 오늘의 순간이 이룩된다. 사운드 아티스트 듀오 GRAYCODE, jiiiiin(조태복, 정진희)의 <Data
Composition>은 오늘날 데이터로 변화되는 시간에 관하여 생각한다. 그것은 1분 1초의 시곗바늘처럼 흐르는 시간은 아니며, 순서에 따른 선형적 처리에서 동시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의 변화가 만드는 시간을 이야기한다. Data Composition은 이처럼 데이터로 구성된 시간에 관한 작품으로,
데이터와 전시 그리고 음악, 3부로 구성된 작품을 서적으로 정리하였다.
2021년 1월부터 시작하여 50일간의
전시 기간 동안 Data Composition 전시에서는 방문객들의 참여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책의 첫 부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한 방법에 관한 작용 원리 및 구조가 설명되어 있다. 이후 Sound와
Exhibition에서는 처리된 데이터로 작곡된 음악 작품과 전시 작품들을 소개한다. Data
Composition 전시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의 기획전으로 제작되었으며, 서적에는 정가희의
전시 서문과 김남시, 김윤철의 전시 비평글이 수록되었다.
차례
작가
노트
시간
Description
of Data Composition
Data
collection
Data sound synthesis
사운드
The
core idea of music composition
Music
album
전시
on
illusion of time
now
slice
frameworks
of Data Composition
도면
전시전경
서문 / 비평
Data
Composition: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예술적 시도 – 정가희
데이터로 구성되는 시간 – 김남시
Data
Composition – 김윤철
크레딧
필자
소개
저자 소개
GRYACODE, jiiiiin (조태복 1984-, 정진희1988-) 개별 전자음악가이자 사운드-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으로서 장르의
제약 없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 독일의 ZKM에
게스트 아티스트로 초대되어 작품 제작 및 발표를 하였으며, 2018년
YCAM InterLab 참여를 비롯하여, 프라하 국립 미술관(2018), 독일 한국 문화원(2019),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2020), 세종문화회관 미술관(2021), 체코 런치밋 페스티벌(2018) 등에서 전시와 연주를 진행했다. 2018년 독일 ZKM ‘기가-헤르츠 어워드’ 작품상을
수상했다.
graycodejiiiiin.kr
@graycode.jiiiiin
책 속에서
“그레이코드와 지인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2인조 전자음악
작곡가 및 사운드미디어 아티스트이다. 이들의 예술 행위는 다채로운 측면을 지닌 시간 개념의 시각화, 나아가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는 소닉랜드스케이프의 창조를 모색한다. 이번
전시는 특히 전시, 웹사이트, 사운드 앨범의 삼부로 구성된(tripartite) 프로젝트이다. 시간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제시하기
위해 작가들은 왼쪽 및 오른쪽 채널에 각각 다른 주기의 파편적인 사운드를 반복 재생하여 다량의 진동을 생성시키고,
동시에 추상적인 대형 흑백 영상을 사영(project)함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개방을 시연하는
전략을 택했다. 관람객은 작가들이 세심히 구축한 전시 구조를 탐험하며 신체적 및 감각적으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에 방문한 관람객들은 불가해한 듯 보이는 시각적 정보를 마주하게 되며, 이들의 온라인 참여(개개인이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시각, 콘텐츠를 관람한 기간 등)가 정보의 원천 역할을 수행한다. 수집된 정보는 최종적으로 50일간의 전시 이후 제작될 그레이코드와
지인의 사운드 앨범 data composition의 재료로 사용된다.”
(100쪽, Data Composition: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예술적 시도, 정가희)
“관객이 전시 웹페이지에 접속했던 시간만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그렇게
모인 데이터에 기반해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 물음을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 데이터와 정보가 갖는 위상을 생각해보자. 필요한 정보를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물건은 인터넷 몰에서 구매하고, 음식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건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페이스 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리트윗하고, 댓글을 달거나, 스마트폰으로 QR
체크인을 하고, 맛집을 검색해 찾아다니는 것도, 넷플릭스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자동 재생되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생각해보면 하루 24시간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시간을 우리는 네트워크에
접속해 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는 시간, 네트워크
위에서 벌이는 모든 일들은 의식하든 못하든 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산한다. 심지어 스마트 워치 같은 디바이스는
걸음이나 수면시간은 물론 혈압과 심박수 등 ‘행위’라 말하기도
힘든 우리의 생명활동마저 데이터화한다. 우리는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이
“현재 이 순간의 노동과 경계,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실제를 만든다”는 걸 알고 있다.”
(103쪽, 데이터로 구성되는 시간, 김남시)
“몰입된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Immersive art)은
최근 디스플레이와 그래픽 기술의 발달과 대중화로 인해 더욱 극대화되었고, 강한 시청각적 체험을 제공하는
작품들은 실제와 가상, 관람자의 몸과 감각을 하나의 과잉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펙터클의 과잉은 여기, 지금(hic et nunc)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에 현존하는 개별자로서의
자신을 잊게 하는 원근법적 구도의 소실점을 향해 우리를 미끄러지게 한다. 이러한 사운드 아트의 장르적
위상과 오늘날 거대한 스펙터클의 과다하게 노출되어 번아웃(burn out)된 우리에게 몸, 그리고 물리적으로 반응하는 음향이 출렁이는 GRAYCODE와 jiiiiin의 전시 ‹데이터 컴포지션›의 공간은 가히 낯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낯설음은 단지
위에 서술한 이유와는 별개로 그들이 추구하는 예술적 실천의 핵심에서 유발된 것일 수 있다. 나는 이
핵심을 크게 추상성(abstractness), 비대상성(non-objectivity)그리고
정동성(affectiveness)이라는 세 가지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08쪽, Data Composition, 김윤철)
저자: GRYACODE, jiiiiin
미디어버스 발행
2021년
7월 25일 발행
ISBN
979-11-90434-16-4 [93670]
165x275mm
/ 128페이지 / 디자인 김영삼
값 24,000원
책 소개
지금의
세대는 데이터가 주도한다. 데이터로 산업과 문화가 바뀌며 오늘의 순간이 이룩된다. 사운드 아티스트 듀오 GRAYCODE, jiiiiin(조태복, 정진희)의 <Data
Composition>은 오늘날 데이터로 변화되는 시간에 관하여 생각한다. 그것은 1분 1초의 시곗바늘처럼 흐르는 시간은 아니며, 순서에 따른 선형적 처리에서 동시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의 변화가 만드는 시간을 이야기한다. Data Composition은 이처럼 데이터로 구성된 시간에 관한 작품으로,
데이터와 전시 그리고 음악, 3부로 구성된 작품을 서적으로 정리하였다.
2021년 1월부터 시작하여 50일간의
전시 기간 동안 Data Composition 전시에서는 방문객들의 참여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책의 첫 부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한 방법에 관한 작용 원리 및 구조가 설명되어 있다. 이후 Sound와
Exhibition에서는 처리된 데이터로 작곡된 음악 작품과 전시 작품들을 소개한다. Data
Composition 전시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의 기획전으로 제작되었으며, 서적에는 정가희의
전시 서문과 김남시, 김윤철의 전시 비평글이 수록되었다.
차례
작가
노트
시간
Description
of Data Composition
Data
collection
Data sound synthesis
사운드
The
core idea of music composition
Music
album
전시
on
illusion of time
now
slice
frameworks
of Data Composition
도면
전시전경
서문 / 비평
Data
Composition: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예술적 시도 – 정가희
데이터로 구성되는 시간 – 김남시
Data
Composition – 김윤철
크레딧
필자
소개
저자 소개
GRYACODE, jiiiiin (조태복 1984-, 정진희1988-) 개별 전자음악가이자 사운드-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으로서 장르의
제약 없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 독일의 ZKM에
게스트 아티스트로 초대되어 작품 제작 및 발표를 하였으며, 2018년
YCAM InterLab 참여를 비롯하여, 프라하 국립 미술관(2018), 독일 한국 문화원(2019),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2020), 세종문화회관 미술관(2021), 체코 런치밋 페스티벌(2018) 등에서 전시와 연주를 진행했다. 2018년 독일 ZKM ‘기가-헤르츠 어워드’ 작품상을
수상했다.
graycodejiiiiin.kr
@graycode.jiiiiin
책 속에서
“그레이코드와 지인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2인조 전자음악
작곡가 및 사운드미디어 아티스트이다. 이들의 예술 행위는 다채로운 측면을 지닌 시간 개념의 시각화, 나아가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는 소닉랜드스케이프의 창조를 모색한다. 이번
전시는 특히 전시, 웹사이트, 사운드 앨범의 삼부로 구성된(tripartite) 프로젝트이다. 시간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제시하기
위해 작가들은 왼쪽 및 오른쪽 채널에 각각 다른 주기의 파편적인 사운드를 반복 재생하여 다량의 진동을 생성시키고,
동시에 추상적인 대형 흑백 영상을 사영(project)함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개방을 시연하는
전략을 택했다. 관람객은 작가들이 세심히 구축한 전시 구조를 탐험하며 신체적 및 감각적으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에 방문한 관람객들은 불가해한 듯 보이는 시각적 정보를 마주하게 되며, 이들의 온라인 참여(개개인이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시각, 콘텐츠를 관람한 기간 등)가 정보의 원천 역할을 수행한다. 수집된 정보는 최종적으로 50일간의 전시 이후 제작될 그레이코드와
지인의 사운드 앨범 data composition의 재료로 사용된다.”
(100쪽, Data Composition: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예술적 시도, 정가희)
“관객이 전시 웹페이지에 접속했던 시간만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그렇게
모인 데이터에 기반해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 물음을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 데이터와 정보가 갖는 위상을 생각해보자. 필요한 정보를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물건은 인터넷 몰에서 구매하고, 음식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건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페이스 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리트윗하고, 댓글을 달거나, 스마트폰으로 QR
체크인을 하고, 맛집을 검색해 찾아다니는 것도, 넷플릭스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자동 재생되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생각해보면 하루 24시간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시간을 우리는 네트워크에
접속해 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는 시간, 네트워크
위에서 벌이는 모든 일들은 의식하든 못하든 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산한다. 심지어 스마트 워치 같은 디바이스는
걸음이나 수면시간은 물론 혈압과 심박수 등 ‘행위’라 말하기도
힘든 우리의 생명활동마저 데이터화한다. 우리는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이
“현재 이 순간의 노동과 경계,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실제를 만든다”는 걸 알고 있다.”
(103쪽, 데이터로 구성되는 시간, 김남시)
“몰입된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Immersive art)은
최근 디스플레이와 그래픽 기술의 발달과 대중화로 인해 더욱 극대화되었고, 강한 시청각적 체험을 제공하는
작품들은 실제와 가상, 관람자의 몸과 감각을 하나의 과잉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펙터클의 과잉은 여기, 지금(hic et nunc)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에 현존하는 개별자로서의
자신을 잊게 하는 원근법적 구도의 소실점을 향해 우리를 미끄러지게 한다. 이러한 사운드 아트의 장르적
위상과 오늘날 거대한 스펙터클의 과다하게 노출되어 번아웃(burn out)된 우리에게 몸, 그리고 물리적으로 반응하는 음향이 출렁이는 GRAYCODE와 jiiiiin의 전시 ‹데이터 컴포지션›의 공간은 가히 낯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낯설음은 단지
위에 서술한 이유와는 별개로 그들이 추구하는 예술적 실천의 핵심에서 유발된 것일 수 있다. 나는 이
핵심을 크게 추상성(abstractness), 비대상성(non-objectivity)그리고
정동성(affectiveness)이라는 세 가지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08쪽, Data Composition, 김윤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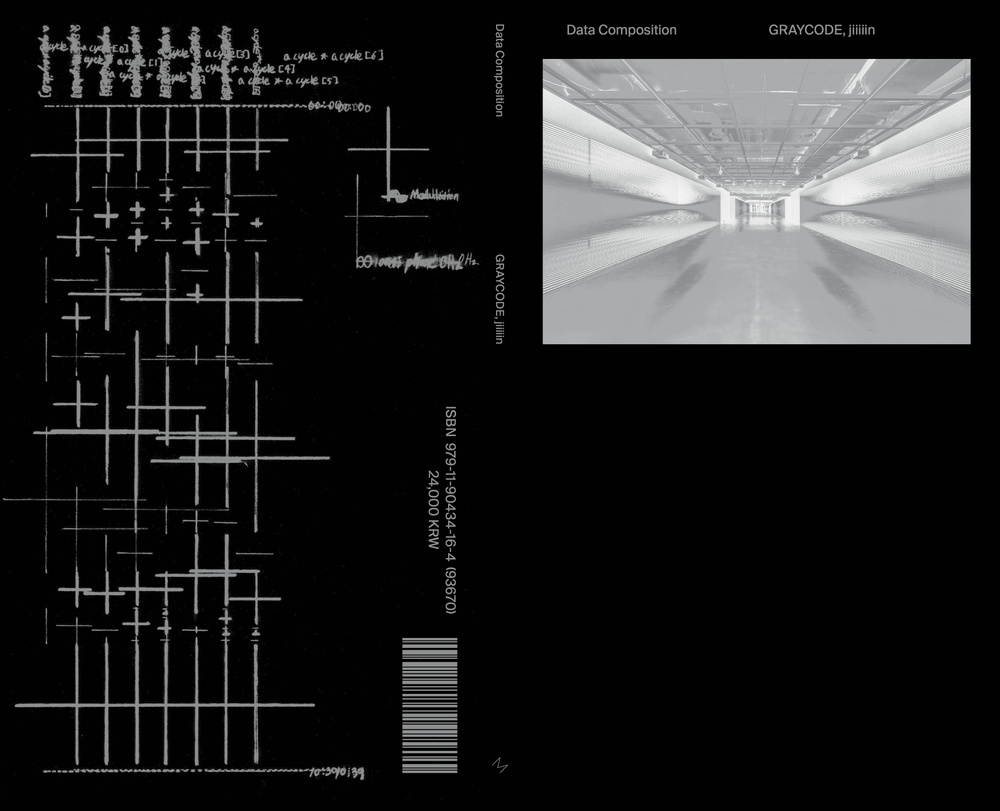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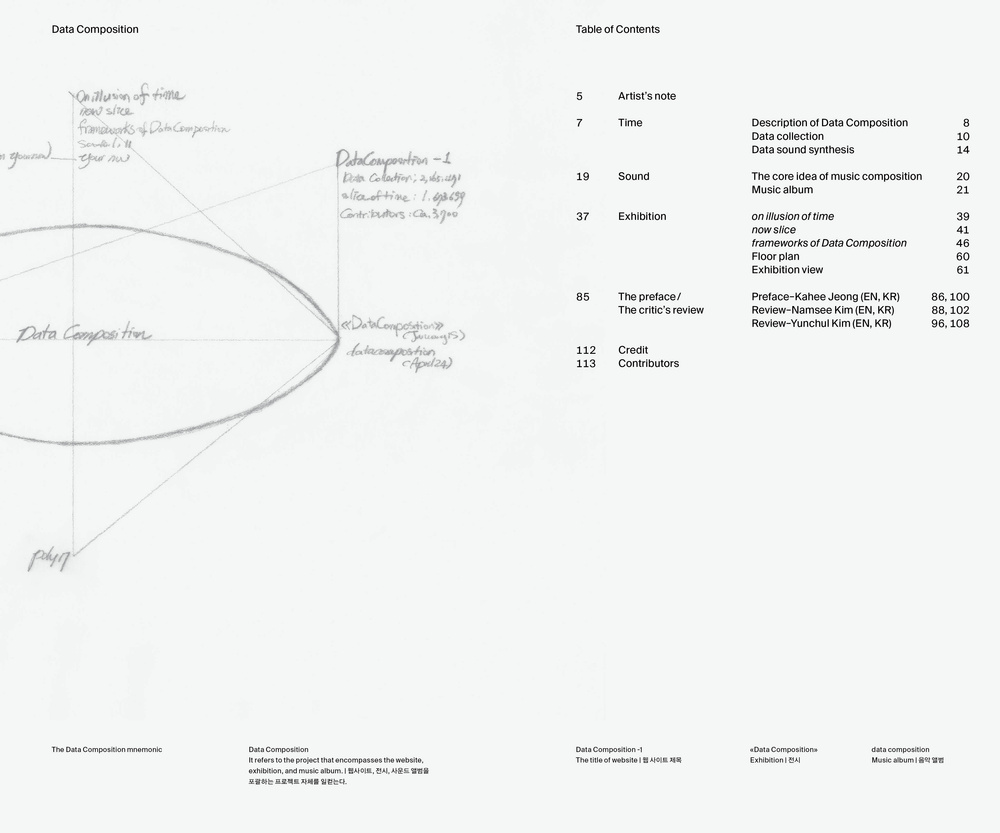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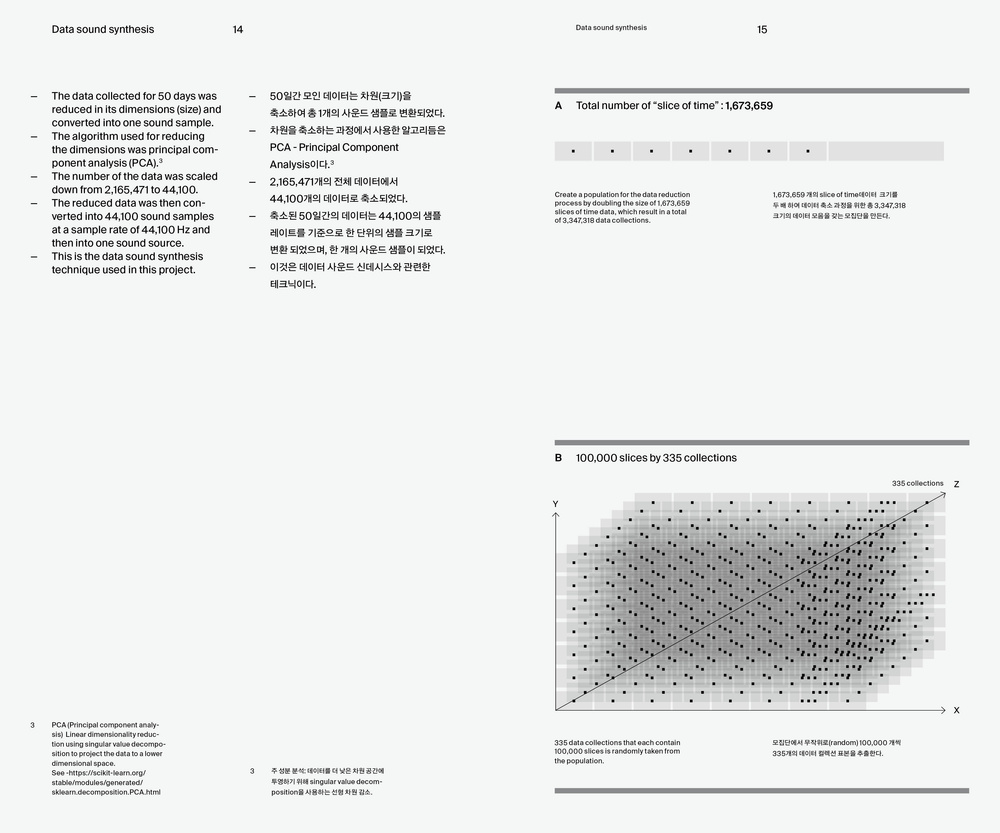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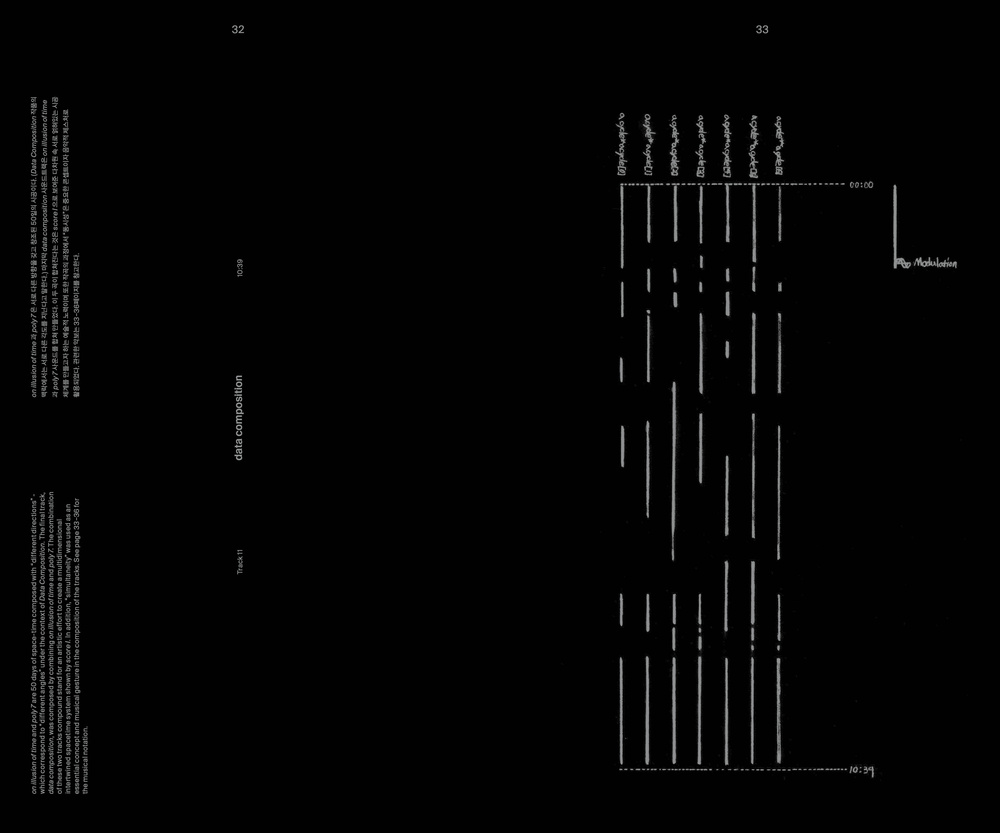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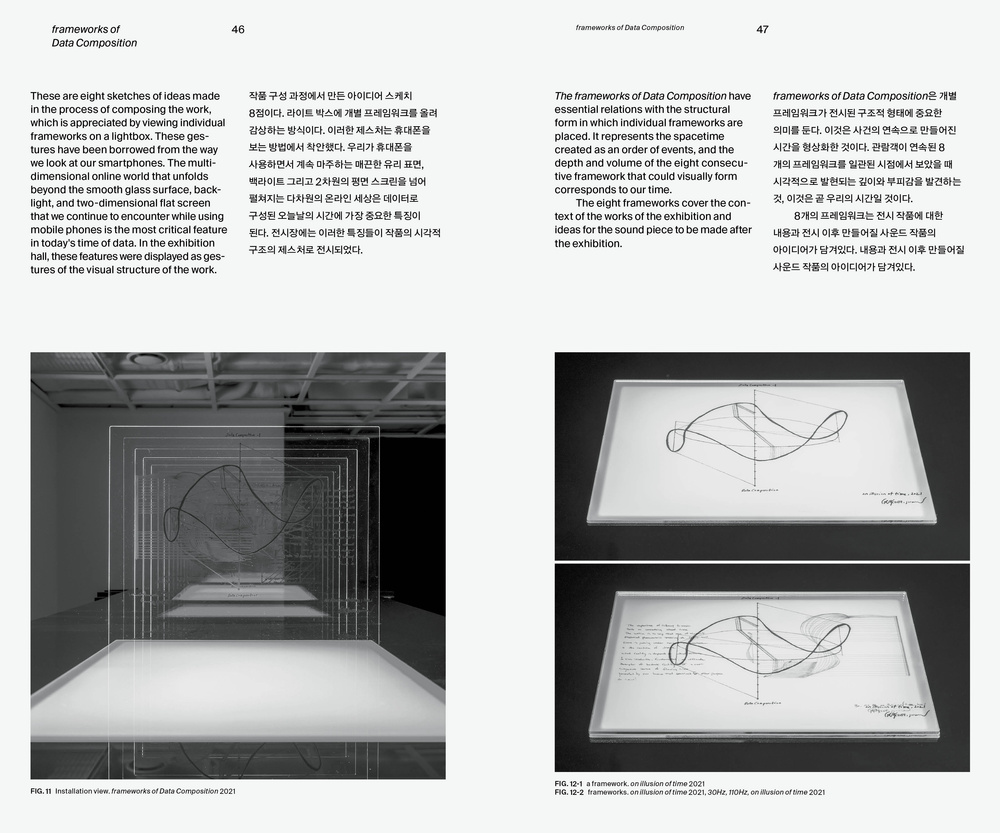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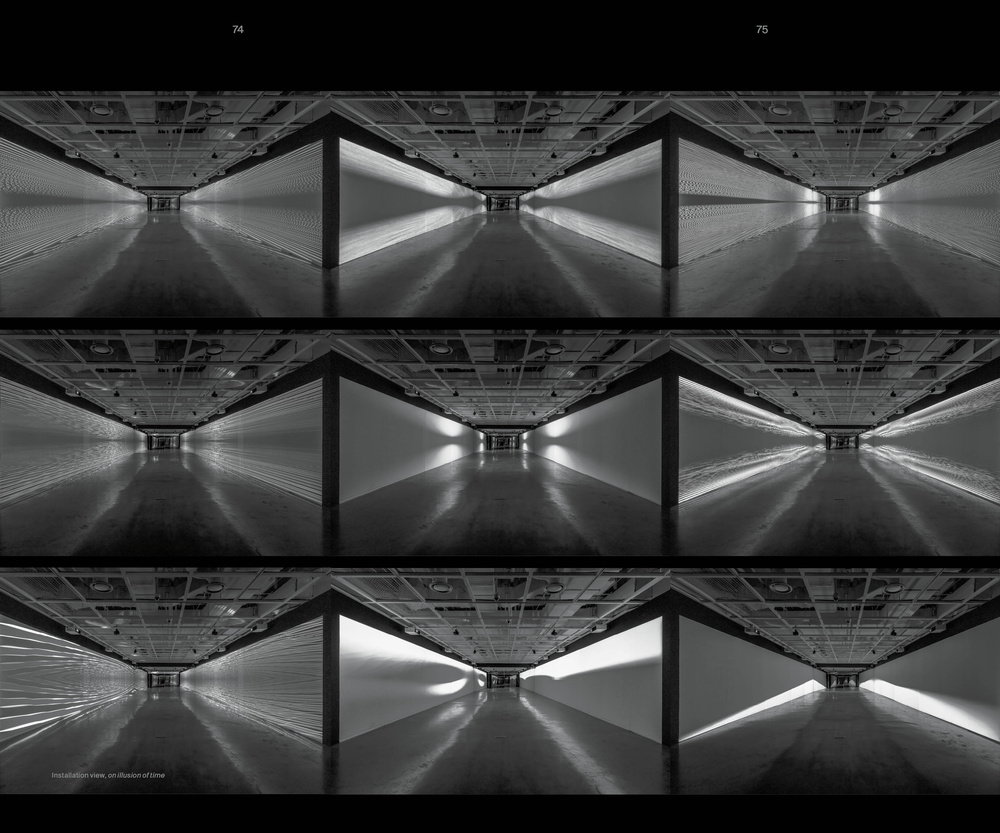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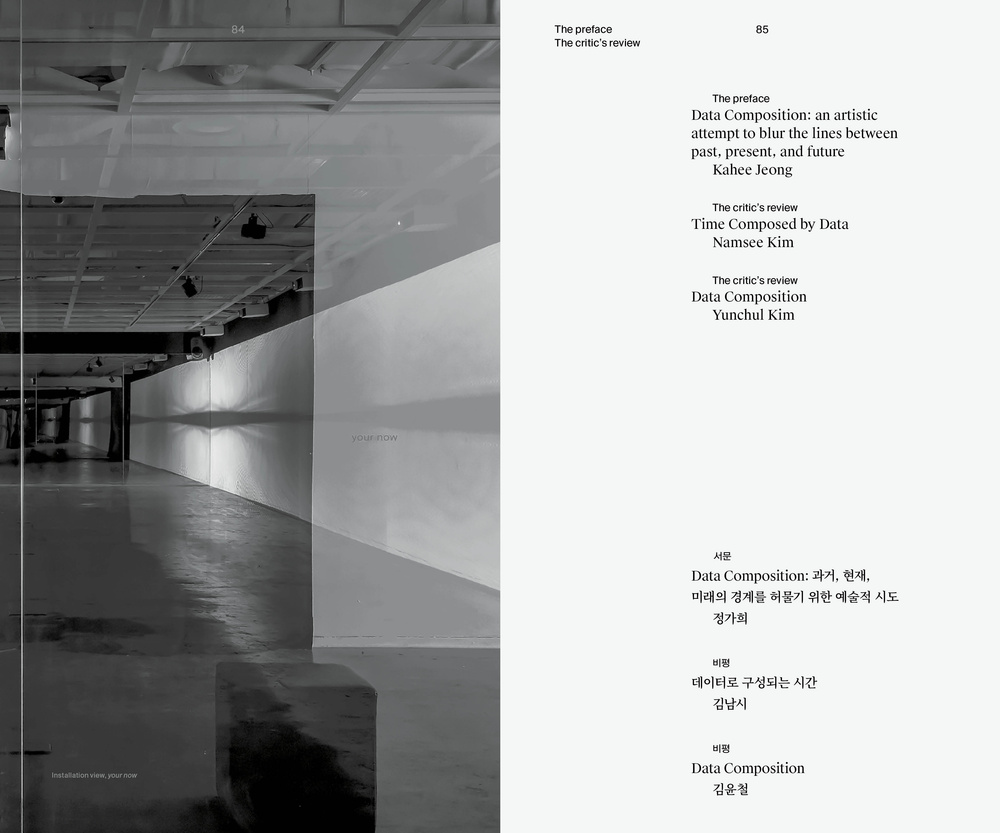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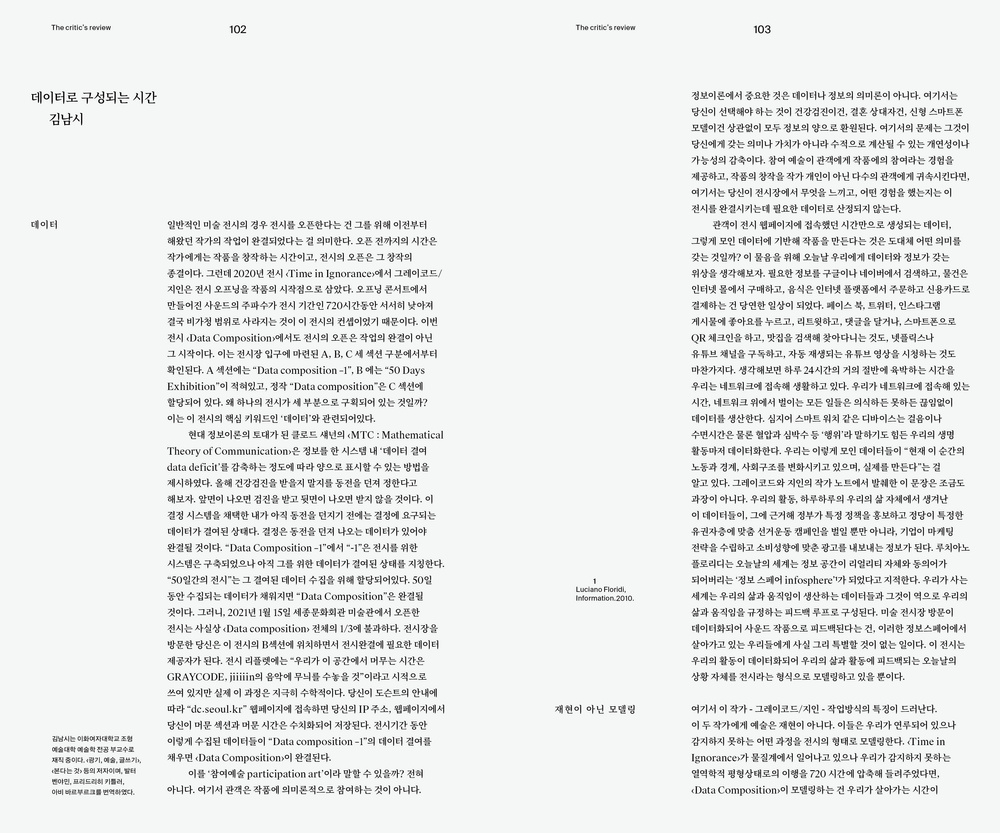
↧